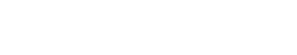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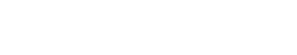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 [표 1] 국가 기본 정보 출처: 외교부 누리집 | |
| 일반사항 |
|
|---|---|
| 정치현황 |
|
| 종교현황 |
|
| 경제현황 |
|
| 우리나라 와의 관계 |
|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51)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https://www.wipo.int/directory/en/details.jsp?country_code=JP)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일본) 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
| [표 2]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
| 기관명 | 기능 |
| 수상관저 지적재산전략본부 | |
|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
| 내각부 모방품・해적판대책관계성청 연락회의 | 모방품・해적판대책 |
| 경제산업성(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종합창구)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 경제산업성(지식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 재무성 세관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단속) | 국경단속 |
| 특허청(모방품대책) | 모방품대책 |
| 문화청(저작권) | 저작권 |
| 농림수산성(품종등록) | 품종등록, 종묘법 |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 지적재산기본법(平成 14년 법률 제122호)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내각에 설치된 기관
• 지적재산전략회의의 역할을 승계한 기관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작성 및 실시의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함.
• 수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으며,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함. 본부에는 지적재산전략 부본부장으로 두고, 본부장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함.
• 본부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원을 두며, 본부원은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 전문가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됨.
• 전문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조사회를 설치할 수 있음.
|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전문조사회 | |
|---|---|
|
• 디지털·네트워크시대에 있어 지재제도전문조사회 (2008년 4월~)
•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회 (2007년 8월~) • 콘텐츠·일본브랜드전문조사회 (2007년 9월~) |
|
• 내각부의 특별기관으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결정하는 지적재산추진계획의 책정 및 집행에 있어 각 중앙기관 사이의 조정 등을 담당함.
• 2003년 3월 1일 내각관방의 조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에 내각부로 이관됨.
• 차장 3인과 참사관 10인으로 구성됨.
• 모방품·해적판의 외국시장대책과 국경단속·국내단속에 관하여, 관련 부처가 일체가 되어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 지적재산추진계획 2004(2004년 5월 27일 지적재산전략본부 회합 결정)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됨.
•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의장이며,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총무성 정책총괄관, 법무성 형사국장, 외무성 경제국장, 재무성 관세국장, 문화청 차장, 농림수산성 대신장관 기술총괄심의관,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부이사장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 구성원 이외에 관련 행정기관의 직원, 전문가 기타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연락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회를 두고 있으며, 연락회의 및 간사회의 서무는 내각관방에서 처리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외국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통하여 경제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함.
•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부여, 산업재산권시책의 기획입안, 국제적인 제도조화 및 개도국협력의 추진,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중소기업·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산업재산권정보제공의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는 법률인 경제산업성설치법, 정령인 경제산업성조직령, 성령인 경제산업성조직규칙 등이 계층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허청장관과 함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 중 기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총괄정리하는 특허기감(特許技監)이 있음.
• 내부부국에는 총무부, 심사업무부, 심사 제1부~제4부, 심판부 및 특허청고문 등이 있음.
• 상표의 심사는 심사업무부, 디자인의 심사는 심사 제1부에서 이루어지며, 특허의 심사 및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서 작성은 기술분야에 따라 심사 제1부에서 제4부에서 이루어짐. 심판부에서는 심사에 대한 불복 심리 등이 이루어지며, 방식심사 및 등록 등은 심사업무부, 기타 사무는 총무부에서 이루어짐.
• 일본의 경제·산업의 발전 및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의한 기획 및 입안에 대한 참가, 산업구조의 개선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이용, 디자인에 관한 지도 및 장려, 도용의 방지 등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모방품·해적판의 일원적인 상담창구나 기업의 지적자산의 파악·활용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의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기업 등이 모방품·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입어 법령 등의 문의나 외국정부에 대한 활동을 요구할 때 상담을 받고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회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 2004년 7월에 설치된 「모방품·해적판대책관계성청연락회의」를 거쳐, 2004년 8월 31일에 개설됨.
• 내부부국에는 총무부, 심사업무부, 심사 제1부~제4부, 심판부 및 특허청고문 등이 있음.
•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메일 접수, 전화 및 면담에 의한 상담접수,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정보관리·제공 및 상기 업무의 실시상에 필요한 관계부처와의 연락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경제산업성은 지적자산의 파악, 활용 등을 통한 기업의 경영 개선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업비밀침해나 주지한 표지의 부정사용, 원산지의 허위표시, 형태모방상품의 판매 등의 「부정경쟁」을 규제하며, 국제약속에 근거해 금지행위를 정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관세 및 내국 소비세등의 징수, 수출입화물의 통관, 밀수의 단속, 보세지역의 관리 등을 주된 목적·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재무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설치됨.
•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나가사키, 하코다테, 무지, 오키나와 등의 9개 세관이 있으며, 이외에 세관지서, 출장소, 감시서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마약·권총을 비롯하여, 모방상품이나 워싱턴조약 등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된 물품에 관한 정보와 이들에 대한 국경단속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세관에서는 국경단속 조치의 하나로, 지식재산침해물품을 관세법 제69조의 2 및 제69조의 11에 의하여 수출 및 수입 금지 화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물품의 수출·수입행위는 국경단속의 대상이며, 회로배치이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행위 역시 국경단속의 대상임.(수출행위는 제외)
• 지식재산침해물품은 세관에 의하여 몰수, 폐기됨.
• 지식재산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인정절차(認定節次)」를 두고 있음.
• 문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및 박물관에 의한 사회교육의 진흥과 함께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히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문부과학성의 외국
•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저작권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 조직으로 국제저작권실과 저작권유통추진실 등을 두고 있음.
• 저작권의 원활한 이용·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해외에서 해적판 대책이나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인 룰 작성 작업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저작권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디지털·네트워크사회에 있어 출판물의 이활용의 추진에 관함 간담회, 전자서적의 유통과 이용의 원활화에 관한 검토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식료의 안정공급, 농림수산업의 발전, 삼림보전,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소관 하는 기관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식료산업국에서 6차 산업화, 지식재산, 종묘, 농림수산식물의 품종등록, 지역브랜드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007년 7월 농림수산분야의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농림수산지적재산네트워크」 포탈 사이트의 개설을 공지한 바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이지 않음.
• 종묘법에 근거해 품종등록제도에 의하여, 식물 신품종의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품종의 육성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 재배되는 모든 식물(종자식물, 양치류, 선태류, 다세포조류) 및 정령에서 지정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품종을 육성한 육성자 및 그 승계인은 품종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의 특성심사요건과 미양도성, 명칭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품종등록의 출원은 농림수산대신(창구는 지적재산과 종묘실 등록팀)에게 품종등록원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문제가 없다면 출원공표가 되고, 품종등록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함. 심사 결과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는 품종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품종등록이 이루어지며, 육성자권이 발생함.
•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고, 법원의 전문적 처리체제를 충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平成 16년 법률 제119호)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원
•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사건을 관할로 함.
• 특허청이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특별지부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이를 처리함.
• 민사소송의 항소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이용권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의 항소사건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전국의 모든 항소사건을 담당하나,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식물의 품종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육성자의 권리,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 이익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의 항소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 항소 사건을 처리함.
•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 지부로 그 전문적인 사건처리에 밀접하게 관계하는 재판사무 분야 등의 일정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는 독자의 권한인 인정되는 등 고등재판소의 통상 지부보다 독립성이 높음.
• 4개의 통상부와 특별부(대합의부)로 구성된 재판부문과 서무를 관장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사무국으로 이루어짐.
• 원칙적으로 재판관 3명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취급함. 다만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사건 중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권등에 관한 소와 관련한 것과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 5명의 합의체(대합의체)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음.
• 소장 이외에 재판관, 재판소조사관, 재판소서기관, 재판소사무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비상근직원인 전문위원이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음.
• 재판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마친 자 중에서 임명함. 반면 재판소조사관 및 전문위원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됨.
| [표 3] 일본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
| 조약명 | 조약 발효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899 | 1980 |
| 상표법 조약 | 1997 | 2002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2016 | 2016 |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0 | 1987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2015 | 2014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2000 | 2003 |
| 특허협력조약 | 1978 | 1984 |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2014 | 2011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1990 | 1998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1977 | 1998 |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 | 2011 |
• 2006년 한일 FTA가 결렬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아직 자유무역협정은 없음.
• RCEP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참가하고 있음. 반면 TPP에는 일본이 이미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을 추진 중인 상태임.
| [표 4]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출처 : KOTRA | ||||
|---|---|---|---|---|
| 무역협정 체결현황 | ||||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일 FTA | - | - | - | (협상재개·개시 여건 조성) |
| 한중일 FTA | - | - | - | (협상 중) |
| RCEP | 한국,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ASEAN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한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 | |
• 2006년 한일 FTA가 결렬된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아직 자유무역협정은 없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 바로가기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바로가기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바로가기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 https://www.ip-navi.or.kr/ipdsdispute/disputeBusinessInfo.navi
-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 https://www.ip-navi.or.kr/kbrand/kbrand.navi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 https://www.ip-navi.or.kr/falseReport/confrontation.navi
-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 https://www.ip-navi.or.kr/kbrand/Kwave.navi
• 특허청과 kotra는 해외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IP-Desk 소개 바로가기 :
(https://www.kotra.or.kr/biz/overseas/overseasInvest/investConsult.do?menuCode=B0208)
• 일본은 IP-Desk 소재국가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10건(국가제한 없음) | |
|---|---|---|
| 지원비용 | 상표 한도 | $500 |
| 디자인 한도 | $500 | |
| 지원 비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 |
•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침해·피침해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 |
|---|---|---|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 |
| 지원비용 | 한도액 | $10,000(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 지원비율 |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 → 50% → 30%) | |
| [표 5]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 |||||
|---|---|---|---|---|---|
|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링크) | 비고 | |
| 1. 지식재산창출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www.ripc.org | ||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위탁기관 미정 | |||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P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 www.ripc.org | |||
| 2. 지식재산활용 | 지식재산 서비스 활성화 사업 |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www.kaips.or.kr | ||
| 3.지식재산보호 |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 www.kotra.or.kr | ||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 www.koipa.re.kr | |||
| 특허 분쟁대응 지원 | (사전예방)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사후대응)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
www.koipa.re.kr | |||
| 4. 기타 수출지원 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 |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exportvoucher.com | 산업부 | |
| 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exportvoucher.com | 중기부 | ||
|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mssmiv.com | 중기부 | ||
•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법령으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으로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있음
• 「지적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 일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 등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함을 밝히고 있음
•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근대화의 관점에서 특허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메이지 18년(1885년) 4월 18일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었으며, 메이지 38년(1905년)에는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음
• 디자인의 보호는 메이지 21년(1888년)의 의장조례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차의 개정 중 1959년에 특허법과 함께 전면개정된 의장법이 현행 의장법임
•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기 전년도인 메이지 17년(1884년) 6월 7일에 최초의 상표법인 「상표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 후, 1959년의 전면개정에 의하여 현행 상표법이 됨
• 근대적 저작권법은 메이지 32년(1899년)에 제정되었으며, 저작권보호의 기본조약인 베른조약을 체결하였음. 여러 차례의 개정 후, 1970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체계는 기본법으로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있으며, 창작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집적회로법, 종묘법 등이 있으며, 신용의 유지를 위한 법률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표 6] 현행 일본 지식재산권법 | |
|---|---|
| 구분 | 내용 |
| 특허 | 1959년 특허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실용신안 | 1959년 실용신안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디자인 | 1959년 의장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상표 | 1959년 상표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저작권 | 1970년 저작권법 (2020년 법률 제48호에 의한 개정) |
| 식물품종 | 2006년 종묘법 (2020년 법률 제74호에 의한 개정) |
| 지리적표시 | 2014년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에 관한 법률 (2018년 법률 제88호에 의한 개정) |
| 집적회로 | 1985년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뢰배치에 관한 법률 (2017년 법률제45호에 의한 개정 |
•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창작의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지적창조물에 대한 권리」와 상표권이나 상호 등의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상의 표지에 대한 권리」로 크게 구별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 및 육성자권 등은 객관적 내용이 같은 것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독점권」이라 하고,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상호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익 등은 타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에는 미치지 않는 「상대적 독점권」이라 함
- 일본 특허청에서는 표준특허의 필수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이선스 협상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에 대한 판정(Advisory Opin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는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비슷한 제도로서, 이해 당사자(표준 특허권자, 실시자 등)의 청구에 따라 일본 특허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필수성 여부를 판정함.
- 판정 결과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의견에 불과하나, 그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됨.
- 따라서,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판정’의 결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비 저렴한 비용(관납료 ¥4만, 수임료 별도)으로 라이선스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권고의견 제도(Conventional Advisory opinion)
- 기존의 권고의견제도(Conventional Advisory opinion)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특허청(패널)의 공식적인 의견임.
-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행정관료가 참여하는 특허청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판단 중 하나로 간주됨.
- 202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회복요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正当な理由があること)’에서 ‘고의가 아닌 것(故意によるものでないこと)’으로 완화된다고 밝힘.
- 구제를 받으려는 자는 본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없었던 절차(定の期間内に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手続)를 진행함과 동시에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의 내용을 담은 회복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회복이유서에는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이유’ 및 ‘절차진행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재하고 본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의가 아닌 것’ 임을 표명해야 하며, 출원심사 청구의 회복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해야 함.
- 회복이유서의 제출기간은 ‘본 기간 내에 절차진행을 할 수 없었던 시점 이후’, ‘절차진행이 가능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및 ‘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임.
- 2023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4월 1일부터 원출원이 거절결정 된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맞추어 분할출원된 경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해 원출원의 전치심사(前置審査) 또는 심판의 결과가 판명될 때까지 해당 분할출원의 심사를 중지하는 운용을 개시한다고 밝힘.
- 적용 대상 :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되고 아직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분할출원 중 ① 원출원의 거절결정 후 분할된, ② 원출원이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계속 중인, ③ 전치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할출원
- 내용 : 출원인 등은 분할출원의 심사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분할출원에 대해서 특허법 제54조 제1항의 적용에 대해 사정을 설명하는 취지의 상신서(上申書)를 제출하고 전용폼(専用の フォーム)에서 송신해야 함
- 효과 : 분할출원이 심사중지의 적용 대상이 되면 ① 전치심사의 경우 출원인에게 특허결정 등본 송달,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최초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 3) 등본을 송달, ③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중 상기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까지 분할출원의 심사가 중지됨
-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생산능력 초과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내용을 통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로서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손해배상액의 산정 규정의 개정(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특허권자 단위당 순이익->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미국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를 인정
- 첫째, 디자인 정의 규정의 개정으로 화상디자인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디자인 개념을 신설하였음. 물품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 예외를 두면서 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한 것임. 그에 따라 실시 개념도 개정하게 되었음
- 둘째, 관련디자인 출원가능시기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쇄적인 관련디자인 출원도 가능
- 셋째, 간접침해의 유형에 전용물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형 간접침해 유형을 추가함. 일본 특허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유형을 의장법에도 추가한 것임
- 넷째, 디자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점을 등록 시에서 출원 시로 개정하였음
- 2023년 5월 23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메타버스 상의 콘텐츠에서 새로운 법적 과제 등에 관한 논점 정리 보고서(メタバース上の コンテンツ等をめぐる新たな法的課題等に関する論点の整理)’1)를 발표함.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교차하는 지식재산 이용 및 가상객체의 디자인 등, 아바타 초상 등에 관한 취급, 가상객체나 아바타에 대한 행위 및 아바타 간의 행위를 둘러싼 규칙 형성·규제 조치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 [표 7] 주요 검토사항 및 법적 과제 | |
|---|---|
| 검토사항 | 법적과제 |
| 가상공간에서의 지색재산 이용과 권리자의 권리보호 | 현실공간 디자인의 가상공간모방,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교차하는 실용품 디자인 활용 |
| 현실공간 표지의 가상공간 무단사용 | |
| 현실 환경 외관을 가상공간에서 재현 | |
| 메타버스 상의 저작물 이용 등과 관련된 권리처리 | 메타버스 상의 이벤트 등에서 저작물 라이선스 이용 |
| 가상공간에서의 사용자 창작활동 | |
| 대체불가능토큰(NFT)등을 활용한 가상 객체의 거래제도, 취급 등의 현황에서 가상 오브젝트의 보유와 NFT 등을 활용한 가상 객체의 2차적 유통 등 | |
| 메타버스 외 인물 초상 무단사용에 대한 대응 | 실재하는 인물의 초상화 삽입 |
| 실재하는 타인의 초상을 본뜬 아바타 등의 무단 작성 무단 사용 | |
| 타인의 아바타 초상 등 무단 사용 관련 기타 권리 침해 대응 | 타인의 아바타 초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관련 타인의 아바타 디자인을 도용해 아바타를 만들고 사용한 경우, 아바타 초상 무단 촬영 및 공개 |
| 타인의 아바타로 위장 등 | |
| 아바타에 대한 비방, 중상 등 | |
| 아바타 시연에 관한 취급 | 아바타 시연과 관련된 저작인접권 권리 처리 |
|
• 특허ㆍ실용신안 제도에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실용신안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 제도와 다른 점은 보호 대상이 「물품의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있음. • 실용신안권으로 설정된 후에도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3년 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 특허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연장등록 시 25년), 실용신안권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 • 해외 47개국 특허청과 PPH, PPH MOTTANAI, PCT-PPH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디자인권은 가장 최근의 개정법(2019.05.)인 ‘의장법(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개정된 항목들은 각각 시행 시기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함. • 디자인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 (※2007.03.31. 이전 출원 건은 15년,2007.04.01.~2020.03.31. 출원 건은 20년) • 상표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몇 번이든 갱신등록신청 가능.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 기간 마뇰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해야하며, 만료 후 6개월이내 갱신 시 동액의 할증등록료를 내고 신청 가능. 갱신등록신청료는 분할납부 가능 • 상표권에 대해 신법 시행일(2019.12.27.) 이전 출원 건은 구법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나신법에 따라 심사 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신법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반영해 개정됨. • 상표는 패스트트랙 심사, 상표조기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저작권 창작 시점에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법에 명시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의 저작권 등록 요건을 확인해야 함. • 지리적 표시는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하는 생산자단체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호 기간 또는 갱신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호됨. 일정한 경우 실효될수 있음(등록생산자단체가 해산 및 청산이 종료된 때,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폐지한 때등) |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용신안제도는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는 점에서 특허제도에서의 보호대상과 차이가 남
•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는 구분되나, 발명(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같이 함
• 실용신안권으로 설정된 후에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 실용신안의 출원이 있는 때는 그 실용신안의 출원이 필요사항의 불기재 등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함
• 일본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8] 일본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 최신특허법 시행일 |
특허법 개정법률 2023. 4. 1. 시행 | 2022. 10. 18. 시행 법률 제19007호 | |
| 외국제도와의 관계 |
47개의 외국 특허청과 PPH, PPH MOTTANAI 및 PCT-PPH 등을 실시하고 있음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
| 출원언어 | 일본어(특허법 시행규칙 2①)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특허법 67)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
| 공지예외주장 |
있음(특허법 제30조.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특허법 30①②)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상실사유(29조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상실사유(29조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특허법 제49조에 열거되어 있는 거절이유 판단) |
있음. |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있음(48의3) 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
| 우선심사제도의 유무 |
있음(48의6)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113) 누구나. 공보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좌동 |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123) 이해관계자(123②) |
있음. 이해관계인만 가능 |
|
PPH : 제1청(선행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청(후속청)에서 간단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제
PPH MOTTANA : 최선 출원이 어느 청에서 이루어졌는가에 상관없이, 참가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심사결과를 근거로 PPH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
PCT-PPH : PCT 출원의 국제단계의 성과물(WO/ISA, WO/IPER, IPER)을 이용한 PPH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
※ IP5는 2014년 1월 6일부터 이들 3종의 PPH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IP5 PPH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음
• 현행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고려하는 연구회」 및 「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분과회의장제도소위원회」의 논의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 개정안을 포함하는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19년 3월 1일 개의 결정되고, 2019년 5월 10일에 가결·성립되면서 같은 달 17일에 법률 제3호로 공포됨
• 2019년 개정법에 포함된 개정항목은 항목별로 그 시행시기가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표 9] 2019년 개정 의장법 주요 사항 | |
|---|---|
| 시행일 | 개정항목 |
| 2020년 4월 1일 |
보호대상의 확대(화상, 건축물, 인테리어) 관련의장제도의 확대 의장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창작비용성의 수준 명확화 한 벌 물품의 부분의장의 도입 관련침해규정의 확충 손해배상액산정방법의 수정 |
| 2021년 4월 1일 |
복수의장일괄출원절차의 도입 물품구분의 수정 절차구제규정의 확충 |
• 일본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10] 일본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의장법 2021.4.1. 시행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2022. 10. 8. 시행 법률 제18998호 |
| 출원언어 | 일본어 (의장법 시행규칙 19. 특허법 시행규칙 2①의 준용) |
한국어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25년(의장법 21) (※ 2007년 3월 31일 이전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200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의장법 4).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상실사유(3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상실사유(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조기심사제도 있음 | 있음 |
| 출원공개제도 | 없음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밀디자인의 제도 | 있음(의장법 41①) | 있음 |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무효심판제도 | 있음(의장법 48). 누구든지(의장법 48②. 일부예외) | 있음 |
• 2019년 12월 2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반영한 새로운 상표법이 시행됨
• 신법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 구법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나, 신법에 따라 심사받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본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 [표 11] 일본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상표법 2020.10.1. 시행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2023. 2. 4. 시행 법률 제18817호 | |
| 표장의 종류 |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 중,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 | 제한 없음 | |
| 출원인 자격 | •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사용의 사실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음 • 다만 상표의 사용 및 사용의 의사가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자연인, 법인) | |
| 출원언어 | 일본어(상표법 시행규칙 22. 특허법 시행규칙 2①의 준용) | 한국어 |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 우선심사제도 | 패트스트랙 심사제도와 조기심사제도 있음 | 좌동 |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상표법 43의2.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있음 |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상표법 46). 이해관계인(상표법 46②)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상표법 50) 불사용 허용기간: 계속하여 3년. 누구든지 |
있음 | |
|
• 패스트트랙 심사: 장기화하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① 지정상품·서비스가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상표법 시행규칙」 또는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니스분류)」에서 게재하는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고 있는 출원으로 ② 심사착수 시까지 지정상품·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6개월에 최초의 심사결과통지를 하는 제도 (2020년 2월 1일 이후 출원된 안건만을 대상으로 함. 그 이전에 출원된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안건은 통상안건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함) • 상표조기심사· 심리제도: 일정 요건 아래,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심리를 빠르게 실시하는 제도. 기본적 조건으로 출원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며, 긴급하게 권리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은 상품·서비스만을 지정으로 하는 경우,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새로운 유형의 상표(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소리 상표 및 배치상표) 및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체상표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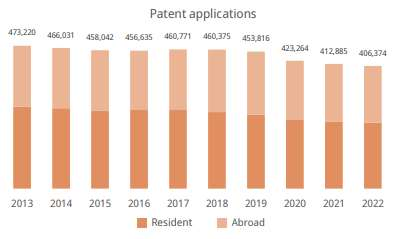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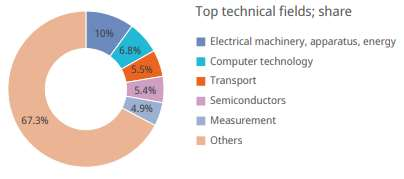
•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별도로 두어 발명과 고안을 보호하고 있음
•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함
• 실용신안법에서는 고안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과 관련한 고안」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방법이나 물질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 특허법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실용신안법에서는 조기 권리부여의 관점에서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는 무심사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다만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불측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실용신안권자는 권리행사에 앞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려 경고해야 함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충족하여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의 산업은 생산업뿐만 아니라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을 의미함.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개인적·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되는 발명, 이론적으로는 그 실시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의료기기, 의약자체는 물의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됨
• 신규성은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으로,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발명,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음
• 진보성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발명을 조금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로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함
• 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등록 요건으로 함. 특허발명과 실용신안 간의 진보성의 차이를 법률 문언상으로는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본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서는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만 기술하고 있고 실용신안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구별하고 있지 않음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
•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그 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공개된 경우에, 그 공개된 날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사실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된 경우에는 제외함
• 실용신안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하여 특허법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특허법 제30조)을 준용하고 있음(실용신안법 제11조)
•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1년 이내)(특허법 제41조)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와 함께 최초로 출원을 하거나, 파리조약 제4 조 C(4)에 의하여 최초 출원으로 간주된 출원 또는 파리조약 제4 조 A(2)에 의하여 최초로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 파리조약의 동맹국명 및 출원일을 기재한 서면을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일본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 상호 간에 전자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출원을 기초출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국제출원에서 일본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국제출원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내서면과 함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내 서면 제출기간의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국내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국내서면의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음
• 실용신안제도에 있어서도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인정되나,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인정하지 않음
• 일본은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출원, 청구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건 별로 작성하여야 함. 서면에는 제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및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 서면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본어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 국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출원서류의 제출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원절차와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있음
• 2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이 새로운 출원은 원특허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됨. 원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시기 또는 기간 내, 특허결정의 등본송달 후 30일 이내 및 거절결정등본송달 후 3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출원 상호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출현 형태에 따라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되며, 출원 변경이 이루어진 때에는 종전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 [표 12] 출원변경 기간 | |
|---|---|
| 구분 | 출원변경기간 |
| 실용신안 → 특허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을 제외함) |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
|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9년 6월 이내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
| 디자인 → 특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
| 특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
•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특허원(원서)」「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요약서」「도면(화합물의 합성방법과 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의 5개 서류에 대하여 각 1통씩이 필요하며, 통상 1건당 14,000엔의 특허출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법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양식을 충족하여야 함
- 문장은 구어체로 하며,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발명의 전체를 출원 시부터 기재함.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명세서의 기재를 갈음하여서는 안 됨
-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이용하며, 용어는 그것이 갖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며,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 전체를 통하여 통일하여 사용함. 다만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출원서(양식 제26)에는 발명자, 출원인 정보 및 제출문건의 목록 등을 기재하며,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개발등완성과 관련하는 특허출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와 함께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서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함.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개발등 완성과 관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에 한정되므로, 「도면」이 반드시 필요함
•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및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 기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청구항으로 구분하고, 각 청구항별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안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출원서류의 제출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원절차와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있음
• 전자출원
- 자택이나 회사 등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허출원서류등을 특허청에 제출(전자출원)할 수 있음
- 전자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컴퓨터, 소정의 인증국이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하고, 인터넷출원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함
- 각도도부현의 INPIT 지재종합지원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출원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할 수도 있음
• 서면출원
-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특허청출원과의 창구(특허청 청사 1층)에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에 의한 방법이 있음
• 사전절차
- 특허출원등의 절차를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함)는 출원등의 절차에 앞서 미리 다음의 절차를 할 필요가 있음
· 식별번호의 부여청구
· 식별라벨의 교부청구
· 포괄위임장(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 요금의 납부
- 전자출원에서는 계좌이체, 전자현금납부, 현금납부, 예납에 의한 납부 및 지정입금납부(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한 출원에서는 전자현금납부, 현금납부, 특허인지에 의한 납부 및 예납에 의한 납부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특허출원 서식 바로가기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6
(https://faq.inpit.go.jp/industrial/faq/search/result/10939.html?event=FE0006)
☞ 실용신안출원 서식 바로가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양식 제1
(https://faq.inpit.go.jp/industrial/faq/search/result/10939.html?event=FE0006)
☞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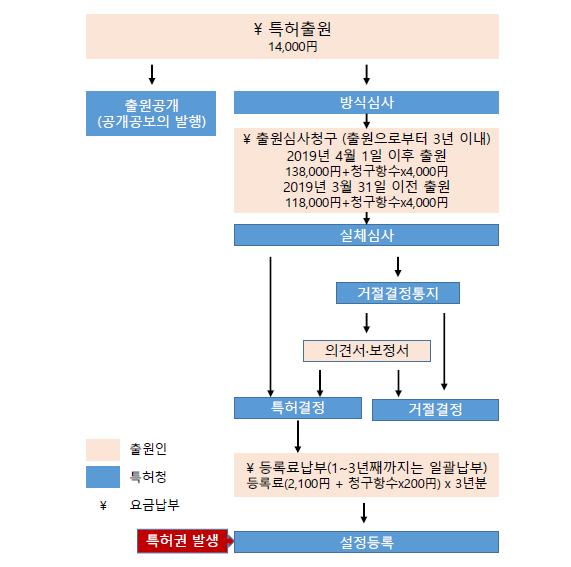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특허출원의 명세서등을 게재한 공개특허공보를 발행하고,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 출원공개 전에 출원의 취하등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특허출원이 공개됨
- 공개특허공보의 1면에는 출원인 성명 등의 서지적 사항과 발명의 요약과 대표도면 등이 게재되며, 다음 페이지부터는 특허청구의 범위 및 명세서의 전문과 필요한 도면이 게재됨
- 이 공개특허공보는 일본 특허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제공하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인은 그의 특허출원이 ① 출원공개되어 있는 경우,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외국어서면출원에서 외국어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출원공개를 청구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원이 공개됨. 다만 출원공개청구서의 제출 후에는 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출원이 공개되며, 출원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라도 요약서의 보정을 할 수 없고, 출원공개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지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에서 판단되며, 이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이루어짐
• 출원심사의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서류나 각종절차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출원인의 자격이나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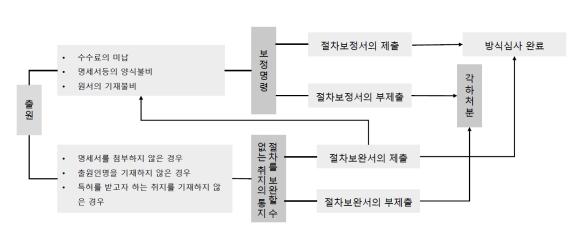
•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가 될지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를 거쳐 판단됨. 이 실체심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출원 절차는 보정명령의 대상이며, 그 지시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으면 보정의 대상이 된 절차는 각하됨
• 방식심사를 거치고 출원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출원은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됨.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특허법 제49조에서 열거하는 거절이유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단계의 최종결정으로 특허결정을 함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일정 절차를 부여하며,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면 심판으로 그 시비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은 확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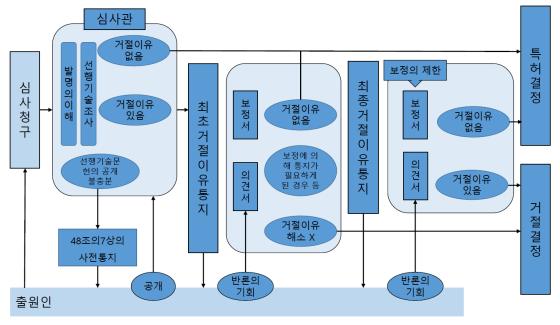
• 명세서 안에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공개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됨
•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국내거주자 60일, 재외자 3월)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기간 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반론을 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정할 수 있음
•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신규사항의 추가는 인정되지 않음
• 보정은 다음의 시기에 할 수 있음
① 출원 시부터 특허결정 이전. 다만 거절이유통지 후는 제외
② 최초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 내
③ 거절이유통지 후의 제48조의 7 통지의 지정기간 내
④ 최종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 내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④·⑤의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의 보정은 청구항의 삭제, 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및 명확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을 위해서만 가능함
• 심사관이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의견서나 절차보정서의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함
•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함. 특허료의 납부가 있던 때는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하며, 이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함
• 특허청 내에 설치된 심판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심판제도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의 상급심」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지재분쟁의 해결에 공헌하는 「지재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역할을 담당함
| [표 13] 심판 청구인과 대상 권리 | |||||
|---|---|---|---|---|---|
| 청구인 | 대상 권리 |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자 | 특허, 디자인, 상표 | |||
| 이의신청 | 누구나 | 특허, 상표 | |||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취소심판 | 누구나 | 상표 | |||
| 정정심판 | 특허권자 | 특허 | |||
| 판정 | 특허청의 견해가 필요한 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 심판관에 의한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는 거절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권리 부여의 가부를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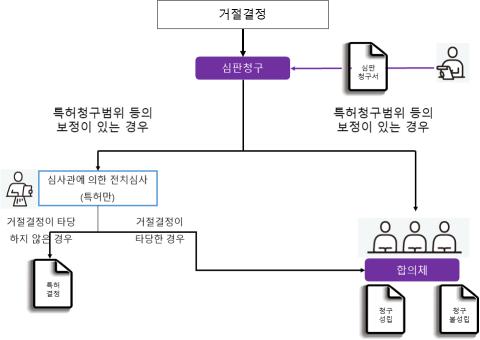
• 특허청구의 성립률은 2019년 68.2%이며(심판관에 의한 전치심사에 의한 등록을 제외), 디자인의 청구성립률은 68.5%, 상표의 청구성립률은 65.4% 임
• 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는데, 특허의 경우 심판부의 결정 중 80% 이상이 법원에서도 유지됨
• 특허게재공보의 발행으로부터 6개월 간, 또는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으로부터 2개월 간, 특허·상표등록에 대하여 공중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타인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는 필요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함
• 특허부여 후의 일정기간에 한하여, 널리 제3자에게 특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이 있던 때는 특허청 스스로가 해당 특허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심리하고,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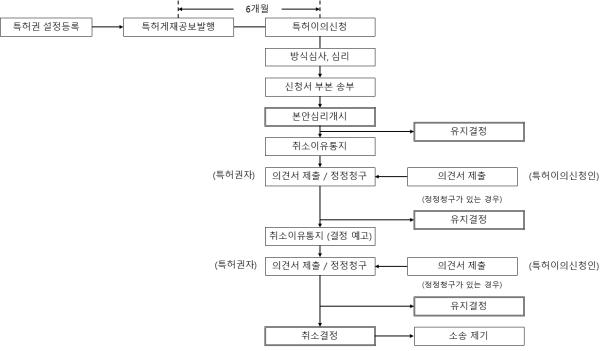
•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연인, 법인 및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익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특허이의신청이유는 특허법 제113조에 규정한 이유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심리는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되며, 서면심리에 의함. 심리는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한 이유 및 증거에 근거하나, 합의체는 직권으로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증거의 채용도 가능함
• 심리의 대상은 특허이의신청이 이루어진 청구항에 한정됨. 복수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심리는 병합되며, 해당 병합된 특허이의신청 중 어느 하나에서 신청된 청구항은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됨
• 특허를 취소할 경우,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정정의 기회를 부여함. 특허권자는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2번째 취소이유통지는 원칙적으로 취소결정의 예고가 이루어짐
• 합의체는 이의가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특허를 취소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함. 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도쿄고등재판소(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나,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 원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제도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단하며, 합의체는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2020년 4월부터, 사전에 합의한 심리계획에 근거해, 여러 차례 당사자와 대면으로 쟁점정리 등을 하는 「계획대화심리」를 시행하고 있음
| [표 14]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
|---|---|---|---|---|---|
| 특허이의신청 | 특허무효심판 | ||||
| 제도취지 | 특허의 조기안정화 |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 |||
| 절차 | 결정계 절차 | 당사자계 절차 | |||
| 신청인·청구인 적격 | 누구나 | 이해관계인 | |||
| 신청·청구 기간 | 특허게재공보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리소멸 후에는 불가) |
설정등록 후 언제든지 (권리소멸 후에도 가능) |
|||
| 신청·청구 및 그 취하 | 청구항별로 가능 취소사유통지 후의 취하는 불가 |
• 청구항별로 가능 • 답변서제출 후의 취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 |
|||
| 사유 | 공익적 사유 (신규성, 진보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 |
• 공익적 사유 • 권리귀속에 관한 사유(모인출원, 공동출원위반) • 특허 후 후발적 사유(권리향유위반, 조약위반) |
|||
| 심리방식 | 서면심리(구두심리 불가) | •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서면심리도 가능) | |||
| 복수의 신청·사건의 취급 | 원칙적으로 병합하여 심리 | • 원칙적으로 병합하지 않고, 사건별로 심리 | |||
| 결정·심결의 예고 | 취하결정 전에 취소사유의 통지(결정의 예고) | • 청구성립(무효결정) 전에 심결의 예고 | |||
| 결정·심결 | 특허의 취소·유지 또는 신청 각하 결정 | • 청구의 성립·불성립 또는 각하 심결 | |||
| 불복심청 | 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청장관을 피고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소 제기 가능. 유지결정 및 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불가 | • 심판청구인 및 특허권자 쌍방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소 제기 가능 | |||
• 주로 특허에 대하여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특허발명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권리를 보증하는 제도
• 무효심판사건·특허이의신청사건·판정청구사건 내지는 침해사건 등과 관련하여, 심결·결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기에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정심판 청구 후에 무효심판이 청구되거나 특허이의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심판 또는 특허이의신청 심리 중에 정정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함
•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특허권자이며,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77조 제4항 또는 특허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때는 이들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권리설정등록이 있던 후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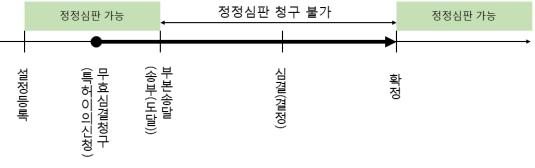
• 합의체는 심판청구서 및 이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기재를 근거로 정정심판의 청구가 특허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정정심판은 청구항별로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정정의 적부를 판단함
• 정정심판의 심결로는 청구성립(정정의 인정), 일부청구성립(정정의 일부 인정), 청구불성립 및 청구각하 등이 있음
• 판정이란 특허청이 청구를 받아, ①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 ②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 ③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중립·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제도임
• 3명의 지정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는 청구인이 특정하는 실시대상(나호) 물건(방법)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판정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특허청(합의체)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감정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하는 감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되며, 권위가 있는 판단의 하나로 언급됨
• 라이선스 교섭의 대상인 특허발명이 특정 표준규격에 근거하는 표준특허발명(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사이의 해결만으로 곤란할 수 있음
• 이에 일본 특허청은 이러한 판단을 특허청이 공정·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라이선스교섭의 원활화와 분쟁해결의 신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표준필수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판정제도를 운영함
• 표준규격문서에서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구성을 모두 가진 것을 「표준규격에 준거하는 제품등」이라 하고 그 「표준규격에 준거하는 제품 등」의 실시가 특정한 특허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경우, 즉 그 「표준규격에 준거하는 제품 등」이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은 해당 표준규격에 필수인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특허발명이 표준규격에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특허발명의 표준필수성」이라 하고, 표준규격에 필수인 발명에 관련한 특허를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라 함
• 표준 필수성 판정에서는 특허발명이 어떤 표준규격에 필수적인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판정에서 나호를 대신하여 표준규격문서에서 특정된 가상대상물품등(가상 나호)을 특정하여 판정을 청구하는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태양을 가짐
(ⅰ) 특허발명이 표준규격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판단을 위해, 표준규격문서에서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상 나호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청구하는 경우
(ⅱ) 특허발명이 표준규격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위해, 표준규격문서에서 불가결하다고 여겨지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가상 나호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정을 청구하는 경우
• 표준필수성 판정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함. 라이선스 교섭, 특허권의 매매 교섭, 특허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양도의 교섭 및 특허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권의 설정의 교섭 등에서 특허발명의 표준필수성에 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나, 특허발명의 표준필수성에 관한 견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표준필수성 판정을 위해서는 표준규격 문서에서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구성에서 가상의 실시대상물품 등을 특정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도록 하여야 함. 대상이 되는 표준규격은 원칙적으로 표준화단체 등의 표준규격을 책정하는 하나의 주체에 의하여 제품 등이 지켜야 하는 기술사양으로 표준규격문서가 정리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에 한함
• 2018년 4월 1일에 운용을 개시한 이래 약 1년을 경과한 2019년 3월 시점에서 표준필수성 판정을 청구한 수는 1건임
• 이는 통상의 판정 청구건수가 연간 50~100건인 것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7월, 일본 특허청은 운용 개정을 통하여 판정제도의 이용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의 나호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 특허발명이 표준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비밀유지도 인정되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19년 7월 1일에 새로이 운용을 시작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12월 31일 시점까지도 이 판정제도의 추가적인 운용실적은 0건으로, 이는 권리자로서는 표준필수성만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 아닌 한 표준필수성 판정제도를 이용할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요인일 수 있음
• 또한 실시자로서는 표준필수성마저도 부정할 수 있다면 교섭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시자측이 이 판정제도를 이용하면 권리자 측이 바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본 판정제도의 이용이 소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 [그림 9] 판정제도 절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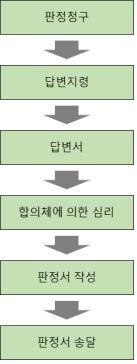
|
• 판정청구는 권리단위를 특정하고, 가호 1개에 1건 청구함 • 판정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을 요구함 (응답기간: 내국인 30일, 재외자 60일) • 답변서의 부본을 판정청구인에게 송달함 • 3명의 심판관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리 • 필요에 의하여 구두심리,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짐 •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과 함께 상세한 이유를 표시함 • 판정 결론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음 • 판정서의 내용은 특허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됨 |
•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출하여 경고한 후에 행사할 수 있음
- 실용신안기술평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임
-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등록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음
- 특허출원에 있어 심사청구의 경우와 달리, 청구항을 선택하여 필요한 청구항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경고나 권리 행사 후 실용신안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실용신안법 제29조의 3)
• 특허결정등본이 특허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하면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며, 이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최장 20년(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있던 것은 최장 25년) 임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 시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최장 10년임
• 특허법상의 실시권에는 크게 허락에 의한 실시권(약정실시권)과 허락에 의하지 않은 실시권이 있음.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에 터 잡은 것으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허락에 의하지 않은 실시권은 법정통상실시권과 재정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약정실시권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즉 특허권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권자의 경우에도 같음
-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특허법 제77조 제2항)」과 「통상실시권(특허법 제78조 제2항)」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다시 계약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의 이전에 가까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낮고, 많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이 선택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법률상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갖지 않는 실시권이라고 여겨지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 아래에서 허락되는 통상실시권을 일반적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함
-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는 판례상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는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전용실시권에 가까운 권능이 승인됨. 한편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갖는 금지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한 재판례(東京地裁昭和40年8月31日判決・判タ185号209頁・「カム装置」事件)와 금지청구권을 부정한 재판례(大阪高裁昭和61年6月20日判決・無体集18巻2号210頁・「ヘアーブラシ」事件)로 나뉨
- 특허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출원단계에서 조기에 라이선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전용실시권·임시통상실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에 근거해 취득할 특허권에 대하여,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가전용 실시권을 설정(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던 때에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특허법 제34조의 2, 제34조의 3)
- 전용실시권·임시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함), 변경, 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이나 특허법 제34조의 2 제6항에 의한 것을 제외함)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
- 통상실시권은 그 발행 후에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임시통상실시권 역시 그 허락 후에 해당 임시통상실시권에 관련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임시전용실시권 또는 해당 임시통상실시권에 관련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임시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짐
- 전용실시권·임시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 사업과 함께 이전할 수 있음
• 법정통상실시권
- 일정 사실에 근거하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
| [표 15] 법정 통상실시권 (특허) | |||||
|---|---|---|---|---|---|
| 종류 | 특허법상의 근거조문 | 실시에 따른 비용 | |||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35조 제1항 | 무상 | |||
|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 | 무상 | |||
| 특허권의 이전등록 전의 실시권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의2 | 상당한 대가 | |||
| 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80조 제1항 | 상당한 대가 |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81조 | 상당한 대가 | |||
|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전의 실시 등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176조 | 무상 | |||
• 재정실시권
| [표 16] 재정실시권의 종류 (특허) | |
|---|---|
| 종류 | 근거조문 |
| 불실시의 경우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8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1조 |
| 자기의 특허발명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92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2조 |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9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3조 |
•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음. 권리의 이전은 특정승계와 일반승계로 구분할 수 있음. 특정승계에는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지분의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권리 이전 등이 포함되며, 일반승계에는 합병, 분할 또는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권리이전은 인터넷출원 소프트웨어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우편이나 창구에서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양도 등의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특허원부에 이전등록할 필요가 있음
☞ 이전등록등록신청서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oroku/iten/tetsuzuki_03.html
• 표준의 의미
-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정의함.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표준화기구(ISO/IEC Guide 2)에 의해 규정
• 표준필수특허의 개념
- 표준필수특허란, ISO, IEC, ITU 등의 표준화기구서 규정한 표준기술을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함. 청구항(Claim)의 구성요소들 전부가 표준규격에서 그래도 읽히는(Read on) 특허를 말함
- 표준필수특허의 대표적인 장점은 a. 특허 침해 발생 시에 입증이 매우 용이하고, b.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c.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
- 표준필수특허에 있어서 청구항의 분량보다는 청구항과 표준문서의 정합성 여부가 중요함
• 표준필수성 평가
- 표준필수성 평가란 표준특허의 각 구성요소(Claim 중 각 구성요소 element)와 표준기술문서 규격이 각 요소를 1:1로 정확히 매칭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함
• 표준필수특허의 중요성
-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후발주자로부터 보호하고, 기업으로부터 표준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함
- LG 전자는 미국 디지털방송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한 제니스社를 인수하여 2008년에만 약 1억 달러의 특허료 수익을 거두었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던 기술분야의 표준특허 보유기업을 과감하게 인수하고, 시장이 형성된 이후 수익을 창출함
•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 표준필수특허의 획득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이러한 표준특허를 사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이 표준필수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무효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표준특허를 고가의 기술료를 주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될 것임
- 국내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중소기업의 표준활동 및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KISTA) 표준특허센터에서 추진하는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이 있음
- 일본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표준특허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필수성 평가를 기업의 요청을 받아서 일본 특허청의 심판부에서 해주고 있음
• 분쟁의 배경
-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서 기술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와 기술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하려는 ‘표준’은 어느 것이나 모두 혁신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양자는 일견 서로 상충되는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둘(양자) 사이에 종종 긴장 관계가 나타남
- 이러한 긴장 관계는 처음 1990년대 통신 기술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행하고 최신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면서 표준화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현재화(顕在化)되면서, 그 결과,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임
- 표준필수특허의 필수성과 유효성에 대한 투명성 향상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일부의 표준화 단체에서 특허권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라고 생각하는 경우, 표준화 단체에 선언할 필요가 있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로는 필수가 아닌 특허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준필수특허로서 선언하는 특허권자도 있음. 보통 이 선언은 특허출원 중의 단계와 표준규격이 결정되기 전에 수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제보다 많은 선언이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선언 과다가 일어나는 배경으로서, 표준필수특허의 기술료(Royalty)가 특정 표준규격에 관한 모든 표준필수특허 건수에 차지하는 특정 특허권자가 보유한 표준필수특허 건수 비율에 따라 산출되고 있음
• 분쟁의 두 가지 문제점
-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홀드업(Hold-up)’과 ‘홀드아웃(Hold-out)’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 특허권자와 실시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심각한지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음
- ‘홀드업(특허 억류, Hold-up)’이란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다른 기술로의 환승이 곤란한 상황에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의 위협으로 인하여 불리한 라이선스 조건이 강요되는 상황. 각국의 재판 례(판례)는, FRAND(공평·합리적·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선언된 표준필수특허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는 것은 한정된 경우라는 생각에 수렴되고 있지만, 협상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도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시자 측에 있어서 ‘홀드업’은 계속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홀드아웃(특허 알 박기, Hold-out)’은 특허권자 측이 라이선스 협상을 신청했지만, 실시자 측은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금지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시도하지 않는 문제를 말함
- ‘홀드업’과 ‘홀드아웃’을 둘러싸고, 이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단지 걱정에 불과한 것인가의 조차에 대하여도, 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의견에 여전히 격차가 있음
• 분쟁의 해소 방안
- IPR 정책이란, 표준화 단체(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가 분쟁을 방지하고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표준필수특허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방침을 말하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가 공평·합리적·비차별적(FRAND)인 것이 되도록 방침의 정비에 노력하여 왔음
- 그 방침은 표준화에 참여하는 각 기업이 보다 질이 좋고 적절한 기술을 표준화 단체에 제안하도록 촉구하고 표준기술이 널리 보급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라이선스의 개념
- 라이선스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어떤 발명, 고안, 디자인, 표장 등을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 3자에게 허용되는 것을 말함
- 법적으로 라이선스의 본질은 원권리자에 의한 허락 또는 동의에 있으며 대가의 유무는 라이선스 성립 요건은 아님. 다만 실무적으로는 로열티가 중요한 인자의 하나가 되고 있음
• 기존 라이선스 협상 방식
- 종래,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라이선스 협상은, 이 분야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크로스 라이선스로 해결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사업 개시 후 라이선스 협상을 수행하는 관행이 있었음
- 또한, 동일한 산업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호 간에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의 권리범위, 필수성, 가치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라이선스 요율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의 시세관(가격 수준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음
•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
- 표준화 단체는 특허권자가 필수라고 선언한 특허가, 실제로 필수인지 여부와 표준책정과정에 있어서 사양이 변경됨에 의하여 필수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고 선언된 특허를 나열할 때 제 3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보급에 의하여, 다양한 인프라와 장비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변화가 국내외에서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그 결과, 기기 간의 무선 통신에 관계되는 표준규격의 실시에 필요한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라이선스 협상은 큰 변화에 노출되고 있음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 사례 증가
- 사물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의 표준규격을 이용하게 되어,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협상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표준필수특허의 특허권자인 정보 통신 분야의 기업에 이어서, 자동차 등의 최종 제품 제조업체 등도 주로 표준기술의 실시자로서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업종의 기업도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 또, 사업을 스스로 실시하지 않고도 보유한 특허권의 행사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PAE(Patent Assertion Entity)라는 주체가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협상 및 분쟁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보임
• 라이선스 협상 방식의 변화
- 라이선스 협상을 둘러싼 관계자의 다양화에 따라, 라이선스 협상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보 통신 분야의 기업과 그 이외 다른 업종의 기업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크로스 라이선스 등에 의한 해결이 곤란해지고 있음
- 이것에 더하여, 필수성 판단 및 라이선스 요금 요율의 시세관이 크게 다르므로 라이선스 협상과 분쟁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라이선스 협상을 위한 안내 가이드의 제정
- 범위한 업종의 기업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협상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이 안심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허청은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된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를 책정하였음
• 표준필수특허 필수성 판단
- 표준특허 필수성 평가란 표준특허의 각 구성요소(Claim 중 각 구성요소 element)와 표준기술문서 규격이 각 요소를 1:1로 정확히 매칭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매우 어려운 작업에 속함
- 표준필수특허의 필수성 판단은 실시자와 표준필수특허 권리자가 라이선스 협상을 시작할 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음. 특허청에서 라이선스 사용료 산정 방법을 정하는 방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필수성 확인을 하지 않고 양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음
- 그러나 양 당사자가 해당 특허 발명이 표준특허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놓고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양 당사자 외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됨
• 표준필수특허 판정제도
- 표준필수특허 판정제도는 표준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해당특허를 반드시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정해 주는 제도로서 침해판정의 확인대상이 표준기술 규격이 되는 것을 의미함
• 일본 특허청의 권고의견 제도(Advisory opinion, ‘Hantei system’)
- 일본 특허청에서는 표준특허의 필수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라이선스 협상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에 대한 판정(Advisory Opin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제도는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비슷한 제도로서, 이해 당사자(표준 특허권자, 실시자 등)의 청구에 따라 일본 특허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필수성 여부를 판정함
- 판정 결과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의견에 불과하나, 그 내용이 대중에게 공개됨. 따라서, 표준특허권자 입장에서는 ‘판정’의 결과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대비 저렴한 비용(관납료 ¥4만, 수임료 별도)으로 라이선스 대상 국가에 일본이 포함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권고의견 제도(Conventional Advisory opinion)
- 기존의 권고의견제도(Conventional Advisory opinion)는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특허청(패널)의 공식적인 의견임. 이러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전문가의 의견임.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행정관료가 참여하는 특허청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판단 중 하나로 간주됨
• 표준 필수성 판정을 위한 권고의견 제도(Advisory opinion, ‘Hantei system’)
- ‘표준에 적합한 제품(즉, 표준문서에 필수적인 구성을 모두 갖춘 제품)등이 특정 특허발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 즉 ’ 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특허발명의 기술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허발명은 ’ 표준에 필수적인 발명‘에 해당하는 특허발명임
- 특허발명이 표준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 특허 발명의 표준 필수성‘의 문제라고 하며 표준에 필수적인 발명에 대한 특허를 ’ 표준필수특허(SEP)‘라고 함
- ’Hantei system‘에서는 특허발명이 표준에 필수적인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의 권고 의견(Convention Advisory Opinion)에 사용되는 객체 "A"대신 표준 문서에서 지정된 가상 객체 제품(Virtual Object) 등을 지정하고 특허발명의 기술 범위에 대한 자문 의견 요청을 제출함. 요청은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
A. 특허 발명이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면 표준 문서에 필수적인 구성으로 구성된 가상 객체가 특허 발명의 기술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자문 의견서를 요청함
B. 특허 발명이 표준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표준 문서에 필수적인 구성으로 구성된 가상 객체가 특허 발명의 기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문 의견을 요청함
2022년 6월 30일, 일본 특허청은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안내서’를 개정했음. 본 안내서는 무선 통신 분야 등에서 표준 규격의 실시에 필요한 특허인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센스 협상에 관한 투명성·예견 가능성을 높여 특허권자와 실시자 간의 협상을 원활히 하고, 분쟁 방지 및 조기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2018년에 책정되었음.
• 기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본 특허법은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의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순이익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자의 양도수량만 확인하면 손해액을 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존 방식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
- 기존 규정은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목적을 고려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과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공제할 수 있게 하였음
- 그 결과 침해자의 양도수량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침해자가 그 초과수량만큼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게 되어 오히려 특허의 침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 손해배상액 산정 규정의 개정
- 일본은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침해자의 양도수량에서 공제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1항)
-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생산능력이 1,0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생산능력 1,000개를 초과하는 9,000개에 대해서는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내용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0개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로서 손해액으로 인정함. 즉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개정된 손해배상액 = 특허권자의 1개당 이익 × 침해품 판매수량(특허권자의 실시능력 및 판매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 수량 공제) + 실시료 상당액 × 상기 공제된 수량 |
-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생산능력이 1,0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생산능력 1,000개를 초과하는 9,000개에 대해서는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내용을 통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0개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로서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은 위와 같은 산정방식을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역시 특허법을 개정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
| [표 17] 출원, 심사 비용 (특허) | |||||
|---|---|---|---|---|---|
| 품목 | 금액 | ||||
| 특허출원 | 14,000엔 | ||||
| 외국어서면출원 | 22,000엔 |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74,000엔 | ||||
| 출원 심사 청구 | 138,000엔+(청구항의 수×4,000엔) | ||||
| 오역정정서에 의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 19,000엔 |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 74,000엔 | ||||
☞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 [표 18] 등록, 연차료 (특허) | |
|---|---|
| 품목 | 금액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4,300엔+(청구항의 수×300엔) |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10,300엔+(청구항의 수×800엔) |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24,800엔+(청구항의 수×1,900엔) |
| 10년부터 25년까지 | 매년 59,400엔+(청구항의 수×4,600엔) |
• 개인·법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제1년부터 제10년까지의 각년분의 특허료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4년 이후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해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내에 연금의 납부가 없던 때는 권리가 소멸하나,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6월 이내라면 그 특허료의 동액의 할증특허료를 납부하면 계속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특허법 제1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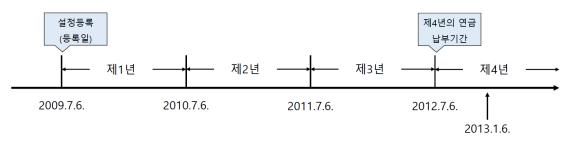
• 2020년 2월 4월 1일부터, 전용사이트에서 계정 등록을 한 자가 희망하는 특허(등록) 번호에 대하여 특허료등의 차기 납부기한 일을 메일로 통지하는 「특허(등록) 료지불기한 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 중임. 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주·개인 권리자를 대상으로 함
☞ 특허(등록)료 지불기한통지서비스 전용 사이트
https://www.rpa.jpo.go.jp/rpa-web/GP0101
• 2019년 1월 1일부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고 예납대장 또는 은행계좌이체로 특허료등을 이체가 가능한 「자동납부제도」가 도입됨. 제4년 이후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와 제2년 이후의 디자인등록료를 대상으로 함. 납부기한 약 60일 전에 사전에 인출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송부되고, 매년 납부기한 40일 전에 1년 치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자동이체됨
☞ 특허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jidou-keisan/kokunai.html
• 납부기간 내에 연금의 납부가 없던 때는 권리가 소멸하나,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6월 이내라면 그 특허료의 동액의 할증특허료를 납부하면 계속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특허법 제112조)
• 특허출원절차와는 달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 출원 시에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의 등록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실용신안 연차등록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jidou-keisan/kokunai.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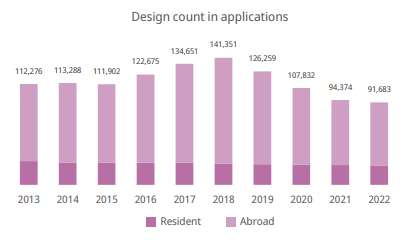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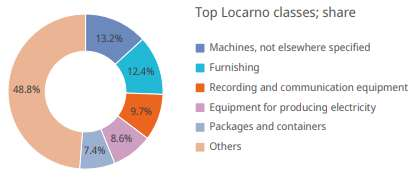
•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이 의장법이 정의하는 「디자인」인 것과 함께 의장법이 정한 디자인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의장법은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 건물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기의 조작용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기기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 표시된 것에 한함)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출원된 디자인은 의장법이 정하고 있는 디자인등록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관을 심사를 거쳐 등록됨
• 등록을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① 공업상의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및 ③ 창작비용이성 등이 있음
• 의장법이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인 것,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인 것,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 등을 세부적인 내용으로 함
-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
· 의장법상의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으로 인정되는 것
|
- 물품: 유체물 중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동산 - 건축물: 토지의 정착물로 인공구조물인 것(토목구조물을 포함함) - 화상: 물품 또는 건물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조작화상 또는 표시화상에 해당하는 것(물품 또는 건물의 표시부에 보인 화상은 물품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취급함) |
·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 자체의 형상 등인 것
· 시각에 호소하는 것인 것
·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인 것
· 물품등 전체의 형상 등 안에서 일정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인 것
- 디자인이 구체적인 것인 것: 출원서 및 첨부도면 등에서 이하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등의 사용의 목적, 사용의 상태 등에 근거하는 용도 및 기능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형상 등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 것: 동일한 것을 복수 제조·건축·작성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현실적으로 공업상 이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는 없고,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충분함. 자연물을 디자인의 주된 요소로 하고 있어 양산할 수 없는 것이나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등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출원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일본국내 또는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함.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디자인을 스스로 창작한 자라도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의장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디자인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 대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한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과 혼동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또는 화상의 용도에 있어 불가결한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심사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출원이 심사됨.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이 통지되며,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함
• 출원공개제도가 없으므로 등록 후의 디자인공보가 발행될 때까지 출원한 디자인이 공개되지는 않음. 또한 비밀의 장제도를 이용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를 한도로 등록디자인을 비공개로 할 수 있음. 디자인을 비밀로 하기 위한 절차는 디자인등록출원 시뿐만 아니라 디자인등록 제1년분의 등록료 납부 시에 할 수 있음(비밀청구료: 5,100엔). 비밀청구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에서 연장, 단축 청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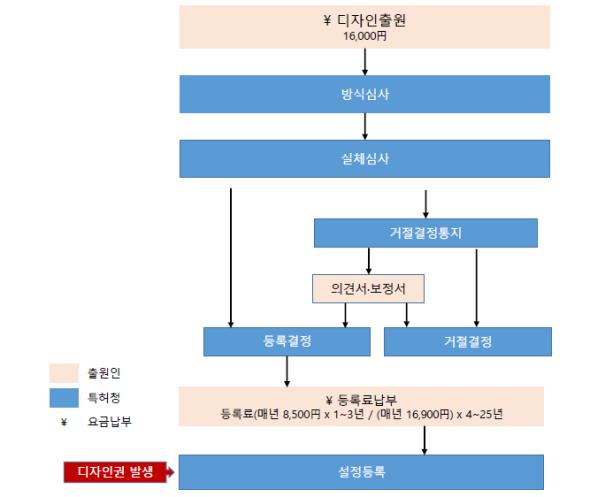
•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에 더하여 특징기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출원서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디자인의 창작을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화상의 용도」를 지재함.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설명」, 「디자인의 설명」 란에 설명을 기재함
• 입체를 나타내는 도면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도면으로 기재함. 예컨대 정투영도법에 의한 육면도나 사시도 등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단면도나 확대도를 추가함. 또한 도면을 대신하여 사진, CG 도면, 모형 내지는 견본에 의한 출원도 가능함
• 출원인은 특징기재서를 제출하여 출원 디자인의 창작 특징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음. 출원서를 제출할 때 또는 출원이 심사, 심판 또는 재심에 계속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 특징기재서의 기재내용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체크만 이루어짐
• 디자인등록제도는 디자인의 창작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창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중복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디자인의 개발에 있어서는 1개의 디자인 콘셉트에서 많은 변형 디자인이 창작되는 것이 창작 실태임
• 관련제도는 출원인이 같은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유사한 복수의 변형 디자인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각각의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각각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 심사관은 각하 또는 취하·포기된 출원을 제외하고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함
• 심사관은 의장법 제17조에서 열거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한 때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한 의견서의 제출이나 출원서류의 보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함
•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후,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절차의 보정을 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같은 날 2 이상의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절차보정서와 함께 협의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견서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국내거주인은 40일, 재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반론이 없었다고 하여 거절결정을 함
• 심사관에 의한 등록결정을 받은 때는 등록결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함
• 디자인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등록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그 내용이 디자인공보에 게재됨. 비밀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 등은 게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을 비밀로 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도면 등을 게재한 도면이 발행됨
•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출원인으로부터 응답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실체심사의 최종결정으로 거절결정을 함. 출원인은 이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원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제도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단하며, 합의체는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2020년 4월부터, 사전에 합의한 심리계획에 근거해, 여러 차례 당사자와 대면으로 쟁점정리 등을 하는 「계획대화심리」를 시행하고 있음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 시부터 발생하며, 매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 권리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장 25년임 (2007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31일까지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20년. 2007년 3월 31일 이전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15년).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역시 그 기초디자인의 의장등록출원일로부터 25년간 존속함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기본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기초디자인 및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동일한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의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할 권리를 가짐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의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할 권리를 가짐
• 의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으로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장법 제29조), 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의장법 제29조의 2), 의장권의 이전의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의장법 제29조의 3), 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30조), 디자인권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31조) 등이 있으며,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설정(의장법 제33조) 역시 인정함
• 등록 디자인은 양도, 이전 및 거래의 대상이 됨, 특허법에서와 같이 디자인권의 이전, 신탁에 의한 변경, 포기에 의한 소명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 기초디자인 및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으며, 기초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한 때 또는 포기한 때는 해당 기초디자인과 관련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음
- 2022년 3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제도의 사용자를 위한 기본 개념, 효과적인 활용법을 소개하는 가이드북 ‘모두의 디자인권, 10인 10색의 사용법(みんなの意匠権 十人十色のつかいかた)’을 발행함. 지난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인테리어(내장), 화상(이미지) 등의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가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동 가이드북은 디자인 제도에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의 개념, 장점 및 비즈니스에 맞춘 활용 방법, 출원 절차 등을 정리하였음. 디자인 제도의 기본, 활용 시 이점, 다양한 비즈니스와 창작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제도 활용 방법, 출원 절차의 기본까지 올인원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제도의 기본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활용 방법을 발견하여 출원의 기본적인 준비까지를 실시할 수 있음. 가이드북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 기재된 URL 및 QR 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에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일본은 디자인권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9년 의장법을 대폭 개정
- 첫째, 디자인 정의 규정의 개정으로 화상디자인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디자인 개념을 신설하였음. 물품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 예외를 두면서 법이 보호하는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한 것임. 그에 따라 실시 개념도 개정하게 되었음
- 둘째, 관련디자인 출원가능시기를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쇄적인 관련디자인 출원도 가능
- 셋째, 간접침해의 유형에 전용물이 아닌 이른바 다기능품형 간접침해 유형을 추가함. 일본 특허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던 유형을 의장법에도 추가한 것임
- 넷째, 디자인 보호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기산점을 등록 시에서 출원 시로 개정하였음
• 건축물 디자인 보호제도
- 건축물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
· 개정 전 일본 의장법에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동산에 해당하는 이동식 구조물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음
· 개정법에서는 물품 이외에도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디자인에 해당하고 정의 규정에 추가함으로써 건축물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로서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건축물과 혼동을 일으키는 건축물디자인,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건축물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실시 범위
· 건축물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의장권 보호를 위하여 독점배타적 권리의 실시행위를 의장법에 명문화하였음. 즉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실시범위는 “건축물의 건축, 사용, 양도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 3자가 의장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건축물디자인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하는 행위에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전시권을 제외하고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장권법에는 “건축물의 건축, 사용, 양도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디자인의 건축산업 측면에서 보면, 의장권의 실시범위가 저작재산권의 권리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음
- 내장디자인
· 건축물을 물품과 같이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물 내부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내장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음
· 다만, 내장디자인은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통상의 디자인출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벌 물품디자인(제7조)’과 함께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예외의 디자인출원으로 취급하고 있음
· 즉 내장이란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의 내부설비 및 장식”이라고 특정하고, 그 “내장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과 관련된 디자인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때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은 규정을 의장법에 새로 도입하였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건축물 관련 복수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벽, 마루, 장식품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고, 이를 건축물의 내장디자인으로 의장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
· 다만, 복수의 물품형태로 구성되는 내장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장 전체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의장권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표 19] 출원, 심사 비용 (디자인) | |
|---|---|
| 품목 | 금액 |
| 디자인등록출원 | 16,000엔 |
| 비밀 의장 청구 | 5,100엔 |
☞ 디자인등록출원 서식 바로가기
의장법시행규칙 양식 제3
https://faq.inpit.go.jp/industrial/faq/search/result/10939.html?event=FE0006
☞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 [표 20] 디자인권 등록료 | |
|---|---|
| 항목 | 금액 |
| 제1년~제3년 | 매년 8,500円 |
| 제4년~제25년 | 매년 16,900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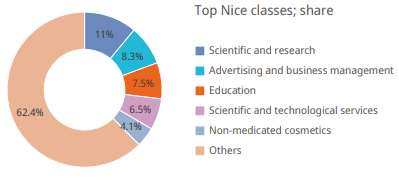
•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 중,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혹은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① 업으로서 상품을 생산, 증명 또는 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② 업으로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증명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상표법 시행규칙에서는 동작 상표(같은 규칙 제4조), 홀로그램 상표(같은 규칙 제4조의 2), 입체상표(같은 규칙 제4조의 3),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같은 규칙 제4조의 4), 소리상표(같은 규칙 제4조의 5), 위치상표(같은 규칙 제4조의 6)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상표권은 표장과 그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조합에 권리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 시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와 함께 그 사용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함. 즉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표장과 그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라는 2개의 요정으로 정해지며, 같을 수 있는 상표가 2개 이상이 있다고 해도 상품·서비스가 다르면 모두 등록받을 수도 있음
•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사용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제2조 제3항)
| [표 21] 상표의 사용 행위 | |
|---|---|
| 구분 | 내용 |
| 상품 |
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②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인 것을 유통시키는 행위 |
| 서비스 |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고객이 이용하는 것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④ 표장을 붙인 물건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에 표장을 붙여 전시하는 행위 ⑥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고객의 것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⑦ 표장을 표시하여 인터넷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상품·서비스 |
⑧ 광고나 거래서류 등에 표장을 붙여 표시·반포하든지,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행위 ⑨ 상품·서비스의 유통을 위하여 소리의 표장을 내는 행위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 자기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 - 공공 기관의 표장과 혼동하기 쉬운 등 공익성에 반하는 것 - 타인의 등록상표나 주지·저명상표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보통명칭」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으로 약칭이나 속칭도 보통명칭으로 취급함
·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란 그 서체나 전체의 구성 등이 특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예컨대 동작상표, 홀로그램 및 위치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을 단순히 읽은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되는 소리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관용되고 있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2호)
· 「관용되고 있는 상표」란 원래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상표였으나, 같은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업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더 이상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그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된 상표를 의미함
· 예컨대 청주에 사용하는 상표로서의 「正宗」이란 문자, 군고구마에 사용하는 상표로 군고구마 파는 소리로 이루어진 소리
- 단지, 상표의 산지, 판매지, 품질, 기타 특징 또는 서비스의 제공 장소, 질, 기타 특징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 흔한 성명 또는 명칭만을 표시하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4호)
- 극히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5호)
- 기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 국기, 국화문장, 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외국, 국제기관의 문장, 표장 등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하는 것, 백지적십자표장 또는 적십자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사업 등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6호)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
- 상품의 품질 또는 서비스의 질의 오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6호)
- 기타 박람회의 상(상표법 제4조 제1항 제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8호)
-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저명한 예명, 약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0호)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 타인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9호)
- 기타, 타인의 등록방호표장과 동일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2호), 종묘법에 등록된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진정한 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7호) 등
•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야 함. 동일 또는 유사한 출원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출원 주의를 채용하고 있음
• 심사청구제도는 없으므로 출원된 것은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됨
• 상표의 출원·사용할 때는 사전에 출원·등록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제공하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이나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전에 상표의 출원·등록정보를 검색하도록 함
• 출원에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5조) 이외에 단체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7조),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7조의 2), 방호표장등록출원(상표법 제64조),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하는 권리존속기간변경등록출원(상표법 제65조의 3) 등이 있음
• 상표를 출원하기 위하여는 상표등록원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작성해야 함. 단체상표 및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출원에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출원서를 작성하게 됨. 출원서에는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및 제6조 제2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을 기재함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 1개의 상표등록출원에는 1개의 상표만을 출원할 수 있음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란에는 크기 8cm 사각 안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를 직접 기재함. 다만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15cm 사각형까지 크기를 할 수 있음
- 상표의 유형에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등과 새로운 유형의 상표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소리상표 및 위치상표가 있으며, 입체상표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상표 유형을 명기하여야 함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를 특정하기 위해 【상표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함. 입체상표, 소리상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기재하며, 소리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5조 제4항의 물건으로서 그 소리를 MP3 형식으로 기록한 CD-R 또는 DVD-R을 첨부함
- 「동작상표」에 대하여는 하나 또는 다른 2개 이상의 그림 또는 사진에 의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표의 변화 상태가 특정되도록 기재함
- 「입체상표」에 대하여는 하나 또는 다른 2개 방향 이상에서 표시한 그림 또는 사진에 의하여 기재함. 혹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입체적 형상을 실선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을 파선으로 그리는 등에 의하여 해당 입체적 형상이 특정되도록 기재함
-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색채가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거쳐 표시된 그림 또는 사진에 의하여 기재함. 혹은 1개 또는 다른 2개 이상의 그림 또는 사진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색채를 해당 색채만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을 파선으로 그리는 등에 의하여 해당 색채 및 이를 붙인 위치가 특정되도록 기재함
- 「소리상표」에 대하여는 문자 또는 오선악보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소리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필요한 경우에는 오선악보에 추가하여 일선악보를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위치상표」에 대하여는 1개 또는 다른 2개 이상의 그림 또는 사진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에 관한 표장을 실선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을 파선으로 그리는 등에 의하여 표장 및 이를 붙인 위치가 특정되도록 기재함
-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는 【표준문자】라 기재하여 표준문자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함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및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및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 란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하고, 그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구분을 기재하여야 함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기재례나 구분은 「유사상품·서비스심사기준」이나 「상품·서비스국가분류표」, 특허정보플랫폼의 상표검색 「상품·서비스검색」을 참조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은 상품·서비스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님
☞ 상표출원서 바로가기
상표법 시행규칙 양식 제2
(https://faq.inpit.go.jp/industrial/faq/search/result/10939.html?event=FE0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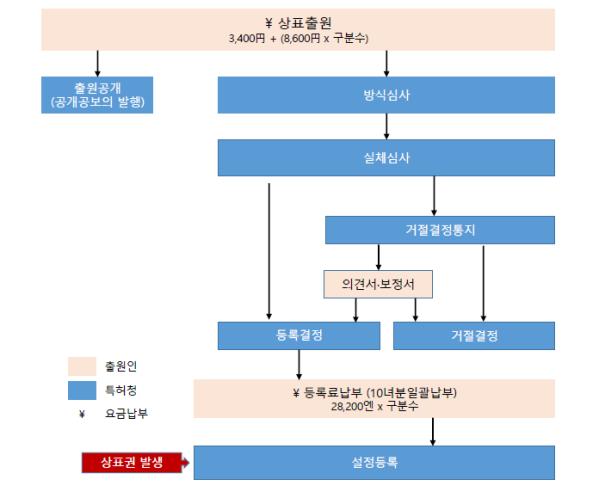
• 상표등록출원이 있던 때는 출원이 공개됨(상표법 제12조의 2). 출원인은 출원부터 설정등록까지의 사이에 제삼자가 권원 없이 출원과 관련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한 때는 사전에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한가운데 설정등록 후 금전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음
•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친 후 심사관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없는지 실체심사를 함. 특허와는 달리, 상표제도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출원이 각하 또는 취하·포기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출원이 심사의 대상이 됨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상표법 제15조의 2), 이에 대하여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 내(국내거주자 40일, 재외자 3월)에 의견서 또는 출원서류의 보정 등을 할 수 있음. 의견서나 절차보정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다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함
•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으로부터 응답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절차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실체심사의 최종결정으로 거절결정을 함. 출원인은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심사관이 등록결정을 하면, 그 등본송달 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납부서」의 제출에 의한 등록료납부절차를 하고, 그 절차가 완료하면 상표원부에 설정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함
• 등록료는 일괄하여 10년분을 납부하는 방법과 5년씩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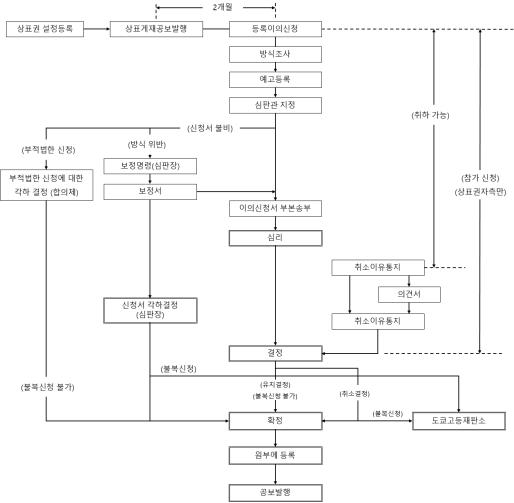
• 상표게재공보(등록 후에 발행되는 상표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43조의 2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
• 누구든지 상표등록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별로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상대방 수(통상 권리자의 수)에 따라 부본 및 심리용 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를 보정할 수 있음.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이라도 인정됨. 그러나 신청한 이유 및 증거의 표시 이외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됨
• 등록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을 경과한 후에 하는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여서는 안 됨
• 심판장은 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위반, 수수료 부족·미납의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며, 지정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에 의하여 절차(등록이의신청서)를 각하하며, 신청인은 도쿄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음
• 부적법한 등록이의신청으로 보정할 수 없는 것(기간경과, 신청이유·증거의 실질적 기재가 없는 등 등록이의신청서)은 보정을 명하지 않고 결정으로 각하하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취소이유의 통지가 있던 후에는 취하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이의신청을 한 때는 지정상품·서비스별로 취하할 수 있음
• 원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제도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단하며, 합의체는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2020년 4월부터, 사전에 합의한 심리계획에 근거해, 여러 차례 당사자와 대면으로 쟁점정리 등을 하는 「계획대화심리」를 시행하고 있음
• 타사가 등록하고 있는 상표권이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표권의 취소를 요구하는 제도
• 일본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지정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 심결이 확정된 때,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가 등록된 날로부터 소멸한 것으로 간주됨
• 등록상표의 사용상황에 대하여는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증명하므로 청구인은 불사용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청구인이 「청구 전 3개월~청구등록일」의 사용에 대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것을 안 후에 사용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임. 다만 상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상표의 사용이 계속되는 한 상표권을 존속시키고 있어,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신청에 의하여 10년의 존속기간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음
• 갱신등록신청료에 대해서도 분할납부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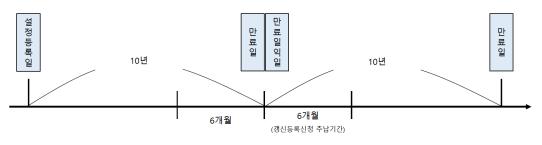
• 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사이에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때는 만료 후 6월 이내에 갱신등록료와 동액의 할증등록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음
• 전용사용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을 하는 권리를 독점함.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표권자의 승낙을 얻었을 경우 및 상속 기타의 일반계승의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에 관련되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음. 통상사용권은 그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상표권 혹은 전용사용권 또는 그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그 후에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지나, 통상사용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상표권의 이전은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2 이상 있을 때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마다에 분할할 수 있음. 다만,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 또는 공익에 관한 단체에게 영리를 목적이라고 하지 않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음
• 공익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이라고 하지 않는 자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것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그 사업과 함께 할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할 수 없으며, 지역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음
• 단체상표에 관련되는 상표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그 상표권을 일반적인 상표권에 변경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체상표권을 다른 단체상표권으로서 이전하려고 할 때는 이전 등록신청 신청 시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 [표 22] 일본의 상표 출원ㆍ심사 비용 | |
|---|---|
| 항목 | 금액 |
| 상표출원료 | 3,400엔 + (8,600엔 x 구분수) |
| 방호표장 등록ㆍ출원 또는 방호 표장ㆍ등록출원에 근거하는 권리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
6.800엔 + (17,200엔 x 구분수) |
☞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 [표 23] 일본의 상표 등록ㆍ유지료 | |
|---|---|
| 항목 | 금액 |
| 상표등록료 | 28,200엔 x 구분수 ··· 10년분 (분납 16,400엔 x 구분수 ··· 5년분) |
| 갱신등록료 | 38,800엔 x 구분수 ··· 10년분 (분납 22,600엔 x 구분수 ··· 5년분) |
• 일본 최초의 저작권 보호 규정으로는 출판자에게 도서의 전매권을 부여하는 1869년의 출판조례가 있으며, 판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독립하여 판권을 저작자에게 인정하고 등록을 그 보호요건으로 규정한 1887년 출판조례가 있음
• 1899년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맹하면서 저작권법을 공포하였으며, 1970년 기존의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인격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물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실연자,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발생하며, 권리의 행사에 있어 등록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도 않음
• 다만, 저작권 관계의 법률사실을 공시하거나 저작권이 이전한 경우의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모든 저작물이나 그 거래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님.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한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는 창작으로 등록할 수는 없고, 아래 표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을 등록할 수 있음
| [표 24]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의 등록 | |||||
|---|---|---|---|---|---|
| 구분 | 등록의 내용 및 효과 | 신청할 수 있는 자 | |||
| 실명등록 (75조) |
•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실명의 등록을 할 수 있음 • 반증이 없는 한,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됨. 그 결과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공표 후 70년부터 실명으로 공표된 저작물과 같이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됨 |
• 무명 또는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 |
|||
| 제1발행 연월일등의 등록 (제76조) |
• 저작권자 또는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발행자는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되거나 공표된 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날로 해당 저작물이 제1발행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됨 |
• 저작권자 • 무형 또는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발행자 | |||
| 창작년월일의 등록 (제76조의2) |
•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이 창작된 연월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반증이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날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됨 |
• 저작자 | |||
|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 (제77조) |
•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의 양도 등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이 있던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권리 변동에 관하여 등록하는 것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등록권리자의 단독 신청도 가능) | |||
| 출판권의 설정 등의 발생 (88조) |
• 출판권의 설정, 이전 등 또는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이 있던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는 출판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권리 변동에 관하여 등록하는 것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나 등록권리자의 단독 신청도 가능) | |||
• 외국인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한 저작물 전반은 문화청 저작권과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가 문화청장관의 지정을 받아 업무를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저작권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기 위해서는 ①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② 사상 또는 감정을 ③ 창작적으로 ④ 표현한 것이어야 함. 구체적으로 아래의 것들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음
| [표 25] 저작물의 예시 | |
|---|---|
| 구분 | 예시 |
| 언어저작물 | 소설, 각본, 논문, 강연 등 |
| 음악저작물 | 음악 |
| 무용저작물 | 무용, 무언극 등 |
| 미술저작물 | 회화, 판화, 조각 등 |
| 도형저작물 | 지도,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조면, 도표, 모형 등 |
| 영화저작물 | 영화 |
| 사진저작물 | 사진 |
|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 |
• 저작권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시점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후 70년이나, 무명 • 이명 저작물, 단체 명의 저작물 및 영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임. 이외에도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기간에는 약간의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절취, 사기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비밀관리성, 유용성 및 비공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비밀관리성」은 비밀정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과 자물쇠, 비밀번호 등에 의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의 비밀관리조치에 의하여 종업원 등의 정보에 접하는 자에서 보아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는 것
-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사업 활동에 사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의하여 경비의 절약, 경영효율의 개선 등에 객관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함.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실패한 실험데이터라도 이에 의하여 연구경비의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음
- 「비공지성」은 보유자의 관리 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 보유자 이외의 제3자가 우연히 같은 정보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도 해당 제3자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고 비공지라고 할 수 있음. 학술지나 학회에서 공표한 것은 특허법에서는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비공지성이 상실하게 됨
• 부정경쟁방지법이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나,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라도 이익을 도모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 용·공개하는 행위, 타인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여 제조된 물건을 사정을 알면서 제공· 수출입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민사조치나 형사조치 등을 받게 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제10호)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하는 민사적 구제조치와 형 사적 조치의 대상이 됨.
• 민사적 구제조치로서 침해금지청구 (제 3조), 손해배상청구 (제 4조) 및 신용회복조치청구 (제 14조)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라는 사익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을 보호법 익으로 하며, 그 실현 수단으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청구를 기본으로 하나, 공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고,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 청구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행위에 대 하여는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일본에서 유명한 지역산물을 지명과 함께 보호하는 제도로는 지역단체상표제도와 지리적 표시 제도가 있음
•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외국에서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명과 상품(서비스) 명만으로 이루어진 지역단체상표를 통하여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1). 반면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2014년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4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 [표 26]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표시의 비교 | ||
|---|---|---|
| 지역단체상표 | 지리적표시 | |
| 목적 | 지역브랜드 명칭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 | 고부가가치를 갖는 농림수산물·식품 둥이 차별화되어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통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쌍방의 이익을 보호 |
| 보호대상(물) | 모든 상품·서비스 |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 (주류 등 제외) |
| 보호대상(명칭) | 「지역명」+「상품(서비스)명」 | 농리무산물·식품 등의 명칭으로, 그 명칭에서 해당 산품의 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산품의 품질등의 확립한 특성이 해당 산지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하는 것 |
| 등록주체 | 농협등의 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NPO 법인 | 생산·가공업자의 단체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
| 주된 등록요건 | - 지역명칭과 상품(서비스)이 관련성이 있을 것 -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을 것 |
- 생산지와 결부한 품질 등의 특성을 가질 것 - 확립한 특성: 특성을 유지한 상태로 대략 25년의 생산실적이 있을 것 |
| 지명의 유무 | 지명을 붙일 필요가 있음 | 지역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지명을 붙일 필요는 없음 |
| 산지와의 관계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충분함 | 품질등이 특성이 해당 지역과 결부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함 |
| 브랜드화의 정도 | 주지성: 일정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을 것 | 전통성: 일정기간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을 것 |
| 사용방법 | -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 지역단체상표는 지역단체상표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는 등록표장(GI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GI마크만 사용할 수는 없음) |
| 품질기준 | 제도상의 규정 없이 권리자가 임의로 대응 | 산지와 결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등록·공개가 필요 |
| 품질관리 | 상품의 품질 등은 상표권자가 자주관리 | 생산·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체가 관리하고 이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점검 |
| 권리부여 | 명칭을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를 취득 | 권리가 아니라 지역공공의 재산이 되며,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지역 내의 생산자는 누구든지 명칭의 사용이 가능 |
| 효력 |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의 부정사용을 금지 | 지리적 표시 및 이에 유사한 표시의 부정사용을 금지 |
| 효력범위 | 등록상표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에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 등록된 농림수산물등이 속하는 구분에 속하는 농림수산물등 및 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및 이에 관한 광고 등 |
| 해외에서의 보호 | 각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가진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보호됨 |
| 제재수단 | 상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국가에 의한 부정사용의 단속 |
| 비용·보호기간 | 출원·등록: 40,200엔(10년간) 갱신: 38,800엔(10년간) |
등록: 9만 엔(등록면허세) 갱신절차 없음 |
| 신청·출원기관 | 특허청장(특허청) | 농림수산장관(농림수산성) |
1)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
• 일본의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지리적 표시법’이라 함)」에 근거하며, 해당 법률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의 표시」라고 정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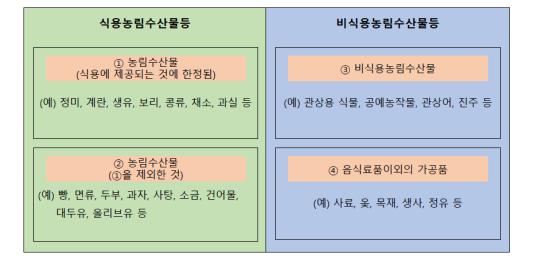
• 이때, 「특정농림수산물등」이라 함은 「① 특정한 장소, 지역 또는 국가를 생산지로 하는 것으로 ② 품질, 사회적 평가 기타 확립한 특성이 ①의 생산지에 주로 귀속되는 농림수산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시 「농림수산물등」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림수산물」,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음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농림수산물로 정령에서 정한 것」,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등을 의미함
•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하는 생산자단체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생산행정관리업무」란 생산자단체가 아래의 업무를 하는 것을 의미함
- 농림수산물등에 대하여 ① 농림수산물등의 구분, ② 농림수산물등의 명칭, ③ 농림수산물등의 생산지, ④ 농림수산물등의 특성, ⑤ 농림수산물등의 생산방법, ⑥ 농림수산물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농림수산물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 등을 정한 명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업무
- 명세서를 작성한 농림수산물등에 대하여 해당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인 생산업자가 하는 그 생산이 해당 명세서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 검사 기타 업무를 하는 것
- 위 2의 업무와 부대 하는 업무를 하는 것
• 「생산자단체」는 생산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함.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정한 것에 한하며, 법령 또는 정관 기타 기본약관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성원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대하여 현재의 구성원보다 곤란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한정함
• 지리적 표시법에서 「생산」을 「농림수산물등이 출하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중 농림수산물등에 특성을 부여하거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하고, 「생산지」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 지역 또는 국가」로, 「생산업자」는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은 생산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음. 생산자단체는 기존의 단체든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든 상관없음. 다만 생산자단체는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록 후는 물론 산품의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이어야 함
• 지리적 표시법은 2018년 법률 제88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2019년 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청은 개정 후의 지리적 표시법 규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됨. 그 이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지리적 표시법에 근거한 절차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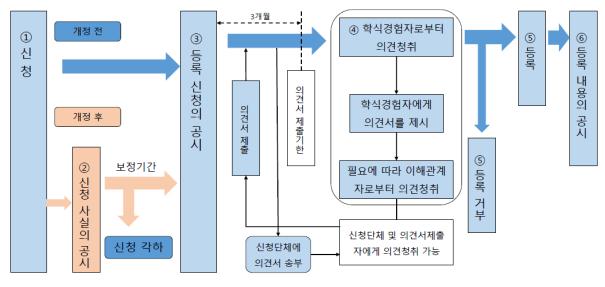
• 신청 및 신청 서류
-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특정농림수산물등의 등록의 신청」, 지리적 표시법 시행규칙 별기양식 제1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 이외에 부속서류로서 명세서,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산품의 특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하는 절차를 정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의 신청 후, 서류의 부족등이 없는지를 확인함
• 신청사실의 공시
- 생산자단체의 명칭, 주소, 신청산품의 구분, 명칭 등의 최저한의 내용을 공시함
- 공시 후, 농림수산성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인 불비나 기재내용이 불충분한지 여부, 즉 산품의 특성, 명칭, 생산방법의 기준 등 등록의 주된 요건을 중심으로 내용면의 심사를 진행함. 필요에 따라 보정지시를 하나, 그 기간이 등록까지 가장 시간을 필요로 해 몇 개월 이상이 되는 것이 통례임. 보정지시에 표시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때는 신청은 각하됨
• 신청서 내용의 공시
- 신청서등의 보정 후,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의 내용이 공시되며, 함께, 명세서,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이 공표됨
- 공시 후 3개월의 의견제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의견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농림수산성에서 학식경험자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의 가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등록 여부의 판단과 공시
- 제출된 의견서와 학식경험자위원의 의견을 근거로 농림수산장관을 등록 여부를 판단함. 등록은 특정농림수산물등등록부에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등록된 경우, 신속하게 등록면허세(1건당 9만 엔)를 납부하여야 함
-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한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등록된 경우 농림수산성 누리집에 등록부와 함께 명세서 및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의 내용이 게재됨
• 지리적 표시의 검색
- 2021년 3월 현재 109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누리집에서 등록산품을 일람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 검색 바로가기
https://www.maff.go.jp/j/shokusan/gi_act/register/index.html
• 지리적 표시의 등록요건은 산품에 관한 요건, 산품의 명칭에 관한 요건, 생산자단체 및 생산방법에 관한 요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산품에 관한 요건: 특정농림수산물등인 것
- 특정한 장소, 지역 등을 생산지로 하는 것인 것
- 품질, 사회적 평가 기타 특성이 자연조건, 전통적 제법 등 생산지역과 결부하는 것
- 특성이 확인한 것인 것으로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대략 25년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것
• 산품의 명칭에 관한 요건: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음
- 보통명칭인 때
- 산품명칭이 이하의 산품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림수산물등이 아닌 때
· 명칭에서 산지를 바르게 특정할 수 있음
· 명칭에서 산품의 특성을 바르게 특정할 수 있음
- 이미 상표등록되어 있는 때, 다만 상표권자가 지리적 표시등록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생산자단체, 생산방법에 관한 요건
- 생산행정을 관리하는 생산자단체가 있을 것
-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가입의 자유가 규약등에서 정해져 있는 것
- 생산자단체가 산품의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인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고, 준수할 것
- 생산자단체가 생산행정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리, 인원체제를 가질 것
• 지리적 표시법에 근거하여 산품이 등록된 경우, 해당 산품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산품 또는 그 포장·용기 등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광고, 가격표 또는 거래서류(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를 포함함)에도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선농산물 등 상품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가까이에 비치한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는 행위도 사용행위로 간주됨. 또한 지리적 표시 첨부사무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함
• 지리적 표시는 사용하는 경우 GI 표장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GI 표장의 표시가 의무사항은 아님

• 지리적 표시산품이 속하는 구분과 동일한 구분에 속하는 산품이나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규제되며, 지리적 표시 산품 명칭 그대로의 표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표시나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의 사용도 규제됨
•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예외적으로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
- 지리적 표시 등록상품의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지리적 표시 등록일 전에 출원된 상표(부정한 목적을 제외)가 등록되고, 그 상표로서 사용하는 경우
- 지리적 표시 등록일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지리적 표시 등록산품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던 자가 계속하여 계속 산품에 명칭을 사용(선사용)하는 경우. 다만 선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7년간이며, 신상품등에 대한 사용을 불가함. 이 역시도 국내 지리적 표시 등록산품의 생산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선사용품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산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표시를 하면 7년 경과 후에도 선사용이 가능함
• 지리적 표시법의 내용이 등록산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기간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갱신이라는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음
• 등록이 실효되거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리적 표시는 영구히 보호됨
• 등록의 실효
- 등록생산자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이 종료한 때
- 등록생산자단체가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폐지한 때
• 지리적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됨. 다만 지리적 표시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도 바로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지도 등을 한 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벌칙 적용이 검토됨
• 지리적 표시의 부정사용
- 개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 단체: 3억 엔 이하의 벌금
• GI 표장의 부정사용
- 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 단체: 1억 엔 이하의 벌금
• 등록 후 의무위반
- 등록된 생산자단체는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을 근거로 그 구성원인 생산업자가 명세서에 적합한 생산을 하도록 필요한 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장관은 생산자단체에 의한 생산행정관리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의무위반 행위 | 벌칙 |
|---|---|
|
- 생산자단체의 명칭 등의 변경 신고, 등록실효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의 변경이나 생산행정관리업무의 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산자단체등의 관계자의 보고해태 또는 검사기피 등 |
개인: 30만엔 이하의 벌금 단체: 30만엔 이하의 벌금 |
• 1985년에 제정된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음
• ‘반도체 집적회로’를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 재료의 표면 또는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트랜지스터 기타 회로를 생성함과 동시에 불가분의 상태로 한 제품으로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제1호), 우리 법과 달리 ’ 회로배치‘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회로 및 이들을 접속하는 도선의 배치‘라고 정의하고 있음
• 회로배치를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경제산업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제출하여 회로배치이용권의 설정 등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법 제28조에 근거해 일반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SOFTIC)에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인 기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창작한 회로배치에 대하여는 그 창작 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기타 사용자를 해당 회로배치의 창작자로 함
• 특허와 같은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여부 등을 등록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지 여부,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있는지 여부,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신청하는 회로배치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이전에 업으로서 양도·수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함
• 회로배치이용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임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및 보전명령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쿄지방법원, 오사카지방법원, 도쿄고등법원이 관할함. 평균 심리 기간은 다음과 같음 5)
| [표 27]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건수 및 평균심리기간 *출처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홈페이지 | |||
|---|---|---|---|
| 연도 (年次) |
신규 건 新受(件) |
종료 건 既済(件) |
평균심리기간(개월) 平均審理期間(月) |
| 2013 | 114 | 99 | 6.7 |
| 2014 | 138 | 111 | 7.1 |
| 2015 | 137 | 162 | 7.8 |
| 2016 | 118 | 129 | 8.3 |
| 2017 | 105 | 115 | 7.3 |
| 2018 | 92 | 85 | 7.7 |
| 2019 | 85 | 88 | 7.0 |
| 2020 | 69 | 65 | 9.0 |
| 2021 | 103 | 86 | 7.0 |
| 2022 | 126 | 122 | 9.2 |
*출처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홈페이지
도쿄지방법원 오사카지방법원은 2014~2022년 발생한 일본 내 특허권 침해에 관한 분쟁 및 소송 건수를 집계함 6)
이 통계는 도쿄 지방재판소 및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지식재산권 전문부가 작성한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의 통계 정보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행정국에서 정리한 것이며 잠정적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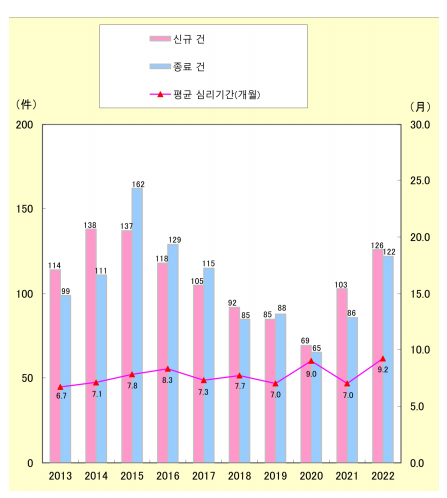
*출처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홈페이지
• 일본의 사법제도는 전전과 전후로 나눌 수 있음. 일본의 근대적 사법제도는 메이지헌법 제정 후인 1890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그 골격이 정해졌으며, 법원은 대심원·항소원·지방재판소 및 구(區) 재판소로 구성되었음. 법원에 검사국이 설치되어 재판관과 검찰관이 사법관으로 육성되는 등 독일의 제도와 유사하였음
• 전후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함께 사법제도도 미국 제도를 따른 많은 변혁이 이루어졌음. 법원에 위헌심사권이 부여되었고 사법권은 모두 법원에 귀속되었으며, 전전에 있던 행정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의 설치가 금지되었음. 최고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 이외에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신설되고, 사법행정의 권한도 법원에 부여되었으며, 절차 면에서도 당사자주의 절차가 대폭 채용되었음
• 일본 헌법 제7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일본 헌법은 최종심, 최상급인 법원으로 최고재판소를 설치하고, 어떠한 하급법원을 설치할지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법에서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및 간이재판소의 4종류의 재판소를 두고, 각각의 재판소가 다루는 사건을 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및 보전명령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平成 8년 법률 제109호)에서는 지식재산분쟁에 관한 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소송을 종래의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경합관할화)
• 2003년 민사소송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平成 15년 법률 제108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제1심을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로 하고(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의 전속관할화), 항소심을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로 전속시켰음
• 도쿄지방재판소의 경우, 민사 제29부, 제40부, 제46부, 제47부가 지적재산권부이며, 오카사 지방재판소의 경우, 제21·26 민사부가 지적재산권전문부임
•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할법원에 더하여,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특허권등에 관한 침해소송 및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 오사카지방재판소 및 도쿄고등재판소의 5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전문적 식견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전문위원을 쟁점정리, 증거조사 및 화해 등의 절차에 관여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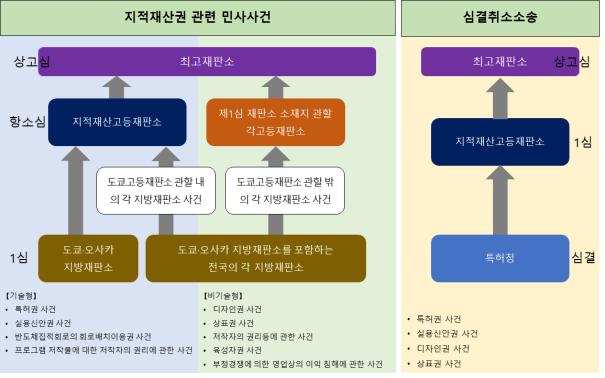
• 1999년부터 이루어진 사법제도개혁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재판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치를 위한 사항을 정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平成 16년 법률 제119호)」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하여 도쿄고등재판소에 특별 지부로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설치되었음.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지식재산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음
•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명령사건은 본안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갖는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가 관할을 가짐. 다만 가압류물건 또는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라면 해당 지방법원에서도 관할을 가짐
• 디자인권등에 관한 소송 본안의 관할법원이 동일본 지역의 지방재판소인 경우에는 도쿄지방재판소도 본안 관할권을 가지므로 도쿄지방재판소에도 보전명령사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일본 지역의 지방재판소인 경우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도 보전명령사건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가압류물건이나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도쿄지방재판소나 오사카지방재판소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음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침해가 됨
• 특허권(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의 실시
-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불과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이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기타의 물건
-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2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건)을 혼합하는 것에 의하여 제조되어야 하는 의약의 발명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제조하는 행위 및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제조하는 의약에는 미치지 않음
• 아래의 행위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함
- 특허가 물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업으로서 그 물의 생산에만 이용하는 물의 생산, 양도 등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물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그 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물로,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대해,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과 그 물이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 그 생산, 양도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물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그 물을 업으로서의 양도 등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업으로, 그 방법의 사용에만 이용하는 물의 생산, 양도 등 혹은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그 방법의 사용에 이용하는 물(일본 국내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 그 발명에 의한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것에 대해, 그 발명이 특허발명인 것과 그 물이 그 발명의 실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 그 생산, 양도 등 혹은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것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을 업으로서의 양도 등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은 침해 판단 및 예외 규정이 적용됨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 등록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함
•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특허법에서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규정이 준용됨
• 디자인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의 제조에만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 등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에 대하여 업으로 하는 행위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제조에만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의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해당 제조에만 이용하는 프로그램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로를 통한 제공 또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의 제조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 등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것들이 일본 국내에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함)으로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시각을 통한 미감의 창출에 불가결한 것에 대해,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인 것 및 그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 하는 행위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제조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의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대여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해당 제조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을 업으로서의 유통, 대여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의 건축에만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혹은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것들이 일본 국내에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함)으로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시각을 통한 미감의 창출에 불가결한 것에 대해,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인 것 및 그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혹은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 하는 행위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건축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의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해당 건축에 이용하는 프로그램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업으로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유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화상의 작성에만 이용하는 물품 또는 화상 또는 일반화상 기록매체등 또는 프로그램등 혹은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에 대해 업으로 하는 행위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작성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일반화상 기록매체등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의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해당 건축에 이용하는 화상 또는 프로그램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화상의 작성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화상 또는 일반화상 기록매체등 또는 프로그램등 혹은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것들이 일본 국내에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함)으로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시각을 통한 미감의 창출에 불가결한 것에 대해,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인 것 및 그 물품 또는 화상 또는 일반화상 기록매체등 또는 프로그램등 혹은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 하는 행위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작성에 이용하는 물품 또는 일반화상 기록매체등 또는 프로그램등 기록매체등의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또는 양도 또는 대여의 신청을 하는 행위
· 해당 작성에 이용하는 화상 또는 프로그램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을 업으로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는 행위 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기록매체등을 업으로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허락 없이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이때 상표권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상표에 근거하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범위 역시 출원서의 기재에 근거하여야 함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자신의 초상 또는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혹은 필명 또는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 등록 후, 부정경쟁의 목적에서, 자기의 초상 또는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또는 필명의 저명한 약칭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해당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생산 또는 사용방법 또는 시기 기타의 특징, 수량 또는 가격 또는 해당 지정상품에 유사한 서비스의 보통명칭, 제공의 장소, 질,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 효능, 용도, 태양, 제공의 방법 또는 시기 기타의 특징, 수량 또는 가격을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해당 지정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보통명칭, 제공의 장소, 질, 제공용으로 제공하는 물, 효능, 용도, 태양, 제공의 방법 또는 시기 기타의 특징, 수량 또는 가격 또는 해당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생산 또는 사용 방법 또는 시기 기타의 특징, 수량 또는 가격을 보통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해당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관용되고 있는 상표
- 상품등이 당연히 갖추는 특징 중 정령에서 정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수요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태양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표
- 지리적 표시와 관련한 다음의 행위.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지리적 표시 등록 특정농림수산물등 또는 그 포장에 지리적 표시를 붙이는 행위
· 지리적 표시 등록 특정농림수산물등 또는 그 포장에 지리적 표시를 붙인 것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지리적 표시 등록 특정농림수산물등에 관한 광고, 가격표 또는 거래서류에 지리적 표시를 붙여 전시 또는 반포 또는 이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지리적 표시를 붙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행위
•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의 사용 또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 지정상품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으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것을 양도, 인도 또는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상품에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은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것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지정서비스 또는 지정서비스·상품에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제공을 받은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물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것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시키기 위하여 양도, 인도 또는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소지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지정상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표시하는 물을 소지하는 행위
- 지정상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시키기 위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표시하는 물을 양도, 인도 또는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지정상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하거나 사용시키기 위하여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는 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하는 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만 이용하는 물을 업으로 제조, 양도, 인도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민사구제조치로서는 각 지식재산권법이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며, 고의 또는 과실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권리자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가 인정됨
• 민법 제703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함
-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의 태양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음(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제36조, 의장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12조,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
·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그 행위의 정지 청구 ·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침해의 예방 청구 ·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의 폐기, 침해행위에 공여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 |
- 정지 청구 또는 예방청구와 함께만 청구할 수 있음. 금지청구 시에는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이미 침해가 현실화되고, 이를 방치해서는 현저히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긴급성이 있는 때는 법원에 대하여 우선 침해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침해하는 모방품을 제조·판매·수입하는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많은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활동은 곤란한 경우가 많음. 이에 손해액에 대하여 산정 규정을 두고 있음(특허법 제102조, 상표법 제38조, 의장법 제39조, 저작권법 제11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로서 필요한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특허법 제103조, 상표법 제39조, 의장법 제40조). 다만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추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의 산정규정(특허법 제102조, 상표법 제38조, 의장법 제39조, 저작권법 제11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 권리자 등은 자신의 (1)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는 판매수량감소에 의한 일실이익, (2) 생산능력 범위를 넘는 부분에서는 라이선스 기회의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이 인정됨. 이에 권리자가 침해행위가 없으면 판매할 수 있던 물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침해자가 양도한 모방품의 수량 중 권리자등의 실시능력에 따른 수량을 곱해 얻은 액((1)의 일실이익)과 실시상응수량을 넘는 수량의 모방품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수량만큼의 라이선스상당액((2)의 일실이익)을 각각 계산하고, 그 합계를 침해액으로 할 수 있음
· 즉, 2019년 특허법 등의 개정 전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판매능력을 한도로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을 곱한 액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음.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판매력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 것임(특허법 제102조 제1항).
· 다만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리자등이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해당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특정수량)은 (1)의 일실이익의 계산에 기초로 하는 수량에서 공제하고, (2)의 일실이익의 계산에 기초로 하는 것으로 함. 이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은 구체적으로는 침해자의 광고 등의 영업노력, 시장개발노력이나 독자의 판매형태, 기업규모, 브랜드 이미지 등이 모방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한 것, 모방품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것, 모방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 특허발명이 모방품의 부가가치 전체의 일부에만 공헌하고 있는 것 등이 있고, 침해자의 주장·입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음
· 모방품의 부가가치 전체의 일부에만 공헌하고 있는 경우, 권리자등이 침해자에게 라이선스 허락을 얻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제2호의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제2호의 라이선스 상당액의 인정에 있어서는 침해 사실의 전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할 만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음
| 손해액 = (실시상응수량의 한정에서 침해자의 양도등수량 - 특정수량) x 특허권자등의 단위당 이익 + 실시상응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특정수량에 따른 라이선스상당액 |
·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이 그 자체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됨.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침해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이익이 얻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할 필요가 있음
| 손해액 = 침해자가 얻은 이익(부정경쟁행위자의 이익) |
· 설령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하여 일실이익, 침해이익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라이선스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는 손해액 최저한을 법정한 규정임. 또한 라이선스상당액의 인정에 있어서는 침해 사실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할 만한 금액을 고려할 수 있음
| 손해액 = 라이선스상당액 |
| [표 28] 실시료율 인정 사례 | |||||
|---|---|---|---|---|---|
| 재판부·판결연월일 | 업계에서의 실시료 시세 | 인정된 실시료율 | |||
| 知財高判(3部) 令和元年11月25日 (令和元年(ネ) 10046号) |
시례: 3% | 3% | |||
| 知財高判(2部) 令和元年10月10日 (平成31年(ネ)第10031号) |
최빈치: 3% 평균치: 3/4% (기계부품) 평균치 4.3% (기타 소모재) |
3% | |||
| 知財高判(3部) 令和元年9月11日 (平成30年(ネ)第10006号等) |
평균치: 2.5% | 3% 1.5% |
|||
| 大阪地判(21民) 令和元年9月10日 (平成28年(ワ)第12296号) |
평균치: 3.9% | 5% | |||
| 大阪地判(26民) 令和元年6月20日 (平成29年(ワ)第9201号) |
평균치: 7.1% (의약품·기타 화학제품) 평균치: 5.3% (건강, 인명구조, 오락) 평균치: 6.0% (바이오·제약) |
7% | |||
| 東京地判(40部) 令和元年5月22日 (平成28年(ワ)第14753号) |
실례: 5% | 5% | |||
| 知財高判(2部) 平成31年4月25日 (平成30年(ネ)第10017号) |
평균치: 4/3% (화학분야) 평균치: 5.96% (유기화학, 농약) |
비공개 | |||
| 大阪地判(21民) 平成31年3月5日 (平成28年(ワ)第7536号) |
최빈치: 3% 평균치: 3.4% (기계부품) 평균치: 4/3% (기타 소모재) |
3% | |||
| 知財高判(3部) 平成31年1月31日 (平成30年(ネ)第10039号) |
평균치: 3.9% (플라스틱 제품) 독점적 라이선스 평균치: 2.0%,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치: 2.1%(운송) |
비공개 | |||
•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03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함
• 신용회복조치청구
- 법원은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특허법 제106조, 상표법 제39조, 의장법 제41조, 저작권법 제115조,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 [표 29] 지식재산권법별 민사적 조치 비교 | |||||||
|---|---|---|---|---|---|---|---|
| 특허법 | 의장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 방지법 |
종묘법 | 반도체집 적회로법 |
|
| 금지청구 | 제100조 | 제37조 | 제36조 | 제112조 | 제3조 | 제33조 | 제22조 |
|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제4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 손해액의 추정 | 제102조 | 제39조 | 제38조 | 제1147조 | 제5조 | 제34조 | 제25조 |
| 침해의 추정 | 제104조 | - | - | - | 제5조의 2 | - | - |
| 과실의 추정 | 제103조 | 제40조 | 제39조 | - | - | 제35조 | - |
|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 제104조의2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2 | 제6조 | 제36조 | - |
| 서류제출명령 | 제105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3 | 제7조 | 제37조 | 제26조 |
| 사증 | 제105조의2 | - | - | - | - | - | - |
|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 제105조의11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4 | 제8조 | 제38조 | - |
|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제105조의3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5 | 제9조 | 제39조 | - |
| 비밀유지명령 | 제105조의4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6 | 제10조 | 제40조 | - |
|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 제105조의7 | - | - | - | 제13조 | 제43조 | - |
| 신용회복조치 | 제106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5조 | 제14조 | 제44조 | - |
- 특허권침해소송에서는 권리자 측에서 침해를 입증하여야 하나 침해의 증거를 피의 침해자 측이 보유하고 있어 권리자 측에서 입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컨대 제조장법의 특허가 대상으로 피의침해자가 그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대상제품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의 발명으로 서버에 있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 등이 거론됨
- 이러한 경우에, 피의 침해자 측이 보유하는 증거를 입수 내지 피의침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써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221조, 특허법 제105조),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234조) 등의 증거수집절차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들 절차를 이용하는 것에 보수적이라 실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해외에서는 일본과는 다른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도 있음. 구체적으로는 폭넓게 자료제출이 강제되는 미국의 ‘discovery’ 외, 영국의 ‘disclosure’,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찰제도’ 등이 언급되고 있음. 일본에서는 권리자가 보다 침해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독일의 사찰제도를 참고하면서, 제소 후에 한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증제도」를 도입하게 됨. 즉 특허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기술전문가가 피의침해자의 공장 등에 출입하여 특허권의 침해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신설함
- 새로이 도입된 사증제도에서는 신청인(권리자)이 사증을 신청하고, 법원이 그 신청에 대하여 사증명령을 발령할지 여부를 판단함
- 상기 판단에 있어, 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증명령을 내릴 수 있음(특허법 제105조의 2 제1항)
① 특허권침해소송/전용실시권침해소송에서 신청(제기 후만 가능)
② 상대방이 서류 등을 소지·관리하고 있을 것(제3자는 포함하지 않음)
③ 입증을 위해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필요성)
④ 침해한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⑤ 다른 수단으로는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다고 예상될 것(보충성)
⑥ 증거수집시간, 당사자부담 등이 상당할 것
- 사증 명령이 내려지려면 증거수집의 필요성, 침해행위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보충성, 상당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에서보다는 상당 부분의 침해 입증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사증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사증인에 의한 사증(조사)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하여 기재된 사증보고서의 취급에 관한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음
| [표 30] 신청인에 의한 사증 절차 | |
|---|---|
| 사증 |
• 사증의 신청 • 상대방의 의견 청취 • 법원에 의한 사증명령·사증인의 지정 또는 각하결정 • 사증인에 의한 사증·사증보고서의 법원 제출 • 출입이나 서류제시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
| 보고서 |
• 사증보고서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 • 상대방에 의한 사증보고서의 비공개 신청 가능(2주 이내)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비공개결정 가능 • 신청인에 의한 열람등사 후 증거로서 제출 |
• 영업비밀누설의 방지책
- 사증제도는 제3자가 공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얼마나 회피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됨. 개정법은 사증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책으로 이하의 제도를 신설함
- 사증인의 기피(사증인이 신청인의 관계처 등 성실히 사증 하는 것을 방해할 사정이 있는 때에 사증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사증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공개
- 사증인에 의한 비밀누설의 형사벌
- 이외에, 증거로서 제출된 증거보고서에 대하여 종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열람금지의 신청(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도 있음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이 침해된 때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특허법 제196조, 상표법 제39조, 의장법 제69조, 저작권법 제119조)
•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주지표시혼동야기행위)에 위반한 자, 부정한 목적을 얻을 목적으로 제2호(저명표시모용행위), 제3호(상품형태모방행위)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인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행위자의 처벌에 추가하여 업무주체인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됨(특허법 제201조, 상표법 제82조, 의장법 제74조, 저작권법 제124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2조 제1항)
•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안 되는 화물」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수출 및 수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안정, 경제질서의 유지란 사회공공의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며, 세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국경조치를 함으로써 그 수입금지의 실효를 기대하는 것임
• 지식재산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국경조치로는 수출입 금지절차와 몰수 절차가 있으며, 지식재산침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인정절차가 있음
• 인정절차 결과,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세관이 인정한 화물은 수입자 자신에 의한 폐기나 세관에 의한 몰수 등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며, 지식재산침해물품의 수출입이나 일본을 통과하는 외국 화물 중의 지식재산침해물품을 국내 운송 또는 적치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관세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됨
• 세관에서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의심이 있는 화물을 발견하는 경우는 금지신청에 의하여 권리자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세관직원이 직접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로 권리자의 금지신청이 큰 역할을 담당함
• 지식재산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출 또는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고, 인정절차를 취할 것을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금지를 신청하는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 또는 상품등표시·상품 형태의 내용, 자신의 권리 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의 물품과 그 이유 등을 금지신청서에 기재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증거와 함께 세관에 제출함
• 이때 세관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으며, 세관은 이를 심사하고 수리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하고, 그 신청에 근거하여 국경조치를 행함
• 법원 또는 특허청에서 권리자와 이해관계자 등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등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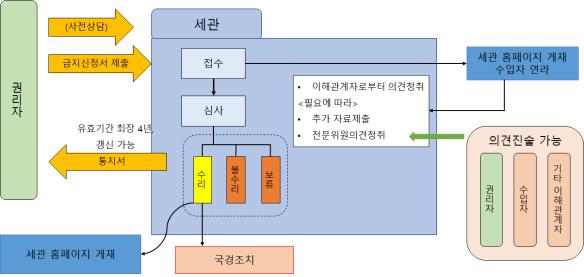
• 금지신청이 수리된 경우, 권리자는 관세법에 따라 해당 신청과 관련한 화물에 대한 인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세관이 판단하는 경우, 상당액의 담보금 공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음(신청공탁)
• 인정절차는 세관이 지식재산을 침해한다는 의심이 있는 화물을 발견한 때, 그 화물이 지식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임
• 특허권자들은 자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 성자권 또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에 관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 대하여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해당 화물이 수출·수입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다른 세관장이 인정절차를 집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정절차의 개시는 침해사실을 권리자가 발견하여 세관에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와 세관이 자체적으로 침해사실을 탐지하여 인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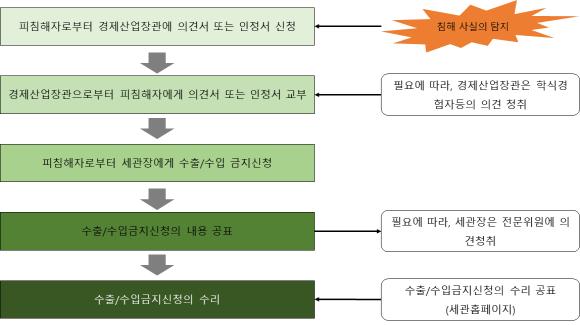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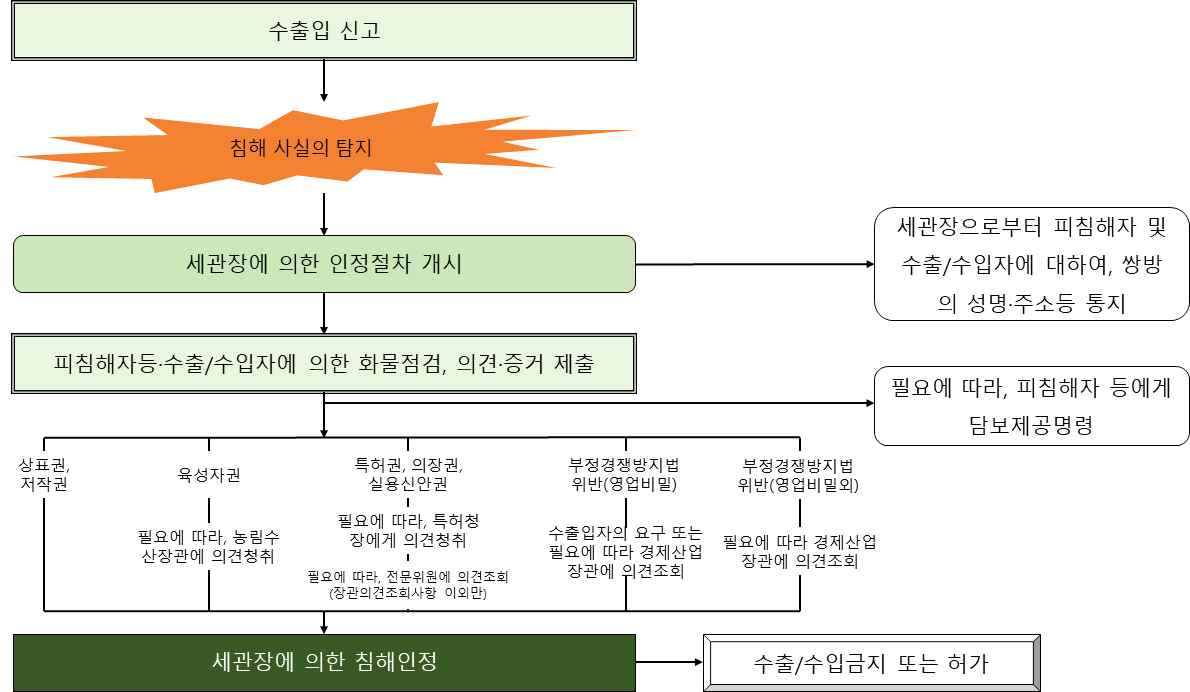
• 세관이 발견한 지식재산침해의심물품에 대하여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식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부터 지식재산침해물품의 몰수·폐기까지 모두 세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권리자는 인정절차에서 세관에 대하여 증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음
• 인정절차나 이후 몰수·폐기 시, 권리자가 세관이나 수입자에게 보관비용이나 폐기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음
• 일정 기간 내에 세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입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인정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음(통관해방제도)
• 세관장은 지식재산침해물품에 해당하는 화물로 수입되고자 하는 것을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해당 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적을 명할 수 있음(관세법 제69조의 11 제2항). 다만 이 조치는 인정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함(관세법 제69조의 12 제4항)
• 국경조치의 대부분은 물품을 몰수·폐기하는 경우로 끝나지만, 반복되는 등 악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되고, 형사벌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의 병과)
• 지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재판과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있음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에서는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위해,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그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 ADR에는 중재와 조정 등 다양한 것이 있음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정이 사안의 내용을 조사한 가운데 판단(중재판단)을 하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게 되는 절차임
• 조정은 당사자 사이를 조정인이 중립적인 제3자로서 중개하고, 분쟁의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나 교섭을 촉진하거나 이해를 조정하는 절차임
2) 平成 16년 법률 제151호(平成 29년 법률 제45호에 의한 개정). 시행일: 2020년 4월 1일.
• 지식재산과 같이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특허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허분쟁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중재에는 외국의 중재판단을 국내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뉴욕 조약)」이 있고, 현재 150개 이상의 국가가 가맹하고 있으므로, 중재에 의하여 뉴욕조약가맹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국제상공회의소(ICC): https://iccwbo.org/
• 국제산 공회의 소 일본위원회: http://www.iccjapan.org/
• 소프트웨어분쟁해결센터: https://www.softic.or.jp/adr/index.htm
|
- 중재: 법원을 대신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중립 한 제3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임하고, 그 판단에 복종하는 분쟁해결절차 - 중립평가: 중립 한 제3자가 기술적인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판단(평가) 또는 해결안의 제시를 하는 절차 - 단독판정: 단독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사항에 관하여 중립 한 제3자(단독판정인)가 판정을 하는 절차 - 화해알선: 중립 한 제3자가 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주적인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절차 |
• 제2 도쿄변호사회중재센터: https://niben.jp/soudan/service/chuusai/
• 도쿄국제지적재산중재센터: https://www.iactokyo.com/
• 도쿄변호사회분쟁해결센터: https://www.toben.or.jp/bengoshi/adr/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https://www.ip-adr.gr.jp/
• 일본상사중재협회: https://www.jcaa.or.jp/
• UDF(Union des Fabricants)-ADR센터: https://www.udf-jp.org/udf_adr.html
• 2019년 10월부터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知財調停」이란 민사조정법에 근거하는 새로운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임
• 민사조정은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선택한 조정위원의 관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나, 지재조정은 민사조정의 한 유형으로, 지재사건전문부인 도쿄지방재판소 및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평소부터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관과 지적재산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변리사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됨
• 기본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과 같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종묘법상의 육 성자권, 부정경쟁방지법, 상표·회사법이 금지하는 상호 등의 부정사용, 타인의 저명한 성명 등의 무단이용(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금전 지급 기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유무 범위를 대상으로 함
• 당사자 사이의 교섭 중에 발생한 분쟁으로 쟁점이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 것이나 교섭에서 쟁점이 특정되고 당사자 쌍방이 화합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 사안에 적절함. 반면 상대방 제품의 신속한 금지를 요구하는 경우, 고액의 손해배상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쟁점이 복수인 경우,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훼손되어 있고 상호 양보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특허권의 무효 주장이 이루어지고, 그 심리판단에는 상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상정되는 경우 등은 소송이나 가처분 절차에 의한 해결이 보다 적절함
• 관할재판소의 합의
- 분쟁당사자는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신청서류의 제출: 지재조정을 신청할 때는 첫 번째 기일까지 재판소에 이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조정신청서(신청의 취지 및 분쟁 요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민사조정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항)
- 관할합의서 등의 부속서류
- 서증
- 증거서명서(분쟁의 요점에 기재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사본을 포함함)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민사조정규칙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해 상대방의 인원수만큼의 부본 및 조정위원회용 복사본 3통(특허 관련 분쟁과 같이 재판소 조사관의 관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통)을 제출하여야 함
• 제1회 기일까지의 실질적 교섭
- 신청서 등의 쟁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1회 조정기일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답변서등의 서면 제출에 의하여 실질적인 반론을 함
- 답변서에는 반론 이외에 신청인에 대한 해결안을 기재할 수 있음
- 법원은 제1회 조정기일 10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제1회 조정기일까지 신청인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제1회 조정기일에 심리가 이루어짐
• 조정위원회는 재판소 지재 부라 불리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심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에 속하는 재판관인 조정주임 1명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사례의 해결에 경험이나 식견이 이 쓰는 재판관 OB, 변호사나 변리사 등으로 선임된 조정위원 2명을 더해 3명으로 구성됨
• 도쿄지방재판소의 경우, 민사 제29부, 제40부, 제46부, 제47부가 지적재산권부이며, 오카사 지방재판소의 경우, 제21·26 민사부가 지적재산권전문부임
• 분쟁 당사자는 일정 기일까지 재판소에 여러 주장을 명기한 자료를 제출하며, 제출된 자료등에 근거해,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회의 조정기일 중에 분쟁해결을 위한 조언이나 견해를 제출함
• 당사자가 재판소에 출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격지인 경우 원격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 조정위원회의 견해에는 쟁점에 대한 심증의 공개에 한하지 않고, 입증의 곤란정도나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소송 또는 가처분에 의한 해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의 의견도 포함됨
•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견해에 근거하여 조정절차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조정절차의 종료(불성립 또는 취하)에 의하여 자주적인 교섭 또는 소 제기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음
• 조정이 불성립 또는 취하된 후 조정의 목적이 된 청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의 심리는 조정위원회에 포함된 재판관이 속한 부이 외의 부가 담당함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 [표 31] 피침해 물품 조사 방법 | |
|---|---|
|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 해 정보 입수 |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 해 상황 조사 |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표 32] 피침해 물품 증거 확보에 관한 법률 | |
|---|---|
|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
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 [표 33]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
|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중인 권리 |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
| 등록된 권리 |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
||||
| 발송 및 후속조치 |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
||||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써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34]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 |
|---|---|
| 구분 |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 배상? •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
| 소송비용분석 |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무효심판 대응 비용 • 협상 비용 |
| 사업 전략 고려 |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 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 [표 35]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 3의 장소 |
| 장점 |
• 심리적·정신적 우위 • 협력 및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 상대방의 단호한 결정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음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짐 • 감정융화 |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
| 단점 | • 상대방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비용이 중복됨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상대방과의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
•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열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일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나 불사용취소를 주장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소송은 등록된 이후 5년 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프린트용으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토너 카트리지(원고 제품)의 재생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들이 재생품을 장착한 때에 토너의 잔량이 「?」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토너 카트리지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부품(원고 전자부품)인 메모리를 제외하고, 피고의 전자부품(피고 전자부품)인 메모리로 교체한 가운데, 재생품 토너 카트리지(피고제품)로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원고가 전자부품의 구조에 관하여 갖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권의 소진에 의하여 특허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특허권자등이 일본국에서 양도한 특허제품 그 자체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특허제품인 정보기기장치 그 자체를 교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됨
• 본건 각 특허권의 권리자인 원고는 사용한 원고제품에 대하여 토너 잔량이 「?」로 표시되도록 설정한 가운데, 본건 각 특허실시품인 원고전자부품인 메모리에 대하여 충분한 필요성 및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서환제한조치를 두는 행위에 의하여, 리사이클 사업자인 피고들이 원고전자부품인 메모리의 서환에 의하여 본건 각 특허의 침해를 회피하면서, 토너 잔량이 표시되는 재생품을 제조, 판매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결과, 피고들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토너 카트리지 시장에서 경쟁상 현저히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창출한 가운데, 해당 각 특허권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에 미친 행위라고 인정됨
•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 보면, 토너 카트리지의 리사이클 사업자인 피고들이 자신의 토너 전량표시를 한 제품을 유저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토너 카트리지 시장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리사이클 사업자인 피고들과 그 유저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독점금지법(독점금지법 제19조, 제2조 제9항 제6호, 일반지정 제14항)과 저촉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본건 서환제한조치에 의한 경쟁제한의 정도가 큰 것, 같은 조치를 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정도가 낮은 것, 같은 조치는 사용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이용 등을 제한하는 것인 것 등의 점도 함께 고려하면,
본건 각 특허권에 근거해 피고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의 발달」을 저해 또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민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원고는 본건 각 특허의 실시품인 전자부품이 포함된 토너 카트리지를 양도등을 하는 것에 의하여 이미 대가를 회수하고 있는 것과 본건 서환제한조치가 없으면 피고들은 본건 각 특허를 침해하는 것 없이 토너 카트리지인 전자부품인 메모리를 소환하는 것에 의하여 재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추인되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금지청구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피고제품이 특허제품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이유로 권리 소진을 부정하면서, 원고 특허권자가 달리 필요성, 합리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소진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피고가 특허권 침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창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원고의 행위는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를 든 가운데 결론으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점을 특징으로 함
• 이산화탄소함유 점성조성물 발명과 관련하여 2건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원고(피항소인)가 원고(항소인)들이 제조, 판매하는 탄산팩 화장료(피고 각 제품)은 상기 각 특허권과 관련한 발명(본건 각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이들의 제조, 판매가 상기 각 특허권의 직접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등을 주장하고, 손해배상등을 요구한 사안
• 원판결을 침해를 긍정하고 손해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추정을 인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가운데, 피고별로 높은 금액의 손해액을 인용함
• 특허법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은 침해자의 침해품 매출액에서 침해자에게 있어 침해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에 의하여 그 제조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비를 공제한 한계이익액으로, 그 주장입증책임은 특허권자측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공제해야 하는 경비는 침해품의 제조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을 말하며, 예컨대, 침해품에 대한 원재료비, 구매비용, 운송비 등이 이에 해당하고, 관리부문의 인건비나 교통·통신비 등은 통상 침해품의 제조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음
• 특허법 제102조 제2항에 있어 추정의 복멸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사정과 같이 침해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특허권자가 받은 침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저해하는 사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예컨대 특허권자와 침해자의 업무태양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시장의 비동일성), 시장에 있어 경합품의 존재, 침해자의 영업노력(브랜드력, 선전광고), 침해품의 성능(기능, 디자인 등 특허발명 이외의 특징) 등의 사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 제1항 단서의 사정과 같이,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도, 이들 사정을 추정복멸의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특허발명이 침해품의 부분만에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도, 추정복멸의 사정으로서 고려할 수 있으나, 특허발명이 침해품의 부분만에 실시되고 있는 것에서 바로 상기 추정 복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특허발명이 실시되고 있는 부분의 침해품 중에서의 평가, 해당 특허발명의 고객유인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함
• 실시에 대하여 받아야 할 요율은 ① 해당 특허발명의 실제 실시허락계약에서의 실시료율(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계에서의 실시료 시세)등도 고려하면서, ② 해당 특허발명 자체의 가치, 즉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이나 중요성, 다른 것에 의한 대체가능성, ③ 해당 특허발명을 해당 제품에 이용한 경우의 매출 및 이익에의 공헌이나 침해의 태양, ④ 특허권자와 침해자와의 경쟁관계나 특허권자의 영업방침 등 소송에서 드러난 제 사정을 종합고려하여 합리적인 요율을 정해야 함
•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잠정적으로 침해행위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재산상태와 비교하여 침해행위에 미친 것으로 실제 도달한 재산상태의 차액이라는 기존의 유력설에 대하여,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단순히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의하여 얻은 현실의 이익, 즉, 이것이 특허제품의 제조라면 제조에서 얻은 이익, 판매라면 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임을 지칭하고, 따라서 침해가 없었다고 한 경우의 가정적 이익을 공제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
•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이익」의 개념에 대하여는 일찍이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을 공제한 액(순이익)으로 한다는 판결이 다세를 차지하였으나, 이 재판례에서는 침해행위에 있어 침해자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 비용만을 공제한다는 침해자 측의 한계이익설을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추정의 복멸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102조 제2항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추정의 복멸과정을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음. 단순히 동종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복멸을 이끄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에게 침해품과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원고는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제7류 「유압셔블」로 상표등록출원(본원)을 하였으나 거절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본원에 관한 「상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색채명을 「택시 옐로」에서 「오렌지색」으로 변경하는 절차보정을 하였음.
피고는 상기 불복심판에 대하여,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유로 「본건 심판의 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본건심결)을 하고, 이에 원고는 본건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함
• 상품의 색채는 예전부터 존재하고, 통상은 상품의 이미지나 미관을 높이기 위하여 적의선택되는 것이고 상품의 색채에는 자연발생적인 색채나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도 있으므로, 거래 시 필요 적절한 표시로 누구나 그 사용을 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로이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단일한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상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해석됨
•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단일한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같은 조 제2항의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군가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사용된 결과, 특정인의 업무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게 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자타상품식별력 또는 자타서비스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전기 취지에 감안하면, 특정인에 의한 해당 상표의 독점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상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되는 사정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함
• 본원상표가 사용된 원고의 유압셔블의 판매실적, 점유율 및 광고선전에서 본원상표 또는 본원상표의 색채가 원고의 유압셔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 많은 수요자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한편, 본원상표는 색채 및 색채가 붙은 위치가 흔한 것으로 그 구성태 양은 특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원고의 유압셔블의 대부분에는 arm 부나 차체후반부 등에 저명상표인 「HITACHI」「日立」이란 문자가 붙어 있고,
이들 문자의 표시에서 원고의 유압셔블의 출처가 실제로 인식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원고에 의한 광고선전은 이에 접한 수요자에 대하여 본원상표와 원고의 유압셔블과의 사이에 강한 결부가 있는 것까지 인상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원고 이외의 복수의 사업자가 본안상표의 색채와 같은 계열의 색인 오렌지색을 그 차체의 일부에 사용한 유압셔블을 판매하고 있던 것을 종합고려하면 원고에 의하여 본원상표가 사용된 결과 본원상표만이 독립하여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는 유압셔블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고까지는 인정할 수 없음
• 일본에서 색채상표에 대한 출원을 접수한 2015년 4월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가 출원된 것은 549건이며, 이중 등록된 것은 8건이며, 이는 모두 복수의 색채가 조합된 상표임
• 아직 일본에 있어 단일한 색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는 소극적이며, 아직은 독점적 응성이 없고 식별력도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임
• 원고(항소인)는 컵등에 넣어 사용하는 시험관 모양의 가습기인 X 가습기 1~3을 개발하였음. 원고는 2011년 11월에 개최된 전시회에 X 가습기 1을, 2012년 6월에 개최된 전시회에 X 가습기 2를 각각 출전하였음. X 가습기 1과 2는 모두 가습기 본체를 외부 전원에 동선으로 접속하는 것에 의하여 전기 공급을 받는 구성을 가졌음. 이후 2015년 1월, 원고는 웹 사이트에서 X 가습기 3을 판매 접수를 시작하였음. X 가습기 3은 가습기 본체와 USB 단자가 케이블로 접속되고, 이에 의하여 전기 공급을 받는 구성을 가졌음
• 피고(피항소인)는 2013년 가을경, X 가습기 1 및 2과 같이 컵등에 넣어 사용되는 스틱형상의 가습기인 Y 가습기를 수입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를 개시하였음
• 원고는 Y 상품의 형태가 X 가습기 1 및 2의 형태에 의거하여 모방한 것으로, Y에 의한 Y 상품의 수입 및 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Y상품의 수입등의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 원판결은 3호에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시장에서 유통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이른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가운데, X 가습기 1, 2는 시장에서 유통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항 5호 イ에서의 「최초로 판매된 날」이 「타인의 상품」의 보호기간의 종기를 정하기 위한 기산일에 불과한 것은 조문의 문언이나 형태모방을 신설한 개정 당시의 입법자 의사에서 명확함. 또한 같은 법에는 「타인의 상품」의 보호기간의 시기를 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같은 법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타인의 상품」인 것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음
• 형태모방의 금지의 취지에 미루어보아, 「타인의 상품」을 해석하면, 이는 자금 또는 노력을 투하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상품화를 완료한 물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해당 물품이 판매되고 있을 것까지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거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품화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또한, 판매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양산품 제조 또는 양산태세의 정비를 하는 단계에 있을 것까지의 필요는 없다고 해도, 상품으로써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등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이 외견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해석됨
• X 가습기 1이 피복되어 있지 않은 동선에 의하여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상품으로써의 모델이 완성하였다고 해도, 판매에 있어서는 다소의 개변이 필요한 것은 통상의 것이라 생각되며, 사후적으로 이러한 개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이 판매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단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고, X 가습기 1의 피복되어 있지 않은 동선 부분을 피복된 코드선으로 치환한 것은 용이한 것으로 X 가습기 1이 판매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X 가습기 1의 상품 해당성을 긍정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항 5호 イ가 정한 3년의 기간은 선행개발자가 투하자본의 회수를 종료하고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거두는 기간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됨.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보호기간의 시기는 개발, 상품화를 완료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 단계에 이른 것이 외견적으로 명확하게 된 때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함. 왜냐하면 이때부터 선행개발자는 투하자본회수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임
• 타인의 상품이라 함은 보호를 구하는 상품형태를 구비한 최초의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품형태를 구비하면서 약간의 변경을 가한 후속 상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그렇다면 보호기간은 항소인 가습기 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항소인 가습기 1 및 항소인 가습기 2 형태의 보호기간은 모두 2024년 11월 1일의 경과에 의하여 종료함. 이러한 이유에서 X의 금지청구를 기각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피항소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항소인에 의한 선의무중과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인용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상품의 해석을 통하여, 보호의 시기에 대하여 판단함과 더불어 보호 종기의 기산점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운 재판례임
• 원심 판결은 보호의 시기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유통의 대상이 되는 물건(실제로 유통 또는 적어도 유통의 준비단계에 있는 물건)」을 제3호의 상품으로 해석한 반면, 본 판결에서는 「상품화」가 완료된 물품이라면 「상품」 성이 긍정된다고 함
• 원고는 75점의 사진소재를 수록한 사진소재집 CD(본건 CD)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본건 CD에는 커피를 마시는 남성이란 제목의 사진소재(본건 사진소재)가 수록되어 있음. 피고는 동인지 이벤트에 소설동인지를 출품하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본건 사진소재의 샘플 영상을 참조하여 일러스트(본건 일러스트)를 그리고, 해당 동인지의 뒤표지에 게재하고, 동인지 이벤트에서 해당 동인지를 50권 판매하였음.
이후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본건의 사용 사실에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본건 사진소재의 판매가격의 20배에 해당하는 54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음. 이에 원고는 본건 사진소재에 관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청구의 불법행위해당성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함
• 원고는 본건 사진소재가 저작물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카메라맨으로부터 저작권 양도를 받은 취지를 주장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사진소재는 배경, 조명, 광량, 색상 등 어느 것이나 평범하고 흔한 표현으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본건 일러스트와 본건 사진소재와의 유사점은 모두 평범하고 흔한 표현이므로 본건 일러스트에서 본건 사진소재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직접 감득할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함
• 사진은 피사체의 선택·조합·배치, 구도·카메라 앵글의 설정, 셔터 찬스의 포착, 피사체와 광선과의 관계(순광, 역광, 사광 등), 음영법, 색채의 배합, 부분의 강조·생략, 배경 등의 제요소를 종합해 이루어지는 한 개의 표현이고, 여기에 촬영자등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본건 사진소재는 오른손에 커피컵을 쥐고, 약간 좌측으로 고개를 숙이며 커피컵을 입가 부근에 두고 있는 남성을 피사체로 하여 피사체에 좌측 전면 위쪽에서 빛을 쬐면서 초점을 맞추고, 배경 일부에 기둥과 식물을 포함시키면서 전체로서 희게 흐림으로써 적색기조의 셔츠를 입은 피사체 인물이 자연스레 강조된 컬러 사진이고, 피사체의 배치나 구도, 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색채의 배합, 피사체와 배경의 컨트러스트 등의 종합적인 표현에 있어 촬영자의 개성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본건 일러스트는 A5판 소설동인지의 뒤표지에 있는 3개의 일러스트 공간 중 1개에 어느 인물이 지닌 잡지의 뒤표지로서, 2.6cm 사방 공간에 그려져 있는 흑백 일러스트로, 배경은 무지의 백색 내지 회색으로 되어 있고, 얇은 흰색 선이 인물의 안면 중앙부를 종단해 있고 문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본건 일러스트는 본건 사진소재의 종합적 표현 전체에 있어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피사체와 광선의 관계, 색채의 배합, 피사체와 배경의 컨트러스트 등)을 지니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 일러스트는 본건 사진소재의 표현상의 본질적인 특징을 직접 감득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사진과 표현형식을 달리 하는 일러스트화가 원 사진의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지를 다툰 사안으로, 사진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창작적 요소)과 피사체와의 관계를 다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 본건 일러스트와 같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제재(再製)가 기존 저작물의 복제 또는 번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제재가 기존 저작물의 표현상의 본질적 특징, 즉 그 창작적 요소를 직접 감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것을 필요로 함
•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9년 BtoC-EC(소비자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19.4조 엔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시 7.65% 증가한 수치임
• 일본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표 36] 일본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
| 번호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 1 | 楽天 | https://www.rakuten.co.jp/ |
• 2020년도의 유통총액은 약 4.5조 엔으로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 라쿠텐 트래블, 벼룩시장, 라쿠텐 24(디렉트), 라쿠텐세이유네트슈퍼 등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플랫폼인 「楽天市場」만으로도 3조 엔 이상의 유통총액을 보임 |
| 2 | Amazon | https://www.amazon.co.jp/ |
• 미국 Amazon의 일본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 일본 내에서의 유통총액이 공개된 바는 없으나, 통판신문사의 추정에 의하면 약 3조엔 정도의 규모를 보임 |
| 3 | Yahoo!ショッピング | https://shopping.yahoo.co.jp/ |
•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관리하는 지주회사 Z홀딩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 2019년의 경우 취급액은 약 1.03조엔으로 전년대비 34.5% 증가함 |
| 4 | メルカリ(Mercari, Inc.) | https://jp.mercari.com/ |
• 일본에 본사를 두고, 일본과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벼룩시장 앱 • 2020년의 경우 약 0.62조엔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함 |
• 코로나 사태로 인한 행동 제한 및 외출 자체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 다만 일본의 경우, 전체 상거래 규모에 비하여 전자상거래화율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님. 경제산업성 조사에 의하면 BtoC-EC의 2019년도 전자상거래화율은 약 6.76%에 불과하며, 성장의 여지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임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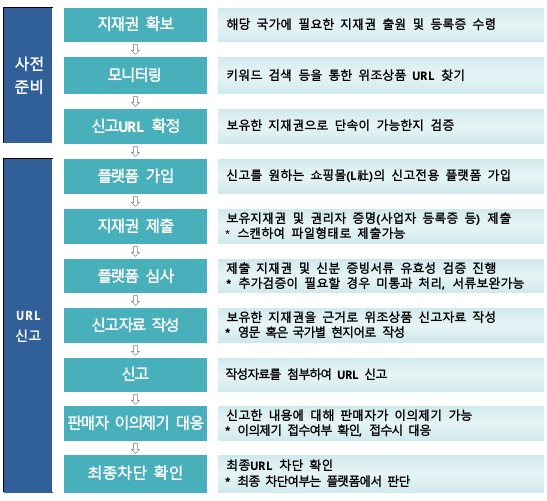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체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라쿠텐은 모회사 ㈜라쿠텐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 라쿠텐그룹은 1997년 도쿄에서 온라인 소매 거래 사이트 ‘라쿠텐 이치바’를 개설하며 설립돼, 이후 전자책 유통, 여행ㆍ숙박 예약 사이트, 핀테크 서비스(앱 기반 결제 시스템), 동영상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함
- 1999년 온라인쇼핑몰 명칭을 ‘라쿠텐’으로 변경하고, 2000년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
- 2022년 기준 회원수는 1억 2,380만 명, 입점한 온라인 매장 수는 5만여 곳, 매출은 17조 3,250억 원으로, 일본 최대 토종 전자상거래 회사임
라쿠텐은 판매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판매자 정책’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아래 내용은 문서 중 ‘5. 의무’, ‘8. 지적재산권’ 발췌
- 라쿠텐 판매자 정책 전문 보기 : https://rakutenmallgo.com/seller-policy>
|
5. 의무 5.6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라쿠텐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c) 판매자가 rakuten에 제공한 정보는 최신의 정확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
8. 지적재산권 8.1 rakuten 및/또는 그 라이선스 제공자는 계약에서 판매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 상표 및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체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하고 보유합니다. 8.2 판매자는 계약 기간 동안만 rakuten에 소유한 로고, 상표, 상호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을 복사, 사용 및 표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로열티가 없고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rakuten에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한 모든 지적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 및 하위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하고 진술합니다. 8.3 판매자는 제3자 소유권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고 본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허가권자이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해당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그러한 지적 재산권의 동일한 소유권 8.4 라쿠텐 식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자료 및 당사자가 부여한 지적 재산권의 파생물을 포함하여 계약 과정에서 편집되거나 준비된 모든 보고서, 사양 및 기타 유사한 문서는 라쿠텐의 절대적 재산입니다. 준비 기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러한 당사자입니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보고서, 사양 및 기타 유사한 문서에 존재하는 지적 재산권은 항상 관련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8.5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판촉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마케팅 활동에 다른 당사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증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rakuten은 판매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전 세계 모든 미디어의 모든 플랫폼에서 rakuten 음식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라쿠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 작성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라쿠텐의 모기업인 라쿠텐 그룹의‘지식재산권 침해신고’ 기능을 통해 특허ㆍ상표ㆍ디자인ㆍ저작권과 관련된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라쿠텐의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 양식 바로가기 :
https://ichiba.faq.rakuten.net/form/rightsmanagement-post-en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위 링크에 접속해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일어와 영어를 지원
② 통지 유형 선택 : 라쿠텐에서 침해 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규’, 또는 기신고 건이 있는 경우 ‘계속’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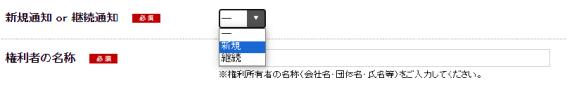
③ 통지인 자격 선택 : 권리자 유형에서 IP 권리 보유자를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선택. 대리인을 선택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야 함(첨부파일 선택 토글은 지원자에서 대리인을 선택하면 활성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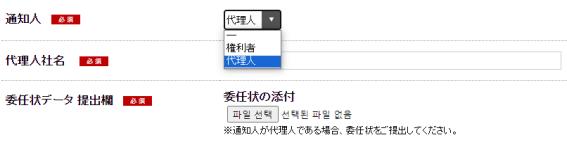
④ 권리자 정보 입력 : 이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입력, 침해 관련 라쿠텐의 상품 페이지 링크(URL주소)를 입력
⑤ 침해 유형 및 사유 선택 :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특허권 중에서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권리를 선택할 수 있음
※침해 권리별 신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함. 예를 들어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면 각각 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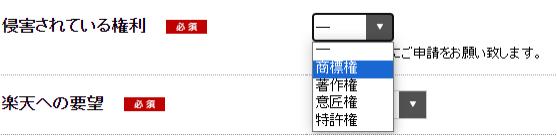
⑥ 요청 사항 선택 : 침해 구제를 위해 라쿠텐 측에 요구할 사항을 선택. 선택지는 1)상품페이지 삭제 2)제품 페이지의 텍스트 삭제 2)상품 페이지의 이미지 삭제 등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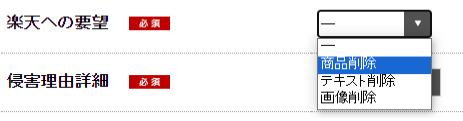
⑦ 침해 사유 선택 : 상세한 침해 사유를 선택하면 하단에 자동으로 설명 텍스트가 생성됨. 선택지는 1) 위조품 2) 상표 무단 사용 3) 이미지 무단 사용 4) 기타 등 4가지이며, 상표 무단 사용의 경우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안내 문구가 표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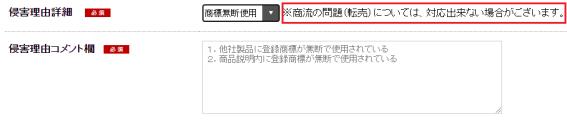
아마존 재팬은 미국 최대의 E-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의 일본 현지 법인으로, 2000년 온라인 서점 형태로 처음 일본에 진출한 뒤 2003년부터 제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현재의 쇼핑몰 형태로 변화
- 2022년 기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아마존은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평균 34% 매출 신장률을 보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서점 돌풍을 일으킨 이후 종합 전자상거래업체로 자리매김함
-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외 배송에까지 확장, 도서에서부터 시작해 화장품/생필품/의류./소형전자제품/식품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세상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에브리싱 스토어(everything store)’로 진화
- 아마존 고유의 ‘최저가 알고리즘’에 의해 상시적으로 아마존 내에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확인한 뒤 상품의 ‘최저가’를 변동하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함
- 아마존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일정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도 ‘아마존 글로벌셀링’이라는 판매자 전용 사이트에서 셀러(Seller) 등록이 가능함
미국 아마존이 바라보는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미국의 연방법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한 상표·특허·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음
아마존이 바라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개념 네 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Trademark) :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됨.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 ‘디자인 특허’란 신규성 있고 독창적인 3D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임. 디자인 특허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셀러들이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한국의 ‘의장권’과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 쉬운데,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스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의 2D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달리,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함. 따라서 미국에서는 캐릭터와 같은 2D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상표의 로고는 ‘상표’로 보호됨
□ 특허(Patent) : 실용 특허(Utility Patent)라고도 불리는 ‘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을 보호함. 특정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 방법, 특정한 조성물이나 기계 등이 모두 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됨.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sellercentral.amazon.com/help/hub/reference/external/U5SQCEKADDAQRLZ?locale=ko-KR
아마존에서 IP 침해 사실 신고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https://www.amazon.co.jp/-/en/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201995100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디자인이 도용된 제품이 일본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https://www.amazon.co.jp/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②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 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 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③ IP침해 유형 선택 : 디자인 침해에 대한 신고는 その他の IP侵害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침해 상품이 아님)
④ 브랜드명 입력

⑤ 상표등록번호, 침해 사실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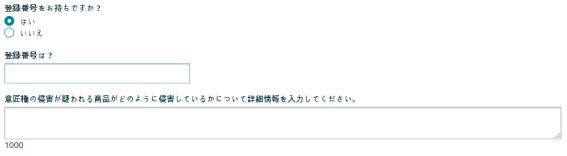
⑥ 개인정보 입력 : 아마존 측과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 권리자 지위(본인 또는 대리인) 선택, 보조 연락처 입력

⑦ 절차는 일반적으로 1~3 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권장됨
①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짐
- 혜택 중에 하나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RAV)’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음
-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임
②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 아마존의 IP(지식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 이는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요건으로 ‘등록된 상표’를 요구하던 시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해진 아마존 IP Accelerator 로펌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③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툴
-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음
④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 아마존은 상표 보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용(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 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하 UPNE)’ 또한 운영 중임
- 아마존에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리스팅을 발견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하면 아마존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 본 프로그램(UPNE) 참여 여부를 3주 이내에 결정하게 됨
- 판매자가 UPNE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침해 의심 리스팅은 바로 삭제됨
- 판매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허권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 4000달러의 참여 비용을 지급하며, 아마존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신속하게(보통 3~4개월 이내)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4000달러의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비용을 돌려받고 리스팅도 유지됨
- 현재는 ‘Invitation Only’로 아마존이 선정한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야후! 쇼핑은 일본 최대의 포털사이트 ‘Yahoo! JAPAN’의 톱페이지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통합 법인 Z홀딩스(주)가 운영
- 2019년에는 그룹사인 PayPay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결제서비스 ‘PayPay’의 이름을 딴 프리미엄 쇼핑몰 ‘PayPay 몰’을 시작
- 포털 내 검색결과 및 각 서비스를 통해 판매페이지로 고객 유입이 가능한 점이 특징
- 입점 매장 수는 2020년 12월 기준 약 1,170,000개이며, 셀러(Seller)로 등록하면 초기비용, 매월 고정비용 등의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을 장점으로 내세움3)
- 야후쇼핑에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일본 현지 법인이 있어야 하며, 일본어 고객 응대 및 운영 대응이 가능해야 함(판매자 입점 등록 시 심사 평가에 영향)
3)「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2021.0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
야후! 쇼핑의 지식재산권은 상위 사이트인 야후재팬이 관리하며,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보호 범위에 관한 사항들은 일본 국내법을 따름
□ 야후재팬은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은 일본 국내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한함
-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신청 자격은 일본 국내외를 구분하지 않으며, 개인 또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
- 야후재팬은 신청서 작성 또는 문의 시 일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보호 프로그램은 야후재팬에 ‘사전 이용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프로그램A, B)로 나뉨. 각 프로그램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절차, 조치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프로그램A’는 사전 이용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 보호 대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유성자권, 저작권, 기타 중 선택 가능
- ‘프로그램B’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며, 사진 이용자 등록을 통해 야후재팬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쇼핑몰(야후쇼핑, 야후옥션 등)의 판매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임. 등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품종보호권 등이며 심사를 거쳐 등록 업체로 선정되면 추후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피해 사실 입증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야후재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
- 프로그램A 및 프로그램B 관련 자주 하는 Q&A 보기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question.html
□ 야후재팬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신청하기
- 개인 판매자라면 프로그램 A 신청이 권장됨
1) 사전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 A’ 이용 가능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가능
- 침해 사실이 발견 시 IP 친해 신고 프로그램 A 온라인 양식을 작성
- 야후! 쇼핑 판매자라면 해당 IP로 로그인, 판매자가 아니라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침해된 제품 페이지의 URL 또는 제품 ID 첨부가 필수이며, 3,000자까지 입력 가능
- 권리 침해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텍스트로 입력해야 함
-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소요
- 다음 링크에서 프로그램 A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program_a.html
- 다음 링크에서 프로그램 A 신청서 작성하기 :
https://form-business.yahoo.co.jp/claris/enqueteForm?inquiry_type=ipprotection_program_a
① 권리자 정보 입력 : 성명, 사업자명, 사업자 주소, 메일주소 등 입력
② 침해 유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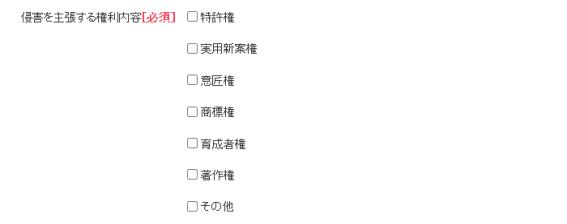
③ 침해 사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 입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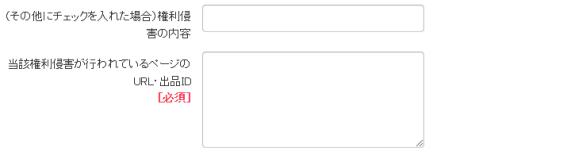
2) 사전 이용자 등록을 한 경우 : ‘프로그램 B’ 이용 가능
- 권리를 침해하는 판매 상품을 삭제 조치만 가능
- 보호 대상은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품종보호권 중 일본 국내 법원의 판례 등에서 법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침해 양태에 한정됨
- 프로그램 B 설명 페이지에서 신청서(PDF 형식)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전송
- 결과가 나오기까지 2~3개월 소요
- 다음 링크에서 프로그램 B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program_b.html
큐텐은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에 진출한 온라인 쇼핑몰이며,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해 G마켓 창업자와 eBay가 공동 벤처 형식으로 시작한 기업임
- 현재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 6개 지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함. 싱가포르 1위, 일본 4위를 차지함
- 2022년 9월 티몬을 인수하고, 2023년 인터파크 쇼핑부문을 분할하여 인수했으며, 이어 위메프를 인수함
- 일본에서는 2009년 eBay가 현지 법인‘이베이 재팬(주)’을 설립하고 2018년 일본 국내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큐텐을 설립함
- 한국어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에서 B2C 해외 직구를 할 경우 큐텐에서의 구입량이 많음. 큐텐을 비롯한 계열사는 2022년 기준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1위(7.72%)4)를 차지함
CNC뉴스 보도자료(2023.07.16.)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8438
일본 큐텐은 자체적으로 고객센터 내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일본 큐텐이 바라보는 지식재산권 개념 4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Trademark) : ‘상표’란 개인, 기업 혹은 다른 법적 실체가 소비자들에게 제품 혹은 서비스가 고유의 공급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표시하고 타인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표시를 뜻 합함. 브랜드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제목에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적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상표권 침해뿐 아니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함
- 산업디자인권 : 산업디자인권은 사물의 시각적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디자인이란 산업 공정에 의해 형성된 모양, 배열, 패턴 혹은 장식을 의미함.
- 특허(Patent) : 특허는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 보호를 획득한 나라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ㆍ복사하거나 발명하는 다른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발명의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부여한 독점적인 권리의 집합임
-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이 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복제, 분배, 재생산 등을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임. 큐텐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모방 금지 : 큐텐의 브랜드 제품을 모방하는 상품의 판매가 불가하며, 큐텐의 판매자가 상품의 진위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조품에 관해 엄격한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움. 또한 판매자가 가품임을 인지ㆍ인정하더라도 모조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적행위 금지 : 큐텐은 불법 재생산 또는 모조품 등의 영업활동을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함. 예를 들어 해적판 CD 혹은 DVD를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ㆍ산업디자인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임
큐텐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산업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중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큐텐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www.qoo10.com/gmkt.inc/CS/NHelpSecurityList.aspx?kind=02
큐텐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신고제도를 통해 IP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음
- 큐텐의 IP침해 신고 제도는 고객센터에서 관리하는 광범위한 신고제도 중 하나임
- 사이트 회원일 경우 구매 이력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으나, 비회원일 경우 구매 이력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음
큐텐에서 IP 침해 신고하기
① 큐텐 고객센터 → 신고센터 → 신고하기 접속
- 다음 링크를 통해 IP 침해 신고서 양식 작성 하기 :
https://www.qoo10.com/gmkt.inc/CS/NHelpReport.aspx?kind=02¬login=Y
② 신고자 정보 입력 :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연락처는 한국(+82) 국가코드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음
③ 침해 유형 선택 : 카테고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센터’를 선택하고 4가지(저작권 침해,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이미지 무단 사용) 중 선택할 수 있음. 다수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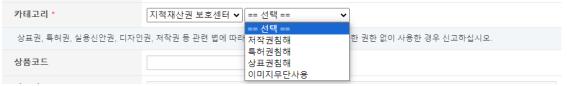
④ 신고 대상 상품 정보 입력 : 상품코드, 상품명을 입력
⑤ IP 침해 사실 입력 및 침해 입증 자료 첨부 : IP 침해와 관련된 모든 사실 정황과 문의 사항을 텍스트로 입력하고, 입증 자료를 이미지 파일(pdf, jpg)로 첨부해야 함. 파일은 3개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며 6개월간 보관됨

큐브랜드 세이프 프로그램(Qbrand Safe Program)
- 큐브랜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기업 셀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구매자가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임
- 기업 셀러가 사전에 회원사로 등록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더 간편하고 입증이 용이함
- 다음 링크에서 QbrandSafe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www.qoo10.com/gmkt.inc/Qsafe/QsafeIntro.aspx
큐브랜드 세이프 프로그램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만약, 타 셀러가 Q brand Safe 프로그램에 가입된 회원사의 제품의 모조품을 판매할 경우, 회원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큐텐에 권리침해 판매자 또는 상품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큐텐은 모조품 판매자에게 판매중단을 통보하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
- 통보를 받은 모조품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다음 링크에서 회원사의 권리침해 판매자/상품 신고하기 :
https://www.quube.net/gmkt.inc/Qsafe/QsafeItemReport.aspx

QbrandSafe 회원사 가입하기
- 사업자등록증, 지재권등록증 증빙자료를 업로드하여 QbrandSafe에 가입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큐텐 큐 세이프 프로그램의 회원사 등록 신청하기 :
https://www.quube.net/gmkt.inc/Qsafe/QsafeRegisterMember.aspx
- 다음 링크에서 큐 세이프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사 목록 보기 :
https://www.qoo10.com/gmkt.inc/Qsafe/QsafeMemberRegHist.aspx
침해 물품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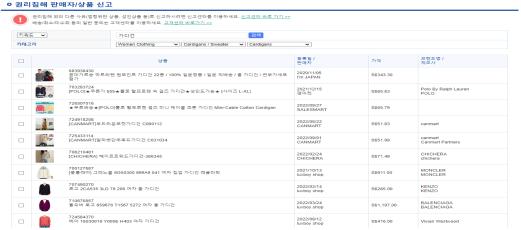
검색창에 제품 키워드 입력 또는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관련 상품의 리스트가 위와 같이 보임
※ 상기 검색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지재권 침해 상품과 관련이 없음
신고대상(판매자/상품)을 선택한 뒤, 권리침해 내용에 따라 신고 사유를 선택함
신고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저작권 침해
- 특허권 침해
- 상표권 침해
- 이미지 무단 사용
- 모조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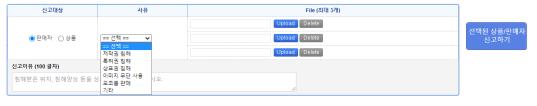
File에 침해 판매자 혹은 상품의 이미지를 첨부하고, 신고이유에 침해 판매자 혹은 상품의 URL 및 침해 양상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하면 됨
- 이후 ‘나의 신고내역’ 탭에서 신고 현황과 큐텐 측의 피드백을 열람할 수 있음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
|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
|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
|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
|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
|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 하는가?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
|
| 7 |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 |
| 8 |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 |
|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
|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센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
| 11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특허 |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일본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
|
| 2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
||
| 상표 | 1 |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검색사이트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
|
| 2 | 상표는 ‘선의의 사용의도(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는 상표인가? | ||
| 3 | 1개의 상표출원당 1개의 류만을 지정하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영업 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
| 2 |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 비밀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
|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 |
|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 |
|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 |
|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
|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 |
|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 |
|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 |
| 2 | (기술제공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
| 3 |
(기술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함 |
|
| 4 |
(기술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
| 5 | (개량기술) 기술공급자의 개량기술과 기술도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방법을 정하였는가? | |
|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7 |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국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
| 2 |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
| 3 |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
| 4 |
· 해외 전시회 참가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
| 5 |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IP-DESK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IP-DESK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바로가기 : https://www.kotra.or.kr/kp/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DD0201) |
|
| 6 |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
|
| 7 |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
| 8 |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형태 및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ex.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한 국제박람회’로 제한되어 있음)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
| 2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3 |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
|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 |
|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
| 6 | 신고시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 |
|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
|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
| 3 |
특허 침해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
| 4 |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
|
|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
|
|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7 |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 [표 37]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
| 기관명 | 기능 |
| 수상관저 지적재산전략본부 | |
| 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
| 내각부 모방품・해적판대책관계성청 연락회의 | 모방품・해적판대책 |
| 경제산업성(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종합창구)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 경제산업성(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 재무성 세관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단속) | 국경단속 |
| 특허청(모방품대책) | 모방품대책 |
| 문화청(저작권) | 저작권 |
| 농림수산성(품종등록) | 품종등록, 종묘법 |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 [표 38] 식재산권 관련 기관(민간) | ||
|---|---|---|
| 단체명 | 대상 지역 | 주요 업무 |
| 국제지적재산보호포럼(IPPF) | 세계 | 모방품・해적판대책 |
|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 아시아 | 해외해적판대책 |
|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 | 중국 |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정보, 세미나 |
| 일본상공회의소 | 일본 | |
| 일본상표협회(JP-TA) | 일본 | |
| 일본상품화권협회 | 일본 | 상품화권정보 |
| 일본지적재산협회(JIPA) | 일본 | 특허・침해대책정보 |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 일본 | 분쟁처리 |
| 일본변리사회(JPAA) | 일본 | 특허정보 |
| 일본변호사연합회 | 일본 | |
| 일본유통자주관리협회 | 일본 | 병행수입브랜드품・부정상품대책 |
|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 | 일본・아시아 | 침해대책 |
| 변호사지재네트 | 일본 | |
| (재)지적재산정보센터(CIPIC) | 세계 | 국경조치 |
| (재)지적재산연구소(IIP) | 세계 | |
| (재)일본특허정보기구(Japio) | 일본 | 특허정보 |
| (재)교류협회(IAJ) 도쿄본부 | 대만 | |
| (재)생활용품진흥센터(GMC) | 일본 | |
| (재)일중경제협회 | 중국 | 중국주요법일람 |
| (재)일본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AIPPI・JAPAN) | 일본 | 일본어 |
| (사)국제상 사법연구소 | 세계 | |
| (사)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 세계 | |
| (사)사적녹음보상금관리협회(SARAH) | 일본 | 저작권 Q&A |
| (사)저작권정보센터(CRIC) | 세계 | 저작권정보 |
| (사)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 세계 | |
|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 일본 | 음악저작권 |
| (사)일본디자인보호협회 | 일본 | |
| (사)발명협회(JIII) | 일본 | 발명, 산업재산권제도 |
|
• 크리에이터로부터 생성 인공지능(이하 AI)에 의한 권리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日 정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2023년 6월, AI와 저작권에 대해 정리해야 할 논점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본 기사에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고 있는 법적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 대해 지견이 높고, 日 문화청 저작권과 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이케무라 사토시 변호사와 같이 해설함 • (저작권 침해 여부) 생성 AI의 사용 여부를 막론하고,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작품을 인터넷에 게시 및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며, 일본이 생성 AI의 개발·학습에 관용적이라고 한들, AI에 의한 생성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은 아님. 이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하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됨① 기존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유사성’② 기존 저작물을 이용할 것을 의도했다는 ‘의거성’ • (저작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생성 AI에게 지극히 간단한 지시를 내려 출력된 결과는 사람의 사상 및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창작적 기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물로 평가할 수 없음. • 그러나 생성 AI에게 마무리를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한 후, 복잡하게 고안된 지시를 내리어 이미지대로 실제로 출력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를 '도구'로써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구상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출력된 문장이나 화상에 사람이 여러 번 손을 가하여 가공한 경우, 가공 후의 작품은 창작성이 인정됨 |
*출처 : KOTRA IP-DESK
| [표 39] 현지 대리인 선정 기준 | |
|---|---|
|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
|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
|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
-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IP STARS는 영국의 지식재산권 분석 기관으로, 2023년 일본의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 랭킹을 집계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IP RIDGE 바로가기
| [표 40] IP STARS 선정 특허 소송 분야 상위 로펌 | |||
|---|---|---|---|
| 번호 | 로펌 | 홈페이지 | |
| 1 | Nakamura & Partners | www.nakapat.gr.jp | law@nakapat.gr.jp |
| 2 | TMI Associates | www.tmi.gr.jp | pat_tm@tmi.gr.jp |
| 3 | Yuasa and Hara | www.yuasa-hara.co.jp | law@yuasa-hara.co.jp |
| 4 | Paul Hastings | www.paulhastings.com | homepage contact |
| 5 | Hiroe and Associates | www.hiroe.co.jp | info@hiroe.co.jp |
- 홈페이지 화면의 가운데 우측의 “特許・実用新案・意匠・商標を検索(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 구글 검색창에 “고급 특허검색”을 입력하는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에 제출된 특허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 가능
- 홈페이지 화면의 가운데 우측의 “特許・実用新案・意匠・商標を検索(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 및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 사이트(USPTO)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임.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임.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함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함. 즉 국제상표 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임.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함.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임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함.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 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 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