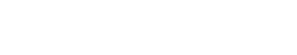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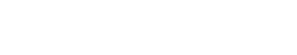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은 유럽 대륙에 위치한 27개국의 정치 경제 공동체임.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경제 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EU가 설립됨.
1952년 8월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이 석탄, 철강 부문 공동정책으로 전후 경제 복구와 독일의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하여 파리 조약에 따라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발족.
로마조약에 따라 1958년 1월 회원국 간 자본, 상품, 노동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원자력의 공동 이용을 위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발족.
1967년 7월 EEC, ECSC, EURATOM 집행부는 유럽공동체(EC)로 일원화하고 1968년 7월 EC의 관세동맹을 완성(역내 관세 철폐 및 공동 관세제 실시) 함. 1979년 6월 최초로 유럽 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을 추진하기로 함.
1994년 2월 EC를 유럽연합(EU)으로 변경.
1968년 7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완성한데 이어 공동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농산물의 수출입, 보조금, 농업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집행위로 일원화, 1993년 1월 단일 유럽 의정서에 따라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완성하여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역내 자유이동을 제약하는 기술적(표준), 물질적, 재정적 장벽을 제거.
또한, 1993년 11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통화 및 정치동맹(monetary and political union)을 추진하였고 1999년까지 경제정책의 조화 및 3단계 통화동맹을 추진하고, 공동외교, 안보정책 추진 및 사법, 내무분야의 공동정책을 수립.
니스조약은 EU 확대와 EU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을 규정함.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기존 15개 회원국이 승인한 니스조약에 따라 2002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10개 후보국의 가입이 공식 결정되었으며 2004년, 2007년에 걸쳐 회원국은 27개국으로 늘어남.
유럽연합(EU)에는 한 국가처럼 입법-사법-행정부가 다 있음. 유럽의회는 입법부, 집행위원회(EUC)는 행정부, 사법재판소는 사법부 역할을 함.
여기에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EU)가 있음. 우리나라의 감사원과 같은 옴부즈맨도 있고, 회원국 중앙은행의 협의체인 유럽연합중앙은행(ECB)도 있음.
유럽연합은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나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 산업, 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법, 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함.
즉,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띠지만 초국가적(SUPER-NATIONALITY) 기능을 강화하는 것.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통일독일 이전의)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 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 10개국이 가입,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남. 2011년 6월 30일 크로아티아와의 EU가입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7월에 크로아티아는 EU의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영국이 2020년 1월에 탈퇴함으로써 현재 회원국은 27개국임. 2023년 현재 후보국은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유고슬라비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이며, 2023년 6월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가 부여됨.
당초에는 각국 의회가 그 의원 중에서 지명한 19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979년 6월의 최초의 직접 선거 후부터는 410명이었다가 현재(2023년 기준)는 의원정수가 총 705명임. 자문적 성격의 기관이지만 EC의 발전과 더불어 권한이 강화됨.
EU 관련 문제 공개 토의, EU 예산 심의, 각종 집행기관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EU위원회에 대하여 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음. 또한 EU에 대한 신규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회의는 1주일간 부분 회기로 1년에 12회 열리는데 주로 벨기에 브뤼셀이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은 브뤼셀에서 열리며, 유럽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있음.
공동체의 결정기관으로 각료급인 가맹국 대표 각 1명으로 구성. 모든 중요정책의 결정을 맡고 있으며, 가맹국의 이익을 대표함. 일반 업무, 경제 및 재정, 농업 분야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 환경, 공업 분야는 1년에 2∼4회 모임을 가짐. 의장직은 영어식 알파벳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순번제로 맡았으나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상임의장인 유럽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어 의장을 선출하고 있음. 현재는 벨기에 출신의 샤를 미셀이 의장을 맡고 있음. 이사회 개최지는 브뤼셀과 룩셈부르크.
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 각료이사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며,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가맹국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하므로, 초국가적 성격.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며 2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 공무원과 23개 전문국을 둠.
EC의 사법기관으로 1952년에 창설. 27명의 판사와 8명의 법무관으로 구성하는데 판사의 임기는 6년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3년마다 13명 또는 14명을 바꿔서 선출함. 로마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공동체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공동체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 제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림.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음.
이사회와 위원회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아보는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사회 각계의 대표자들로 구성. 위원 임명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각료이사회가 결정.
이밖에 통화평의회, 운수평의회, 경기대책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등이 있음.
유럽 헌법 제정 조약(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은 유럽 연합(EU) 및 유럽 공동체(EC),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아래 체결, 비준된 50여 개 이상의 조약과 의정서, 부속 문서를 대신하여 이들 조약의 이념과 효력을 하나의 헌법의 형태로 집약해 유럽 연합 가맹국의 의사 결정을 통일화하려는 조약으로, 줄여서 유럽 헌법 조약이라고 부름.
1999년 유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유럽 연합 차원의 기본권 헌장 마련을 위한 헌법회의를 독일 쾰른에서 구성. 2000년 10월에는 54개 조의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의결하고 2개월 후 프랑스 니스에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채택. 2001년 12월에 벨리에 라에컴 유럽이사회에서 헌법회의 설치를 결정. 2002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6월 18일까지 총 26차례의 헌법회의가 열렸고 2004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 헌법 조약에 최종 합의.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 연합 모든 가맹국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각 나라에 따라 다름. 의회 결의만으로 비준하는 국가도 있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며, 국민투표 또한 의회가 이에 대해 다시 비준할 수 있는 나라와 구속력을 갖는 나라로 갈림. 또한 투표율에 따라 구속력이 생기는 나라도 있음. 2005년 2월의 스페인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조약이 가결되었지만, 5월의 프랑스와 6월의 네덜란드에서는 부결됨.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의 비준 연기와 취소가 촉발되었고 결국 기존의 유럽 헌법을 대체할 리스본 조약을 2007년 12월 13일에 체결함.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10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뒤 같은 해 12월 공식 서명하여 보통 리스본조약이라고 부름.
무산된 유럽헌법조약에서 유럽연합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을 제정하기로 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개정하여 새롭게 합의한 것이 이 조약임.
조약의 내용은 유럽연합의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띰. 먼저 유럽연합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 6개월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상임의장)을 신설하고,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안보정책 대표직도 신설. 또 의사결정 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이중다수결 제도로 변경됨. 이중다수결 제도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유럽연합 전체인구의 65% 이상,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제도로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17년부터 전면 실시됨.
이 조약은 27개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발효되는데, 당초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될 예정. 유럽헌법조약이 무산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27개 회원국 중 26개 회원국은 의회의 비준을 거치는 절차를 선택. 그러나 유일하게 국민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아일랜드에서 2008년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47%에 그쳐 부결되었다가 2009년 10월 3일 재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7.13%가 찬성하여 비준됨으로써 2009년 12월 1일 조약이 발효.
리스본 조약 발효로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加重多數決, Qualified Majority) 방식을 통해 상임 의장을 선출. 국제정상회의에서 EU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의 임기는 2년 반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함. 상임의장은 유럽이사회와 연간 네 차례 열리는 EU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주재하는 권한을 가짐. EU 회원국 정상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의 모임인 유럽이사회는 EU의 일반적인 정치 현안과 방침을 결정하며 입법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음.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약칭 CJEU, 또는 ECJ)는 유럽 연합(EU)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 EU 안에서는 최고 재판소에 해당. 영어 정식 명칭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룩셈부르크의 수도인 룩셈부르크 시에 위치.
1952년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사법재판소’란 이름으로 설립.
1958년 -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면서 유럽공동체사법재판소(유럽사법재판소)가 됨.
1989년 - 유럽제1심재판소(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가 병설됨.
2005년 - 특별재판소로서 유럽연합공무원재판소(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가 설치됨.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로마 조약에 의하여 27명의 판사와 11명의 법무관으로 구성됨.
판사(Judge)의 임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각 가입국은 각자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 1명을 추천해서 전가입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 보통 판사의 수는 가입국의 수로 일치하지만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는 반드시 홀수 인원수의 판사를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국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에는 추가의 판사 1명이 임명. 임기는 6년으로, 재임할 수 있음. 3년마다 13명, 또는 14명을 바꿔서 뽑음. 임명된 판사는 호선으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장관(President of the Court)을 선출. 장관의 임기는 3년에 재임은 가능함. 2023년 현재의 장관은, 2003년 10월 7일에 취임한 그리스 출신의 바실리오스 스쿠리스(Vassilios Skouris)가 맡음.
법무관(Advocates General) 은 재판소의 계속(係屬) 사건에 대해 공평하고 독립한 입장으로 의견을 말하는 자리로, 재판소를 보좌. 다만 법무관의 의견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구속하는 것은 아님.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무관은 각국의 추천을 받아 전가입국의 상호 승인을 거쳐 임명되지만 11명의 법무관중 6명은 유럽 연합의 6 대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되어 나머지의 5명은 6 대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윤번제로 임명. 또 재판소는 11명의 법무관중에서 1명을 수석 법무관(First Advocates General)으로 임명. 수석 법무관의 임기는 1년으로, 제1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에서 심사여부를 제안. 이 외에도 재판소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Registrar; 임기 6년, 재임 가능)을 임명.
EU에서는 유럽 의회나 유럽 각료 이사회, 유럽 위원회등의 기관이 법률을 제정⋅집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로마 조약이나 마스트리흐트 조약등의 EU의 기본 조약과 맞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국내에 있는 법률이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재판소에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여 적합성의 심사를 함. 그런데 EU 법에 대해서 가입국내의 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판단이 EU전체적으로 통일된 판단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이때 로마 조약에 의해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 법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져 통일적인 법의 해석을 실시.
또한 가입국이 EU조약⋅법률로 정해져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의 청구를 받고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위법 상태의 인정을 실시하거나 위법으로 여겨진 해당국이 대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액의 벌금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EU 법, 특히나 기본 조약 존중의 확보에 임함.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협의 자문관(Consultative Competence) 제도를 실행함, 무엇보다도 계쟁권(Contentious Competence)을 가짐. 계쟁권 덕분에 회원국,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이나 기업도 유럽 사법 법원에 제소가 가능함. 또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유럽 연합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릴 수 있음. 그 밖에도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은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함.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일상생활에서 유럽 건설과 유럽 통합에 기여함.
유럽에서는 일찍이 유럽 내 통일적 지재권 부여절차와 지재권의 권리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옴. 그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 유럽특허청 EPO의 설립이 됨.
EPO의 설립은 뮌헨조약 제1조약에 의해 이루어짐. 동 조약은 1973년 뮌헨에서 조인되고, 1977년 발효. 조인국은 당시 유럽공동체(EC)의 구성국 외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웨덴, 스위스, 터키, 모나코, 유고슬라비아, 리히텐슈타인, 핀란드 등을 구성국으로 하여 운영됨.
이 조약에 의하여 뮌헨에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EPO)이 설치되어 특허를 부여함. 유럽특허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조약절차에 따라서 특허부여를 희망하는 1개국 이상을 지정하여 출원함.
유럽특허청에서는 특허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출원자가 지정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내법에 의한 특허와 동등한 유럽특허를 부여. 출원인은 자기가 지정한 나라의 수효만큼의 유럽특허를 취득하게 됨.
이 제도는 각 나라별 특허제도에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통일적 특허제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것으로서, 각국의 특허제도를 그대로 둔 채 유럽특허제도를 신설한 것. 따라서 출원인은 종래와 같이 각 나라별로 특허출원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희망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유럽특허청에 출원할 수도 있음. 출원인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유럽특허와 국내특허의 요건이나 효력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가 있음.
이 유럽특허조약에 의하여 각국의 특허청은 중복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심사기관이 없는 프랑스 등에서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또 출원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의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조약의 성립으로 가맹국의 국내 특허법도 조약에 가까운 내용으로 개정되어 특허제도의 통일화에 한걸음 다가서게 됨.
이 유럽특허조약은 특허부여라고 하는 주권의 일부를 국제기관에 위촉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국제조약으로서는 매우 이례적(異例的)인 것. 또 이 조약은 유럽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비가맹국의 국민도 이 제도를 이용, 유럽에 출원할 수가 있음. 이 유럽특허와는 별도로 유럽공동체의 통일적 특허조약에 의하여 1975년에 서명된 ‘유럽공동체 특허’가 있음.
하지만, 현행 유럽특허의 경우, 가맹국 모두에 적용되는 하나의 특허권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통일된 심사과정을 통해 지정국 수만큼의 특허를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특허라고는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옴, 이에 따라 향후 유럽특허통일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불러옴.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사무소(EUIPO)는 유럽 연합의 인터넷 시장을 위한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하는 기관. 본사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위치함.
EUIPO는 상표(EUTM) 뿐 아니라, 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에 대한 심사 및 등록을 관리함. 보호 대상은 제품 또는 구성 부품의 선, 윤곽, 무늬, 소재 또는 장식 등을 포함한 외관상 특징임. 또한 보호 대상은 공업 제품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예품, 의류, 직물, 만화 캐릭터, 그래픽 심벌, 아이콘 등도 보호 대상이 됨.
비등록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투 트랙으로 디자인권을 관리 감독하고, 비등록 디자인권은 공중이 최초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당일부터 출원 절차나 방식 없이 즉시 발생함. 존속기간은 최초로 디자인을 사용한 날부터 3년임. 그리고 등록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25년까지 갱신 가능함.
EPO의 특허권과는 다르게 EUTM과 RCD에 대해서는 등록 이후의 절차(취소, 요건, 존속 기간, 효력 범위 등)에 대해 통일된 효과를 부여하기에, “통일된 지재권”으로 볼 수 있음.
유럽 의회는 기존의 명칭인 “유럽 위조 및 불법 복제 감시 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유럽 지재권 침해 감시 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로 변경하여, 감시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함.
감시 기구의 주요 업무로는 지재권 관련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U 회원국 내 지재권 집행 기관 및 사법 당국의 집행 결과 기록 데이터베이스, 집행 관련 베스트 프랙티스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제3 국과의 지재권보호 관련 국제협력 등을 포함함.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가 2012년 12월 유럽 단일 특허(European Patent with Unitary Effect) 제도의 도입에 관한 REGULATION (EU) No 1257/2012(“UPR”)을 승인하고, 또한 EU 회원국 25개국들이 2013년 2월 이러한 유럽 단일 특허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유럽 특허의 유·무효, 침해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서명.
유럽 단일 특허 제도의 발효 및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데, 필수 비준국 중 하나인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시행 날짜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었음. 이에 통합특허법원 측은 독일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독일이 2022년 12월 중에 관련 규정을 비준할 것을 전제로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공표하였으나, 2022년 12월 초에 그 시행 시기를 다시 2개월 연장함.
UPCA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13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이 협정에는 유럽에서 특허가 가장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음. 또한, 2013년 당시에는 서명국에 영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영국이 브랙시트로 인해 빠지고, 폴란드가 추가되어 총 25개국이 가입국이 확정됨.
독일은 2023년 2월 17일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이로써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 발효 조건이 갖춰짐. 최종적으로 2023년 6월 1일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 시행 시기가 확정됨.
단일 특허는 모든 참가국에 걸쳐 “단일 특허권에 기초한 효력”을 가짐. 이는 EUTM이나 RCD와 같이 분할될 수 없는 하나의 특허권임.
단일 특허 제도는 크게 단일 특허 보호(Unitary Patent Protection)와 통합특허법원(UPC : Unified Patent Court)의 두 축으로 구성될 수 있음.
단일 특허 제도는 기존의 통합 특허권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하는 제도임. 즉, 유럽 단일 특허는 종래의 일반 유럽 특허와 구별되어 별개의 출원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럽 특허와 동일하게 출원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됨.
출원인은 EPO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나라별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EPO를 통해 출원인은 구성국 중 자기가 희망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이는 출원에 필요한 비용, 시장 상황, 요건 및 효력 등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27개의 EU 국가 중 24개국이 단일 특허 제도에 참여하기로 동의함. 2023년 2월 기준 17개국의 비준이 완료되었음.
(단일 특허 가입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단일 특허 가입 예정 국가)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단일 특허 가입 거부 국가)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단일 특허 가입 불가 국가)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 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튀르키예,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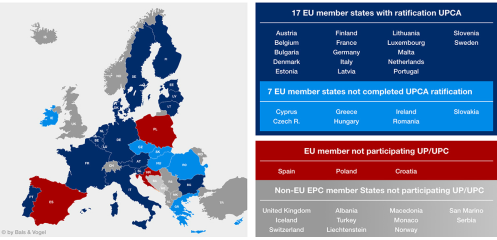
EPO에 의해 유럽 특허가 등록되고 나면, 단일 특허의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단일 특허에 대한 요청은 EPO에 명시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개별국 지정을 통한 기존의 유럽 특허 획득이 여전히 가능함. 다만, 단일 특허 요청이 제출된 경우, 개별 국가의 지정은 단일 특허 가입 국가가 아닌 국가만 지정할 수 있음. 즉, 단일 출원 절차에 기초해, 가입국에 대해서는 단일 특허로 특허권을 향유하고, 비가입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유럽 특허권 제도에 기초한 특허권 향유가 가능함.
단일 특허 신청에 따른 별도 관납료는 발생하지 않음. 즉, 출원, 심사 및 출원 연차료는 동일함. 다만, 갱신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단일 특허에 대한 갱신료는 체약국 개별 국가의 평균적 갱신료에 비해 약 4배 정도 비쌈. 따라서, 4개국 이상 국가에 대해 지정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단일 특허 활용의 실익이 있음.
최소 6년(최대 12년)의 과도기 동안 전체 특허 명세서의 번역이 요구됨. 명세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EU 국가의 공식 언어 적어도 하나에 대한 번역이 필요함.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로 제출된 명세서는 영어 번역문이 요구됨. 번역문은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과도기 이후에는 기계 변역이 사용될 예정. 단일 특허에 대한 출원 및 심사 요청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외의 언어로 제출된 경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 기관은 500유로의 보상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효과 부여의 조기 신청 및 특허허여 결정 연기신청 가능.
유럽 단일 특허 제도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EPO는 출원인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유럽 단일 특허 제도의 시행에 앞서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 특허에 대한 단일효과 부여 신청을 허용함.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미리 단일 효과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3년 6월 1일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단일 특허로서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됨.
유럽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유럽 특허 허여 결정이 이루어져 버리면 단일 효과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음. 이는, 단일 특허 신청이 단일 특허의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해야 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EPO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럽 특허 허여 결정을 유럽 단일 특허 시행일 또는 그 직후로 연기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허용함.
과도기 기간 내에 런던 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를 적어도 하나 지정하는 경우, 번역에 대한 요건과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런던 협정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만 유효화하는 경우라면 번역 요건과 비용이 오히려 증가될 수 있음.
과도기 이후에는 기계 번역에 따라 번역 요구 사항 및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음. 4개 이상의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에 갱신료가 감소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 오히려 연차료가 늘어날 수 있음. 단일 특허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국가에 대해 추가적인 개별국 진입이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스페인 등에 대한 별도 지정이 필요함. 단일 특허에 대한 관할은 언제나 UPC의 관할에 속하므로, 특허권 권리 행사 비용에 유리함. 연차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선택적으로 특허를 포기할 수가 없음.
단일 특허 제도 도입에 따라, 유럽 특허 사건에 관해 가입국 전체에 대해 다국적 관할권을 가지는 통합 특허 법원이 설립됨.
EU 회원국들은 2013년 2월 유럽 단일 특허 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유럽 특허의 유, 무효, 침해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에 서명함.
통합특허법원은 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심법원(Court of Appeal)의 2심 제로 구성되며, 1심법원의 경우 무효사건과 침해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하는 이원적 체제를 원칙으로 함.
1심 법원은 체약국들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부서(local and regional division)와 중앙부서(Central Division)로 구성됨. 일반적으로 중앙부서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업무를, 지역부서는 침해 소송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됨.
통합특허법원은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뿐만 아니라 보전처분, 손해배상, 라이선스에 관한 소송 등 유럽특허의 제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관할함.
통합특허법원의 심리 대상에는 단일 특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럽 특허도 포함됨. 따라서,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 판결의 효력은 그 유럽 특허가 등록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미침. 즉, 일반 유럽 특허가, 단일특허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특허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효력은 당해 유럽 특허가 등록된 모든 지역에서 단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
UPCA는 위와 같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에 관하여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Opt-Out 조항이라고 함. UPCA 발효 후 7년의 유예기간(위 기간은 추후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에는 일반 유럽 특허의 침해나 무효소송을 개별 국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특허권자에 대해서는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특허에 관한 소송을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서 배제할 권리를 부여함.
하지만 특정 특허에 관한 Opt-Out 권한은 통합특허법원에 당해 특허에 관한 사건이 제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반 유럽 특허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이 실제로 배제되는지 여부는,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이 먼저 제기되는지, 아니면 Opt-Out을 먼저 하는지에 따라 결정됨.
(Sunrise period) 일반 유럽 특허에 도전하는 측에서 특허권자의 Opt-Out 권한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리 통합특허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UPCA 발효를 위한 최종 비준서가 기탁된 이후 UPCA가 실제 발효할 때까지의 3개월(sunrise period)의 기간 동안 일반 유럽 특허의 권리자가 미리 유럽통합법원에 Opt-Out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됨.
통합특허법원이 2023년 6월 1일에 개원하므로 sunrise period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됨. 즉, 2023년 3월 1일부터 일반 유럽 특허의 권리자에게는 Opt-Out을 진행할 기회가 부여됨.
Opt-Out의 철회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나, 철회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음. opt-out의 절차는 온라인 사건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별도의 관납료는 없음.
유예 기간이 지나게 되면 궁극적으로 유럽통합법원은 회원국에서 EPO가 부여한 모든 특허 (단일 특허 및 기존 일반 유럽 특허 모두)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됨. 유예 기간이 지난 후 유럽통합법원의 관할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국가 특허청에 별도의 출원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음.
| [표 1] 유럽 특허별 관할 법원 | ||
|---|---|---|
| 구분 | 관할(2030년 5월 31일까지) | (2030년 5월 31일 이후) |
| 유럽 단일 특허 | 통합특허법원(UPC) | 통합특허법원(UPC) |
| 일반 유럽 특허 |
(Opt-out 신청) 개별국 법원 (Opt-out 미신청) 개별국 법원 또는 통합특허법원(UPC) |
통합특허법원(UPC) |
| 개별국 특허 | 개별국 법원 | 개별국 법원 |
* Opt-Out에 따른 관할 변경, 날짜는 연장될 수 있음.
- 장점
유럽에서 단일 침해 소송 조치가 가능함. 예컨대, 범 유럽의 침해 금지 명령의 발행 등이 가능할 수 있음. 경험 많은 IP 판사가 유럽 전역에서 배출되어, IP 법률 시스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초기에 통합 특허 법원을 활용하는 경우, 초기 판례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초기 발생하는 판례들은 유럽의 개별국 법원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침해 실시의 단계가 개별국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완화될 수 있음.
- 단점
절차가 체계화되기 전까지 여러 판례들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EPO 이의 신청 기간 만료에도 무효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음. 절차의 분리가 가능하므로, (침해 여부와 유효성 등) 소송 비용이 증가될 위험이 있음.
우리나라의 유럽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2년에는 총 10,367건이 출원되었음. 이는 출원 건수 국가별 순위로 6위임.
표준 특허 등을 중심으로, 유럽 특허 확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럽 특허 출원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단일 특허 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주는 제도이므로, 유럽 특허를 출원해 왔거나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 국가별 진출 계획과 특허 포트폴리오, 비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개별국 특허, 일반 유럽 특허, 유럽 단일 특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출원 방법을 선정해야 함.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소송을 회원국의 국내 법원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통합특허법원에서 처리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함.
다양한 옵션이 주어지는 것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충분한 규모와 비용을 가진 기업에게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
2023년 6월 현재, 유럽 단일 특허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기업 등은 사전에 관련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초기 판결 동향, 통합특허법원 운영 추이, 경쟁사들의 대처 방안 등을 예의주시하며 특허 전략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럽에 대한 지재권출원 루트는 유럽 각개별 국가에 대한 직접 출원 루트와 유럽특허청(EPO), 또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통합 출원루트로 나누어질 수 있음.
유럽 각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대한 직접 출원과 관련한 통계는 국제지식재산기구인 WIPO에서 매년 산정하고 있으며, EPO와 EUIPO도 역시 각각의 루트를 통한 출원에 대한 통계를 매년 발간.
EPO는 매년 연감(annual report)을 발간. 이 리포트에는 EPO에 출원되거나 등록되는 특허의 정량적 분석이 담겨있음. EUIPO 역시 통계리포트를 발간. EUIPO는 월별로 업데이트를 하여 실시간 통계치를 제시함.
2022년 EPO에 출원된 특허 출원건수는 193,46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함.
에릭슨, 지멘스, 바스프와 필립스가 유럽 회사 중 EPO에 대한 상위 출원인으로 랭크됨. 또한, 상위 10 대 출원인 중에는 상기 유럽 회사가 4개, 미국회사 2개(Qualcomm, Raytheon Technologies), 한국회사 2개(삼성계열 및 LG계열), 일본회사 1개(소니), 그리고 중국회사 1개(화웨이)가 위치하며, 화웨이의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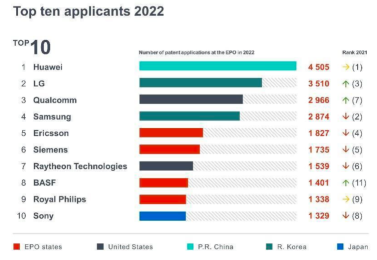
* 출처: 유럽특허청(EPO)
대한민국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36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EPO 상위 15개국 중에서 2번째 높은 성장률을 보임. 대한민국의 특허 출원 상위 5개 분야는 전기기계장치, 에너지, 디지털통신, 컴퓨터 기술, 반도체 및 시청각 기술임. 특히, 전기기계장치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 관련 분야는 전년대비 67.7% 증가해 중국(+47.4%), 일본(+19.9%), 미국(+18.1%)의 성장률을 넘어섬. 배터리 기술 분야는 2021년 14% 감소했으나, 2022년 96%로 다시 반등하였으며, 특허 점유율은 2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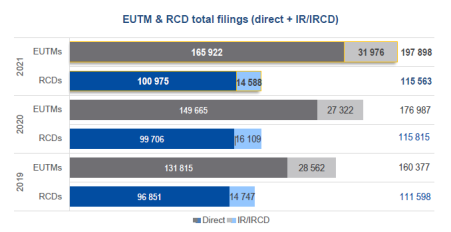
* 출처: EUIPO
2021년에 EUIPO에 출원된 EUTM은 197,898건이며 RCD는 31,976건임. EUTM은 165,992건이 WIPO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되었으며, 31,976건이 국제 등록(IR) 출원됨.
Pro patent(특허권자에게 관대한 법리를 가진 관할)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소송 관할로는 많이 사용됨. 반면 pro ingfringer(침해자에게 관대한 법리를 가진 관할) 소송비용이 높은 영국은 소송 관할로 사용되기엔 불리하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pro patent(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법리)를 가진 관할 법원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판결이 가능성이 높아 침해 소송 전 합의권고의 채택을 자주 받는 관할이 되며(torpedo전략), 프랑스, 영국이 주로 이용됨. 독일의 경우, 좀 더 객관적이라는 선입견에 의한 forum shopping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분석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판사들이 많은 관할이라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짐.
유럽에서의 지재권 분쟁은 multi national의 양상을 띠는 게 특징. EU가 하나의 경제시스템으로서의 function을 하게 됨으로써 cross border dispute의 양태가 자주 발생함.
아래는 2015~2109년 유럽 내 주요 국가별 특허소송현황 및 상표소송현황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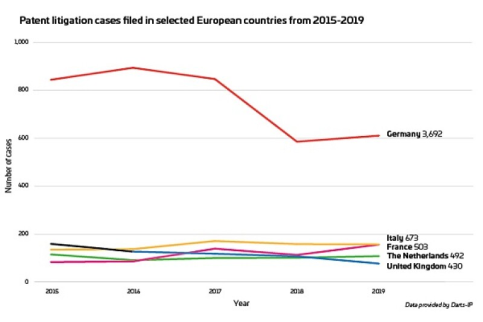
* 출처: Darts-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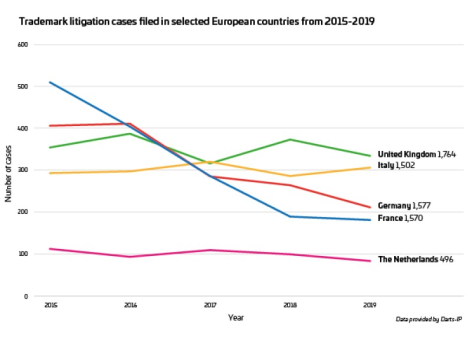
* 출처: Darts-IP
EU는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측면을 고려. 그 하나는 회원국 간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통일화이며, 그 배경에는 지식재산권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차이는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하여 단일시장의 형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 예컨대 엄격한 위조품 방지규정을 운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덜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상품을 위조품을 이유로 유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측면은 주로 산업 재산권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요 고려사항. 또 다른 측면은 EU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식재산을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범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 특히 1883년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체결된 후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베른협약),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로마협약)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협약과 조약이 체결되어 옴. 또한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협정(TRIPS협정)은 무역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96년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저작권조약(WCT)과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이 체결됨. 특히 저작권 분야에서 EU는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이들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역내 저작권 관련법의 통일화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등이 전통적으로 포함됨.
특허분야에서는 특허부여절차(심사절차 및 등록절차)까지는 유럽특허청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고, 그 후에는 각 회원국의 법에 따라 관리되는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모든 EU회원국들이 참여함. 특허 부여 절차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EU 내 통일적 행사까지도 전체 EU회원국에 걸쳐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체특허제도를 창설키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6월 1일부로 시행됨.
상표와 디자인분야에서는 회원국들의 국내 제도의 통일화가 이루어졌고, EU내에 단일의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이미 운용됨. 한편, 실용신안제도는 각 국의 제도차이가 워낙 커서 회원국 간의 국내법 통일화는 별개로 하고 단일의 실용신안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
현재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됨.
먼저, 각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제도에 따른 권리의 보호. 이 형태의 제도는 기존의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예;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국가의 특허제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럽의 특정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당해 국가의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획득한 후, 권리를 활용할 수 있음.
둘째, 유럽 특허청을 통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 방법. 유럽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만일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특허취득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 소비가 막대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 협약이라고도 칭함)’ 체결을 통해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하나의 특허출원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73년 독일 뮌헨에서 유럽 20 여개국이 모여 유럽 특허 부여 절차(심사 및 등록)의 통일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가국 중 16개국이 EPC에 합의한 이후 4년이 지난 1977년 10월 7일 EPC 협약은 발효됨.
EPC에 따라 독일 뮌헨에 조직과 체계를 갖춘 후 설치된 EPO(European Patent Office : 유럽특허청)는 1978년 6월 1일 최초의 유럽 특허 출원을 수리하게 되었고, 같은 해 독일 베를린과 기존 국제특허연구소(International Patent Institute)가 위치한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청을 두는 등 확장을 하게 됨.
1983년도에 10만 번째 출원을 수리한 EPO는 빠른 발전을 통해 8년 뒤인 1991년도에 50만 번째 출원을 수리하게 되고, 1997년도에는 100만 번째 출원을 수리하게 됨.
EPO는 90년대 초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위치했던 국제 특허 문서 센터(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를 확장하여 비엔나 지청을 두게 되었으며, European Commission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를 위하여 벨기에 브뤼셀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1973년 10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체결된 EPC의 정식 명칭은 “유럽 특허 등록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으로서, 흔히 European Patent Convention, 즉, EPC로 약칭됨.
EPC는 유럽 특허청(EPO)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며, 유럽 특허(European Patent)가 등록되는 절차(심사 및 등록)를 제공하는 다국가간 조약. 여기서 “유럽 특허(European Patent)”라는 용어는 EPC에 의해 설립된 유럽 특허청(EPO)의 심사절차를 통해 등록된 특허를 지칭하는 용어임.
하지만, 실제 “유럽 특허”는 EPC 협약국에 공통으로 권리가 성립되는 통일 특허(권리)가 아니라, 협약국 개별국의 독립 사법절차에 의해 행사되고 또 각 협약국의 절차에 의해 무효(또는 취소)가 가능한 개별국의 독립된 특허권의 집합임. 하지만 EPO는 “유럽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개별 조약국의 개별 권리를 구속함.
EPC는 EPO가 단일화되고 통일화된 절차 및 심사과정을 통해 “유럽 특허”를 부여하는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EPC는 EU 기구 및 가입국과 관련 없는 독립된 협약임. 따라서, EPC 협약국은 EU 가맹국의 구성과는 상관이 없음. 예를 들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터키, 모나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EU 가입국이 아니지만, EPC 협약국임. 반대로, 말 타는 EU가입국이나 EPC 협약국은 아님.
하기는 EPC의 협약국으로서, EPO에서 등록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독립된 특허가 등록되는 국가(2023년 현재) 임.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키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베이나, 슬로바키아, 산마리노, 터키(총 39개국)
런던 협정은 협정 회원국에서 EPO 특허 번역문 제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PO 특허를 활성화하고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협약으로서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현재 회원국은 영국, 헝가리, 모나코,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알바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스위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핀란드, 마케도니아로서 총 22개 국가임.
현행 유럽 특허 조약 EPC는 1973년 10월 5일 뮌헨에서 체결되어 1977년 10월 7일 발효한 후 2000년 11월 29일에 개정된 조약(2007년 12월 13일 시행)이 적용됨.
알바니아,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라트비아, 스위스, 모나코, 키프로스, 몬테네그로, 체코, 북마케도니아, 독일, 몰타, 덴마크,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루마니아, 영국(*), 세르비아, 그리스, 스웨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산마리노, 아이슬란드, 터키, 이탈리아(총 39개국)가 있음.
EPO와 협정을 맺고 있는 확장 국가(Extension State)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가 있으며, 효력인정 국가(Validation States)로는 모로코, 몰도바 공화국, 튀니지, 캄보디아가 있음. 그루지아는 5번째 효력인정 국가가 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으며, 협정이 2019년 10월 31일에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는 않음.
EPO 회원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유럽 변리사를 선임하여야 함.
(1) 영국은 2020년 2월 1일 8시 (한국기준)를 기준으로 EU를 탈퇴(BREXIT)하였음. 그러나, 유럽특허청(EPO)에서 담당하는 특허의 경우 브렉시트 전후로 변동이 없음. 이는 유럽특허청(EPO)은 EU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회원국 자격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임.
(2) 유럽지식재산청(EUIPO)에 등록되어 있는 EU 상표와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받음. 유럽지식재산청(EUIPO)은 EU 소속기관으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회원국 자격은 상실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영국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영국 지식재산청(UKIPO)으로 출원하여야 함.
*출처 : 유럽특허조약(EPC) epo.org/en/legal/epc
EPO 절차를 위해서는, EPO 공용언어인 영어, 독일어 또는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1) 출원서(Request) (Form 1001) : 대리인이 서명 가능
(2) 명세서(Specification)
(3) 클레임(Claims)
(4) 요약(Abstract)
(5) 필요한 도면(Drawings)
(6) 위임장(Power of Attorney)
(7) 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
(8)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문(Translation of Priority Document) 심사관으로부터 제출 요청한 경우에만 제출함.
- 절차 언어는 EPO 공용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하지만, 공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명세서로도 출원할 수 있음(EPC 14).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기 어느 하나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이 기간 내에 EPO 공용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번역문 제출명령이 나오며, 번역문 제출명령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PO 공용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취하로 간주함. 따라서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최장 4개월간 번역문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셈. 그러나 이 규정은 PCT절차를 통하여 EPO출원을 한 경우엔 적용되지 아니함.
- 긴급하게 출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음. “최소한의 서류”라 함은 출원인의 명칭, 명세서, 기본 우선권 주장 정보를 말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이 경우에는 EPO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은 PCT절차를 통한 EPO 출원을 한 경우엔 적용되지 아니함.
- 파리 조약의 동맹국이 아니라도 WTO 회원국에 출원된 출원인 경우, EPO의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이 될 수 있음. (EPC 87 – 89)
- 우선권 주장은 최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장할 수 있음. (EPC 87 – 89)
- 출원 수수료 및 심사료 등의 수수료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EPO로부터 수수료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증된 추가요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출원 시에 모든 지정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EPC 79), 출원 시 지정국을 지정할 필요가 없음. 지정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까지 개별적으로 지정국 지정을 취하할 수 있음.
- 서면 형식에 의한 출원 및 전자 출원 모두 이용 가능함.
EPO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없으며, EPO에서 개발한 MulitPay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EPO에 계좌를 만들면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음.
유럽 특허 출원은 뮌헨 특허청, 헤이그 지청, 비엔나 지부 및 베를린 지부에서 접수하며, EPC 체결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되어 접수. PCT 루트를 통해 유럽 개별국가로의 출원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EPO를 지정하여야만 국내출원으로 지정되는 국가로는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총 12개국)가 있음.
① 방식 심사는 출원인 표기, 명세서 및 청구범위 포함 여부 등의 기본적인 서지사항의 내용을 심사하여, 결함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 서류의 제출일이 출원일로 인정된다. 이후 출원 수수료 및 심사 수수료가 소정 기간 내에 납부되었는지 여부의 심사를 함.
② 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기타 요구 사항, 요약, 도면 등에 관한 방식 심사를 거치게 됨. 이 방식 심사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완 통지서가 전달. 이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출원은 거절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③ 신규성(Novelty)
출원 공개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후출원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후출원의 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 다음 경우의 사실이 발생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출원인의 뜻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발명이 공표된 경우
- 국제 박람회에 발명을 출품함으로써 발명이 공지된 경우
이 경우에는 출원 시에 그 취지의 신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출원인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명이 공표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음.
④ 부등록 사유
다음의 발명은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도, 등록받을 수 없음.
- 과학적인 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과 발견
- 단순한 정보 제공
- 정신적 활동에 대한 계획과 방법, 유희적인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미적 창조물
유럽의 대부분의 법원 및 특허청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 과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을 적용함. 유럽특허청(EPO)의 진보성 판단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고려하고 해당 선행기술에 비해 진보된 성과에 대해 판단함. 특허권자에 의해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당업자가 청구된 발명과 동일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자명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 혹은 당업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했을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한지의 여부를 판단함.
① 영국의 진보성 해석
영국 법원은 1985년도의 “Windsurfing International Inc. v Tabur Marine(Great Britain) Ltd”에서 최초로 확립된 자명성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한 바 있음. 본 케이스에서 확립된 단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채택.
- 추상적 당업자를 정함.
- 해당 당업자의 관련된 기술 수준을 정함.
- 판단 대상 특허청구범위의 발명 사상을 파악함.
- 기술 수준을 사항과 특허청구범위의 발명 사상의 기술적 차이를 파악함.
- 특허청구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단할 때, 상기 기술적 차이가 당업자에게 자명하였을 발전을 구성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발명 사상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함.
발명이 자명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당해 기술분야에 숙련된, 하지만 발명 능력이 없는 가상의 기술자에게 특허권자의 발명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자명이라는 단어는 기술적 성과가 “기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자명한지 여부에 대한 것. 따라서, 가상의 기술자는 상업적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함.
전문가 증언은 영국 특허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학자를 이용. 이들 감정인들은 법원에서 발명자가 수행한 고난도의 발명이 실제 당업자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당업자의 평균적 지식수준에 대하여 과장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나 유럽특허청에서 보다 영국의 특허소송 절차에 있어서 당업자의 평균 지식수준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짐. 영국에서의 소송 당사자들은 자명성 공격을 단지 몇 개의 선행기술과 당업자의 평균 지식수준에 근거하여 수행. 반면, 문헌적 증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및 유럽 특허청)에서는 자명성 공격을 더 많은 선행기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② 네덜란드의 진보성 해석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따르는 경향이 큼. 이는 네덜란드 법원이 유럽 특허청에서 적용되는 자명성 판단을 보통 따른다는 의미이며, 동일한 선행기술이 적용될 때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함.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 특허청에서 제시되는 과제/해결 접근법을 적용함. 즉,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확정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설정한 후, 특허청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과 기술적 과제로부터 당업자에 의해 자명했을 것인지를 판단함. 네덜란드의 판사는 이러한 판단에 있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 이상의 기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함.
네덜란드 소송에 있어서, 네덜란드 법원이 유럽특허청의 자명성 판단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은 흔하며, 유럽 특허청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는 공식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특허청의 판단이나 사례에 따름.
모든 유럽 법원과 함께, 네덜란드 법원은 특허의 유무효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허의 무효에 관한 유럽특허청의 결정을 단순히 인용할 수는 없음. 하지만, 특허의 무효에 관한 유럽 특허청의 결정, 특히 이의신청 절차에 따른 결정은 네덜란드 법원이 자명성을 판단하는 경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됨.
③ 프랑스의 진보성 해석
프랑스 법원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
- 발명은 특허가 출원된 시점에서 해당 발명과 관련한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진보 또는 개량, 또는 다른 공지 유사 기술과의 자명한 조합에 비해 한 단계 더 있어서, 진보성이 있어야 함.
따라서, 예를 들어, 발명이 각자 다른 선행 기술에 기재된 수단의 병렬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프랑스 법원은 그러한 선행 기술들을 조합하는 것이 자명하지 않았다면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프랑스 법원은 발명자가 동일한 발명의 요지를 다루는, 입수가능한 모든 특허 및 공지문헌을 알고 있다고 간주함.
그러나, 발명이 시행하는데 자명하다 하여도,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경우 또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 예상할 수 없었거나 그 방법이 알려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지 기술의 적용 이상에 관한 것인 경우, 자명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 또한, 프랑스 법원에서는, 선행 기술이 당업자에게 상반된 결과를 교시하고 있다면 발명은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프랑스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은 기술적 난점을 해결했거나, 발명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었거나, 상업적인 성공이 있다거나, 진보적인 기술을 사용하거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거나 하는 여러 판단 요소로부터 결정될 수 있음.
④ 독일의 진보성 해석
독일의 경우, 특허 무효성 이슈는 별도의 법원, 즉, 연방 특허법원(BPatG56))의 별도의 무효성 판단 절차에서 다루어짐. 침해 소송에서의 피고가 연방 특허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침해를 다루는 소송의 판사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침해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고 기다림.
독일 법원은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따라는 경향이 있으며, 자명성을 판단할 때, 과제/해결 접근법을 적용함. 또한, 법원은 특허의 유무효를 따지는 유럽특허청의 당사자계 절차의 결과에 강하게 영향을 받음.
⑤ 이탈리아의 진보성 해석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 역시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과 마찬가지로 유럽특허청의 사례를 따름.
⑥ 스페인의 진보성 해석
일반적으로, 스페인 법원 역시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따름. 바르셀로나의 항소법원은 “스페인 법원이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따를 의무도 없고, 유럽 특허청의 사례가 스페인 법원의 선행 판례가 될 수도 없지만,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음.
출원일이 부여된 출원은 방식 심사와 동시에 실체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관은 인용 참증을 발견한 경우 그 자료와 함께 조사 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
이 조사 보고서는 청구 범위를 기초로 작성되며, 조사 보고서에는 실체 심사에 따라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문헌, 관련 청구범위, 신규성/진보성의 판단근거의 문헌 내 해당 부분 및 카테고리가 포함됨.
이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출원인은 자체적으로 출원을 계속할지 여부의 판단을 하게 되며,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을 보정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종래의 EPO 조사 보고서는 단지 선행 기술 문헌명 등만이 기재되었고 해당 기술 문헌에 근거한 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의 EPC 규칙 개정 12)에 따라 확장된 조사보고서(EESR : Extended Examination Search Report)가 도입되어, ① 심사관의 특허성에 관한 견해가 표시되고, ② 심사관의 견해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또는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③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EESR에 대하여 출원인이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 다음 단계의 실체심사 보고서(First Examination Report)가 통지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전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④ 만약, 심사관의 특허성에 관한 견해가 부정적인 경우, 출원인이 EESR에 대하여 대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단계인 실체 심사 보고서(First Examination Report)에서는 위 EESR의 심사관 견해와 같은 보고서가 발행. 이 EESR은 PCT 출원의 국제 조사보고에 근거한 특허성 견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
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됨.
공개공보에는 출원 시의 명세서, 청구 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포함되며, 조사 보고서가 공개 시점에 생성되어 있다면 조사 보고서도 첨부. 조사 보고서가 공개될 때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사보고는 출원 공개와 별도로 공개.
공개된 출원은 소위 임시 보호의 권리(Provisional Protection)가 주어짐. 그러나 이 임시 보호의 권리에 관해서는 각 지정국에서 권리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음.
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의 특허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① 파리 협약에 따른 EPO 출원의 경우, 조사 보고서가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출원 심사 청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 6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EPO는 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하며, 이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심사 청구를 완료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기간도과 통지 1개월 이내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기존에는 이 6개월 기간 내에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지정국 요금을 납부하여야 했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지정 국가 요금이 일률적으로 500유로로 정해였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필요가 없어짐.
② 상기 조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예를 들어,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EPO는 출원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 절차 계속 여부를 출원인에게 문의함. 이 EPO의 통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③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은 심사부에서 출원 및 출원에 관한 발명이 EP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심사가 이루어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First Examination Report),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줌. 이 기간은 4개월이며, 2개월 연장 가능하며, 출원인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원은 원칙적으로 거절됨. 또한,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출원의 출원서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가지는 출원은 지정된 국가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음(Whole Content Approach) (EPC 54(4)). 한편, 출원에 관한 발명이 EP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심사부는 유럽 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함.
① 특허사정통지는 EPO가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의미함. 심사관이 제시한 발명의 내용에 대해 출원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론(보정 등)의 기회를 주고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의를 구하는 통지.
②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발명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EPO 공용어 중 절차 언어 이외의 다른 두 언어에 의한 특허청구범위 번역문(예를 들어, 절차 언어를 영어로 했다면, 독일어 및 프랑스어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 이 수수료의 납부 및 번역문의 제출을 위한 기간은 특허사정통지(Rule 71(3))일로부터 4개월. 이 기간 내에 수수료 납부 및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이 기간은 연장이 불가.
③ 특허 결정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심사관이 제시한 발명의 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원하는 지정국에 지정국의 언어로 번역한 명세서를 지정국의 특허청(또는 특허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지정국의 등록 특허를 가지게 됨.
④ 특허 결정 통지 후 출원인이 기간 내에 소정의 수속을 한 경우, 수개월 후 특허 사정서 (Decision To Grant)가 발행되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특허번호 및 특허일이 기재됨.
출원인은 출원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및 조사 보고를 받은 후, 그리고 심사관의 실체 심사의 최초 의견서 수령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할 수 있음. 그 이외의 시기에 보정을 원하는 경우는,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함. 보정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원 시의 공개 내용을 초과하여 새로운 사항을 포함시킬 수는 없음.
분할 출원은 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 즉, 특허 사정 결정이나 특허 거절 결정 공고 전까지 할 수 있음.
① 우선권(Priority) 주장 기한이나 심판 청구(Appeal)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출원인이 응답 기한을 도과하였다 해도 EPC 121조의 계속 절차 신청을 하여 권리 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② 계속 절차의 신청은, EPO로부터 기한의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능함.
원칙적으로, PCT 출원을 통해 국내 단계 이행된 출원에 관해서, 지정 관청은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국제 출원의 처리 또는 심사를 할 수 없음(PCT 제23조, 제40조). 따라서 조기 처리의 청구는 PCT 출원을 통해 EPO 단계로 이행된 출원에 대해 조기에 국제 출원의 처리 및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EPO에서의 조기심사 청구는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라고 칭하며, 통상의 EPO 출원 및 PCT출원을 경유하여 EPO를 지정한 출원 모두에 적용. 출원인이 조사 보고서 및 최초의 심사보고(First Examination Report)를 빨리 받아보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특허 취득의 시기를 앞당기기를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 조기 심사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i) 조기 조사(Accelerated Search)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출원(최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에 검색 보고서를 받을 수 있음.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시 조기 조사 청구를 하는 경우, EPO는 최대한 빨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함.
(ii) 조기 심사(Accelerated Examination)
- 조기 심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음.
- 조기 심사 청구가 된 경우, 심사부는 출원서류의 수령일과 조기 심사청구서 접수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심사 보고서를 발행. 이 PACE에 의한 조기 심사 청구가 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EPO에서 어떠한 통지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내에 응답해야 함. 출원인이 지정 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 조기 심사 절차는 중단됨.
특허 허여 공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EPO에 특허 허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이유는 특허의 대상이 특허성이 없는 경우, 명세서가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허 허여의 대상이 출원 시의 공개 내용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됨.
이의 신청의 심리는 이의부에서 이루어지며, 이의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는 취소가 되며,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의 신청은 기각됨.
또한, 이의 신청 심리 절차 중에 특허권자가 명세서 등의 보정을 통해 이의 신청의 이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특허권자에게 새로운 특허증이 발행됨.
거절 결정 및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판부(Board of Appeal)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 청구 이유서는 거절 결정 또는 이의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심리 결과의 형태는, 거절 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 심판 청구가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의 심결을 하게 되며,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의 경우, 이의 신청의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의 심결을 하며, 심판이 종료됨.
기본적인 절차상 하자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이유에만 심판부의 결정에 대해 확대 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확대 심판부에 의한 심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절차상의 결함 및 하자에 한정되어 일반 심판절차 규정을 따르지 않음.
특허 허여 결정(Decision To Grant) 통지 후 일정 기한이 지난 후 특허증이 특허권자에게 교부.
가) 특허권자는 EPO로부터 특허 허여 후, 보정 절차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한정(limit)할 수 있으며, 특허 취소(Revocation)를 청구할 수 있음.
나) 보정의 이유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다) 특허 이의 신청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음. 하지만, 특허청구 범위의 한정을 위한 보정 절차가 계속 중에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보정 절차가 종료됨. 특허의 취소 절차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계속됨.
유럽 특허 공보에 유럽 특허를 부여하는 취지의 특허 공고가 이루어지면, 특허 공고일로부터 특허권자는 각 지정국에서 그 나라에서 부여된 국내 특허와 유사한 권리가 발생함.
그러나, 각 지정국은 유럽 특허 명세서가 자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대다수의 체약국에 해당된다), 특허권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자국의 공용어로 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번역문을 요구하는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정국에서는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지정국의 번역문의 제출에 관해서는 런던 협정(London Agreement)과의 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협정의 항목을 참조하여 설명함.
(1)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2) 특허권은 특허공고일로부터 발생.
(3) 특허 유지 연차료는 출원일로부터 3년째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 허여될 때까지 EPO에 납부. 특허허여 이후에는, 보고를 요구한 지정국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함.
PCT 출원 후 EPO를 지정하여 EPO 절차를 거치는 경우, 다음 국가에서는 해당국 국내 특허가 아닌 EPO 광역특허가 발생.(Euro-PCT route). 벨기에, 사이프러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모나코,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PCT 출원이 EPO를 지정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EPO에 번역문 제출과 함께 국내단계이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물론, 이 경우 EPO에서 불이행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원인은 불이행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함으로써 기간도과를 면할 수 있음. 이 경우 추가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
- PCT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도면의 설명, 요약서
- PCT 19 조 보정서⋅진술서
- PCT 34 조 보정서 등
① PCT 단계에서 EPO를 국제 조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EPO가 PCT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보충적 국제 조사보고(Supplementary Search Report)는 생성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조사를 위한 수수료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한편, EPO가 국제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전인 경우에는, 보충적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짐.
② 이 보충적 조사에서 출원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추가 조사를 EPO에 청구할 수 없음.
③ 이 경우 EPO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최초의 발명에 대해서만 보충적 조사보고(Supplementary Search Report)를 작성(EPC 164조 1항).
④ 따라서 단일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기타 발명에 대하여 특허 심사를 받고 싶으면, 출원을 분할할 필요가 있음. 또한 EPO가 국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EPO의 조사 범위에 따라 출원을 계속할 수도 있음.
EPO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조약의 회원국에 각각의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출원. 따라서 출원을 하기 전에 EPO 출원으로 발명의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개별국가 출원을 하여 발명의 보호를 받을지에 대하여 미리 판단하여야 함.
EPO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는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지정 국가의 모든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EPO 출원의 실체 심사에 있어, 특히 진보성 등의 기준은 각 지정국 개별 특허청의 진보성 등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있음.
또한 EPO 출원과 개별 국가 출원을 한 경우의, 출원비용, 특허유지 비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EPC 2000 개정법에 따라, WTO 회원국에 출원된 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EPO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예를 들면, 대만은 파리조약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WTO에는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만 특허 출원을 우선권으로 하여 EPO 출원을 할 수 있음.
② EPC2000 개정법은 EPO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도 일단 EPO 출원은 할 수 있게 함. 그러나, EPO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EPO 공용어 중 하나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만 함.
③ EPC2000 개정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하는 EPO 출원의 출원 시 우선권 증명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이, 우선권 수반 출원의 출원 번호, 출원일 및 출원 관청을 명기만 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됨. 하지만, 역시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우선권 증명서가 영어, 독일어 또는 불어가 아닌 경우에는 역시 2개월 이내에 이러한 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따라서, 결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 당초부터 영어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EPO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 증명서 및 이의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유리하고, 대리인 비용을 아낄 수 있음.
④ 직접 EPO 출원을 하는 경우와, PCT 출원 통해 EPO를 지정하여 PCT 국내 단계 이행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 청구 수수료 납부 기한 및 지정국 수수료 납부 기한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⑤ 조기 처리 요청(Request for Early Processing)과 조기 심사(PACE PROGRAM) 두 가지 때문에 현지 대리인에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이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조기 처리 요청(Request for Early Processing)은 PCT 통해 EPO 국내 단계 이행 출원에만 해당되는 절차이므로 유의해야 함
① EPO 출원은 출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 심사를 하지 않음. 심사 청구기한은 조사보고서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 기간 내에 심사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② EESR(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 이 조사보고서에 부정적인 견해가 표시된 경우는 최초의 거절 이유 통지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심사 청구를 함과 동시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 만약, EESR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ESR과 동일한 최소 심사 보고서가(First Examination Report)가 통지.
③ EPO 출원제도는 단지 출원에서 특허까지의 절차적 및 실체적인 심사까지만 통일한 것. EPO에서 특허허여 이후 각 지정국 특허청 및 법원에서 권리 침해 및 무효 등이 판단되는 것으로서, 출원인은 특허허여 통지를 받은 즉시 각 지정국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EPO 특허 관리를 의뢰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권리행사면에서 바람직.
① 런던 협정이 시행되었다 하여도, 특허가 자동으로 각 지정국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님. 지정된 국가가 EPO 특허의 자국어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이 번역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원인은 각 지정국의 번역문 제출 기한을 충분히 관리하여야 함.
② EPO 특허 명세서의 각 지정국 자국어 번역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번역문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도 되도록 빨리 각 지정국의 대리인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③ EPO는 특허 부여 후 이의 신청 제도를 채택함. 따라서 이의 신청 중에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 허여를 받은 경우, 변경 내용 부분의 번역문을 각 지정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점을 유의해야 함.
④ EPO 출원이 특허허여된 경우, 각 지정국 특허청에 특허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번역문 작성 및 제출, 그리고 연차료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신뢰 있는 현지 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 함.
유럽특허청(EPO)은 통상 2년마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므로 유럽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 확인이 필요함. 지난 2020년 4월 개정에서 약 2.5% 관납료를 인상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년 만인 3 2023년 월 4 관납료를 5% 인상함.
| [표 2] 유럽특허청(EPO) 출원 및 심사 관납료 | |||
|---|---|---|---|
| 항목 | 관납료 | ||
| *단위: €(EUR) | ₩(KRW) | ||
| 특허 일반/PCT 출원료(온라인) | 135 | 189,540 | |
| 2차 분할출원 가산료 | 235 | 329,940 | |
| 3차 분할출원 가산료 | 480 | 673,920 | |
| 4차 분할출원 가산료 | 715 | 1,003,860 | |
| 5차 이상 분할출원 가산료 | 955 | 1,340,820 | |
| 조사료 | 1,460 | 2,049,840 | |
| 심사 청구료 | 1,840 | 2,583,360 | |
| 지정국 수수료 | 660 | 926,640 | |
| 청구항 가산료(15항 초과 60항 미만) | 265 | 372,060 | |
| 청구항 가산료(61항 이상) | 660 | 926,640 | |
| 국제 출원에 대한 송신료 PCT요청(PCT/RO/101) 및 문자 형식의 신청서(온라인) | 0 | 0 | |
| 국제 출원에 대한 송신료(그 외) | 145 | 203,580 | |
※ 참고사항
- 환율 : 1EUR=1,404KRW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함
출원유지료와 연차료는 마감일 3개월 이전부터 납부할 수 있으므로, 예를들어 2023년 6월 30일까지 마감 기한인 출원유지료와 연차료는 2023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음.
관납료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표 3] 유럽특허청(EPO) 등록 및 연차료 | |||
|---|---|---|---|
| 항목 | 관납료 | ||
| *단위: €(EUR) | ₩(KRW) | ||
| 특허 등록료 | 1,040 | 1,460,160 | |
| 특허유지료 | 출원일로부터 3년차 | 690 | 968,760 |
| 4년차 | 845 | 1,186,380 | |
| 5년차 | 1,000 | 1,404,000 | |
| 6년차 | 1,155 | 1,621,620 | |
| 7년차 | 1,310 | 1,893,240 | |
| 8년차 | 1,465 | 2,056,860 | |
| 9년차 | 1,620 | 2,274,480 | |
| 10년차 | 1,775 | 2,492,100 | |
※ 참고사항
- 환율 : 1EUR=1,404KRW으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이후 갱신료 후불에 따른 가산금을 갱신 수수료의 50% 지불해야 함 (Rule51, 2항)
- 35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된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있음(서열 목록의 일부를 구성하는페이지는 계산하지 않음)(규칙 38, 2항). 36번째 페이지 및 각 후속 페이지에 대해 17유로 추가 지불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는 체결국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로서, 하나의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 출원했을 때 지금까지 각국이 별도의 독립적인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해 왔으나 PPH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한 나라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다른 나라가 우선 심사를 하게 됨으로써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국제특허 획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이어야 하며,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하여야 함. 또한,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함.
한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포함된 경우, 상대국 특허청에 대해 PPH를 통해 우선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반대의 경우, 즉,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포함된 경우는 설명을 생략)
가) 한국 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 및(상대국 언어) 번역문
나) 한국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 관련통지서 및 번역문
다) 상기 심사 관련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라) 한국 특허출원과 상대국 특허출원의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2023년 8월 현재 한국특허청과 PPH 제도를 실시하는 유럽 각국 특허청은 다음과 같음.
- 덴마크, 영국, 러시아, 핀란드,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유럽에서는 1987년부터 시장 독점권인 신의약품의 시험 데이터 보호 제도(선발의약품의 승인 후 6년에서 10년간 후발의약품의 신청 금지하는 것으로, 개별국가마다 보호기간이 달랐음)가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대신하여 운용되고 있음. 그러나, 1984년 미국, 1988년 일본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연구센터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연장제도 창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짐.
그러나, 특허권 자체의 존속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특허권 만료 직후부터 다른 보호를 발생시키는 방안은 EPC 63조를 개정하여 EPC 전 체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개별국가의 상황과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 그 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EPC 제63조에는 저촉하지 않고도 특허권 만료 직후부터 다른 보호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추가 보호 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제도를 1992년에 채택하여 1993년부터 시행하게 됨. 보호 기한의 상한은 미국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5년임.
SPC 제도의 근거는 Council Regulation(EEC) 1768/92이며, 식물보호 제품(patent protection product) SPC에 관한 EC No.1610/96과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 품 특허에 대하여 SPC 보호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는 EC 1901/2006이 추가되었고, EEC 1768/92가 수차례 보정되어 현재는 Council Regulation(EC) 469/2009에 의해 운영됨.
SPC는 특허 만료 이후에도 추가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매우 독특한 권리로서, 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만료가 된 이후에 해당 특허가 보호하는 제품의 독점판매권리가 새롭게 발생된다는 점이 다른 국가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와 다른 점임.
SPC의 효력은 보통 최장 5년. 하지만, 해당 SPC가 “소아과 연구 계획 프로그램 PIP: Paediatric Investigation Plan에 따라 수행된 임상 실험의 데이터로부터 제조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경우라면, SPC의 효력은 5.5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1993년 1월 2일 자로 발효된 EEC No.1768/92 제1조에서 (i) “사람 및 동물용 의약품(medicinal product)”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2월 8일 자로 발효된 EC No.1610/96 제1조에서 (ii) “식물 보호제품(plant protection product)”을 규정함.
“사람 또는 동물용 의약품(medicinal product)”은, 인간 또는 동물의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이의 배합물과;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의학적 진단 목적이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리 기능을 회복, 교정 또는 개질시 킬 목적으로 인간 또는 동물에게 투여되는, 물질(substance) 또는 이의 배합물을 의미함.
식물보호제품(plant protection product)”은, 제초제, 살충제, 식물성장 조절제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유해 생물로부터 식물 또는 식물 생성물을 보호하거나 유해 생물의 활성을 방해할 목적, 식물의 생존 과정에 영향을 끼칠 목적, 바람직하지 않은 식물을 제거할 목적, 식물 일부를 제거하거나 식물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장을 방지할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활성 물질(active substance) 또는 하나 이상의 활성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preparation)를 의미함.
SPC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Council Regulation(EC) 469/2009 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SPC 신청이 된 국가에서 SPC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기본특허(basic patent)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제품(product)이어야 함.
(2) 유럽연합 지침 2001/83/EC 또는 유럽연합지침 2001/82/EC에 의하여 승인(시판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3)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전에 SPC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허가가 최초의 허가이어야 함.
상기에서 “제품(product)”이란 사람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활성성분(active ingredient) 또는 이의 배합물; 또는 식물보호제품의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또는 이의 배합물을 의미함.
또한 “기본특허(basic patent)”란 소정의 제품(product), 이의 제법 또는 용도에 대한 특허로서 SPC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특허권자가 지정한 특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SPC를 신청하는 소정의 제품이 동일한 특허권자 소유의 다수의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그중에서 하나의 특허를 기본특허로 지정할 수 있음.
신청시기는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SPC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단 시장 판매 허가일이 기본 특허에 대한 특허 부여일보다 빠른 경우 기본 특허 부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SPC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본특허가 국내특허 또는 유럽특허이거나 상관없이 SPC 부여를 받고자 하는 당사국 특허청에 신청하여야 함.
①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기본특허 번호 및 발명의 명칭
③ 제품에 대한 최초 시장허가를 받은 날짜 및 허가번호(최초 시장허가가 상기 제품에 대한 EEA 내의 최초 시장허가가 아닌 경우, 나중의 시장허가를 받은 날짜 및 허가번호도 기재되어야 함)
① 허가의 사본(특히 허가번호 허가 날짜 및 허가받은 제품의 특징에 대한 요약이 기재되어야 함)
SPC 신청서는 SPC를 받고자 하는 개별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국 특허청에서는 상기 Regulatioin 및/또는 독자적 세부규정(존재하는 경우에 한함)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수행함.
SPC의 보호기간은 유럽 내 최초 시판승인(Market authorization : MA)이 허여 된 날짜일로부터 계산함. SPC의 기간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 보호기간 = “유럽 내 최초 시판승인이 허여 된 날짜” - “해당 특허권의 출원일” - 5년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해당 특허의 출원일과 유럽 내 최초 시판승인 허여일이 5년 이내인 경우엔 SPC가 인정되지 않으며, 유럽 내 최초 시판승인이 해당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 - 10년 이내에 허여 된 경우라면, SPC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서부터 시판 승인까지 걸린 기간만큼 인정이 되며, 유럽 내 최초 시판승인이 해당 특허 출원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허여 된 경우라면, SPC는 고정 5년으로 인정.
정확한 “유럽 내 최초 시판 승인일”에 대한 분쟁은 많지 않지만, 그중 하나가 Hassle AB 케이스(CJEU case C-127/00) 임. 본 케이스에서, CJEU SPC를 적용하기 위한 “유럽 내 최초 시판 승인일”은 개별국 가격 결정 및 보상 규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승인절차에 따라 승인된 날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과를 판단하는 기관으로부터의 승인날짜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유럽 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 : EMA)과 유럽위원회(EC)에서는 소위 “확정 시판승인 : centralised MA” 제도를 2005년 11월 20일부터 도입하였는 바, 이 제도가 시판 승인일자 결정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 “확정” 시판 승인과 관련하여 두 가지 날짜가 혼용되었기 때문인데, EC가 시판 승인을 결정한 날짜와 시판 승인 신청자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가 그것으로, 이 두 날짜사이에는 통상 2-4일 정도의 차이가 있음. EU 내 대다수 국가의 특허청은 EC의 시판 승인 결정일을 SPC 보호기간 산정에 사용하였으나, 실제 시판 승인의 효력은 MA 신청인에게 통지가 되기 전까지는 발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대다수 EU 국가와는 달리 벨기에는 SPC 보호기간 산정을 MA 결정통지일 기준으로 함.
SPC 의한 보호는, SPC 신청의 기본이 되는 기본 특허권의 전체 범위에 걸친 것이 아니라 “기본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 내에서” 및 “의약품으로써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특정제품(product), 및 SPC 만료일까지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상기 제품의 의약품으로써의 모든 용도”에 한정됨.
상기에서 “제품(product)”이란 사람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 또는 이의 배합물; 또는 식물 보호제품의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또는 이의 배합물 의미함.
따라서 SPC에 의한 보호에는 SPC 신청 시 기초가 되었던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의학적 용도(medical indication) 뿐만 아니라 SPC 보호기간 중에 동일한 활성성분에 대해 추가로 시장판매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학적 용도가 포함됨. 이러한 점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후의 FDA 승인을 받은 용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미국에서의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비해 보다 관대함.
또한 SPC에 의한 보호는 기본 특허권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며 동일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됨. 따라서 기본 특허권에 대해 실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SPC 기간 동안에도 동실시권에는 변함이 없음.
마찬가지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법이 SPC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 특허권에 대해 이루어진 결정 등에 대해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불복수단을 SPC에 대한 결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현행 유럽의 특허 출원은 개별국 출원에 의한 개별국 등록도 가능하지만, EPO에 출원하여 통일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됨. 하지만, EPO에서 심사를 마치고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결국 EPO 회원국으로 번역문 제출을 함으로써 개별국별 특허가 생성되며, 이는 곧 하나의 유럽 특허가 아닌 EPO 회원국별 다수의 특허의 집합으로서 존재한 것. 결국 현행 EPO 특허 시스템은 심사의 통일화에 관한 것일 뿐, 통일된 특허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현행 EPO 특허 시스템은 유럽 각국의 특허 사법 시스템이 통일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하는 바, 유럽 각국은 고유의 사법 제도에 근거하여 각국의 법원별(관할)로 각자의 특허 소송 절차 및 심리를 진행함.
이러한 개별국 관할 특허 소송 시스템은, 경제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EU 내의 다수의 회원국에서 제기되는 동일한 사안의 특허 소송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많은 제안이 있어옴.
2009년 12월 4일 개최된 EU Competitiveness Council(경쟁력위원회) 회의에서 두 가지 합의가 이루어짐. 첫째는, 통일 유럽 특허의 기본 내용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유럽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에 관한 것임.
2012년 6월 29일 European Council(유럽 이사회 또는 유럽 정상회의라고도 불린다)에서 Unified Patent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고, 2012년 내에 그동안의 제안된 규칙들을 정비하고 개별국 조약체결을 2013년 상반에 마무리하여 2015년 이내로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함.
2012년 6월 29일 합의된 주요한 내용으로는 EPO에서의 등록 후 개별국 번역문 제출 및 등록을 폐지하고 EPO자체에서 영어, 독어, 불어 3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표함으로써 EU 28개국에서 통일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개별국특허소송 시스템을 폐지하고 통일된 법원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다루며, 파리를 central court로 하여 특허소송을 집중해서 다루고 뮌헨을 기계 및 에너지분야 특허소송을 다루는 브랜치로, 런던을 바이오, 의약 등의 특허소송을 다루는 브랜치로 하기로 한 것.
통합특허제도(UPS)에 따르면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하나의 유럽 특허(EU patent)와 통일 관할을 가지는 통합 특허 법원(UPC)을 사용하는 특허 소송 제도가 형성되게 됨.
유럽 특허의 경우, EPO에서 등록된 특허는 자동적으로 조약체결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EPO에서 특허 원부를 마련하여 특허가 관리되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 특허법원 설립은 곧 EU 전역을 커버하는 하나의 단일 특허소송 관할권을 설립하자는 의미함.
독일이 2023년 2월 17일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일특허는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되었고, 동시에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운영을 시작됨.
유럽통일특허제도(Unified Patent System)의 시행으로 출원인의 특허취득에 대한 소요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 아니라, 그 절차 또한 매우 간소화하게 되는 이점이 있으며, 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개별국별로 독립적 심리를 하는 현 시스템의 상반된 결론을 방지하게 됨으로써 유럽 내 특허 소송에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고, forum shopping / torpedo로 대두되는 개별국 소송 시스템에 비해 소송 기간 및 소송 비용 역시 현저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UPC의 유럽연합 특허에 관한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은 “통합된 특허권 보호”와 “통합된 특허권 보호를 위한 번역제도”임.
현행 EPO 심사 및 등록을 거친 유럽특허는 EPO 회원국 각각의 개별 특허의 묶음(bundle)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지만, “유럽연합 특허”는 조약체결국 전체에 “하나의 통일 특허권”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됨.
이를 위해 EPO는 EPC 절차에 따라 “유럽연합 특허출원”의 조사 및 심사를 실시. 공고까지는 기존 EPO의 절차와 동일하지만, 특허 공고가 나게 되면 1개월 후 유럽 특허의 효과가 조약체결국에서 발생하며, 이의신청 없는 경우 통상의 유럽연합 특허가 됨.
현행 유럽특허의 경우, 등록 후 연차료는 개별국 특허청에 지불하게 되나 “유럽연합 특허”의 연차료는 일괄하여 EPO에 지불됨. 결국, 이 같은 등록 후 관리를 위해서 EPO는 “유럽연합 특허”의 원부(register)를 만들고 해당 “유럽연합 특허”의 양도 및 라이선스 부여를 관리하게 됨. “유럽연합 특허“의 양도, 사용권 부여 등은 조약체결국 전체에 효력을 미치게 됨.
“유럽연합 특허”와 관련한 침해 소송 및 특허 무효 심판은 새롭게 설립되는 통합 특허 법원이 관할하게 됨. 개별국가에서의 무효판단은 금지됨.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취소를 원하는 특허권자는 5년 시행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가능함.
USP는 “유럽연합 특허”의 번역문제에 대하여 고품질 자동번역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음. 물론, 현재 만족할 만한 자동 번역 시스템이 개발완료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 실시 후 12 년의 잠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유럽 특허 명세서 전문을 출원이 영어로 한 경우 EU 공식 언어(불어, 독어) 중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 출원인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통일 특허 신청 시 제출하는 방안을 두고 있음.
잠정 기간 동안에 고품질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사용 가능하게 되면 즉시 번역의무는 없어짐.
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독점”권, 즉, 등록 디자인 모방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부여함. 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소유자에게, 디자인이 형상일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구현한, 또는 디자인이 장식일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지닌, 모든 제품의 생산, 사용, 수입 및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 연합(EU)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이러한 권리는 정보를 가진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실질적으로 상이한 인상을 주지 않는 유사한 디자인까지 확장됨. 소유자는, 비록 그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모방하지 않고 디자인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유럽 연합 내에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실시하는 제삼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등록 된 유럽공동체 디자인 권리를 얻으려면, 스페인 알리 칸테에 본사를 둔 EUIPO에 정식 출원이 필요함.
(2) 보호대상
디자인은 제품(그 내부를 포함)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일 수 있으며, 제품의 선, 윤곽, 색, 형상, 질감, 소재 또는 장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 제품은 컴퓨터 아이콘, 또는 인쇄 서체와 같은 그래픽 심벌일 수도 있음.
등록을 위한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어야(novel) 하며,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모두 유효 출원일 전에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판단됨.
(3) 유예기간
상기 기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예외는, 출원일 전 12개월 내에 디자인 창작자에 의해, 또는 디자인 창작자에 의한 개시의 결과로 인해, 디자인이 이전에 개시되는 것은 신규성(Novelty) 또는 독특성의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러나,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유예 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더 짧은 기간을 인정하므로, 이러한 개시로 인해 개별 국가, 특히 유럽 연합 밖의 국가에서 디자인을 추가로 등록 받지 못할 수 있음. 상기 특례 조항이 이 기간 동안 디자인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은 가능하면 디자인이 개시되기 전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함.
(4) 보호조항
상기 요건에 대한 또 다른 예외는, 관련 사업 영역의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 유효 출원일 전에 알려질 수 없었던 이전의 개시는 무시된다는 것임. 이 특례 조항은 개시의 정도, 장소 또는 시간에 의해, 단지 모호한 개시를 배제하는 것으로 여겨짐.
(1) 신규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으려면, 이전 디자인과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은 세밀함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함.
(2) 독특성
디자인이 독특성을 가지려면, 정보가 있는 사용자(제품의 최종 소비자)에게 이전의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상이한 인상을 주어야 함.
(3) 제외되는 특징 및 디자인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디자인의 특징, 또는 그 제품이 다른 제품에 연결되거나 또는 다른 제품 내에, 주위에 또는 그에 기대어 놓여서 둘 중 어느 한 제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특징은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그러나, 모듈형 제품의 조립을 허용할 목적을 제공하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있음. 올림픽 심벌, 로열 암스(Royal arms) 및 국기와 같은 보호 기장(emblem)을 포함하는 디자인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1) 출원서 제출
출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도면 또는 사진이 필요함. 대안적으로, 견본 또는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 견본 또는 모형으로부터 도면 또는 사진을 준비할 수 있음. 제출할 수 있는 3차원 디자인에 대한 시점(view)의 수는 7가지임.
- 출원인(개인 또는 회사)의 성명, 주소 및 국적
-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설명 또는 일반 명칭(불분명한 경우) 및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출원의 전체 세부 내용.
- 등록료 및 공개 수수료, 및/또는 공개의 연기에 대한 수수료
-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청에 의해 그 후 정해진 추가 기간 내에 최초 출원서의 공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출원서와 함께 우선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보다 효율적임.
(2) 공개의 연기유럽 공동체 디자인은 일단 등록이 되면 일반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공개는 출원일 또는 주장된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음. 이러한 연기는 디자인이 공개되기 전 공개 수수료의 납부뿐만 아니라 출원 수수료 납부를 필요로 함. 그러므로, 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시점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의 종료 3개월 전임. 연기 기간 동안은, 등록이 제삼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이상, 제삼자에 대하여 등록을 주장할 수 없음.
(3) 다중 출원서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한 로카르노 디자인 분류(Locarno Design Classification)에 속하는 한, 둘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제목의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중 출원서 제출의 이점은 단일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임. 다중 출원서에 있는 각각의 디자인은 별개의 재산권이므로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설정되고 양도될 수 있음.
(1) 출원서는 형식적 이유에 대해서만 심사되며, 선행 디자인 조사는 수행되지 않음. 일단 심사가 종결되면, 디자인은 등록되고 공개(연기의 대상)가 이루어짐. 출원 시 모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이 과정은 보통 2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
(2) 견본
종래의 표현 대신 2차원 디자인 견본을 이용하여 등록 유럽 공동체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디자인이 반복 패턴일 경우, 반복하는 전체 패턴이 견본에 나타나야 함. 이러한 접근법은 디자인이 직물 또는 벽지 디자인일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됨. 견본은 26.2cm x 17cm 크기, 50g의 무게 또는 3 mm 두께를 초과할 수 없음. 각 디자인 당 5개의 견본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견본을 포함한 출원의 지연 공개
지연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표현에 대한 대안으로 견본을 사용하는 것만이 가능함. 지연 공개를 요청함으로써, 디자인은 등록될 때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음. 디자인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표준의 표현(예: 사진)이 적어도 공개일 3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출원 시 공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등록은 25년간 지속되지만, 지속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수수료 납부를 통해) 갱신되어야 함.
유럽 연합 디자인 출원은 “우선일”을 발생시키며, 유럽 연합 디자인 출원이 그 디자인에 대한 제1 출원인 경우, 유럽 연합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된 다른 국가에서의 해당 디자인 출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우선일을 주장할 수 있음.
선행 권리에 근거하여 신규성 또는 독특성 결여가 주장되면 그 권리의 소유자에 의해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 등록 후 출원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 제기가 허용됨.
(1) EUTM은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사무소(EUIPO)에 직접 출원해야 하며, EUTM의 권리자는 하나의 단일의 등록된 권리를 가지며, 유럽 연합 전체에서 집행할 수 있음.
(2) 출원은 임의의 EU 언어로 제출될 수 있으며, 모든 출원인들은 EUIPO의 5개의 작동 언어 중 하나를 제2 언어로 선택해야 함.
(3) 심사 청구 제도는 없으며, EUTM은 모든 건이 직권 심사의 대상이 됨. EUTM은 하나의 상표 출원/등록으로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제도로서 각 EU 회원국의 국내 상표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는 제도임.
따라서, 출원인은 EU 회원국 국내 상표 제도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있고, 이를 근거로 EUTM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로컬제도와 통일제도 간의 조율과 균형을 위해 EUTM은 seniority 제도 등을 둠. 절대적 거절 이유의 유무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지며, 상대적 거절 이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함.
(4) 이미 하나 이상의 EU 국가에서 국내 등록 및/또는 국제 등록의 지정을 보유하고 나서, 동일 상표에 대해 모든 유럽 연합 국가들을 포괄하는 유럽연합 상표(EUTM) 등록을 획득한 경우, 원래의 등록/지정에 대한 출원일을 EUTM 출원일 대신 기록할 수 있음. 이는 EUTM의 관련 국가에서 EUTM 출원일 보다 앞선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우선권은 등록 후에 주장될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 상표(EUTM)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러한 지위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을 위한 모든 표장에 대해 등록이 가능함. 이는 물건의 모양, 이의 포장, 색상 및 소리 등을 포함함.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
- 기술적 상표 (유럽 연합의 상당 지역에 사용을 통해 식별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 상품의 성질에 기인한 모양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된 표장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양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된 표장
-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는 형상 또는 다른 특징만으로 구성되는 표장
- 일반명칭 또는 관련 산업 또는 산업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예를 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하여)
- 공공 정책에 반하는 표시 (예를 들어, EU 국가에서 모욕적이거나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이유로) 파리 협약 제6조에 의해 보호되는 마크 (국기 및 엠블럼 등)
보호된 원산지 표시 (PDO), 보호된 지리적 표시 (GPI), 및 기타 보호되는 용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
출원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출원인의 표시
① EUTM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
출원절차를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니스협정(Nice agreement)의 국제분류를 적용하며, 하나의 출원은 여러 분류를 포함할 수 있고, 각 분류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함. 국제 분류(NICE) 제도가 사용되어 45개 분류의 상표 및 서비스가 있음.
③ 제2 언어 지정
EU 개별국의 언어로 출원이 되는 경우, EUIPO의 공용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에서 하나를 제2언어로 선택하여야 함. 출원언어가 상기 EUIPO의 공용어인 경우는 상관없음. 대게 제2언어를 영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 등을 어렵게 하기 위해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을 이용하여 EUIPO의 루트를 밟는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제1언어는 영어가 되며, 제2언어는 지정하지 아니함.
④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표시
⑤ 기타
상표 견본을 제출한 취지의 표시
국제 인식 색채 코드보기(색채 자체가 표장인 경우)
우선순위(Seniority)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EU 회원국의 국내 상표의 표시
EUTM 출원을 위해서는 전문가 선임이 선택사항이나, EUIPO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다른 조치들에 대해서는 유럽 경제 지역 (EEA)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 특허권자, 또는 이의신청인은 EEA의 상표 변리사 (또는 자격을 갖춘 법적 실무자)에 의해 대리되어야 함.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
EUTM 출원에 있어서 EUIPO는 수수료 감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수수료는 EUIPO에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단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지연수수료 납부는 지원하고 있지 아니함.
절대 거절 이유는 상표 본래 가지고 있어야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장,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 등의 등록을 막기 위한 거절 이유로서, 아래와 같음.
가) 제4조의 상표의 정의에 위배되는 표장: 즉, 시각적으로(graphically)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없는 표장이거나 자신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게 할 수 없는 표장
나) 식별력이 없는 상표
다)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지리적 표시, 생산일자, 서비스 일자,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 등 거래에 사용되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라) 현재 언어상 상용되거나 선의로 상용되는 언어 또는 상거래에서 확립된 상용어구가 된 표장이나 표시로만 구성된 표장
마) 상품의 성격, 기술 효과, 내재적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바)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
사) 속성, 품질, 원산지 등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표
아) 파리 조약에 규정된 동맹국, 동맹국 국가 간 단체의 문장, 휘장 등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표
자) 파리 조약에 규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장, 표장, 또는 문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표
차) 포도주 또는 증류주 산지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나, 당해 산지 이외의 지역을 산지로 하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상표
카) 이사회 규칙 EC 510 / 2006에 규정된 원산지 명 등을 포함한 상표로서, 당 규칙 제13 조에 규정된 같은 종류의 제품에 대한 경우
상대적 거절 이유는, 식별성 등의 상표의 본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 상표이지만 선출원 상표 또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을 거절하기 위한 규정이며, 직권 심사에서는 상대적 거절 이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며, 선행 권리의 권리자로부터 이의 신청(opposition)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가) 선행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선행 상표가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
나)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선행 상표가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한 상표로서 선행상표가 보호받는 지역에서 공중으로부터 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표(혼동가능성은 선행 상표와 관련되어 혼동될 가능성을 포함). 선행상표라 함은 해당 상표보다 등록일이 빠른 상표로서, 공동체 상표, EU 회원국의 국내 등록 상표, EU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등록 상표 등을 포함
다) 상표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을 한 상표로서, 당해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지 못한 경우
라) 단순한 지역적 중요성의 의의를 넘어 거래에 사용되는 미등록 상표 또는 기타 표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단, EU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의하여 선행 표지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및 선행하는 표지가 후발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함)
방식 심사 후 절대 거절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 절대적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 취지의 통지를 출원인에게 한다. 출원인은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응답 기간은 최대 6개월임.
EUIPO는 상술한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심사함. EUIPO는 출원과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는 이전 EUTM 및 국제등록의 EU 지정에 대해 자동 검색을 수행함. 출원인은 EUTM 출원을 제출할 때 이러한 조사 결과를 무료로 요청할 수 있음. 만일 선행 EUTM 등록/출원이 발견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에게 통보되지만, 선행 권리자가 해당 EUTM 출원에 대해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재량사항임.
추가 요금을 내고 몇몇 개별국가 특허청에서 컨플릭트 가능성이 있는 선행 상표를 검색하는 요청이 가능함. 그러나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 특허청은 검색을 수행하지 않으며, 검색 보고서는 세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가 제한됨. 만일 선행 권리가 발견되면 오직 심사 중인 출원인에게만 통지됨. 컨플릭트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표장의 동일/유사성 및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에 의한 대중의 입장에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함. 유명한 등록 상표는 보다 넓은 보호 범위를 가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디스클레이머 disclaimer : 권리불요구”를 요구할 수 있음. “권리불요구제도 또는 디스클레이머”는 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보통명칭, 기술적 명칭, 법인격 표시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출원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임.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 절대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 공고가 이루어짐.
출원 공고에 의해 출원인은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즉, 출원 공고 후 행해진 침해 행위에 대해서, 출원인은 등록 후 침해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절대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은 거절 결정이 됨. 출원 공고가 이루어지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EUTM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되며,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음.
EUTM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유럽 연합의 어떤 국가에서든 “진정한 사용” 상태이어야 함. 만약 5년의 연속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은 불사용으로 취소될 수 있음. 그러나, 하나의 유럽 연합 국가에서만 EUTM에 대해 타당한 수준의 진정한 사용이 있으면 사용을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특히 문제의 유럽 연합 가입국이 더 넓은 영토인 경우, 유럽 연합 전체에 걸쳐 상표의 보호가 보장됨.
침해 소송을 제기할 EUTM 소유자의 권리는, 특정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EUTM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로 유럽 연합의 어느 시장에서든 출시된 상품에 대해 “소진”됨.
EUTM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이유에 근거하여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EUTM은 무효로 될 수 있음. 그러나, 선행 권리의 소유자가 EUTM의 사용 및 등록을 5년 이상 묵인한 경우, 선행 권리의 소유자는 EUTM의 유효성을 공격할 수 없음.
EUTM은 단일의 등록이므로, 유럽 연합의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될 수 없음. 그러나, EUTM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양도될 수 있음. 양도가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려면 EUIPO에 양도를 등록할 필요가 있음.
EUTM는 유럽 연합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며,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음.
각 회원국 특허청은 보통 상이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발명(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자나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특허청의 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됨.
저작권은 학문, 문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작품 및 여타 보호대상(음악, 영화, 인쇄수단, 소프트웨어, 공연 또는 실연, 방송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여 학문, 예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그 차이에 따라 단일 시장으로서의 유럽지역에서의 저작권보호는 문화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EU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통일화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통일화가 용이한 분야부터 시도되기 시작.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적응한다는 관점에서 집행위원회는 1988년에 저작권과 기술 도전에 관한 녹서를 발표하였고, 1990년 12월에는 그 녹서를 구체화하는 행동계획을 채택. 행동 계획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위성방송과 케이블전송 및 대여권의 보호와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기간의 통일화에 초점을 둠.
또한 EU는 기술개발과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새로운 조약 내용을 공동체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권리의 통일화에 관한 지침을 2001년 5월에 채택. 3
집행위원회는 EU 저작권 관련 기본규정에 해당되는 지침인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통일에 관한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2001/29/EC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을 2001년 5월에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국내법에 2002년 12월까지 반영하도록 함.
동 지침은 기존의 저작권 관련 지침들의 복제권, 송신권 및 배포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보완 또는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특히, 송신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를 구분하여 저작자에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송신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중전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연이나 음반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이용제공권만을 부여함.
또한, 동 지침은 권리자의 허락 없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기술적 장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작품 구분 및 이용 조건 등과 같은 권리관리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
한편, 동 지침은 복제권, 송신권 및 배포권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조항들을 규정함. 복제권 중 네트워크상의 제삼자간 전송 또는 합법적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과정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복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또한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결정하도록 함. 교육, 연구, 장애자 등을 위한 공공목적을 위한 복제, 송신 및 배포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예외를 인정함.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이 제안됨.
제4편 제2장 제13조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에 따르면, 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하고, ② 회원국들은 제1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하고,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함.
EU에서는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지침(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통일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93/98/EEC of 29 October 1993 harmonizing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이 1993. 10월에 채택됨. 동 지침에 의하면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에는 공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 해부터 70년간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되도록 규정함.
한편, 집행위원회는 당초의 지침 내용을 일부 개정한 새로운 지침(Directive 2006/11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term of protection of copyright and certain related rights)을 2006년 12월에 채택하여 2007. 1. 25자로 발효시킨 바 있는데, 이 지침은 특히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일부 사항을 다음과 개정한 것.
즉, 음반제작권의 보호기간을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동 지침 제3조 제2항 제1문)으로 하는 한편, 위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에 음반이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되거나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법적 공개 또는 전달 시점으로부터 50년 후에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동 지침 제3조 제2항 제2문)과, 실연가, 영화, 음반의 최초 고정자 및 방송사업자 등의 관련권리는 50년간 보호되며 또한, 저작권 만료 후까지 출판 또는 전송되지 않은 작품의 저작자는 최초 공개 및 전송시점으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됨.
주로 미술 저작품과 같은 경우 작가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는 그의 작품이 대부분 낮은 가격에 판매되나, 명성을 얻게 된 후 고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이때 판매금의 일정 비율을 원 저작자(직계 상속인 포함)에게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자에 대한 재판매권 보호지침(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이 2001년 9월에 채택. 재판매권은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선택적 보호사항에 해당되는 것.
재판매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판매가가 3,0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판매가격에 대한 재판매권 부과비율은 판매가격의 4%부터 0.25%까지이며 판매가격이 높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고 총부과액이 1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재판매권의 보호기간도 예술품의 보호기간과 같이 저작자 사후 70년.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금지시키는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회원국 법규정의 통일을 위하여 1991년 5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mes)이 채택되었다.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은 문학작품과 같이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창작품인 컴퓨터프로그램을 회원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아이디어나 원칙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동 지침은 이러한 베른협약의 의무를 회원국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택된 것.
저작자가 갖는 독점 배타권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 번역, 각색, 배치 및 기타의 변경과 배포에 대한 것이며, 특히 침해 복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유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와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해 채택한 기술적 고안의 불법 제거 또는 훼손시키는 수단을 유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결함의 수정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을 위한 복제는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또는 최초 공개된 이후 당초에는 50년이었으나, 1993년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현재는 70년. 특징적인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직무상 창작된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고용주가 그 권리를 독점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회원국 간 데이터베이스보호 관련 법제의 조화를 통한 역내 데이터베이스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1996년 3월에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이 채택됨.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데이터)가 체계적, 조직적 방법에 의해 배열된 데이터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전자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접근 가능한 것으로 정의됨. 동 보호지침은 이와 같은 자료(데이터)의 선택 및 배치에 포함된 지적창작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취득, 분류 또는 표현하는데 소요된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는 것.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의 지적창작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현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 자체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는 그 표현의 복제, 번역, 각색, 배포 및 전시 등에 관한 독점배타권. 그러나 비전자적(noneelectronic) 데이터베이스의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와 교육 및 연구 개발목적을 위한 발췌는 침해가 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데이터 베이스가 완성된 다음 해부터 15년간임.
문학 및 예술적 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여권, 대출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을 통일하기 위해 1992년 11월에 지식재산분야의 대여권, 대출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EEC on rental right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이 채택.
회원국들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본의 대여 및 대출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대여권(rental right)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권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대출권(lending right)은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목적이 없이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대여 및 대출권자는 영화감독, 연기자, 음반제작자 또는 영화제작자를 포함한 저작권자.
동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실연가, 음반 및 영화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인 고정, 복제 및 배포권을 부여해야 하며, 실연가에게 자신의 실연에 대한 독점적인 방송 및 송신권을 부여해야 하고, 방송사업자에게는 자기 방송 내용의 재방송 또는 송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도록 함. 저작자 및 실연가 등에 대한 송신권 등에 대해서는 정보사회의 저작권 및 관련권리에 관한 지침에서 동 지침의 내용을 수정함.
저작자나 실연가가 음반 또는 영화 등에 대한 대여권을 이전,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여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들을 대표하는 징수 기관에게 보상에 대한 행정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U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재의 70년에서 90년으로 연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됨. 이 주장은 주로 많은 양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기업들에 의해 제기되고 형편인데, 창작자인 저자, 작곡자 등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기간연장에 따른 혜택을 일부 기대할 수 있어서 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될 경우, 방송제작을 위한 소요비용의 증가우려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
유럽에서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90년까지 연장하여야 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아직 제시된 바 없음. 미국의 저작권법이 보호기간을 9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럽도 이와 비슷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이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지는 않은 형편이어서, 향후 단기일 내에 이 주장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유럽의 국가들은 iPod, DVD player, MP3 플레이어, 복사기 등과 같은 장치 및 공 CD, 공 카세트테이프 등이 저작권이 설정되어 있는 작품(주로 음악, 도서 등)을 복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하에 이들에 대하여 특별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
이 제도는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고 특히 저작권료징수협회에게는 참고로 미국 저작권법 제302조(c)는 무명, 익명 등으로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은‘최초 공개된 해로부터 95년의 기간 동안 존속’된다고 규정함.
매우 유용한 수입원이 되고 있으나, 부과금의 결정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국가별 징수 요금의 수준도 상이하다는(국가별로는 이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등의 논란과 함께, 이 특별 부과금으로 인한 제품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반면, 저작권료 징수협회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인 이 부과금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서, 이 제도의 향후 방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
유럽연합은 ‘저작권’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2019년 3월 20일,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안'(이하 ‘저작권 지침 안’)을 가결함.
저작권 지침 안은 2019년 6월 7일 시행되고,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지침 안은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 보호 범위를 규정함(현 제15조, 초안 제11조).
저작권 지침 안의 주요 내용은,
- 언론출판물발행인(publisher of press publication), 발행인은 유럽연합 내에 발행인의 사무소, 본부, 사업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함.
- 언론출판물은 일간신문, 일반 또는 특별 주제를 다루는 주간 또는 월간 잡지,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잡지와 뉴스 웹사이트도 포함하고, 과학저널과 같은 것,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음.
- 언론출판물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함. 하지만 이러한 ‘면책 범위’는 사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개별적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물을 “매우 짧게 발췌하는 행위”로 제한함.
- 보호기간은 언론출판물 발행 후 2년까지임.
- 저작자의 수익분배청구권: 언론출판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언론출판물 발행인이 받는 경우에 이 수익을 적절하게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지침 안 15조는 여러 가지의 쟁점(실효성, 저작인접권의 차별적 적용 가능성, “매우 짧은 발췌”의 범위 설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언론의 의존성)을 가짐.
저작권 지침 안 발효 이후, 프랑스는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 신설하고, 2019년 10월 말 시행에 들어감. 독일은 2021년 5월 20일에 저작권법 개혁안(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을 통과시키고, 이 법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됨. 이탈리아는 2021년 4월 20일 저작권 지침 안을 승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초안 작성했고, 12월 12일 발효하였으며,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 기관인 AGCOM(통신 규제기관)이 뉴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식별할 것을 규정함. 더불어 협상 개시 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AGCOM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1) 저작권 지침 안은 2019년 6월 7일 시행되고, 회원국은 2년 이내에 국내법에 반영해야 함
(2) 지침 안은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출판물 보호 범위를 규정하며(현 제15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표 2] 온라인 이용과 관련한 언론 출판물의 보호범위 | |
|---|---|
| 보호범위 | |
| 언론출판물 | 1) 신문 또는 일반잡지 또는 특별잡지와 같이 단일 제호로 주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개별 아이템을 구성하거나, 2) 뉴스 또는 다른 주제로 관련된 정보를 일반 공중에서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3) 서비스제공자의 주도하에 편집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통제하에 어떤 미디어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을 포함함(이상 제2조 제4항). 즉, 일간신문, 일반 또는 특별 주제를 다루는 주간 또는 월간 잡지를 포함함. 언론출판물에는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잡지와 뉴스 웹사이트도 포함하며, 어문저작물 이외에 사진저작물과 비디오물을 포함함. 다만, 과학 또는 학문적인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의 경우, 과학저널은 포함하나 블로그와 같은 웹사이트는 포함하지 않음. |
(3) 언론출판물발행인(publisher of press publication) : 발행인은 유럽연합 내에 발행인의 사무소, 본부, 사업의 주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언론출판물을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언론출판물 발행인에게 공중이용제공권을 부여함. 다만 이러한 ‘면책 범위’는 사용자가 언론출판물을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이퍼링크, 개별적 단어의 이용 또는 언론출판물을 “매우 짧게 발췌하는 행위”로 제한함.
(4) 보호기간은 언론출판물 발행 후 2년까지임.
(5) 저작자의 수익분배청구권:언론출판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자는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이용하여 지불하는 대가를 언론출판물 발행인이 받는 경우에 이 수익을 적절하게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
저작권 지침 안 발효 이후 프랑스는 가장 먼저 국내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월 말 시행에 들어갔음. 즉, 저작권 지침 15조 이행을 위해,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2019년 7월 24일 법’을 신설했음.
구글은 EU 개정저작권지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서 기사 발췌문을 보여주는 방식을 종전의 기사 제목과 썸네일 사진 및 기사의 앞부분 몇 줄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제목과 링크만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함.
2020년 4월 9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de la concurrence)은 구글(Google)에 뉴스의 재사용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함.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프랑스 뉴스 발행인 등 언론계와 뉴스 재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협상할 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발효된 2019년 10월 24일부터 납부했어야 하는 사용료의 소급 적용할 것을 명함.
하지만 구글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에 항소함. 경쟁위원회가 정한 시일인 2020년 8월 말까지 뉴스사용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년 10월 프랑스 법원은 구글 항소를 기각하고 콘텐츠 이용료에 대해 저작권자와 협상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구글은 2021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언론 단체와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게시자 별로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 틀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결국, 2021년 2월 14일 구글은 프랑스 언론매체 연합인 APIG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등으로 3년간 7600만 달러(약 84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2021년 5월 20일 독일은 저작권법 개혁안(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을 통과시킴. 이 법은 2021년 8월 1일 시행됨.
2021년 11월 구글은 주간지 슈피겔, 디차이트,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및 베를린 타게스슈피겔을 포함한 몇몇 언론사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함.
2021년 11월 18일 구글은 크고 작은 규모의 언론출판사들과 논의가 진전된 단계라고 밝힘.
2021년 10월 독일 저작권료 징수단체 중 하나인 코린트미디어(Corint Media)는 구글과 협상에 돌입하고, 2022년 저작인접권 협상에서 뉴스사용료로 4억 2000만 유로를 요구하지만 협상은 결렬됨.
한편 코린트미디어는 2021년 12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될 2022년의 독일 언론사의 뉴스콘텐츠 사용료로 1억 9천만 유로를 요구했지만, 협상은 난항이 예상됨.
2014년 10월 28일 스페인 의회는 구글뉴스에 링크와 스니펫(snippet)을 노출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도록 하는 법 을 통과시킴. 저작권 관리 기관인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구글과의 협상에 나서며, 만약 뉴스 사용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적 재산권 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음. 이 법은 2015년 1월 1일 발효함. 하지만 이에 대응해 구글은 뉴스 서비스 중단함.
2021년 11월 2일 지적재산권법에 새로운 조항 도입함. 뉴스 저작인접권의 집단 관리 의무를 공식화하지 않으며 언론사와 저자가 콘텐츠의 출판 및 보수와 관련된 협상을 단독 또는 집단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남겨둠. 플랫폼 사업자에 선의와 투명성의 조건 하에 협상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며,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함.
2021년 11월 3일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서비스 재개할 것이라 발표함. 구글은 개별 협상 없이 언론계 전체에 저작권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이탈리아는 2021년 4월 20일 저작권 지침 안을 승인,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초안 작성했고, 이는 12월 12일 발효됨.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독립 기관인 AGCOM(통신 규제기관)이 뉴스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들을 식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협상 개시요청 후 30일 이내에 보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론사가 해당 문제를 AGCOM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뉴스사용료 제안은 위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제안서 중 어느 것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GCOM이 일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음.
플랫폼 사업자는 언론출판사 또는 AGCOM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언론출판사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AGCOM은 지난 회계 연도에 달성한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을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음.
2 김성윤, “NGT 식물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 제안서 분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23
• NGT(New genomic techniques) : 2001년 GMO 법 시행 이후 등장하였거나 개발된 생명공학기술(생물체의 유전물질을 변경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 NGT 식물 : 식물 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삽입되었을 수도 있는 육종가의 유전자풀 외부에서 유래한 유전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으로 표적 돌연변이 유도 또는 시스제네시스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얻어진 유전자 재조합 식물
- NGT1 식물 : 부속서 Ⅰ에 명시된 기준(기존 식물과의 동등성 기준)을 충족하거나, GMO 법에 적용될만한 추가 변형이 없는 조건하에서 부속서 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NGT 식물의 자손
- NGT2 식물 : NGT1 식물을 제외한 NGT 식물
•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 유지
• 광범위한 식물 종, 특히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 주도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와 혁신이 가능한 환경조성
• 카테고리 1 NGT 식물(이하 NGT1 식물) (자연적 또는 전통적인 육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식물) 및 NGT1 제품(식품·사료·가공품)은 제안된 법령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검증절차 이행 후, 이 기준 충족 시 GMO 법 (Directive 2001/18) 적용을 면제하여 일반 작물과 동등하게 취급
- NGT1 식물 정보는 종자표시, 공공 데이터베이스, 식물품종 카탈로그를 통해 모든 회원국 국민들에게 제공됨(다만 기업비밀 유지 조항 적용)
• 그 외의 모든 NGT 식물은 카테고리 2 NGT 식물(이하 NGT2 식물)로 분류되어 GMO 법 적용 대상
-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위해성심사와 승인 절차 진행
- 이력 추적, GMO 표시
- NGT2 식물은 Directive 2001/18/EC 26b 조(GMO 재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규정, 회원국의 재배결정권 배제
• NGT 식물은 유기농 생산 규정(REGULATION (EU) 2018/848)에 의하여 유기농 생산에서 금지
- 유기농 생산에서 NGT 식물 제외를 위하여 유기농 및 Non-GM 재배 농민은 NGT 제품 공개 목록, 품종 카탈로그의 종자 표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 농식품 생산에 대한 EU의 대외의존도 감소
- (농민) 농약, 비료 사용 감소로 인해 식물 품종 선택의 폭 확대, 비용이 절감 및 환경적 성과 증대
- (소비자) 안전한 제품 선택의 폭이 확대, 영양 개선, 농약 등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축소
- (중소기업을 포함한 연구자 및 식물 육종가) 법적 명확성 향상 및 육종 속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더 많은 도구 제공
- (식량 시스템) 기후 복원력, 천연자원 절약, 배출량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소, 식량 안보 강화
• NGT1 식물 검증절차에 따른 비용 감소 추계
- (육종가) 검증 1건 당 약 995만 유로~1,120만 유로(한화 약 142억 원 ~160억 원)
- (행정기관) 연 총 절감액 약 140만 유로(한화 약 20억 원)
• NGT2 식물 승인절차에 따른 비용 감소 추계
- (육종가) 승인 1건 당 10만 3천 유로 이하 (한화 1억 5천 원 이하)
- (행정기관) 연 총 절감액 70만 유로 이하(한화 10억 원 이하)
- (검증 방법 및 검증 수수료 면제) 10만 5천 유로(중소기업, 52,500유로) 절감
| 목차 | 내용 |
|---|---|
| 제1장(제1조~제4조) | GMO 법률의 대상, 범위, 특별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NGT 식물 및 그 유래 제품에 대한 검증절차(제2장) 및 승인절차(제3장)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시함 |
| 제2장(제5조~제11조) |
부속서 Ⅰ에 따른 표적 돌연변이 유도, 시스제네시스를 통해 얻어진 NGT 식물이 자연 또는 재래식 육종 기술에 의해 얻어진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 기준 규정 - NGT1 식물은 GMO 법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되며, 기존의 식물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름 - 유기농 생산에서 있어서는 계속 금지 - NGT1 식물의 환경방출 전 검증은 요청을 받은 회원국 수행, 식품 및 사료의 경우 EFSA에서 과학적 자문 제공 및 위원회결정 - 부속서 Ⅰ 기준 준수 검증 결정은 EU 전체에 유효 - NGT1 식물 종자 표시 및 공공 데이터를 구축, 카탈로그에 NGT1 식물 표시 |
| 제3장(제12조~제25조) |
NGT2 식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EU의 기존 GMO 관련 법률이 일부 조정되어 적용됨 - 규제 인센티브 조항(제4절 제22조)은 부속서 III 제1부에 열거된 형질을 포함하는 NGT2 식물에 적용되며, 부속서 III 제2부(제초제 내성)에 열거된 형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 NGT2 식물 및 제품은 EU GMO 법의 이력추적 및 라벨링 요건을 적용받음(제4절 제23조) - NGT2 식물은 EU 지침 2001/18에 따른 회원국들이 자국 내 GMO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재배결정권)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원국은 공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4절 제24조) |
| 제4장(제26조~제34조) | 위임 및 이행 규정(제26조~제28조), 가이던스(제29조),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제30조), 타 연방법 참조(제31조), 행정검토(제32조), 다른 법률 개정(제33조) |
• 유럽의회 승인 → 유럽관보게재 → 관보게재 2년 후 시행
- 유럽의회 승인을 위한 일반 입법 절차 진행
• 농민, 종자기업, 식품·사료기업 등은 해당 제안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이나, 유기농기업·반 GMO 단체 등은 반대의견 제출, 특히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이 해당 제안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함
• 제안된 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위원회 간 협상을 거쳐 표결로 승인한 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 게재 후 2년 후에 시행되므로,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EU는 그린딜 정책과 Farm to Fork 정책,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등 농식품 시스템 중 NGT 식물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기후변화, 지역분쟁(러-우크라 전쟁) 등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한 EU 회원국 국민 보호 정책 일환
• GMO에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EU에서 규제 완화 규정을 제안함으로 인하여, 국내 다수 바이오분야 업체 및 연구자들의 신규 법안 제정 또는 LMO 법의 추가 개정 요구 증대 예상됨
• 소비자·환경단체는 EU 집행위원회 제안 법안이 유럽의회 승인을 위한 일반 입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EU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개정안(22년 7월 22일 제출)이 국제 규제 조화 및 규제 합리화에 가장 부합함을 강조할 것이라 예상됨
-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산물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중에서 EU의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의 개정법안과 가장 유사함
• 검증절차 대상은 NGT1 식물이며, ①시장 출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 방출(환경방출)하는 NGT1 식물의 검증(안 제6조), ②시장에 출시할 목적인 NGT1식물의 검증(안 제7조)으로 구분
| 환경방출용 NGT1 식물 | 시장 출시용 NGT1 식물 | |
|---|---|---|
| 검증기관 | - 환경방출 되는 회원국 관할기관 - 해당 회원국이 둘 이상일 경우 그 중에 하나의 회원국의 관할기관 |
-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
| 검증요청서 내용 |
EFSA 표준 데이터형식에 따른 검증 요청서 제출 a. 요청자의 성명과 주소 b. NGT 식물의 명칭과 상세 c. 도입된 또는 변형된 특성 및 특징에 대한 설명 d. 수행된 연구의 사본 및 입증 자료 - NGT 식물(식물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삽입된 외래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 부속서 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e. 의도적 환경방출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명칭 f. 기밀 취급 정보 요청의 정당성 EFSA 표준 데이터형식에 따른 검증 요청서 제출 |
a. 요청자의 성명과 주소 b. NGT 식물의 명칭과 상세 c. 도입된 또는 변형된 특성 및 특징에 대한 설명 d. 수행된 연구의 사본 및 입증 자료 - NGT 식물(식물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삽입된 외래유전자를 포함하지 않은) - 부속서 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e. 기밀 취급 정보 요청의 정당성 |
| 요청서 반려 | - 관할기관은 요청서 정보 누락 시 30일 이내 요청 접수 불허 통보 | - EFSA는 요청서 정보 누락 시 30일 이내 요청 접수 불허 통 |
| 검증 | - 관할 기관은 요청 접수 30일 이내 해당 NGT 식물이 부속서 Ⅰ의 기준을 총족하는 지 확인하여 검증 보고서 (verification report) 작성한 후 다른 회원국 및 위원회에 제공 | - EFSA는 요청 접수 30일 이내 해당 NGT 식물이 부속서 Ⅰ의 기준을 총족하는 지 확인하여 문서 (statement) 작성한 후 회원국 및 위원회에 제공 |
|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 검증 |
- 해당 보고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 - |
| 결정채택 | - 의견이 없을 경우 : 위원회 및 회원국 검증기간 이후 7일 이내에 NGT1 식물 여부 결정 후 요청자, 다른 회원국, 위원회에 통보 - 의견이 있는 경우 :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받은 위원회는 EFSA와 45일 이내 결정 초안을 작성한 후 필요시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문 채택 |
- 위원회는 EFSA의 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작성 후 필요시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문 채택 |
| 결정공개 | - 유럽연합 공식 관보 게재 | - 유럽연합 공식 관보 게재 |
| 소요 검증기간 |
- 요청 반려 시 : 최대 30일 - 요청 접수 시 : 최대 37일 ~ 95일 |
- 요청 반려 시 - 최대 30일 - 요청 접수 시 - 최대 60일 |
• NGT 식물 중 승인절차 대상은 NGT2 식물과 NGT2 제품(식품 및 사료 포함)이며, 승인절차는 ①시판 이외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B의 절차 적용, ②식품 및 사료 이외의 제품을 시판하는 경우 지침 2001/18 파트 C의 절차 적용, ③GM 식품 및 사료의 시판에 대해 규정 (EC) No 1829/2033의 절차 적용
| EU (안) | 우리나라(안) | |
|---|---|---|
| 관련 법령 또는 개정안 | GMO 법, NGT식물법(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 개정안(국회 계류) |
| 법적 정의 상 GMO 여부 | NGT 식물은 GMO 해당 | GMO 해당 |
| 규제 적용 | NGT1식물은 GMO 규제 면제 NGT2 GMO 식물은 규제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일부 규제 면제 (위해성심사등) |
| 사전검토의 유무 | NGT1식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유전정보 확인 절차 진행 NGT2 GMO 식물은 규제 적용에 따라 승인 절차 진행 |
사전검토 절차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예정 (외래유전자 도입 및 잔존 여부 확인 등) |
| 표시 | NGT1식물 유래 종자 표시 의무 NGT2 GMO 식물 및 유래 제품 표시 |
표시 여부 및 방법 검토 필요 (현재 식품위생법상 표시 대상 GMO) |
지식재산권 제도를 식물 신품종 개발에 적용하여 신품종 개발 기술을 장려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절차결정에 의해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한 품종 보호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식물 신품종보호규정(Council Regulation EC No.2100/94 of 27 July 1994 on Community plant variety rights : CPVR)이 1994년 7월에 채택되었고, 1996년 9월에 ‘공동체 식물품종보호청(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 CPVO) 프랑스 Angers)’이 발족. CPVO는 EU 독립기구 기구이며, 유럽식물품종보호권(CPVR)을 위한 업무를 독자적인 책임 하에서 수행.
CPVR 출원은 모든 식물의 종(species) 및 속(generes)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식물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하여 출원인은 CPVO에 출원서, 특성기술서(TQ : Technical Questionnaire), 특성기술서의 기밀사항(Technical Questionnaire Confidential part), 품종명칭 출원(Proposal for a variety denomination), 통지서(Notification form) 및 수수료 납부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CPVO는 심사를 통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신규성이 있는 경우 품종권이 부여되며, 품종권은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해부터 25년간(포도, 수목의 경우 30년) 보호됨.
CPVR 출원은 EU의 회원국 및 UPOV 동맹국의 국민. EU 이외의 동맹국으로부터의 출원인은 대리인을 선정해야 함.
출원 서식은 CPVO에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데, 요청 시 사용언어 및 출원할 품종의 종을 명기해야 함. 서식은 각 국가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특성기술서와 함께 출원된 날짜에 따라 처리됨. “출원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읽고 작성하며, “해당 없음(not applicable)”인 경우라면 해당란에 표시함. 출원서의 작성은 부표 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특성기술서(TQ)는 재배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
- 주요 작물의 프로토콜은 기 작성됨. 일부 프로토콜을 아직 적용하지 못한 종⋅속의 경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작성된 UPOV 양식을 이용할 수 있음. 일부 UPOV form이 없는 작물의 경우 Office에서 제공하는 일반 TQ를 사용해야 하며, 주요 작물의 TQ는 웹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만약 Online 상에 TQ가 없는 경우 Office로 문의하기 바람.
교배품종의 육종가는 관련자료의 기밀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
출원과 동시에 명칭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CPVR의 등록이 지연되지 않도록 늦지 않게 제출되어야 함(공보에 공고 후 이의제기기간 3개월 소요)
이사회법 2100/94 및 시행 규정인 규정 1239/95에 의하여, 재배시험의 완료 등, 기타 심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 품종명칭이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됨.
국가기관을 거쳐 출원한 경우 Office에 직접 통지해야 함.
출원인은 수수료 납부에 관해 Office에 정보를 제출해야 함. CPVO에 납부되는 모든 수수료는 본 양식을 이용해야만 함.
모든 과수 및 화훼류는 특성기술서에 칼라사진 2부씩을 첨부하여 출원해야 함(필수). 사진은 재배시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출원인은 꽃, 과일 등 기타 관련부위의 접사사진 및 식물체 전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함.
CPVR 출원의 거절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 및 항소 절차가 있음.
집행위원회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EU 내에서 통일된 특허보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996년 7월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8/44/EC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을 제안함, 이 지침은 1998년 7월에 채택.
지침의 주요 내용은 동물, 식물의 변종, 동물과 식물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생물학적 방법, 각종 형성 및 발전단계에 있는 인체 및 그 요소의 단순한 발견과 인체 유전자 조작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들을 특허가 될 수 없는 발명으로 규정함.
인체에서 분리되었거나 기술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인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농장에서 농업적 목적을 위한 증식과 복제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불 없이도 특허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동 지침의 내용은 1999년 9월부터 유럽 특허청의 특허부여 기준에 반영하여 시행됨.
한편, 회원국들은 2000. 7. 30까지 동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아직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 지침은 논란이 많은 지침 중의 하나.
EU는 컴퓨터 관련 발명 또는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을 내용으로 하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 보호 지침(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의 설치 여부를 논의한 바 있음. 동 지침 안은 유럽 특허청이 영업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발명에 대해 사안별로 특허를 부여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여 유럽 차원의 통일된 특허부여제도를 설치하자는 의도로 2002년 2월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것. 동제안의 발표 이후 2005년 초까지 유럽에서는 이 지침 안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05년 7월 유럽의회 총회는 표결을 통해 이 지침 안(법안)의 채택을 최종적으로 부결시킴.
동 표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유럽 의회 의원들이 지침의 채택을 반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또한 컴퓨터 관련발명에 대하여 광범위한 특허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EU 지역의 반대 분위기 및 일부 대기업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 및 큰 수익에 대한 반 대기업 정서 등도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럽 의회 의원 중 절대다수(찬성 14, 반대 648, 불참 18)가 위 지침의 채택을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지침 안은 자동 폐기됨.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향후의 특허보호 여부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유럽 특허청 또는 각 회원국 특허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고, 따라서 각 특허청의 정책방향 또는 심사기준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결정되도록 됨. 한편, 유럽의 특허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특허청의 경우, 위의 결과를 반영하여 컴퓨터 관련 발명 또는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어, 발명의 일반적인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외에도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허락하는 한편, 순순한 영업 발명 및 알고리즘 등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정책방향을 밝힘으로써, 유럽에서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취득은 한층 어려워지게 됨.
(1)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반도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 반도체 법안(European Chips Act)을 2022년 2월 8일 발의하였으며, 2023년 4.18에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되었음을 발표함.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함.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 게재 시 확인 가능함.
(2)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임.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임.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제정을 추진해 옴.
(3)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한편, EU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함.
(4) EU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짐. 첫째,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함.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가 포함됨. 둘째, EU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다만, 해당 시설은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first–of-a-kind) 설비이어야 하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약속해야 함. 셋째,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가 도입됨. 공급망 위기단계 발령 시에는 반도체 사업자들에게 생산 역량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게 되며, 통합 생산설비 및 개방형 파운드리에게는 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음.
(5) 반도체 관련 정책
- EU 반도체 칩법(European Chips Act)
가) 개요: 집행위, EU Chips Act 발표(`21.09) 및 채택(`22.02). 칩법 작업문서는 지난 22년 5월 공개됨.
나) 목적: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 및 유럽의 기술리더십 강화
다) 내용: 칩법에는 3가지 구성요소가 존재
- Chips for Europe: 첨단 칩의 대규모 기술 역량 구축 및 혁신 지원 이니셔티브
- 새로운 프레임워크: 생산 능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공급 보안 보장
- 조정 메커니즘: 시장 발전 모니터링 및 위기 예측을 위한 회원국과 위원회 간 조정 메커니즘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협력을 위한 EU 현황 파악의 필요성 증대함. 최근 EU는 일본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22.05.)하였으며, 캐나다와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육성을 위해 여러 선진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CT 분야 강국으로 반도체, 5G/6G, AI 등 다양한 디지털 분야에서 EU의 주요 연구협력 대상 국가 중 하나임. 특히 러-우 전쟁 이후 EU에 있어 한국, 캐나다, 일본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지난 2021년 9월 EU는 한국에 디지털 파트너십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EU 디지털 10대 협력 분야가 제시됨.
| [표 3] 한-EU 디지털 10대 협력 분야 | |
|---|---|
| 한-EU 디지털 10대 협력 분야 | |
|
1. ICT 공동 연구 2. 데이터 관련법 및 시스템 3. 5G/6G 4. 숙련, 인력교류, 디지털 포용 5. 사이버 보안 6. 디지털 통상 7. AI 원칙 및 규제 8. 반도체 9. 플랫폼 협력 10. HPC 및 양자기술 |
|
유럽의 디지털 관련 전략으로는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이 있으며, 유럽의 주요 디지털 정책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디지털 10년’이 있음. Digital Decade의 목표는 ‘디지털 나침반’의 네 축을 따라 형성되며, 각 축에 따른 목표 달성 현황을 매년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를 통해 발표. Digital Decade는 데이터 인프라, 저전력 프로세스, 5G 통신, 고성능 컴퓨팅, 보안 양자 통신, 공공 행정, 블록체인, 디지털 혁신 허브, 디지털 기술 등 9개 분야에서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다국가 프로젝트를 지원.
디지털 분야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데이터 법안, 사이버 보안 법안,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법안, 반도체칩법, 인공지능 법안 등이 있음. EU데이터전략의 목표는 단일 유럽 데이터공간 형성에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GA, 2020)과 데이터 법안(Data Act, 2022)을 제시.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은 불법 및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든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며, 디지털 시장 법안(DMA)은 대형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 규제를 도입. 반도체칩법은 10년 내 EU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EU AI법안은 AI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적용.
*출처 : 유럽연합 의회, EU AI Act: first regula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23.12.19.)
☞유럽연합 AI 정책 알아보기
https://www.europarl.europa.eu/topics/en/article/20230601STO93804/eu-ai-act-first-regulation-on-artificial-intelligence
2021년 3월 집행위가 발표한 2030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으로(2022년 7월 EU 이사회 및 의회는 해당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합의에 도달), 기술, 정부, 인프라, 비즈니스 총 4개의 방향성에 중점.
| [표 4]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유럽 정책 | |
|---|---|
| 구분 | 구체적 목표 |
| Skills : a digitally skilled population and highly skilled digital professionals |
§ 2,000만 명의 ICT 전문가 육성 + 젠더 통합 § 인구 최소 80%의 기초 디지털 기술 습득 |
| Businesses : digital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
§ EU 회사 75%가 클라우드/인공지능/빅데이터 사용 § 스케일업 성장 및 금융 지원을 통한 EU 유니콘회사 2배 확대 § 중소기업 90% 최소 기초 디지털 intensity 레벨 달성 |
| Infrastructures : secure and sustainable digital infrastructures |
§ 연결성 : Gigabit for everyone, 5G everywhere § 반도체 : 글로벌 생산량에서 EU 지분 2배 확대 § 데이터-Edge&Cloud : 기후 중립적이고 안전한 엣지 노드 1만 개 § 컴퓨팅 : 양자가속기를 통한 첫 컴퓨터 |
| Government : digitalisation of public services |
§ 핵심 공공 서비스 : 100% 온라인 제공 § e-Health : 모든 시민이 의료 기록에 접근 가능 § Digital Identity : 시민의 80%가 Digital ID 사용 |
*출처 :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rope's Digital Decade
☞유럽 디지털 10년(Europe’s Digital Decade) 자세히 알아보기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s-digital-decade#tab_4
2022년 1월 집행위가 제안한 Digital Decade를 위한 기관 간 선언. 선언문에 요약된 디지털 권리와 원칙은 EU 기본권 헌장,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권리와 같은 기존 권리를 보완. 이는 시민에게는 디지털 권리에 대한 참조 프레임워크를, EU 회원국과 기업에게는 신기술을 다루는 지침을 제공
전 세계 무대에서 EU의 인간 중심의 디지털 의제 홍보 및 EU 규범· 표준과의 일치 또는 수렴 촉진하고, 디지털 공급망의 보안과 탄력성 보장 및 글로벌 설루션 제공
| [표 5] EU 디지털 시민권 및 내용 | |
|---|---|
| 디지털 권리와 원칙 | 상세 내용 |
| 사람과 인권 중심의 디지털 전환 | § 디지털 기술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디지털기업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보장해야 함. |
| 연대 및 포용성 지지 | § 디지털 기술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합해야 함. 모든 사람은 인터넷, 디지털기술,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 온라인 선택의 자유 보장 | § 사람들은 공정한 온라인 환경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며,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안전해야 함. 인공지능과 같이 새롭고 진화하는 기술과 상호작용할 때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
| 디지털 공공 공간 참여 촉진 | § 시민은 모든 수준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 개인의 안전, 보안 및 권한 강화 | § 디지털 환경은 안전해야 함. 모든 사용자는 권한을 부여받고 보호받아야 함. |
| 디지털 미래의 지속 가능성 촉진 | § 디지털 장치는 지속 가능성과 녹색 전환을 지원해야 함. 사람들은 자신의 장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소비에 대해 알아야 함. |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내용은 ① 규제 협력, 역량 구축, 국제협력 및 연구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결합한 툴박스설정 ② EU, 회원국, 민간기업, 뜻이 같은 파트너 및 국제 금융 기관을 한데 모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디지털 경제 패키지 설계 ③ EU 내부 투자와 외부 협력 수단 결합 ④ 가능한 디지털 연결성 펀드를 통해 EU 파트너와의 연결성 향상에 투자. 분야로는 6G, 양자,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이 있음.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위는 단일국가가 스스로 개발할 수 없는 대규모 다국가 프로젝트의 개시를 증진하며 가속화함. 모든 EU 국가는 RRF(회복기금)의 20%를 디지털 전환에 할당하도록 되어있으며, 2022년 7월 통계에 따르면 EU 국가는 평균 26%를 이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6] EU 분야별 다국가 프로젝트 | |
|---|---|
| 디지털 권리와 원칙 | 상세 내용 |
| 데이터 인프라 | § European 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 |
| 저전력 프로세서 | § Alliance on Processors and Semiconductor technologies |
| 5G 통신 | § Public Private Partnership on 5G (5G PPP) § The Smart Networks and Services Joint Undertakings (SNS JU) |
| 고성능 컴퓨팅 | § 유럽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EuroHPC JU) |
| 보안 양자 통신 | § 유럽양자커뮤니케이션인프라(EuroQCI) 이니셔티브 |
| 공공 행정 | § 공공서비스, 산업 및 시민에 ‘Joinup 플랫폼’ 활용 장려 § 스마트공공서비스(Smart public service) |
| 블록체인 | § 유럽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 |
| 디지털 혁신 허브 | § 유럽디지털혁신허브(EDIHs) |
| 디지털 기술 | § 디지털교육실행계획(2021-2027) § Digital skills and jobs coalition |
가) 개요: 향후 5년 동안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조치 및 투자 전략.
나) 비전: 유럽의 가치와 권리,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
다) 목적: 단일 유럽 데이터 공간 형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및 데이터 주권 보장
라) 방법: 데이터 처리 능력, 표준, 도구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함께 데이터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법률 및 거버넌스 결합. 구체적으로, 데이터 접근 및 재사용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규칙 설정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차세대 표준, 도구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하며, 유럽의 클라우드 역량을 위한 단합하고, EU 전체의 상호운용 가능한 공동 데이터 공간을 통한 주요 부문의 유럽 데이터 통합하며,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권한, 도구 및 기술 제공.
가) 유럽데이터전략에 따른 10개의 전략 분야를 위한 데이터 공간. 공공부문과 기업에서 EU 전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 데이터 공간은 보안 기술 인프라와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 구성. 보건, 산업&제조, 농업, 금융, 모빌리티, 그린딜, 에너지, 공공 행정, 기술 9가지분 야에 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EOSC)까지 총 10개의 데이터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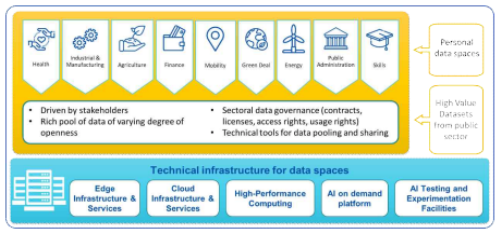
가) 개요: 집행위는 데이터 전략의 일부로 해당 규정을 제안하여(`20.02), 사회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 강화 프레임워크 제공. 해당 법안은 2022년 6월에 발효되어 15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3년 9월에 적용
나) 목적: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신뢰와 데이터 가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메커니즘 강화 및 데이터 재사용에 대한 기술적 장애물 극복. 광범위한 전략적 영역(보건, 환경, 에너지, 농업, 이동성, 금융, 제조, 공공행정 등 민간 및 공공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부문)에서 유럽공동데이터공간의 설정·개발 지원
다) 목표: 공공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보호데이터(개인 데이터 및 상업적 기밀 데이터 등)의 보호되는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칙과 보호장치 제공
EU 규칙 및 가치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조치
가) 개요: 집행위, 데이터에 대한 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조화된규칙에 관한 규정 제안(`22.02.)
나) 목적: 산업 데이터의 잠재력 활용을 통한 데이터 경제 리더로의 도약
다) 목표: 데이터 액세스 권한 간의 일관성 보장 및 IoT 장치에서 생성된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칙 설정을 통한 공정성 보장
가) EU 사이버보안 전략
- 개요: 집행위·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새 EU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20.12.)
- 목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복원력 구축.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글로벌하고 개방된 인터넷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 제공. 사이버 공간의 국제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
- 내용: 사이버보안을 위한 EU의 세 가지 활동 영역(1 회복력, 기술 주권 및 리더십, 2 예방,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운영 능력, 3 글로벌하고 열린 사이버 공간 발전을 위한 협력)
가) 개요: EU 사이버보안 법 채택 (2019년 초)
나) 내용: ENISA 강화 및 최초의 EU 전역의 사이버보안 인증 프레임워크 설정
다) ENISA(EU사이버보안청) 주요 역할
- 유럽사이버보안인증프레임워크 설정 및 유지(특정 인증 체계에 대한 기술적 기반 마련. 공인인증서와 발급된 인증서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에 홍보)
- EU차원에서 운영 협력 강화(EU회원국의 사이버보안 사고 처리 요청에 대한 지원.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및 위기 발생 시 EU 조정 지원)
가) 개요: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안 및 디지털시장법안 채택(`22.07). 두 법안은 집행위에 의해 지난 2020년 12월 제안되어 22년 봄 정치적 합의에 도달
나) 목적: 혁신·성장·경쟁력 육성 및 더 작은 플랫폼·중소기업·신생 기업의 확장 촉진(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보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투명성과 명확한 책임 프레임워크 구축. 단일 시장 내에서 혁신, 성장 및 경쟁력 육성)
다) 대상: EU 단일시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중개자(중개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 [표 7] EU 온라인 중개 플랫폼 및 특징 | |
|---|---|
| 디지털 권리와 원칙 | 상세 내용 |
| 중개서비스 | §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 도메인 주소 등록 기관 등 |
| 호스팅서비스 | § 클라우드 및 웹호스팅 서비스 |
| 온라인플랫폼 | §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소셜 미디어 등 |
| 대규모플랫폼 | § EU 인구의 10%(4,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 |
라) 의무사항: ①불법적 상품·서비스·콘텐츠 삭제 의무, ②플랫폼에 의해 콘텐츠가 잘못 삭제된 이용자 보호, ③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에 대한 투명성 조치 의무, ④불법적인 상품·서비스 판매자 추적 조치, ⑤대규모플랫폼에 자사 시스템 오용 방지 조치 의무 등 부과
가) 목표: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게이트키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을 통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이 가능한 디지털 시장 형성. DMA의 핵심은 게이트키퍼의 규정과 이들에 대한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에 있음
나) 내용: 게이트키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음
- 게이트키퍼 의무사항: 타 서비스 허용(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것과 다른 가격·조건으로 제3 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외부결제 허용(비즈니스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자신의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키퍼플랫폼 외부에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를 통하지 않고 관련 비즈니스 사용자로부터 앱을 획득한 경우)). 데이터 접근성(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하는 도구 및 정보(광고주와 게시자가 지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 등) 제공). 상호운용성 확보(특정 상황에서 제3 서비스가 게이트키퍼의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 허용)
- 게이트키퍼 금지사항: 데이터 부당 이용(게이트키퍼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를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 혹은 제삼자 서비스의 개인 데이터와 결합하는 행위. 효과적인 동의 없이 타깃 광고 목적으로 게이트키퍼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행위). 자사서비스 강요(비즈니스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이트키퍼의 식별 서비스를 사용, 제공 또는 상호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소비자가 플랫폼 외부의 비즈니스에 연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자사서비스 우대(게이트키퍼 자체 상품서비스를 제삼자의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기타 부당 행위(사용자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행위.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관행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 개요: 집행위, 세계 최초 AI에 관한 법률인 EU AI Act 제안(`21.04.)
나) 목적: AI의 위험 해결 및 유럽의 AI 기술 글로벌리더 역할 확보하며, AI의 특정 사용에 따른 위험 해결
다) 구성: 총 85개 조항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조문이 절반 차지)
| [표 8] AI 법안 조문 구성 | ||
|---|---|---|
| AI 법안 조문 구성 | ||
| Title Ⅰ | 일반조항 | 제1조 ~ 제4조 |
| Title Ⅱ | 금지된 AI (practices) | 제1조 ~ 제4조 |
| Title Ⅲ |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준수사항, 의무사항, 평가, 인증, 등록 등) | 제6조~제51조 |
| Title Ⅳ | 특정 AI 시스템의 투명성 의무 | 제52조 |
| Title Ⅴ | 혁신 지원조치 | 제53조~제55조 |
| Title Ⅵ | 거버넌스 | 제56조~제59조 |
| Title Ⅶ |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 제60조 |
| Title Ⅷ | 사후 시장 모니터링, 정보공유, 시장 감시 | 제61조~제68조 |
| Title Ⅸ | 행동강령 | 제69조 |
| Title Ⅹ | 기밀 및 벌칙 | 제70조~제72조 |
| Title Ⅺ | 권한의 위임 및 위원회 절차 | 제73조~제74조 |
| Title Ⅻ | 최종 규정 | 제75조~제85조 |
라)내용: AI법안은 위험도를 기반으로 AI 유형을 4단계(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위험)로 분류
가) 개요: 유럽의 디지털 혁신 산업을 대표하는 선도적 무역 협회로 유럽 전역 41개의 국가무역협회 및 98개의 글로벌리더기업을 포함한 3만 6천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
나) 내용: Digital Europe의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Accessibilitech: IT도구 사용 촉진을 통한 장애인 및 고령화 인구를 위한 전자 접근성개선 및 향상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 Blockchain Skills for Europe: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부문별 접근 방식 제시를 위한 4년 초국가적 이니셔티브
- Digital Skills and Jobs Platform: 유럽의 디지털 기술 이해관계자를 모은 유럽 전역의 디지털 기술정보 및 직업 커뮤니티의 중심
- Digital SkillUp: 유럽 시민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이해 증진 및 디지털 미래 대비를 위한 프로젝트 (온라인 학습 포털)
- The European Green Digital Coalition: ICT 부문 내 디지털화의 지속 가능성 이점 극대화 및 다른 주요 부문(에너지, 운송 등)의 지속 가능성 목표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
- European Software Skills Alliance: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대한 분야별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4년 초 국가적 이니셔티브
- Women 4IT: 디지털 기술 교육 제공을 통한 여성의 디지털 분야 경력 및 역량강화 지원 프로젝트
☞디지털 유럽(Digital Europe)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유럽 디지털 시장의 조화를 위해 동부 유럽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로 4개의 주요 프로젝트로 이루어짐.
- EU4 Digital Facility: EU의 디지털 단일 시장의 이점을 동유럽 국가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로밍 관세 절감, 고속 광대역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자 서비스를 확장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프레임워크 조화를 지원함.
- EaPConnect: EU 및 동부 파트너 국가의 연구/교육(R&D)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EU4 Digital Cyber: 동유럽 파트너 국가 간의 다양한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에 대한 EU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EU4 Digital Broadband: EU 모범 사례 및 전략에 따라 국가 광대역 전략의 개발 및 조기 구현에서 동부 파트너 국가 지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 특유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하는 것.
유럽 지역은 농업, 낙농 및 농업가공품 등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역사적, 기술적 전통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높은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에 관련된 지리적 명칭들 중 많은 수가 세계 적인 명성을 얻게 있어서, 유럽 내에서는 물론,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저명한 위치에 있는 지리적 표시를 관련 없는 타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를 사용토록 할 경우, 이들 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명성에 피해가 초래되고 기존에 권리를 누리던 해당 지역의 생산자 등의 경우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유럽에서는 지리적 표시가 유럽의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집행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이 노력은 역내시장에서 지리적 표시를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함께 EU 이외의 지역(제3 국)에서 유럽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는 모습으로 나타남.
EU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골격규정은 2006년 3월에 채택된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지정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510/2006 of 20 March 2006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출처 : 유럽연합 포털(Your Europe)
☞EU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특정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연관성을 갖는 품질 또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 가공, 처리 등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생산자, 가공자들(producers or operators)로 구성된 단체(단체의 규모는 제한 없음)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정상품이 유일한 생산자에 의해 생산 또는 가공되는 등 특정한 사안에 해당될 경우에는 1인의 자연인도 이를 출원할 수 있고, 소비자 단체의 경우에도 생산자단체와 함께 출원할 경우, GI등록출원이 가능함. 지리적 표시 등록출원 서류의 작성 언어는 EU회원국의 공식언어 중 어느 하나이면 가능함.
국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동일한 지리적 표시(GI)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생산 또는 가공자 단체의 경우, 동일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출원(joint application)할 수 있음, 등록신청 명칭의 길이는 제한 없으며, 지리적 명칭과 여타 명칭을 조합한 명칭을 출원할 수도 있음.
EU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함. 먼저, 회원국의 담당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단계 심사인데, 이 단계에서 보호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GI만이 제2단계 절차에 진입할 수 있음. 다음 단계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사단계이며, 최종 심사에 해당.
제1단계 심사는 출원서를 접수한 회원국의 관련업무 담당기관의 직원들이 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2단계 심사는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농산물품질정책과(Unit of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Policy)의 직원들이 회원국을 경유하여 제출된 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
지리적 표시 심사의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는 상품의 특성 또는 명성의 원인이 특정 지역과 어떤 연관성(Link)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며, 심사는 모두 서류심사에 의하고 있고, 심사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 직원이 직접 현지출장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은 이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내용 및 근거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함. 집행위원회의 등록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제1심 법원에 불복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구비됨.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에 대한 권리는 여타 물품의 소유권과는 개념을 달리함. 즉, 지리적 표시는 단체(또는 사람)를 중심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진 단체 또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공공적 권리(public right)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는 소유자(owner) 로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people who has right to use)라는 형태로 표현. 이로 인해 위 권리자가 당해 특정지역을 벗어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그 지역으로 이동하여 올 경우에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됨.
보호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는 권리양도의 대상이 아니며, 권리의 보호 기간에도 제한이 없음.
EU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신청을 위한 비용은 모두(출원료, 심사료, 등록료 등) 무료이며, 제3 국에서 출원한 경우에도 동일함. 지리적 표시는 공공적 권리이므로 권리침해 즉, 무단사용 등에 대한보상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그에 대한 제재조치만 규정되어 있고,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거나 안내하는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의 제도는 없으며 명성의 유지를 위한 활동은 전적으로 당해 GI 사용단체의 역할로 봄.
회원국의 심사 관련기관에 제출된 GI등록신청에 대하여 당해 기관이 보호대상으로 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정한 후(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1단계 심사의 결과), 관련 내용을 집행위원회에 보내어 집행위원회에서 제2단계 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출원인은 당해 GI에 대한 임시보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이 임시 보호 권리는 당해 출원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즉, 제2단계 심사의 결정이 이루어진 때 종료.
등록된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먼저, 상표는 권리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나 지리적 표시의 경우에는 권리가 지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다음으로, 보호기간 의 측면에서 보면 상표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할 수는 있으나 일정한 기간(10년)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반면, EU에서 보호되는 GI는 한번 등록되면 기간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음.
권리획득 및 보호를 위한 비용 측면의 경우,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서 등록,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기 위한 절차 및 이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나,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없으며, 특히 상표의 경우 제3국에서 발생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지적됨.(지리적 표시 사용권자들 중에는 소규모 생산자단체들이 많아서 국제적 침해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 따라서 집행위원회 등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상표제도 보다는 GI제도를 통한 지리적 명칭의 보호가 더 강력한 것으로 봄.
다른 측면의 경우,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서는 품질(quality)과 지리적 위치간의 연계성이 중요하나 상표법은 상표자체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함께 특정품질 및 제품의 원산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이 있음.
보호수준에 있어서도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의 혼동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지리적 표시의 오용, 남용에 대해 보호가 가능하나 상표의 경우에는 주로 소비자들이 혼동이 있는 경우에 보호되도록 되어 있어서, 두 권리는 보호의 범위 및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U는 상표법상의 단체표장제도(collective trade mark)보다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라는 별도의 특별제도(Sui generis system : 지리적 표시 보호만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 운용되는 등록 및 조사, 통제시스템)를 통한 지리적 명칭의 보호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상표법상의 단체표장제도 (collective trade mark)가 지리적 표시라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또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통해 EU농산물의 품질제고, 농촌지역의 경기활성화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EU의 농업정책, 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며, 그러한 제도상의 효과는 상표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
EU는 2006년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을 개정하여 EU 이외 지역(국가)의 단체가 EU 역내에서 GI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출원인의 지역구분(EU역내, 외) 없이 동일한 보호대상, 심사기준을 적용.
EU 외부에서 출원된 지리적 표시는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위원회(농업총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회원국 중 어느 나라의 지리적 표시 관련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 회원국의 기관은 서류를 집행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게 됨), EU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리적 표시는 출원인이 속한 국가(자국) 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시임을 입증하여야 함.
현재 WTO는 포도주 등이 아닌 농산물과 일반 식품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즉,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 그러나 EU의 GI제도는 실제 대중 오인 유발을 묻지 않고 그 사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과잉보호의 논란이 있음. 또한, 포도주나 증류증 등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 예를 들어,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Pacharan” 등에 지리적 표시를 부여하는데, 실제 Grappa는 알코올 35%부터 60%까지를 함유하는 포도주로서 이는 이탈리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 이는 특히 한국-유럽연합 FTA 협정 시 유럽에 있어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많은 지재권 전문가들이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WTO TRIPS 협정에서도 지리적 표시가 특정 지역뿐 아니라 당사자(당사국)의 국가영토(territory)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도 보호한다는 점을 들어 과잉보호가 아님을 주장함.
EU는 지리적 표시(GIs : geographical indications)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 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함.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 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함.
EU는 재화의 자유이동과 농산물의 품질정책 추진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를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EU회원국이 적용받은 규정을 채택함. 이러한 규제구조는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바 농산물 및 식료품의 보호, 포도주⋅제품의 보호, 증류주 및 포도주에 기초한 주류(wine-based drinks)의 보호임.
EU 차원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2년 7월 24일 제정된 “농산품 및 식료품(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명칭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정 2081/92(Council Regul-ation 2081/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ti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임.
EU의 1992년 이사회규정을 보면 농산물 및 식료품의 지리적 표시 보호는 앞서 언급한 PDO와 PGI, 그리고 다른 이사회규정 2082/92에 규정된 이른바 “보증된 전통적 특성(TSG: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으로 알려진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제도가 기본골격을 이룸.
1992년 이사회규정 2081/92 제2조에 의하면 PDO는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지역, 특정 장소 또는 특별한 경우 특정국가의 명칭을 의미하며, 이러한 PDO의 개념은 리스본협정상의 원산지명칭의 정의와 일치함.
규정에 의거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1) 상품이 반드시 특정한 지리적 구역(지역)에서 기인(생산)되어야 함.
(2) 상품의 품질과 특성은 본질적 또는 배타적으로 원산지의 기후⋅토양⋅지방의 노하우 등과 같은 자연적⋅인적요소를 포함한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해야 함.
(3) 해당 상품의 원재료의 생산, 가공, 조제(preparation) 단계부터 완제 품의 생산단계까지 모두 특정의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전통적인 명칭(traditional designations) 즉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명칭 역시 상기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명칭으로 간주함. 치즈의 경우 Feta가 좋은 예.
그러나 표상(symbol) 또는 이미지(image)와 같은 기타의 명칭(designa-tions)을 PDO로 등록될 수 없음.
PDO 제도하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이 본질적 또는 배타적으로 특정지역의 고유한 자연적 요소와 인적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 기인해야 함. PDO는 상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단계로부터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EU에서 잘 알려진 PDO상품을 예로 들자면 프랑스의 Roquefort 치즈, 이태리의 Gorgonzola, 그리스의 Feta, 이태리의 Chianti Classico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태리의 Prosciutto di Parma 등을 들 수 있음.
PDO의 이러한 조건은 상품의 특성(features)과 지리적 원산지(geogra- phical origin) 간에 밀접하고 객관적인 연관성(close and objective link)을 정립하기 위한 것. 따라서 지역과 품질의 필수적 연계성(terroir)이라는 개념이 법률적인 뒷받침하고 있는 셈.
그러나 이사회규정 제2조 3항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함. 즉 아래와 같은 경우 당해 상품의 원재료가 가공지역보다 넓거나 혹은 다르더라도 경우에 따라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designations)이 PDO로 인정될 수 있음.
(1) 원재료의 생산지역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
(2) 원재료의 생산을 위하여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경우
(3) 원재료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검사제도가 있는 경우 등.
한편 이사회규정 2081/92에 의거하여 보호되는 두 번째 형태의 지리적 표시인 PGI는 농산물 및 식료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지역, 특정한 장소,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명칭을 의미함. PDO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PDO로 등록할 수 있음.
(1) 상품이 반드시 특정한 지리적 구역(지역)에서 기인(생산)되어야 함.
(2)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reputation), 또는 기타의 특성을 보유해야 함.
(3) 상품의 생산단계 중 적어도 1개의 단계는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예컨대 수입된 원재료).
이상과 같이 PDO와 PGI는 해당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유사한 요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PDO가 PGI보다 상품의 품질과 지리적 관계가 훨씬 밀접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즉 PDO와 비교해 보자면 PGI는 특정지역 내에서 상품이 제조, 가공되거나 또는(or) 조제(prepare)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범위가 넓음. PGI의 경우 상품은 특정지역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독특한 품질이 한 가지만 지리적 요소에 기인하여도 등록될 수 있으며, 식료품의 특성이 전적으로(exclusively) 특정지역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어느 지역 또는 특정장소를 나타내는 비지리적 명칭(non-geographical name) 역시 그것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PGI로 등록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PGI의 경우 품질과 지리적 연계성이 긴밀하거나 객관적(close or objective) 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등록 당시의 명성에 기초하여 등록될 수 있음. 더구나 PGI는 당해 상품에 대해 인적인 공헌과 지방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PDO의 전제조건이 없음. 생산자 및 생산자 집단(단체)은 상품을 PDO를 통한 보호를 신청하거나 또는 PGI를 통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일반명칭(generic name) 즉 어느 지역을 가리킬지라도 그것이 보통명칭(common name)이 된 경우에는 PDO 또는 PGI로 인정될 수 없음.
또한 이사회규정에는 보통명칭과 관련하여 명확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보통명칭은 어느 생산자 집단이 그러한 명칭을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가능여부에 관한 당국의 입장이 밝혀지게 됨.
PDO와 PGI 이외에도 이사회규정 2082/92에서는 “보증된 전통적 특성(TSG: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이라는 특수한 성격의 증명제도를 실시함.
TSG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해당상품은 반드시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농산물 또는 식료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함.
나) 해당 상품의 특수한 성격은 전통적인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 또는 가공되어야 함.
TSG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명칭 또는 표상(symbol)은 상품의 특수한 성격을 설명(describe)하거나 또는 그 자체적으로 특정적(specific)이어야 함. 이러한 점에서 볼 때 TSG 지정제도는 지리적인 측면(geographical dimension)이 생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전통적 기인성(traditional attribute)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경우 전술한 PDO 및 PGI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이사회규정 510/2006에 의거하여 PDO 또는 PGI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모든 상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소비를 위한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료품에 적용.
식품의 경우 이사회규정의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으며, 농산물은 이사회규정의 부속서 Ⅱ 및 EC조약(EC Treaty)의 부속서 I에 열거됨.
본래 1992년 이사회규정의 부속서Ⅱ에서는 천연탄산수(natural mineral waters)와 용천수(spring waters)를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해서는 2006년 이사회규정에서 제외시킴.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당시 물의 보호를 위한 수백 건의 신청을 받았으나 대부분 기존의 명칭과 기존의 상표와 같았음. 비록 이사회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공존을 인정하고 명성에 기초한 지리적 표시 및 이전에 존재하던 상표의 명성(renown)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 이러한 이유로 광천수와 샘물의 명칭이 지리적 표시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그러나 수개의 광천수와 샘물이 이미 등록되었기 때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가 설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이들 명칭들이 등록에서 폐지됨.
이사회규정 510/2006 제2조에 의하면 농산물 및 식료품을 나타내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 한하여 명칭(names)으로 등록될 수 있음.
가) 농산물 및 식료품을 기술하는 지방, 특정장소, 그리고 특별한 경우 국가의 명칭으로서 PDO 및 PGI의 등록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나) 농산물 및 식품이 전통적으로 어느 지방, 특정장소가 원산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리적 또는 비지리적 명칭으로서 PDO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한편 다음의 명칭들은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으로 등록될 수 없음.
가) 일반명칭화(보통명칭화)된 경우
나) 일반대중이 당해 상품의 실질적인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큰 식물의 변종이나 동물의 품종과 겹치는 명칭의 경우
다) 일반 대중이 해당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동음이의어(homonyms)가 있는 경우
라) 이미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며, 당해 상표의 평판이나 사용되어 온 기간을 고려할 때 등록되어 사용될 경우 당해 상표의 상표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규정 1898/2006의 제2조에 의하면 PG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생산자의 집단(group)으로 제한됨.
여기서 집단이란 법적인 구성형태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농산물 또는 식료품을 취급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가공업자의 연합체(association)를 말함. 특이한 점은 단체가 아닌 자연인 및 법인은 해당지역에서 유일한 생산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할 수 있음.
a. 출원인은 등록출원서를 제품명세서(product specification)와 함께 지리적 표시가 위치한 회원국에 제출.
b. 당해 회원국은 등록출원서 및 상품명세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송부(요건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기각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c. 집행위원회는 신청일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출원서가 명세서 기재사항 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회원국에 통보. 이러한 조사과정에서는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ttee)와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가 참여.
집행위원회가 신청내용이 제반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출원인 성명, 주소, 상품명칭, 출원요지 등을 포함한 내용을 EU관보에 등록신청하여 공고.
등록과정에서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 할지는 신청된 명칭에 대하여 회원국내에서 잠정적 보호기간뿐만 아니라 상품명세의 수정을 위한 조정기간(adjustment period)을 허용할 수 있음. 생산자집단은 5년까지 조정작업을 할 수 있음. 다만 관보에 해당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당해 상품이 유통되어야 함.
한편 신청 시 지리적 명칭이 국경지역의 명칭이거나 전통적인 명칭이 이전의 동등한 절차(equivalence procedure)에 의거하여 인정된 다른 회원국의 지역 또는 제3 국에 있는 지역과 관련된 명칭일 경우 출원신청을 하는 회원국은 출원신청을 송부하기 전에 다른 회원국 또는 제3 국과 협의하여야 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공동신청을 할 수 있음. 회원국들은 당해 식료품의 집행위원회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사기구를 설치해야 함.
PDO와 PGI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지리적 구역(지역)과 함께 제품명세(product specifications)가 매주 중요함. 즉 집행위원회규정 제4조 1항에 의하면 PDO 또는 PGI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느 농산물 및 식품이든 제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함, 제품명세의 내용이 단순한 장소의 명칭을 벗어나 훨씬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이러한 제품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음.
a. 특유한 경우 원재료, 그리고 중요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감각 수용 적 특성을 포함한 농산물 및 식료품의 명세
b. 지역의 한정(명확한 지역의 기술)
c. 농산물 및 식료품의 제조방법의 기술, 특유한 경우 변함이 없는 지방의 제조방법
d. 당해 상품이 지리적 환경 또는 지리적 원산지가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
e. PDO 또는 PGI 또는 이와 동등한 당해회원국의 전통적인 표시(traditional national indications)
한편 출원신청에 대한 인증절차(recognition procedure)에 의거하여 출원신청이 관보에 공고된 후 다른 회원국들은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즉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든 지리적 표시가 규준을 충족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출원사항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음. 예컨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명칭이 보통명칭이거나 동음이의어 거나 또는 상표와 충돌된다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출원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해 명칭은 “PDO 및 PGI의 등록대장(Register of 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and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에 게재되며, 등록명칭은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들이 당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이용.
2006년 규정에서는 명칭(names), 표시 및 표상(indications and symbols)에 관하여 이전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을 규정함. 즉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갖고 유통되고 있는 EC내에 원산지의 식료품들에 대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라벨은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거나 그와 관련한 EC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이러한 의무는 2009년 4월 30일 이후부터 유통되는 상품에만 적용.
EU규정은 지리적 표시를 광범위하게 보호함. PDO 및 PGI에 관한 규정 510/2006에 의하면 생산자집단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금지행위로 규정함.
가) 등록된 지리적 표시 상품과 양립될 수 있거나 보호되는 명칭의 명성을 부당 하게 사용하는 한 등록된 명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용행위는 금지.
나) 특정상품의 실제 원산지가 표시되거나, 또는 보호되는 명칭이 스타일(style), 타입(type), 방식(method), 어느 지역에 생산된 것과 같은(as produced in), 모방(imitation),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들로 번역되거나 그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라도 보호되는 명칭의 오용, 모방 또는 환기행위는 금지.
다) 포장의 내⋅외부,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등에 출처, 원산지, 상품의 특성 또는 상품의 본질적인 품질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는 금지.<
라) 일반소비자들에 해당상품의 실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기타의 모든 행위는 금지.
그러나 이상의 금지사항의 예외규정으로서 등록공고일 이전 5년 동안 임의로 사용한 경우 등록공고일 이후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상품의 실 원산지는 표시되어야 함.
WTO 회원국들 중에서 지리적 보호를 상표법에 이루어지는 미국 등 다수국가들은 EU규정이 WTO/TRIPS협정과 GATT 1944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만이 컸음.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미국이 정식으로 EU와의 협의를 요청한 바 있었으며, 2003년에는 미국과 호주가 WTO 분쟁해결기구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패널(panel) 설치를 요청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분쟁대상이 됨.
당시 미국과 호주는 EU규정 2081/9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함.
가) EU규정 2081/92 제12조 1항은 비 EU WTO회원국이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3 국이 동 규정 제4조 28)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제3 국 당국이 EU규정에서 정한 검사제도를 운영해야 하고 등록거절권리(right to the objection)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은 WTO/TRIPS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
나) EU규정은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WTO/ TRIPS협정 제16조 1항을 위반. 즉 법적효력을 갖고 선등록된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표권자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음.
다) EU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등록 상표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U규정은 WTO/ TRIPS협정 제24조 5 항상에 규정된 회원국의 의무조항에 위배. 이는 공존하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 간의 우선(priority) 문제로서 EU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므로 미국등의 상표법체계에서와 같이 선등록우선권의 원칙(principle of first-in-time, first-in- right)이 적용되어야 함.
이상과 같은 미국과 호주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EU규정 2081/92를 WTO/ TRIPS협정 및 GATT 1994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이 결과 EU는 EU규정 2081/92을 일부 개정하여 EU규정 510/2006를 공표하였으며, 이 중 제3 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규정에서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와의 관계와 개정된 등록절차 및 거절(이의 제기) 절차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가) 기본적으로 지리적 표시의 등록신청공고일 이후의 상표등록출원(그것이 침해행위를 구성하고 원산지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와 종일한 제품인 경우)은 거절되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무효화하여야 함.
이와 같이 동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선등록 또는 후등록된 상표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러나 원산지국가에서 지리적 표시(PDO 또는 PGI)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선의로(in good faith) 등록이 출원 또는 등록되거나 사용된 경우 비록 침해 행위를 구성하더라도 공존(co-existence)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동 규정에서 산지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는 상표의 평판 또는 명성, 그리고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2 등록이 제품의 동일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함.
나) 제3 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동등성(equivalence)과 상호주의(reciprocity)를 요구하는 조항은 폐지되었으며, 제3국내의 지역의 명칭이 보호를 받기 위하여 EU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5 조에 규정함. 동 조의 규정을 보면 외국의 신청자는 종전의 EU규정 2081/92와는 달리 소속국가 정부기간의 심의와 당해 기관을 통한 등록신청을 할 필요 없이 당해 제조업자들이 집행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절약을 할 수 있게 함.
다) 이의제기절차에 관하여 신규정에서는 제3 국 정부기관에 의한 이의제기의 검증(verification)과 당해 기관을 통한 이의제기절차를 폐지함. 이에 따라 제3 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직접 할 수 있게 됨.
라) 1992년 규정상의 검사구조(inspection structures)와 제3 국 정부에 의한 진술(declaration) 규정을 개정함. 즉 신규정 제11조 2항에서 당해제품은 시판되기 전에 제품명세(product specifications)와 일치한다는 점이 제3 국 정부가 지명한 공공기관 또는 한 개 또는 2 이상의 제품증명기관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EU는 광범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통한 보호를 함.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1월 현재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건수가 722건에 달함(포도주와 증류주 제외). 이 뿐만 아니라 2006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지리적적 표시 등록을 위하여 46건이 이의신청 여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국 생산자 1건(콜롬비아 커피)을 포함하여 235건이 신청 중에 있음. 따라서 EU의 경우 EU 이외의 농산물 및 식료품 생산자들이 EU내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는 경우가 극히 적음.
DO 및 PGI를 이용하여 보호를 받는 품목을 보면 치즈, 육류제품, 과일⋅채소⋅곡물, 올리브, 미네랄워터 등 음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 이러한 점을 볼 때 EU국가들의 지리적 보호대상 품목은 본질적으로 지방산품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국가별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을 보면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유럽 남부국가들의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전체의 0% 이상), 유럽 북부국가로서는 독일이 많은 건수를 보임.
특히 유럽 남부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산지별 제품차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등록건수가 훨씬 많은 셈. 다만 유럽 북부국가에 속하지만 독일의 경우 식료품제도가 상당히 차별화됨으로써 지리적 표시 등록건수가 많은 편. 따라서 일부 유럽 북부국가들의 제품이 보통명칭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EU국가 간의 등록분포가 뚜렷한 격차를 보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미국의 연방국가의 각 주에 견줄 수 있을 만큼 법적 제도의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음. 특히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등을 통하여 이룩된 법적 통일 상태를 보충하는 입법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단일의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독자적인 법통일조치에 나서 독자적인 유럽의 공동체적 법망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식재산권의 내제적인 국제 통일적 성격이 강해지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각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이해대립이 더욱더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유럽 내의 지재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과 국제사법적 보호를 위한 소송 절차법 등의 통일화가 타 분야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발전을 해옴.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허여는 주권의 행사로서, 지식재산권의 제한이나 부존재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한 국가의 법관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허여 된 내용대로의 권리를 자국에서 보호하는 한 그 침해 및 그에 대한 구제는 자국의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의 타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의 유럽의 통일 지재권제도는 아직 그 완성을 보지 못하는 상황임.
이미 유럽(의 가맹국 간의) 단일 권리로서 기틀을 잡게 된 연합 상표, 공동체 디자인 제도와는 달리 유럽 특허 조약(EPC)은 그 “유럽 특허(European Patent : EP”라는 것이 통일 권리가 아닌 각국의 특허의 “묶음”의 개념으로밖에 발전을 하지 못한 상황이며, 브뤼셀 조약에 의한 관할 통일화 움직임과 유럽 연합 지식재산권 집행지침에 의한 공동체 권리의 집행 통일화가 유럽의 통일 관할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보았지만 여전히 각 연합국 내의 지재권 관련 소송에 있어 속지주의 원칙을 완전히 깨지 못함.
결국, 상기와 같은 통일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식재산권 소송의 현실은 여전히 유럽 각국의 법제에 고유의 편차를 내재한 채로 개별국 소송에 의존하고 있어 통일된 결론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는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들의 비효율적 소송 전행 및 과다한 소송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유럽특허조약(EPC) 원문보기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
유럽의 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을 근거로 하는 유럽특허청(EPO)에서 통일심사를 하는 집합적 유럽 특허와 개별 국가에서 개별 절차에 의해 등록되는 개별국 특허가 혼재됨.
상기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체약국은 39개국이지만,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은 27개국 가이며, 유럽특허청은 유럽특허의 침해소송이나 무효 소송을 관할하지 아니함. 유럽 특허의 소송은 해당 특허가 등록된 개별국가의 관련법에 의해 진행되며, 필연적으로(통일되지 아니한) 개별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판단되게 되어 개별국별로 상이한 결론에 다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유럽특허의 무효성은, 유럽특허조약에서 규정한 요건을 근거로 각국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 물론, 무효와 관련한 통일적 규정이 EPC 등에 존재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에 대해서 개별국이 가지는 규정을 적용. 더욱이, 침해의 판단은 EPC의 규정(특히 EPC 제69조)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국 법원은 침해 판단의 문제에 있어 자국 내 경험으로 개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 이러한 차이는 결국 유럽 내 특정국가의 법체계가 권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경향을 보이거나 침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까지 전개됨.
통일된 심사체계를 가졌음에도 개별국가에 등록되어 개별국가의 개별적 사법체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유럽 지식재산권 소송 체계에 있어, 유럽 특허(즉, EPO의 통일심사과정을 거처 EPC 가맹국가에 등록된 집합적 EP특허)의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음. 특히, 많은 경우, 특허권 침해는 유럽의 다수의 국가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되며, 유럽현합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한 국가의 한 소송체계에서의 판결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벌어짐.
둘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침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유럽특허의 특허권자가 결정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국가의 사법 체계를 이용하여 침해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다음의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
가) 침해품을 제조하는 해외(또는 EU 경제권 역외) 제조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역내 유통업자 및/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가
나) 유럽 외의 특허권자가 해당 국가에 거소 지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구제 수단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해당 국가에 거소 지나 영업소 또는 사용권자가 있어야만 구제 수단을 조치할 수 있는가
다) 침해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련 실체법이 양 당사자 중 일방에 유리한 경향이 있는가
라) 침해가 이루어지는 복수의 국가 중 어느 국가가 특정 지식재산권 보호 수단에 대하여 특히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조치가 되는가
마)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구제 수단(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가지는 국가는 어디인가
바) 특정국가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을 유리하게 인용하는 경향이 있는 법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어디인가
사) 특정국가의 법원에서의 승소가 유럽 전체에서의 소송 외 합의 또는 중재에 유리하게 미치는가
아) 침해가 이루어지는 복수의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소송 기간 및 소송 비용에 있어서 유리한가
자) 침해가 이루어지는 복수의 국가 중에서 침해자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무효 방어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한 국가의 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해당 관할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실.
침해 용의를 받는 피고나 특허의 권리 대항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 대개 관련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EPO에 이의 신청을 청구하거나, 개별국가에서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이나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럽 내 복수의 국가에서 여러 종류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대규모 특허 소송은 매우 흔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복수 관할 특허 분쟁에 있어서는, 각 사건들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매우 일관되고 정리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 각 관할에서 동일한 증거와 입증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특허 침해 소송사건이 유럽의 각 법원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원의 경우 매우 빠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을 고려한 전략은 사건 초기에 최대한 빨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유럽에서는, 특허권자가 소송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제한이 존재.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유통업자뿐 아니라 제조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의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증명할 몇 가지 증거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영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제조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제한함. 즉, 영국 법원은 자신의 국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자는, 단지 영국 유통업자가 해당 제품을 영국으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 침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주지 않고 있음.
특허권자가 특정 국가의 특정 유통업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에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함. 특허 전문 판사(혹은 기술 판사)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기술 이슈를 다루는 데 많은 경험이 있으며, 대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특허 전문 법원은 영국의 런던 법원,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 독일 법원(특히, 뒤셀도르프 법원), 프랑스의 파리법원, 이탈리아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원(바리, 볼로냐, 카타니아, 플로란스, 제노아, 밀라노, 나폴리, 팔레르모, 로마, 튜린, 트리에스테, 및 베니스), 그리고 스페인의 상업법원(특히 마드리드 및 바르셀로나의 상업법원) 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특허 침해 소송은 상기 법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관할 국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소 가능성, 절차의 신속성, 및 승소 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구제 조치라 할 수 있음.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의 절차는 매우 빠른 편.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결정은 1년 이내에 이루어짐. 영국의 경우, 소송은 9 내지 12개월 정도 소요. 영국 특허법원의 약식소송 절차(Streamlined Procedure44))를 이용하면 6개월 이내에 1회의 심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스페인의 경우, 법원에 따라 절차가 9 내지 15개월 정도 걸림(바르셀로나 법원이 마드리드 법원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편).
다른 국가의 법원의 절차는 상당히 느린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소송개시 후 12 내지 18개월 내에 심리가 진행되며, 결정은 심리 후 6주 뒤에 내려짐. 이탈리아의 경우, 1심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는데 일반적으로 2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함.
소송 당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후 유럽 전역의 진행 중인 또는 진행가능한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는 경향이 있는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함.
물론, 각 소송의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국가의 법원의 경우 특허에 대한 실체법 해석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됨. 또 어떤 국가는, 특정 소송 절차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지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제한함. 이는 명백히 피고에 대하여 불리한 절차임에 튤립 없음.
영국의 특허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음. 특히, 특허에 주요한 약점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특허 청구범위가 매우 넓고 유사한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영국의 특허법원은 침해 인정에 매우 인색한 편이었기 때문임. 또한, 영국 특허법원은 유럽 특허(EP)로 기인한 영국 특허의 무효 판결을 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짐. 그 결과, 잠재적 침해자는 영국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소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영국 법원이 영국의 특허에 대한 무효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지만, 영국 법원이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견지한 견해 및 영국 법원의 무효 결정은 다른 유럽국가의 법원에 매우 유용하게 작용, 특히 EPO의 이의신청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까다롭게 판단을 하는 이런 영국법원의 경향은, 특허권자가 영국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의 관할 법원에 특허권자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또한, 영국은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침. 또한, 영국 법원은 그 절차의 특수성에 의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침해 대상의 제품정보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정보나, 특허 출원 시의 출원과 관련한 연구정보 등에 대한 문서 등을 얻는 데 매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다른 예로서, 침해판단과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별도의 법원과 별도의 절차로 판단되는 독일의 법원 절차는 특허권자에게 유리함. 특허의 유효성 다툼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이 “기술구성의 차이”가 있어서 선행 기술과 유사하지 아니함을 근거로 특허의 유효성을 방어하지만, 특허의 침해의 다툼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침해자의 실시 기술과 “기술구성의 차이가 없어서 “ 유사함을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때 침해자는 이러한 특허권자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행 기술과 자신의 실시 기술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침해자의 주장이 성공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때때로 유효성 방어논리와 침해 주장 논리가 모순되는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됨. 이 때문에, 침해 판단과 특허의 유효성 판단이 다른 법원에서 다른 절차에 의해 별도로 진행되면, 특허권자는 상반될 수도 있는 침해 주장 논리와 특허 유효성 판단 논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여지가 많아짐.
유럽 특허 조약(EPC)에서의 실체적 요건의 통일화 및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CJEU)에서의 통일적 법해석 노력 등에 따라 유럽 각국 특허법의 실체적 규정이 상당 부분 통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국 법원의 해석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
특히, 양 당사자의 논리 및 그 근거가 상당 부분 경합하는 경우, 각 유럽 국가의 법원은 조금씩 다른 접근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며, 이 경우 다국적 특허 소송에 있어서 그 결과의 차이를 낳게 됨.
특히,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이로부터 유도되는 침해 판단은 분명 유럽 각국의 법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여겨짐.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 및 이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에 의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통일화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 관할 법원들 간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특허와 동일한 사실을 근거하는 경우라도 유럽 내 각 법원 간의 특허 청구범위의 보호범위 및 침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의 상반된 결정이 나게 될 잠재적 요인으로 충분. 침해는 국내법에 의해 판단된 다는 규정인 유럽특허조약 제64조(3)는 이러한 법원 간 판단의 차이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도 볼 수 있음.
유럽특허조약 제69조(1)에 의하면, 유럽특허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범위의 결정은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Nevertheless)” 명세서 및 도면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사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정 자체가 매우 모순적이고 모호한 상황이 된 것도 각국 법원의 해석의 상호 다른 접근을 허용케 하는 요인으로 생각됨.
발명자가 유럽 특허청(EPO) 절차에서 제출하게 되는 출원포대(File wrapper)의 의견서, 견해서 등에서 밝힌 출원인의 의견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각국 법원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영국 및 독일의 경우, 특허권자가 EPO 과정에서 주장한 의견은 일반적으로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네덜란드 및 스페인의 경우, 때때로 출원포대의 출원인의 의견을 참조. 출원 포대의 출원인의 의견은 프랑스 절차에 있어서 참조의 대상이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 법원은 출원포대의 의견 내용도 반드시 참조하도록 되어 있음.
영국은, 유럽 특허 조약(EPC)에 시행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음.
“(특허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며,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해석되며, 보호의 범위는 그에 따라 정해진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영국 특허 법원의 현재 입장은 2004년 10월에 영국 상원에 의해 “Kirin Amgen Inc v Hoechst Marion Roussel Limited(이하 Amgen 케이스라 함)” 케이스와 관련하여 확립됨. 이 케이스는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과 관련된 케이스인데, 영국의 대법원 판사인 레오나드 호프만 경(Lord Leonard Hoffmann)이 영국 상원에서의 모두 발언을 통해 특허는 목적론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확정함. 목적론적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은 영국의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반이며, 유럽 특허 조약과 일치.
상기 “Amgen”케이스 이전에 영국 법원은 “Improver Corporation v Remington Consumer Products” 케이스에서 도출된 일련의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툭허청구범위를 해석. 일명 “Improver Questions”라고 하는 이 청구범위 해석의 판단 기준은 목적론적 해석의 보조 수단으로, 일정 부분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 판단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 “Amgen” 케이스에서 호프만 경은 이들 “Improver question”은 일률적으로 적용되서는 아니 되며, 단지 가이드라인으로서만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함.
“Amgen” 케이스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식은 유럽 특허 조약의 원칙에 직접적인 적용으로 대체됨. 호프만 경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오직 하나만의 필수적 판단 기준이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특허권자가 특허청구범위에 사용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당업자가 알 수 있는가”
유럽 특허조약에서 명백하듯이, 이러한 해석 방식은 특허청구범위가 표현의 문언적 의미에 엄격하게 기속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명세서 및 도면을 포함한 전체적인 특허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이런 해석 자체는 특허의 맥락 및 배경에 매우 민감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특허의 전체적인 맥락은 결국 청구항의 문언에 넓은 해석 또는 좁은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
전체 맥락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항소법원 케이스 “Mayne Pharma Pty Ltd v Pharmacia Italia SPA”에서 강조되었는데, 2005년도 2월에 도달한 이 케이스의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특허권자가 문맥과 상관없는 특징적인 의미(넓든 좁든)를 가질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문맥상의 그 해당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함. 이 판결은 특허권자가 구하려는 기술적 사상에 비추어 청구범위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김.
① 1930년 Philips v Tasseron 케이스에 대한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로, 네덜란드에서는 보호범위를 규정하는 원칙은 특허 부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본질(essence)” 또는 “발명 사상(inventive idea)”이라는 개념이었음. 발명의 본질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원칙은 보호범위를 다소 넓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② 1978년 1월 1일, 유럽 특허조약 제69조 및 이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이 네덜란드 특허법에 도입되면서, 네덜란드 특허 규정 1910의 개정이 있었는데, 네덜란드 특허법 1910의 제30조 53)에 추가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독점권은 특허 명세서 내의 특허청구범위, 특허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제공되는 도면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본 개정 내용은 결국 당시의 네덜란드 법원에 의해 특허에 부여된 보호범위의 해석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보이는 바, 즉, “발명의 본질”이라는 네덜란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원칙이 유럽특허 조약 제69조와 어느 정도 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③ 1995년 “Ciba Geigy v Oté Optics” 케이스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뒤에 있는 “발명의 본질”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과한 문언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대법원은 문언적 해석이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넓은 보호범위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함.
- 과도한 문언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 “발명 사상(inventive idea)”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 필요한 수준의 제삼자를 위한 법적 안정성은 법적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발명 사상”의 개념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의 결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 특허권자의 실수와 과오의 산물은 전적으로 특허권자가 책임져야.
- 혁신 발명은 특허권자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쪽으로 하여 일정정도 더 넓은 보호범위를 받을 수 있음.
- 당업자가 명세서 및 도면을 읽은 후에도 의문점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과정에서의 서류들을 특허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Ciba Geigy v Ot Optics” 케이스에 관한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발명의 본질”의 원칙은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원칙 중 하나 정도로 이해됨.
④ 2002년의 “Van Bentum v Kool” 케이스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Ciba Geigy v Ot Optics” 케이스의 상기 “Ciba Geigy v Ot Optics” 케이스에서의 원칙(“발명의 본질” 개념을 포함한)을 재차 확정하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 내에서, 만약 발명의 내용 및 다른 공지된 정보(예를 들어 출원과정에서의 파일 등)에 비추어 보아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제삼자(당업자)는 특허권자가 “발명의 본질”에 포함되는 변형물의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한 프랑스 특허법규정은 프랑스 산업재산권법 제 L 613-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럽 특허 조약 69조와 일치함.
프랑스 산업재산권법 제613조 2는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해 결정.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기 위해 명세서 및 도면이 이용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프랑스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 규정은 2004년 4 월 28 일 “Applimo SA, Noirot SA, Campa SA V Atlantic SA”케이스에서 프랑스 대법원에 의해 확정됨.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표현이 모호할 때 상세한 설명을 청구범위의 정확한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프랑스 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도면에 언급되지 아니한 어떤 요소나 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함.
도면은 상세한 설명을 보조할 수는 있어도, 도면에 표현된 모양이나 발명의 구성이 문언에 의해 설명되지 않거나, 상세한 설명이 그러한 모양 및/또는 구성이 도면에 표현된 만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면은 상세한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음.
독일연방 대법원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유럽특허조약 제69조의 해석에 대한 의정서에 근거하여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하여 접근함.
최초의 주요 케이스는 “Formstein [1991]”케이스로서,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적 판단요건은, 명세서 및 도면을 참조하여, 당업자가 그의 기술지식을 근거하여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당해 침해에 사용된 방법을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원리가 동일한지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함.
“Weichvorrichtung I case [1993]” 케이스에서 독일 대법원은 특허 출원과정에서의 특허권자의 진술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
“특정 실시예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경우, 그러한 선언이 특허 허여의 근거가 되었고 특허 허여 과정에서의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현재 소송의 상대방이며 특허권자가 선언된 내용과 반대로 특허의 보호를 위해 주장하기 위하여 선언된 경우라면, 해당 선언은 침해 소송 시의 금반언의 원칙의 개념하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독일에서는, 균등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쟁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조로 특허 청구범위를 기초하고 자신의 기술지식에 근거하여 당업자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침해자와 동일한 기술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
이탈리아 지적재산권법 제52조는,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에 의해 결정되며,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상기 원칙은 “Southwire v Continuus [1999]” 케이스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판시함.
“특허의 보호 범위 확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검토를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상세한 설명에 의해 발명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특허가 무효이기 때문에, 본 특허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기인하는 기술적 데이터를 참조하여 해석되어야만 한다.”
밀라노 항소법원은 “Fedegari Autoclavi v De Lama case [2002]” 케이스에서 상기 대법원에서 제시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
“발명 사상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의해 추론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특허청구되지 않은 구성 요소에 대해서 특허보호가 부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이 특허청구범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유럽특허조약 제69조의 해석에 대한 의정성과 이탈리아 지식재산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탈리아 판례들은 특허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호와 제삼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안정성 사이에서 좋은 균형점을 이루는데 관심이 많음.
스페인 특허법 제60조는 유럽특허조약 제69조와 동일한 규정으로서, “특허 또는 특허출원으로부터 추론되는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에 의해 결정. 하지만,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일반적으로 스페인 법원의 특허청구 범위 해석은 유럽특허청의 결정과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짐.
스페인 법원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진다”라는 소위 “actos propios”라는 금반언 원칙을 적용. 스페인 법원에 따르면, 법률적 행위는 명백하고, 결정적이며, 확정적이어야 하며, 선행하는 법률적 행위와 양립되거나 모순될 수 없음.
스페인에는 포대 금반언에 대한 결정적인 판례가 없음. 특히, 특허 소송의 관점에서 특허의 보호 범위를 해석하는 일련의 원칙에 대한 판례가 없지만, 포대 금반언에 대하여 언급하는 판례는 있긴 함 (2006년 9월 바르셀로나 항소법원의 “Grupo Combursa, S.L. v Controlsa, S.A.”케이스).
특허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적 단계는 사건이 다루어지는 각 국내 법원의 룰에 따라 다름. 유럽 각 법원의 절차의 특히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임.
- 소송 전 고려 사항
- 증거 입수 방법,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입수하는 방법
- 각 법원의 소송 제기 기한(시효)
- 심리 중 증거 제출 방법
- 승소 시 법원으로부터 부여되는 구제 수단
침해소송을 개시할 때, 소송 의도를 침해자에게 전달하고 경고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
영국 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구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영국 특허법 1977은 침해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외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
특허권자로부터 소송하겠다는 협박으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의 협박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협박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침해와 무효에 대한 판단이 필요. 따라서, 영국 특허 또는 영국을 지정한 유럽특허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는 협박 규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
반면,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경우, 권리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혹은 협박)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과도하게 정당하지 못한 소송 협박을 포함하는 경고장은 이탈리아 민법규정 제2598조의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
독일의 경우, 협박이나 경고에 대한 구체적 특허법 규정은 없음. 하지만, 사법의 일반 규정은 정당하지 못한 경고장은, 특허 침해 주장을 중지하라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경고장의 협박의 정당하지 못함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되면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됨.
소송의 협박은 프랑스 법에서 범죄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며, 불법 행위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민사적 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몇몇 국가에서는, 특허 소송을 개시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진행 중인 유럽 특허청 절차(주로 이의신청의 결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중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영국의 경우, 특허법원은 절차를 중지하는데 넓은 재량권을 가짐. 하지만, 영국 법원은 절차 중지를 고려할 때 사건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함. 가장 중요한 요건은 양 당사자의 확실성을 구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 특허 법원의 결정이 유럽 특허법원의 이의 신청 결과보다 훨씬 전에 구체적으로 도달하는 상황이라면, 특허 법원은 중지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임.
네덜란드의 판사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재량이 있음.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고 유럽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중지는 이의 신청의 결과가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여 될 가능성이 높음.
이탈리아 법은 사법적 권한이 있는 타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만 절차의 중지를 허락. 판례는 이탈리아 법원이 유럽 특허청을 행정적 기관으로 보며, 따라서, 유럽 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절차의 중지가 허여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스페인 법원도 유럽 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소송절차의 중지는 허여 하지 않음.
너무 오래된 침해 행위와 관련한 소제기 기한의 제한 법규는 유럽의 각국 관할 법원마다 각각 상이함.
영국의 경우, 특허 침해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소송 절차가 개시되기 전 6년의 시점 또는 특허 공개 일자 중 늦은 시점 이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
네덜란드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한, 특허 침해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출원 공개일 이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 인정.
프랑스에서는, 특허침해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소송절차 개시일 전으로 3년이 시작되는 시점 또는 프랑스어로 출원 공개일(혹은 경고장을 받은 날) 중 늦은 날 이후로 발생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인정.
독일에서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은 원고가 침해 및 침해 행위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을 포함하는 해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함.
이탈리아의 경우,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장하여야 함.
스페인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주장은 권리자가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함.
상대방(침해자)의 제품 및 방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침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특히 침해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함. 유럽 각 국가의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접근, 증거 규칙 및 증거 조사 절차(discovery57)),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 및 실험에 대한 절차는 상이함. 영국 법원은 침해의 증거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매우 유리한 면이 있는데, 이는 강력한 증거 조사 절차가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Chiron v Organon Technika”케이스에서, 영국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 및 증인 반대 심문 결과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법원에서 취해진 소송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됨.
지식 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4/48(집행 지침)은 사법 기관에 침해자 및 기타 제삼자에 의해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 많은 유럽의 사법 관할에 있어서, 이 조항은 기존 규정에 비하여 많은 발전을 한 것. 이 조항은 차후에 보다 자세히 설명함.
그러나 영국 법원 절차는 상대방의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선택권의 종류가 많음. 적절한 경우, 영국 법원은 상대방의 내부 문서 공개,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준비, 그리고 샘플이나 성분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다른 국가의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단지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고, 당사자는 이러한 추정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때때로, 제품을 검사 또는 조사하거나 제품이나 방법을 기술한 당사자에 의해 공개된 문서를 통하여 확보될 수 있음. 하지만, 당사자( 및 판사)는 주요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방 당사자에게만 알려지게 됨. 각국의 법원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이나 절차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하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함.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사건의 특정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를 상대방에게 공개할 의무가 발생. 자료의 공개 의무에 의해, 양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있는 내부 자료까지 공개하여야 함. 주요한 점은 다음과 같음.
- 유럽에서는, 상기와 같은 정도의 증거조사는 영국(및 아일랜드)에서만 가능함.
- 일단 절차가 진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여야.
- 법원의 별도의 명령 없이 자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타입에 제한이 있음. 그러나, 법원은 기타 자료에 대해서도 요구할 권한이 있음.
- 당사자는 특별히 준비된 진술서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증거 조사를 피할 수가 있음. 침해자의 경우,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함으로써 제조 매뉴얼, 도면, 생산 정보기록 등과 같은 다른 중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음.
- 당사자가 공개한 문서들은, 영국 법원에 의해 열람되거나 공개적으로 인용되는 즉시, 상대방에 의해 다른 어떤 법적 절차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
영국 법원은 당사자에게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서면 설명서에 포함될 정보의 종류와 상세 정도를 명시할 수 있음(예를 들어, 적용예, 사용된 원재료의 양과 종류, 온도, 속도, 압력, 구조식).
영국 법원은 당사자에게 상대 당사자가 제조 방법을 조사할 수 있게 허락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영국 내 또는 양국 외 모두 가능하다). 조사원으로서 변호사 및 독립적인 전문가는 자격이 제한됨. 법원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방법을 조사하는 상대방에게 성분 샘플, 중간 물질 및 최종 물질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영국에서는, 당사자가 실험의 결과를 얻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원의 허락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에게 특정 조건을 부과함. 이러한 조건은, 예를 들어, “실험은 상대방과 전문가의 조회하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있음.
실무적으로, 상대방의 실험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 실험은 사용된 방법이나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 실험을 수행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실험에 사용하는 원재료 샘플을 요구하기 때문임. 이들 샘플은 내부 시험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임.
침해 압류는 프랑스의 독특한 절차로서,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상대방에 통보 없이 기술 전문가를 대동한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침해품을 발견한 곳에 들어가 침해품의 샘플을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법원은 물품이나 방법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침해품과 관개되는 계좌번호 또는 판매량 등과 같은 서류의 압류도 허가할 수 있음. 이 명령은 침해 제품 또는 침해 방법의 설명이 포함된 법원 집행관이 작성한 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증거를 특허권자가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또한, 특허권자는 침해품의 제조 및 유통에 사용된 기계 및 장치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음. 법원 집행관 보고서(불복할 수 없다)는 법원에서 침해 이슈를 다룰 때 사용됨. 본 침해 압류를 통하여 확보된 회계 장부 및 정보를 근거로 하여, 법원은 시효 기간 내로 이루어진 침해의 범위를 판단함.
네덜란드에서 채택되고 있는 절차로서, 실제 소송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는 증인으로서 증거 제공을 할 수 있음. 당사자는 주요한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확보하는 기회가 됨. 예비 심문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예비 심문 이후 특정 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 의무는 없음. 이 절차는 방법 특허의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특히 유용.
독일에서는, 당사자가 특허 침해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약식절차에서의 장치 및 문서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이러한 신청은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능함.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이익을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문서 조사신청을 허여. 그러나, “Faxkarte case [2002]” 케이스에서는 독일 대법원은 조사에 대하여 보다 진보적인 시각을 견지함. 법원은 양 당사자의 관점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서조사 신청이 적절하다는 점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종종, 법원의 명령에 의한 조사는 침해 소송의 실질적 증거로 사용되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가에게 한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민사 절차법 843a 조 및 191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해와 관련된 특정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스페인 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음. 신청자는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 문서뿐 아니라 문서의 내용 역시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내용을 모르면서 떠보기 위해 문서를 신청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막기 위한 것.
언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의 타이밍 결정은 다국가 관할 특허 소송에 있어서 핵심. 타이망은 법원이 특허 분쟁에 대하여 브뤼셀 조약/루가노 조약 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소송의 타이밍과 한 관할에서의 특정 증거가 다른 관할에서 발생된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유럽 각국의 소송과 비교해 보면, 영국의 소송은 매우 엄격한 증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됨. 종종, 가장 중요한 증거가 실험을 참관하는 도중에 또는 상대방 측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 과정 도중에 나옴. 일단 심리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서로가 입수가능한 상태가 되어 다른 관할의 소송에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증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공개한 서류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경우 다른 관할의 소송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 관할 중 영국이 포함되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다른 국가 관할의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유럽 각국의 소송과정의 심리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 어떤 국가에서는, 법원은 직권주의에 근거하여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인에게 판사가 직접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경우도 있음. 양 당사자는 심리 전에 증거와 주장을 모두 다 제출하고 정작 심리는 하루 정도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영국의 심리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는 판사에게 사건이 제시되는 방향을 거의 대부분 조절하게 됨. 양 당사자는 각각의 감정인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은 감정인을 반대심문함. 이 제도는 유연성이 큰 편이며,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심리는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함. 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가 몇 주정도 걸리기도 하며, 그 대부분의 시간은 감정인의 반대 심문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음.
영국에서의 소송은, 최고의 감정인을 찾아 의뢰하는 것이 승소하는 데 매우 중요함. 감정인은 필요한 전문성 및 소속 당사자 측을 지지하는 입장과 의견을 가져야 함은 물론, 질문에 대하여 확신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법원에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함.
2003년 4월, 영국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특허 소송 진행을 목적으로 약식 소송 절차가 도입됨. 약식 소송 절차는 사건의 양 당사자의 합의하거나 법원이 명령하는 경우 적용. 사건이 약식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법원은 하기 사항을 명령.
- 모든 사실 증거 및 감정 증거는 문서로 제출되고 특정 주제 외에는 반대 심문이 제한됨.
- 실험을 하지 아니하며, 증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 심리는 6개월 이내에 열리며, 하루 정도 심리하게 됨.
영국의 약식 특허 소송절차는 복잡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매우 효과적임. 영국의 특허 법원 판사들은 고액의 복잡한 소송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합리적인 약식 소송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스페인의 심리 절차에 있어서는,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피고는 업무일 기준으로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피고의 답변서는 감정보고서를 포함하거나 예비심리 직전까지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언급을 포함하여야 함. 더욱이, 스페인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최초 준비서면에 사실관계 및 법률적 주장을 모두 다 포함하여야 함. 유일한 예외는 다음 기일에 추가 주장을 허용한다는 점.
특허 침해 소송에서 구할 수 있는 주요 조치의 종류는 금지처분(injunction), 손해배상(damage), 및 비용청구(cost).
유럽의 모든 법원은 각 관할권 내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명령은 심리 전에 허여 되면 임시처분(가처분 : interim or preliminary)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안 판결에 의한 최종처분(final) 일 수 있는 것.
금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처벌은 대게 벌금이다. 금지 처분 명령을 위한 경우의 가장 심한 처벌은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서 무제한 벌금 및/또는 회사의 자산 압류 등.
영국에서는, 특허권자나 전용(독점) 실시권자가 침해자에게 본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침해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침해의 우려를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가처분은 침해가 인정되거나 침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2달 정도 후에 결정됨.
가처분을 결정하는데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가처분을 심리할만한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
- 가처분 없이 본안 심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가 손해배상으로 구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
- 가처분이 결정되었을 때 피고가 받게 되는 피해, 또는 가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원고가 받게 되는 부담의 피해의 정도
- 양 당사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결정하지 않음.
-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가능성 여부 사안의 긴급성 또는 비밀유지성과 같은 상황의 현안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일방 결정(ex parte)으로 내릴 수도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특허권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권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구하여 손해 배상 소송 중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의 충분한 근거가 됨. 네덜란드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긴급사안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가처분 신청인은 사안의 긴급성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이론적으로는, 가처분을 일방 결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임.
프랑스의 경우, 본안 소송 청구 전에 승소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가처분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또는 31일(달력일 기준) 이내로 실질적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가처분은 침해자 및 침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개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예측가능한 미래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행위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음.
독일은 특허권자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권자에게 가처분 신청의 권한을 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의 충분한 근거가 됨. 그러나, 신청인이 침해 행위를 알게 된 직후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독일 법원은 이 기간을 4주 이상 허용하지 아니함.
독일에서는, 유효한 특허임과 동시에 침해되었음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와 같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가처분 결정을 함. 가처분 심리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허만료가 가까워 왔다거나 침해한 제품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제공되었거나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처분 심리는 열리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히 특허권자나 사용권자가 일방 결정의 가처분을 신청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방어적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방어적 의견서는 잠재적 피신청인이 미리 가처분의 방어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어 법원으로 하여금 구두 심리 없이 가처분을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됨.
이탈리아에서는, 특허권자, 전용(독점)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통상(비독점) 실시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가처분 결정의 요건은, 사안의 긴급성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입증.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과 침해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요약을 제출하여야 함.
스페인에서의 가처분은, 특허권자 또는 독점실시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 가처분 신청은 침해가 임박했음을 입증하면 침해 전에도 가능함. 가처분 결정을 하기 위하여 스페인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사안의 긴급성, 특허권자 승소가능성 및 특허의 권리 활용.
스페인에서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침해의 본안 소송과 함께 청구되며,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 물론,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이 매우 긴급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본안 소송 절차 이전에 신청할 수 있기는 함. 본안 소송이 먼저 청구되는 경우, 가처분은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에 근거하여야만 선청이 가능함.
가처분 신청인이, 사안이 매우 긴급하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구두 심리로 인한 지연이 가처분의 효과에 큰 타격을 주게 됨을 소명하는 경우, 스페인 법원은 일방 결정에 의해 가처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
유럽 내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그중 하나의 경우가 국경 간 금지명령으로서, 유럽 내 몇 개의 특정 국내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 역사적으로 네덜란드 및 독일과 같은 국가의 국내 법원은, 다른 관할 법원보다 이러한 결정을 많이 처리해 옴. 하지만, “GAT/LUK” 및 “Roche/Primus” 케이스에서의 결정은, 이러한 국경 간 금지명령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됨. “GAT/LUK”케이스에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브뤼셀 규정에 규정된 바의 특허 유효성과 관련한 특별 관할권은 해당 유효성 이슈가 제기된 어떠한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즉, 특허의 유효성 문제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원에 전속된다는 의미함. 그러므로, 무효 주장에 기초하는 침해소송의 방어는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원에서만 다툴 수가 있음.
“Roche/Primus” 케이스에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피고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브뤼셀 규정에 따라 한⋅EU 국가에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에 대해 단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국경 간 금지명령은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가능한데, 네덜란드 피고를 상대로 하는 임시 구제 조치(Interim Relief) 절차 및 유무효가 쟁점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가능함. 네덜란드에서의 특허 침해소송 중 중 특허의 무효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네덜란드 법원은 원고에게 다른 협약국에서 먼저 무효 판단을 받을 때까지 절차를 중지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이 경우 원고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네덜란드 법원은 국경 간 금지명령을 결정하지 않음. 피고가 브뤼셀 규정의 협약국이 아닌 국가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국경 간 금지명령은 여전히 가능함.
국내 법원들은, 비록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의 무효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의 특허의 패밀리 특허의 침해소송을 다룸. 이 경우, 국내 법원은 자신이 다루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개시되고 동일한 당사자에 의해 “동일한” 특허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자신이 다루는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없음.
그러나 독일 법원이 독일에 등록된 유럽특허의 침해문제를 다투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네덜란드 법원이 동일한 유럽특허의 네덜란드 등록특허의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서로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없음. 왜냐면, 유럽 특허는 공고 후 각국의 특허로 등록되면 모두 다 다른 특허로 간주되기 때문임. 반면, 독일 법원이 동일한 유럽특허로부터 유래된 독일 등록 특허 및 네덜란드 등록 특허와 관련한 침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우, 네덜란드 법원은 동일한 유럽특허로부터 유래된 네덜란드 등록 특허와 관련한 침해사건을 다룰 수가 없음. 이미 네덜란드 등록 특허는 독일 법원에서 독일 등록 특허와 함께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임. 이 경우, 네덜란드 법원은 브뤼셀 조약에 따라, 해당 네덜란드 등록 특허의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관할을 거절하고, 미리 진행된 독일 법원으로 하여금 네덜란드 등록특허(와 독일 등록특허)의 침해 이슈를 결정토록 하여야 함.
다소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국가에서 같은 특허의 침해사건을 다루는 절차가 시작된다면, 다른 국가에서의 동일한 특허의(동일한 당사자간의) 침해 판단 절차를 막을 수 있다는 점.
토피도(Torpedo) 전략은 특허권자가 소송 절차가 빠른 국가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침해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절차가 느린 국가(예를 들어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 전략은 침해자가 브뤼셀 규정을 이용하여 소송절차가 빠른 국가의 법원에서 침해 이슈를 다루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과거에는, 침해자는 토피도 전략을 이탈리아 또는 벨기에 법원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이젠 동유럽 국가에서의 국경 간 효과를 가지는 비침해 확인의 소가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2004년 5월 1일, 10개의 새로운 국가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었고, 2007년 1월 1일 자로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에 조인하여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모두 28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였던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음.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법원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단 한 개의 특허침해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뤼셀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이들 국가에도 적용됨. 따라서, 이제 국경 간 금지명령 절차들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인 토피도 역시 새로운 가능성과 문제점이 상존.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새로운 유럽연합국에서 제기되는 국경 간 금지 명령 절차는 다른 유럽연합국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 소송을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것.
하지만, 유럽 특허권자들에게 브뤼셀 규정의 확대로 인한 장점도 발생될 것. 이제까지는, 이들 동유럽 국가에서의 절차의 지연 및 지재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인하여, 유럽 특허권자들은 이들 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을 꺼려 왔음. 하지만, 현재 이들 국가들은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브뤼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유럽 국가에 의한 국경 간 금지 명령 절차에 의해 이들 동유럽 국가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짐. 따라서, 네덜란드에서와 같은 국경 간 금지 절차는 더욱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정립됨. 그러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름. 일반적으로는, 해당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게 될 로열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결정됨.
손해배상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며, 감정인은 제조된 침해품의 개수(또는 수입된 개수), 판매개수 및 매출액 등을 결정. 특허권자가 특허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감정인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양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준하여 추정. 로열티 비율은 특허가 커버하는 기술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율로 산정하며, 법원은 침해가 없었으면 권리자가 더 높게 책정했을 거라는 가정을 근거로 감정인이 산정한 로열티 비율을 종종 증가시킴.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감정인은 침해자에 의한 총판매액을 특허권자가 손해 본 판매액으로 보고, 침해가 없었을 경우 특허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금액을 계산.
영국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익의 손해라는 관점에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피고(침해자)의 침해 판매로 인하여 자신의 판매가 줄어 손해를 봤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로열티 추정 방식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 판매 손해는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제조할 수 있었던 모든 제품의 판매를 포함. 영국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배상액은 비교적 큰 편.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법원은 피고에서 자신의 침해행위로 얻게 된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독일의 경우, 과거에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해당 발명을 사용했을 때 지불했어야 하는 로열티를 기준으로 하였음. 또 다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인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로열티 기준의 산정방법에 비해 덜 채택되어 왔으나, “Gemeinkostenanteil [2000]”케이스에 의해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수정됨. 이 사건에 따르면 침해자는 이익에서 침해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경상비를 제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액 산정을 로열티 산정을 기준으로 할 건지, 또는 침해자의 이익 관점을 기준으로 할 건지 결정하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함.
프랑스에서는, 특허권자는 특허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손해 본 매출을 커버하도록 산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로열티 기준으로 산정. 로열티 금액은 해당 특허의 기술분야에서 보통 적용되는 로열티 율을 기준으로 하며, 약 3% 정도 증액됨. 법 2007-1544 EU 집행지침의 시행규칙에 의해 동 지침의 제13조의 내용을 프랑스 산업재산권법에 도입면서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도 둠.
이탈리아의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전통적으로 특허권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해왔지만, 최근 이탈리아 법원들은,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 또는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로열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절한 로열티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임.
스페인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상의 로열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게 된 이익, 또는 침해자와 경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얻었을 수 있는 특허권자의 이익에 따라 손해 배상액이 산정. 마찬가지로 집행지침의 시행규칙에 의해 원고는 손해배상의 보상으로서, 침해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주장할 수 있음.
손해배상은 대게 별도의 심리절차에서 다루어지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엔 별도의 심리절차를 통하되 반드시 손해 배상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유럽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음(treble).
각자 다른 유럽 국가들의 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에 대한 실체법과 또 각자 다른 법원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띰. 유럽의 특허 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어떤 국가의 법원에 사건을 진행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하며, 승소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함. 또한 사건이 점차 진행함에 따라 전략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검토되어야 함.
토피도(Torpedo:어뢰) 전략이란 침해 혐의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소송진행이 느린 EP 회원국의 법원에 해당국 로컬 특허 뿐만 아니라 EP 내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 비침해 확인 소송을 청구하여 EU 내의 법원 관할을 지배하는 “the rules of lis pendens 소송고지원칙”에 의해 EU 내의 다른 국가에서 특허권자에 의한 침해소송 청구를 막거나 특허권자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절차를 유예하도록 하는 것.
유럽 소송제도에서 ‘토피도(Torpedos)’ 사용이 이슈화 된 것은 1978년에 시작된 유럽 특허제도 때문임. 유럽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에 의해 부여됨. 특허가 부여된 후에 유럽 특허는 현지 공식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국가에서 개별 국가 특허권으로 전환.
유럽특허조약(EPC)의 가맹국이 되려면 각 국가는 자국의 특허법을 여러 면에서 통일(harmonise) 시켜야.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유럽 특허의 효력(validity)은 이론상 모든 EPC 국가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 또한 침해에 대한 판단도 모든 EPC 국가에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 심지어 클레임 해석에 대한 기본 개념마저도 EPC 국가마다 다르게 취급됨.
유럽의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의 또 다른 근거는, “민사 및 상사 문제에 있어서 관할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브뤼셀 협약”(‘the 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브뤼셀 규정’).
이 규정의 취지는 EU 회원 국가들 내의 소송에서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제한하고 동일 문제에 대한 중복 소송을 방지하자는 것. ‘포럼 쇼핑’은 특허권자가 소송이 가능한 여러 국가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
브뤼셀 규정에서는 민사 소송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본 문서는 주로 특허소송문제에 중점을 두어 설명함.
브뤼셀 규정 2(1) 조는 “특허권자는 비록 소송을 유발하는 행위가 EU 국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본국이 EU 회원국일 경우에는 피고의 본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그러나, 상기 규정 2(1)와 택일적으로 적용되는 브뤼셀 규정 5(3) 조는, 그 행위가 발생한 EU 국가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서로 다른 EU 국가에서 다수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브뤼셀 규정 6(b) 조는 소송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어 ‘모순된 판결(irreconcilable judgments)”이 내려질 위험이 있을 경우, 다수 국가에서 활동하는(acting) 다수 피고들을 상대로 단일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브뤼셀 규정 21조에 따르면, EU의 한 국가 내 법원에 공식적인 법정소송에 의해 분쟁이 맨 먼저 제기된 경우, EU 내의 다른 모든 관할권에서는 첫 번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심리를 거절해야 함. 이 규정이 분쟁 중인 특허의 무효와 관련된 모든 심리(예를 들면, 침해주장에 대응하여 해당 침해소송에서 무효특허임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특허의 무효를 다루는 소(예를 들어 특허무효소송)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일부 논쟁이 있음.
‘Cross Border Injunction 전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금지명령’ 개념은 바로 이러한 근거 위에서 비롯된 것. “Cross Border Injunction”이란 한 국가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도 금지명령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 IP소송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러한 금지명령이 네덜란드와 독일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됨. 이 경우 특정 법원에서 동일 유럽 특허가 등록된 모든 EU 국가에 적용되는 특허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음. 네덜란드와 독일이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국가에서 Cross Border Injunction 개념을 잘 수용하였고, 동시에 이 두 국가의 소송제도가 가금지명령(interim injunction)을 비교적 신속하게 허용하는 편이었기 때문임. Cross Border Injunction이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한 특허권자는 EU 내의 침해 혐의자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됨.
하지만, 다른 많은 EU 국가의 법원은 특허 분쟁과 관련한 Cross Border Injunction에 있어서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의 실례를 따르지 않았음. 특히 영국 법원은 Cross Border Injunction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아니하였으며, 특허의 무효가 쟁점인 특허분쟁일 경우에는 injunction을 허가하지 않았음.
특히, 브뤼셀 규정 22(4) 조에서는 EU 회원 국가 내에서의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허권의 효력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정에 유보해 주고 있음. 따라서 예를 들어 유럽 특허의 영국 부분은 오직 영국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원이 결정한 매우 빠른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수많은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특허 침해자들은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을 개발.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으로 인하여 피고는 합법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음. 그 근거는 브뤼셀 규정 27조로서, EP 특허에 대해 비슷한 조치가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시작되었을 경우, 어떠한 EU 관할권에서도 동일한 EP 특허와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규정함.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침해 혐의자는 소송진행이 상대적으로 늦은 사법시스템(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벨기에 법원)에 비침해 확인소송(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을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처음에 소송이 접수된(예를 들면, 이탈리아) 법원을 제외한 EU 내의 다른 법원들은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절차를 모두 유예해야 함. 결국 특허권자는 첫 번째 사건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다른 EU 국가에서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벨기에와 이탈리아 법원의 경우 특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보통 수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존속기간의 상당한 부분이 잠식되는 셈.
잠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또 다른 지연책은 유럽특허청의 특허부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이의신청과 이의신청불복절차는 그 자체만도 5년 정도 걸리며, 종종 그 이상 소요. 따라서 EPO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비침해 확인소송을 시작하면 특허권자는 수년 동안 꼼짝 못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
물론, 특허권자들이 이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한 브뤼셀 규정에 따른 절차도 있음. 벨기에 법원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걸 꺼려하여, 침해 혐의자가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피도(Torpedos)’전략은 피고에게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무기.
이 ‘토피도(Torpedos)’전략의 위력은 타이밍에 크게 의존. 피고는 유럽 특허 부여 이후 9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그리고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당해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declaration)을 청구해야 함.
결국, 포럼 쇼핑을 제한하려는 브뤼셀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부 벌이지고 있음. 특허권자는 여러 EU 국가에 효력이 발행하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속하게 판단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독일) 법원을 물색하게 될 것이고, 잠재 피고는 EPO에서 이 특허를 무효화할 방법을 찾으면서 이 특허와 관련해서 시간을 길게 끌(예를 들어, 이탈리아나 벨기에)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려 할 것. 잠재 피고가 어떤 국가의 법원에 해당 EP 특허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특허권에 대하여 비침해 확인소송을 청구함으로써, 특허권자는 EU 내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이러한 ‘포럼 쇼핑’은 최근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이하 CJEU)에서 내린 판결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 GAT-v-LuK 사건과 Roche-v-Primus 사건인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브뤼셀 규정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 이 사건들은 ‘토피도(Torpedos)’ 문제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토피도 전략 (Torpedos strategy)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가) 이러한 최근 CJEU 결정에 따라, 이제는 EU 회원국의 법원이 EP 특허와 관련해서 전유럽에 미치는 관할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듦.
① 브뤼셀 규정 제2조(침해장소가 아니라 피고 주소지에서의 고소)
한 네덜란드 회사가 EP 특허의 네덜란드, 스위스 및 프랑스 특허에 대한 침해로 네덜란드 법원에 피고가 된 경우, Cross Border 구제책이 가능하려면 특허의 효력이 문제시되지 않아야만 함. 만약에 특허의 유무효가 소송의 방어방법의 일부로 제기되고 있으면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 특허와 스위스 특허의 침해/효력만을 검토할 것. 그 이유는 스위스는 EU 회원국가가 아니어서 브뤼셀 규정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임.
②브뤼셀 규정 제5조(침해 장소에서의 고소)
EP 특허의 네덜란드와 영국 부분 침해 문제로 영국 회사와 한국회사가 네덜란드 법원에서 피고가 된 경우, Cross Border 구제책이 불가능함.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네덜란드 특허와 관련해서만 두 회사를 상대로 침해 사건을 심리할 것.
③ 브뤼셀 규정 제6조(다수 피고들 중 한 사람의 거주지에서의 고소)
영국 회사, 네덜란드 회사, 한국 회사가 EP 특허의 네덜란드와 영국 부분 침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법원에서 피고가 된 경우. Cross Border 구제책이 불가능
네덜란드 법원은 네덜란드 특허에 대해서만, 그리고 네덜란드회사와 브뤼셀 규정에 들지 않는 회사들, 곧 한국 회사에 대해서만 침해 사건을 심리할 것.
(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피도(Torpedos)’ 역시 마찬가지의 한계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음. 이론적으로, 특허의 무효여부가 문제시된다면, 이탈리아 법원에 제출된 토피도(Torpedos) 때문에 특허권자가 차후에 다른 EU 관할권에 제기한 사건이 더 이상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실제 케이스가 아직 없으므로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많은 유럽 국가들이 EU에 새로 가입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의 법원의 태도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두 판례의 영향이 EU국가들의 법원에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현재로서는 관망할 수밖에 없음. 이미 독일의 경우 침해 문제를 심리하는 지역 법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있긴 함. 어떻든 간에, Cross Border Injunction과 토피도 전략(Torpedos strategy)이 예전과는 달리 더 많이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은 함.
(다) CJEU 결정들과 브뤼셀 규정은 공동 침해(joint infringement)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공동침해(joint infringement)는(예를 들어) 모회사의 “지원 support”을 받은 현지 자회사들이(하나의 공통된 목표에 따라 행동하면서) EU 회원국의 어떠한 국가에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를 말함. 영국 법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공동불법행위(joint tortfeasorship)’라고 칭함. 모든 국가의 법원들은 ‘지원활동’으로 간주되는 지원 수준에 대해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EU로 수출하는 국내 회사들은, 이론 상, 현지 자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활동” 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공동침해로 제소당하는 것을 상당 수준 피할 수 있음.
유럽 특허청(EPO)에서 등록된 유럽특허(EP)는 번역문 제출 등으로 유효하게 진입된 각 가맹국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특허의 집합으로서, 등록 이후 독점적 권리의 행사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은 각 국가의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는 침해 판단과 유무효 판단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기타 국가, 특히 독일의 경우는 유무효와 침해를 분리하여 판단.
EPC는 EP의 특허성 판단이나 침해 판단에 대한 실체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법원의 유무효 판단이나 침해 판단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특허조약(EPC)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프로토콜(Protocol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9 EPC)에 의해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통일화된 지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 적용법률에 대한 해석 등에 있어서 각 국가 관할 법원들 간의 판단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 이러한 각국법원의 판단의 차이는 결국 유럽 내 다국적 특허 소송에 있어 침해용의자나 특허권자에게 각자에 유리한 법원을 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만연하게 함.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등은 사법구조가 civil law 시스템으로서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영국은 common law 시스템을 채택하여 판례법 체계를 따르고 있음.
영국 법원은 침해 판단과 특허성 판단을 같이 다루고 있으며, EPO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전문 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전문가 감정서를 자주 사용하며,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도 자유롭게 허용되며, 디스클로져(disclosure) 절차, 즉, 증거조사 절차가 마련. 소송진행은 매우 빠른 편, 비용은 상당히 비쌈. 특허의 무효 판결을 많이 생산해 왔으며, 따라서 주로 침해 용의자에 대해 우호 한 법원으로 알려짐.
독일의 경우, 무효만을 판단하는 전문 법원을 두고 있으며, EPO 이의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절차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음. 전문 감정은 법원의 판단하에서 법원이 지정하여 이루어지며, 반대 심문 절차는 허용되지 않음. 절차 진행은 사건과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 법원은, 침해 문제와 특허성에 대해서 함께 판단을 하며, 1심 법원의 판결내용이 항소법원에서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음. 반대심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2009년 말부터 모든 특허소송은 파리 법원에서만 다루게 됨.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편.
한때 국경 간 금지 명령(cross border injunction)을 얻는 게 용이했던 네덜란드 법원은, 특허 문제에 대한 전문 법원을 운용하여 침해문제 및 특허성을 함께 판단, 항고심(2심)이 매우 느리게 진행. 전문 감정절차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반대 심문 절차는 매우 드물게 허용.
각국 법원의 절차의 차이 및 구제수단의 차이로 인한 포럼 쇼핑의 중요성은 특히 절차 진행 속도의 차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진행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특히 토피도 전략이라고 함.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특허 소송절차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탈리안 토피도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많음.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판결의 자유로운 유통 또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독(이하 “독일”이라 함), 이탈리아 및 프랑스 등 당시 유럽공동체의 6개 회원국은 1968년 9월 27일 브뤼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1973년 2월 1일 발효. 브뤼셀협약은 국제관할과,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중협약’(convention double)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유럽 연합 국제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규범. 브뤼셀협약은 영국 등의 가입을 계기로 1978년 가입 협약에 의하여 개정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정.
브뤼셀협약의 체약국들은 암스테르담조약이 1999년 5월 1일 발효된 뒤 브뤼셀협약의 법형식을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Rè glement du Conseil, Verordnung des Rates)으로 전환하여 브뤼셀 규정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2002년 3월 1일 발효.
브뤼셀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럽의 각 나라가 자국의 영토에서 고유한 관할권을 가지나 복수개의 국가 내에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복수개의 개별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브뤼셀 규정에 따라 ⅰ) 회원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법원에 보통 재판적(브뤼셀 규정 제2조)이 인정되고, ⅱ)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브뤼셀 규정 제5조(3))및 청구의 병합에 의한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브뤼셀 규정 제6조)이 인정되며, ⅲ) 특허 등록 또는 유효성과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등록 등이 이루어지는 회원국 법원에 배타적 관할권(브뤼셀 규정 제22조)이 인정.
특히, 브뤼셀 규정 제27조는 소송의 원인과 당사자가 동일한 절차가 각기 상이한 회원국에 제기되었을 때, 최초로 소가 제기된 법원의 관할이 입증될 때까지 다른 법원은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최초로 소가 제기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원에 우선하여 관할을 주장할 수 없음을 규정함. 판례에 따르면, 침해소송과 비침해 확인의 청구는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소송의 원인이 동일함.
결국, 이러한 브뤼셀 규정에 따라, 유럽 내 다국가 특허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원고 피고가 동일인이고 같은 특허에 근거한 침해 소송과 비침해 확인소송, 그리고 무효소송의 진행은, 피고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법원 및/또는 진행이 늦은 법원에 비침해 확인 소송 또는 무효 소송 절차를 먼저 제기하려는 전략(토피도)과 원고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법원 및/또는 진행이 빠른 법원에 침해 소송을 먼저 제기하려는 전략이 맞서게 되는 포럼 쇼핑이 만연하게 됨.
2006년의 Roche-v-Primus 사건은 피고들 사이의 연관성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브뤼셀 규정에 따라 한 EU 국가에서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에 대해 단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에서 CJEU는 ‘연관성’이 성립되려면 별개의 조치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올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동일한 그룹에 속하는 회사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통해서 어떤 특허를 침해할 경우 ‘모순된 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CJEU가 확인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EU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각의 침해 행위는 그 사건의 각각의 공과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함. 결국, CJEU의 판결은, 서로 다른 EU 국가에서 행동하는 다수 피고들을 한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처음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국가의 법원은 기다리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며 결국 Cross Border Injunction과 ‘토피도(Torpedos)’의 위력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됨.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CJEU)는 2012년 7 월 12 일 유럽 특허를 기반으로 각 EU 회원국의 복수국 특허 침해에 대한 국경 간 임시 명령에 관하여, 브뤼셀 규정을 새롭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림(C-616/10).
이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진행 중인 Solvay v Honeywell 사건에서, 헤이그 법원이 CJEU에 회부한 질의(reference for preliminay ruling)에 대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judge)의 형태로 판시한 것, 결국 일정한 요건(동일특허, 동일침해행위, 개별국 별도 제소 등)을 갖추는 경우 국경 간 임시 명령이 가능, 따라서 포럼 쇼핑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법 해석을 남겼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유럽연합의 개별 소송 시스템과 다국적 소송에 있어서의 국경 간 조치 절차에 기인하는 포럼쇼핑의 미래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설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유럽 통합특허법원 설치는 곧 유럽 특허 소송의 통일화를 가져오게 되며, 관할 통일 및 집행 통일이 완성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포럼쇼핑의 원천적 폐기를 가져오기 때문임.
한편, EU의 회원국 중 동유럽 국가들은 또 다른 포럼 쇼핑의 기회가 됨. 브뤼셀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이들 국가에도 적용. 포럼쇼핑의 가장 근본적 전략 방안인 토피도의 새로운 가능성이 이들 국가에 존재함.
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새로운 유럽연합국에서 제기되는 국경 간 금지 명령 절차는 다른 유럽연합국에서 진행되는 특허 침해 소송을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수준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을 것임.
EU 규정에 의한 세관조치는 Council Regulation(EC) No 1383/2003(이하 “EU 세관조치규정”이라 함)를 근거로 함.
1998년 위조상품 수입에 대한 국경 단속제도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 1994년 WTO/TRIPs 협정의 발효에 따라 국경조치가 가능한 대상 권리를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디자인권, 특허권으로 확대. 이후 이 1994년 규정을 강화하여 대체하는 EU규정을 제정한 것이 현행의 EU 세관조치규정함. 현행의 EU 세관조치규정은 그 시행을 위하여 Commission Regulation(EC) No 1891/2004) (이하 “EU 세관조치규칙”이라 함)의 적용을 받음.
*출처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EU 세관조치규정 자세히 보기:
https://www.gov.uk/guidance/standard-essential-patents-seps-explained
EU 세관조치규정에 따라 세관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상표를 모방한 모조품(counterfeit goods), 저작권(copyright), 저작인접권(related right)이나 디자인권의 허락 없이 복제된 해적판(pirated goods), 특허, 식물품종권(plant variety right),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원산지 명칭(designation of origin)을 침해하는 침해품 등을 대상으로 함. 1994년 규정에 비하여 식물품종권,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도 단속대상에 포함한 것.
개인 휴대품이라도 대량의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와 압수가 가능함. 물품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침해물품 폐기가 가능함.
세관조치는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권리자에게 침해여부 확인절차를 개시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 세관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후에 판단된 경우, 권리자는 그 세관조치로 인하여 발생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세관조치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할 수도 있으며, 권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직권단속이 가능함.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경우, 권리자에게 수출입 신고 사실을 통지하고 3 업무일 동안은 통관을 보류. 권리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한 제품에 대하여 이 기간 내에 세관조치 신청을 할 수 있음. 만약 이 기간 내에 권리자의 세관조치 신청이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해제.
세관조치 신청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각 회원국의 세관이 정하는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회원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음. 세관조치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음.
신청서에는 세관이 해당 상품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 상품의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 ⓑ기만행위의 유형이나 패턴에 관해 권리자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 권리자가 지정한 연락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그리고, 해당 상품에 관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디자인/상표 등의 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의 허여 여부를 30 업무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신청서를 허여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권리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신청에 의하여도 신청을 허여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통관 보류는 해제.
신청을 허여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세관은 그 사본을 회원국의 관세청에 통지하고, 권리자에게는 해당물품의 통관보류 유지를 통지.
통관보류를 유지하는 기간은, 신청서 허여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못함. 즉, 세관조치가 신청된 후 1년간은 해당 물품이 통관되는지를 세관에서 감시하게 되는 것. 다만, 이 기간 만료 전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만료 후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직권조치에서 세관은 통관을 보류한 물품의 수량과 성질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
신청에 의한 세관조치에서 통관보류 유지 중인 물품이 세관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해당 세관은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통관 보류 사실을 해당 신청서를 처리한 관세청에 즉시 통지. 세관은 권리자 및 소유자에게 세관조치 사실을 통지하고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권리자는 통관보류 중인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검사는 침해여부 확인의 목적으로만 할 수 있음. 아울러 권리자는 통관 보류 중인 물품의 견본을 입수할 수 있고, 이는 기술적 분석 등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통관 보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세관에 반환하여야 함.
통관보류 중인 물품이 실제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이라도, 권리자와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간이 신속한 폐기처분이 가능함.
간이처분을 위해서 권리자가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날(기준통지일)로부터 10 업무일(10일 연장 가능; 부패 염려가 있는 물품은 3 업무일로서 연장불가) 이내에 통관보류 중인 물품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해당 세관에 통지하여야 함.
아울러, 해당 물품을 폐기하도록 물품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물품 통관신고자/소유자/보유자의 동의서를 권리자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신고자,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물품의 폐기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봄.
간이절차에 따른 폐기비용은 권리자가 부담. 다만 회원국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견본보관: 후일 법률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견본을 보관.
통관보류 중인 물품의 권리 침해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유치되어 있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 예를 들어 프랑스인 권리자가 프랑스 관세청에 세관조치를 신청하여 침해의심물품이 독일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권리자의 권리 침해여부는 독일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
세관의 통관보류는 침해를 확인하는 의미라기보다는, 권리자에게 침해확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 따라서, 간이 처리 절차에 따르지 않고 물품의 통관 보류 상태를 유지하거나 종국적으로 폐기하기 위하여는,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품임을 법원의 확인절차를 기준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이러한 기간 이내에 법원의 확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세관이 통지받지 못하면 세관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를 해제하게 됨. 또한, 권리자가 간이처리 절차를 취한 경우라도,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자나 수입신고자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를 해제하게 됨.
침해여부 확인 절차가 법원에 제소된 경우라도, 법원이 금지 처분 등 중간 조치 명령을 발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보증을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이때 보증은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어야 함.
침해여부 확인 절차에서 침해가 아닌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통관 보류를 해제할 수 있음.
간이절차에 의하여 즉, 권리자 및 소유자의 폐기 동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법원의 침해 판결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폐기. 폐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 폐기 시에는 향후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견본을 채취하여 보관.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폐기를 위한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EU는 담보 없이 권리자의 보증만으로 통관 보류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폐기를 위한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EU는 지적재산권 침해우려 물품의 신고자 및 보유자의 동의가 있을 시 신고를 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을 폐기할 수 있음.
권리자의 조치 요청 신청서(application for action) 작성, 조치 요청 신청은 각 EU 회원국의 세관 당국의 EDI(Electro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이 있을 경우, 컴퓨터로 작성.
회원국은 조치요청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세관조치 요청의 취하 시 혹은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하여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세관의 물품보관과 폐기 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과 모든 회원국에 이 요청서를 접수할 경우의 번역비도 권리자가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포함. 보증금 제도는 시행하지 아니함. 이 요청 신청서는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매년 연장될 수 있음.
해당 세관부서 혹은 세관은 이 사실을 권리자와 신고자 혹은 물품소지자에게 알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통관보류 및 압류된 물품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 권리자 혹은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세관은 물품의 샘플을 제공하고 이 샘플은 물품의 통관보류나 압류가 끝나기 전에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반환해야 함.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없이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는 것.
권리자는 침해물품의 신고자 혹은 보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10 일 내에 해당 부서에 지적재산권 침해사실을 알림. 권리자가 이 물품의 폐기를 원할 경우의 모든 책임과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하며 이의신청에 대비하여 증명용 샘플을 남겨둠.
세관은 물품의 통관보류 및 압류의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린 후 10 일 이내에 침해 사실에 대한 법적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공지나 폐기에 대한 아무런 서면신청이 없을 시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최대 10일 연장이 가능함.
a) 주로 폐기처분하고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상업적으로 처분하여 국고에 귀속함.
b) 해당 기관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물품거래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빼앗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c)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추징금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음.
위조상품(위조품, counterfeit, fake, Copy)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생산자가 아닌 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써, 모조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함. 위조품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침해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주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서 위조행위가 이루어짐. 그중 특히 상표는 개발 단계와 선전기간을 거쳐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탄탄한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마케팅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권리 없는 제삼자가 아무런 노력이나 사용대가도 없이 그 상표의 유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임.
위조품 시장은 끊임없는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인터넷 상거래의 발달 등에 의해 시장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위조품 생산국가의 기술의 발달로 용이하게 진정상품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
위조품의 대상은 주로 고급 패션 또는 주얼리 브랜드의 유명 상품이었으나, 최근엔 담배, 의약품, 휴대전화, 반도체(메모리 카드) 등 모든 분야의 유명 상품으로 확대됨.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는 진정 상품 권리자의 상업적 손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 손실 및 비즈니스 기회의 상실에도 미치며, 소비자의 경우 품질의 열화로 인한 불 측의 위해를 입을 수도 있고, 위조품 제조 유통에 있어서의 탈세 등은 국가에 대한 큰 손실이 됨.
위조품 제조 유통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기업화가 되어 있으며, 위조품 제조 유통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위조품 제조 유통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어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 특히, 위조품 제조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가 바로 이러한 국가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임.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으로, 이들의 총 GDP의 합은 16조 달러(2022년 현재)이고,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GDP 규모는 인해 GDP가 감소함. 2020년 현재 GDP 규모는 동북아, 북미, 유럽순이며, 2021년에 중국에 GDP를 추월당함.
유럽 유럽의 세관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된 지적재산권의 건수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압류 물품 역시 그 규모가 계속 늘어감.
또한, 위조품의 출처(선적국)는, 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타이완, 터키 이집트 등으로서, 2009년도에 유럽연합의 세관조치에 의해 압류된 물품의 2/3가 중국에서 선적된 것.
유럽연합의 세관조치 규정에 의해 압류된 물품과 관련한 지재권의 종류는 상표가 90.1%로서 압도적으로 많고 특허가 5%, 저작권이 3.6%, 디자인권이 1.3%.
압류된 물품 1건당 행사된 권리의 유형을 보면, 상표권이 55%이고, 특허권이 43%. 이는 곧 상표권의 행사 의해 세관조치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특허권 또한 상표권과 함께 위조품을 단속하는 권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차후 손해 배상 등에서 상표권에 비하여 유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EU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유래 국가로는 중국, 홍콩, 튀르키예 공화국 3개 국가가 위조상품의 거의 90%를 차지. 위조상품의 상위 품목은 의복(29%), 시계(11%), 기계 및 기계 도구(3%), 가죽제품(7%), 전기 기계 및 전자제품(3%)이며, EU의 세관 압수 상품 50% 이상은 미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E 다음으로 스위스, 프랑스, 영국이 위조상품의 주요 피해국가임.
*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OECD/EUIPO의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상품 불법거래위험’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결국 EU 세관조치 규정은 EU 내외의 경계에서 시행되며, 위조품이 일단 EU 내로 들어오면 EU 내에서는 세관 검열 없이 자유롭게 유통. 따라서, EU 내에 들어온 위조품은 각국 지재권을 바탕으로 민사 조치 또는 형사 제재로 대응하게 됨.
유럽 연합에서의 위조품 대책은 크게 예방부문과 법적 조치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 예방에 있어서는 필요한 유럽연합 내 국가에 지재권을 취득하여 세관에 등록신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조치에 있어서는 행정조치(세관조치), 민사소송 및/또는 형사재판을 실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유럽 연합에서의 위조품 대책은 크게 예방부문과 법적 조치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 예방에 있어서는 필요한 유럽연합 내 국가에 지재권을 취득하여 세관에 등록신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조치에 있어서는 행정조치(세관조치), 민사소송 및/또는 형사재판을 실행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위조품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업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유리한 것은 당연. 위조품 예방은 단순히 보호대상과 관련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필요한 유럽 내 국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님. 위험한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사업결정을 하는 경우, 위조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수단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운용하는 사안에 대한 고려 및 법적 수단에 대한 고려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표 9] 위조품 예방 전략을 위한 고려사항 | |
|---|---|
| 구분 | 상세 내용 |
| 전략적 요소 |
- 위조품의 리스크가 높은 시장에서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선택적 특정을 함. - 최종 제품이 위험 시장을 통과하는 것을 되도록 회피함. - 연구 개발 부서를 위험 국가에 두지 아니함. - 위조를 위한 분석이 어려운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방지함. - 제품의 부품 공급자를 가능한 분산시킴. - 최종 제품을 자국 내에서 조립함. - 중요한 부품 공급자를 확보하여 둠. - 제품 개발에 관한 모든 요소(개발계획서, 도면, 주요 엔지니어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 - 제품 및 제품 포장의 핵심 요소를 정기적으로 변경. - 제품 및 제품 포장에 고유의 각인을 만들어 둠. |
| 운용적 요소 |
- 거래 상대 또는 하청업체의 선택에 있어서, 문제 해결능력 및 신의를 검증. - 거래 상대 또는 하청업체를 직접 컨택하고 제조 및 판매 현장을 자주 방문. - 제품 제조와 제품 포장 제조 사이의 유효성을 확인. - 원자재/원재료의 수량과 최종 제품 간의 관계를 제어. - 거래 상대 또는 하청업체로부터 제조 공정에 관여하는 직원의 목록을 확보. - 거래 상대를 타이트하게 관리(회계 감사를 하거나 불시 방문등을 실시). -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 특히 신경 씀. - 종업원에 대한 지적재산권 교육을 실시. |
| 법적 요소 |
- 진출할 국가에 대한 자사의 지재권 및 잠재 경쟁사의 지재권에 대하여 파악하고, 상호 분쟁 위치에 대해 사전 조사. -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미리 지재권을 확보해 둠. - 모든 종류의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 둠. 특히,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송부하기 전 비밀 유지 계약은 필수. - 모든 종류의 계약에, 지재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위조품 예방을 위해 지재권의 확보를 고려해야 할 국가는, 시장 기준으로 판단하되, 시장이 아니더라도 경쟁 기업의 소재지, 위조품 제조자의 잠재적 소재지, 위조품 운송루트 상의 거점 국가(도시) 등을 검토하여야 함.
또한, 지재권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유럽특허청이나 유럽상표디자인보호청의 사례를 고려한다면, 유럽에 지재권 등록에 있어서 특허의 경우 출원 후 3-4년 정도로 소요기간을 상정하여야 하며, 상표나 디자인의 경우도 소요 기간을 2-3년 정도로 상정하여 준비하여야 함.
유럽 연합에 수출되는 위조품의 주요 해상 운송 루트는 대게 중국-지중해-유럽의 루트를 거치며, 육상 운송 루트는 중국-러시아-동구권 루트를 거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루트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로 진입하는 주요 거점은, 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프랑스의 르아브르 및 마르세이유, 말타, 터키의 이스탄불, 사이프러스, 헝가리, 폴란드 등.
이들 도시의 세관에는 대개 지재권에 근거한 세관조치 등록신청이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국가에 지재권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위조품에 대한 지재권법상의 법적 조치는 크게 행정조치(세관조치),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으로 이루어짐.
세관 조치의 목적은 국경에서의 위조품의 통관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상기 위조품 운송 루트상의 거점 도시의 세관에 지재권 목록을 등록신청함.
유럽연합 세관조치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1383/2003)에 따라 세관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통관 물품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압류조치를 함.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가 많을수록, 위조품의 통관보류가 결정될 기회가 높아짐.
일반적으로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정보, 지적 재산권 정보, 모방 제품 이름, 제품의 특징 비교표, 제조 회사 명, 지역 명, 상표, 포장방법 등을 제시. 제품 샘플이나 사진도 제출하는 것이 유리. 사전 정보 입수의 경우라면, 항구의 이름, 운송 회사, 선박 회사, 운송 루트(출발지, 최종 지점, 경유 지점, 지도와 함께. 등록된 정보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각 세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위조품의 통관을 감시할 수 있음.
민사 소송의 목적은 위조품의 제조, 유통 등을 실시하는 자의 침해 행위의 금지, 손해에 대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을 받는 것. 한편, 형사 재판은 위조품의 제조, 유통 등을 실시하는 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형사 제재의 경우 대규모 위조품 제조 유통 시에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증거보전은 권리자가 증거보전의 의미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침해혐의자의 샘플을 압류하는 증거개시 절차의 일종. 프랑스의 혁명직후 1791년도의 위조압류(Saisie contrefaç on) 제도로부터 유래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Anton Piller 명령으로 존재. 증거보전은 지식 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2004/48(집행 지침) 제7조에 규정됨, 기타 국가에서도 사전경고 없는 증거조사압수명령의 성격의 증거 보전 조치들이 운용됨. 프랑스 지재권 소송의 80% 이상이 증거보전 압류조치를 통해 실행됨.
대상 권리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유효한 지적 재산권으로서, 권리자, 출원인, 독점 실시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음. 대개 집행관(bailiff)과 변리사가 협조를 하여 필요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사진사, 열쇠공, 경찰 등과 동행하여 침해 혐의자의 공장, 본사, 전시회장, 판매처 등에 사전 동의나 사전 경고 없이 방문하고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 보통, 침해 용의 제품, 기술 서류(설계도, 공정표, 제조 방법 등), 영업 서류(카탈로그, 광고, 전표, 운송 전표 등), 회계 서류(제조수량, 판매 가격, 판매량 등)를 확보.
보통 침해 혐의자는 해당 정보 등이 영업 비밀임을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전문가, 회계사 등)를 대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열람하고 침해와 관련 없는 부분은 먹칠 등으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공받을 수 있음. 비용은 3,000 ~ 20,000유로 정도 소요. 증거보전 압류명령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도입된 증거보전 방안이며, 각국별로 실시형태가 다름.
3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457) (2023.12.5. )
2004년 유럽연합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영역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지침 2004/48/EC를 채택. 각 회원국은 국내입법화 의무에 따라 다소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어도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는 이 지침의 내용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침 내용은 유럽연합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집행지침의 대상은 지식재산권 집행의 보장에 필요한 절차 및 구제방안의 통일(집행지침 제1조).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회원국 법제도 간의 차이점을 배제하여 지식재산권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동체시장의 순조로운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
집행지침은 지식재산권의 민사법적 집행에 관해서만 규정하며, 형사법적 제재는 종전과 같이 TRIPs 내지는 회원 개별국가의 법(집행지침 제2조 제3항 b호, c호)에 따름. 또한 집행지침은 지식 재산권이 침해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규정하지 않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지식재산권 실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은 공동체법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평준화되었음은 물론. 집행지침의 내용은 집행통일의 최소요건이므로, 개별국가에서 보다 그 보호책을 강화한 입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침에 저촉되지 않아 유효. 집행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조치, 절차 및 구제수단은 한편으로는 유효, 비례성과 강제성이 있어야 함.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적법한 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되고, 아울러 그러한 남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지식재산권의 실체법적 영역은 집행지침의 규율대상이 아님(집행지침 제2조 제3항 a호). 이는 집행지침의 적용범위를 집행에 한정한 까닭. 또한 집행지침 제2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저작권법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관한 공동체규정에 대해서는 집행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법은 공동체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 뿐만 아니라 집행지침은 개인정보 관련 사람에 관한 보호에 관한 1995년 10월 24일 유럽연합 지침, 1999년 12월 13일의 전자서명에 관한 지침 및 2000년 6월 8일의 전자거래에 관한 지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집행지침은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하여 회원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 절차 및 권리구제수단 등을 규정하고,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제재사항과 행정협력사항을 규정하는데 이는 이행입법의 대상이 아님.
제4조는 원고적격, 즉 누가 권리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를 규정하고, 제5조는 저작자 내지는 인접저작자의 자격을 추정하는 규정함. 제4조의 원고적격은 여느 입법례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추정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에 이름이 나타난 자를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로 추정.
집행지침 제6조는 상대방당사자의 증거제출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당사자제출주의, 즉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 규정함. 제1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s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제43조 제1항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출 의무의 발생요건으로, i) 권리자가 충분한 청구이유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처분가능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ii) 권리자가 제출하여야 할 증거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 iii) 증거가 상대방당사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야 하며, iv) 상대방당사자가 그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자신의 비밀유지이익을 침해받지 않을 것 등.
법문에 따르면 집행지침 제6조는 소송법적 규정함. 이는 마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문서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2호)에는 권리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에, 소송법적 제출의무를 정하는 기타 규정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을 집행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음. 소송법적 제출의무는 기껏해야 자유심증 요소가 되거나 또는 권리자의 주장이 진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불이익만을 발생시킬 뿐.
집행지침 제6조 제2항은 상업적 목적으로 자행된 권리침해인 경우에는 제1항이 정하는 요건 항에서 상대방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은행장부, 재정 및 상업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함.
집행지침은 실체법적 청구권에 기한 보전처분과 증거보전처분을 나누어 규정함. 집행지침 제7조에서는 소송전후의 증거보전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집행지침 제9조는 소송절차에서의 보전처분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집행지침 제9조의 보전처분은 실체법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나, 증거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지침 제7조의 증거보전조치는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의 제도로 이해됨.
사전적 증거보전조치는 압류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영국의 Anton Piller-명령 112)이나 프랑스의 위조압류(Saisie contrefaç on) 제도는 직접 압류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같이 사전적 증거보전을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로 이해하는 법제에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기 때문에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같이 제삼자에게 모색적 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됨. 그런데(독립적) 증거보전절차는 장래 소송의 증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증거보전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소송법상 의무인 증거제출의무를 가지고 가처분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음.
집행지침 제8조는 TRIPs 제47조와 그 뿌리를 같이 하지만, 정보제공의무의 범위와 제공의무자의 적격성의 면에서 보다 폭넓은 제공의무를 지우고 있음. 즉, 권리자는 집행지침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첫째,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출처 및 판매경로, 둘째, 물품 또는 용역의 제조자, 생산자, 판매자, 인도자, 전점유자, 상업용 구입자 및 판매장소의 이름과 주소, 셋째, 제조, 생산, 인도, 보유 또는 주문한 물품의 수량과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위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정보 등.
정보제공청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절차와 관련하여서만 보장되는 권리. 따라서 집행지침 제8조에 따른 정보제공청구권은 정보침해 관련 소송이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또한 집행지침 제8조 제1항 제 a호 내지 제 d호에 열거된 정보제공청구권은 제삼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넓음.
집행지침 제8조에 기한 정보제공청구는 소송계속절차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문받을 가능성 만으로 지침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됨. 그러나 소송상 청구인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실만이 정보제공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단순히 증인으로 신문받을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인이 청구원인에 필요한 개별적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다른 한편, 정보제공의무가 소송절차계속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제공대상이 광범위하고 제삼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지침 제8조는 집행지침에 따른 지식재산권보호체제의 핵심적 내용을 이룬다 할 것.
집행지침 제9조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의 보전적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증거방법의 확보를 규정하는 집행지침 제7조의 경우와 달리 집행지침 제9조의 규정취지는 침해에 기하여 발생한 권리자의 실체법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 따라서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보전처분과 다르지 않음. 집행지침 제9조 제1항은 금지청구권 및 폐기청구권의 보전을,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그 대상으로 함.
집행지침 제9조 제1항은 침해의심물품의 판매경로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a호에서 그 물품의 중지조치와 b호에서 그 물품의 압류 및 인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1항은 TRIPs 제50조 제1항 a호와 유사한데, 가처분제도를 두고 있는 법제와 별 다른 차이가 없음. 다만 a호는 중간자에 대한 금지청구가 가능하며, 저작권법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이 규정에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제삼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입법이유서는 명문으로 이 규정과 같은 조치의 요건과 절차는 연합회원국의 개별법에 따르도록 함.
집행지침 제9조 제2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침해자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은행구좌의 차단 등의 보전절차를 둘 것을 요구. 이는 결국 가압류제도의 법리와 다르지 않음.
집행지침 제9조 제3항은 충분한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데, 이로써 집행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보다 침해주장의 요건이 강화. 집행지침 제4조 이하 제7조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며, 집행지침 제7조와 상관관계를 가짐.
보전처분은 국가의 주권행사이므로 자국 영토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특히 특허보전처분의 경우에는 특허침해를 우려하여 침해행위의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보호지국에서만 가능함.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보전절차에 따라 처분하면 됨. 반대로 외국에서 발하여진 보전처분이 국내에서 그 효력을 가질 수도 없음. 대부분의 국가는 보전처분을 승인대상판결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임.
브뤼셀 I-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요건, 절차 및 효력은 모든 체약국가에 통일적으로 적용. 브뤼셀 I-규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체약국에서 내린 재판은, 보전 절차에 따른 보전처분을 포함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 승인.
그런데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허여 된 집단특허권은 공동체특허조약이 예정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특허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자국 부분의 유럽특허권에 대해서만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됨. 다만 “kort geding”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보전절차에서는 유럽특허권 중 네덜란드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라 외국특허 부분에 대해서도 침해금지가처분을 하고 있음.
집행지침 제10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침해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적합한 조치를 둘 것을 요구함. 집행지침에서 열거한 조치로는, 판매경로에서의 회수, 판매경로로부터의 완전한 차단 및 폐기. 이 조치의 대상에는 침해물품은 물론 주로 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재료와 도구가 포함. 구제조치의 수행은 원칙적으로 침해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집행지침 제10조 제2항), 대상 및 구제형식의 판단시에는 비례성의 원칙과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집행지침 제10조 제3항).
이 규정은 TRIPs 제46조에서 연유하는데, 폐기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TRIPs 제46조보다 보호방식이 다양함.
많은 입법례가 지식재산권 침해 시 보통 침해물품의 폐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물품이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는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 것이 보통. 이에 따라 침해자는 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회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가의 여부가 문제 되는데, 집행지침은 폐기청구권과 더불어 명문으로 회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침해자는 시장에 있는 침해물품을 회수하여 그 물품의 유통을 차단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됨. 뿐만 아니라 폐기청구권의 대상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재료 및 도구」를 포함시켜 보호범위를 넓힘.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은 집행지침 외에 국경 간 조치의 경우 「지식재산권침해혐의 물품에 대한 세관조치에 관한 유럽연합위원회 규정」)에 따라 간이절차에 따라 폐기가능함. 이는 세관이 페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 없이도 바로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함. 이 경우 침해 혐의자의 동의는 적극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소극적인 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점에 그 특색이 있음.
다시 말하면, 침해자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은 후 2주 이내에 폐기에 대해 이의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집행지침 제11조는 권리자에게 침해자 및 중간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보장하라는 내용.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2001/29/EG 지침이 중간자에 대한 규정 제9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지침에 따라 처리됨.
집행규정 제11조는 TRIPs 제44조와 상응한 규정인데, 중간자를 포함시키는 점에서는 TRIPs보다 진일보한 입법.
집행지침 제12조는 회원국이 적절한 경우에 침해자가 권리자의 청구권을 보상금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는 입법례가 많으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나 실용신안법 등에는 그와 같은 규정은 없음.
집행지침 제13조는 유책의 침해행위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규정함. 이에 더 나아가 제1항은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손해배상액의 확정시 제반사정, 즉 일실이익과 비재산권 상의 손해를 참작하도록 함. 또 다른 산정방법은 실시료에 상당한 총액제로 확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2항은 과실 없는 침해행위의 경우 이익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을 규정함. 이 규정은 TRIPs 제45조 제1항과 유사한데, TRIPs는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집행지침 제14조는 TRIPs 제45조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원칙을 채택할 것을 요구. 미국과 달리 영국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 점에 관한 한 회원국의 이행입법에 문제가 없음.
가) 규정의 의미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award)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
오늘날 중재는 소송과 유사하게 엄격한 절차와 실정법에 따라 행해지고 있고 또 과중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체적 기능을 하고 있음과 아울러, 그 이상의 독자적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즉 빠른 속도로 고도의 전문화⋅기술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사분쟁을 일일이 법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거래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짐.
ADR(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조정과 중재는 모두 국가 공권력에 바탕을 둔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른 법관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에 근거하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자주법정제도. 그러나 중재가 제삼자의 판정에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다른 ADR 방식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
중재의 대상은 계약에 의한 사법상 법률관계를 당사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형성하도록 인정하고 있는 사법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 사법상의 법률관계일지라도 통상의 소송에 의한 판결 절차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하며, 형사, 고용, 사회보장, 비송사건, 가사심판사건, 집행사건, 보전사건 등은 그것이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일지라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중재는 임의 중재(ad hoc arbitration)와 기관 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로 분류. 전자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인의 수, 중재절차, 중 재지, 심문절차와 판정기간 또는 준거법 등을 임의로 약정하는 것. 이에 반해 기관중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중재를 의뢰할 상설 중재기관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두는 것.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 계약에 대하여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당사자가 가령 약정대로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중재판정에 따르기를 기피하게 될 것이므로 임의 중재는 이용도가 적고,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상설중재기관에 맡겨서 수행됨.
영국에서는 중재인 협회가 중재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중재 절차를 규정하는 중재법은 법원이 중재 절차를 지휘하고 감독 및 관여하는 권한과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권한을 행사하는 개개의 세부적인 절차 방식은 판례법에 따름. 영국의 중재는 당사자 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영국의 중재는 그 중재 합의가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특색이 있음. 따라서, 중재약정을 항변으로 제출한다 하여 당연히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님. 중재 약정은 법원이 모든 분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신청하여 소송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불과함. 중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법원은 절차 진행 중 감독할 수 있음.
영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중재 절차는 영국 법원에서의 특허 침해소송 절차에 비해 상당히 느리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허 침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희박함. 영국 특허법은 특허의 유효성은 특정 절차(법원 및 특허청에 대한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에서만 다루어질 수 있고, 그 유효성은 다른 절차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없음을 규정함. 실무적으로 중재 절차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다루어진 경우, 중재 재판부의 결정은 등록된 특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중재 재판부의 결정이,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당자사들이 특허를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특허를 집행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 도출된 결론과 증거가 이의 절차를 위해 특허청에 송부된 경우
- 당사자의 중재합의
- 중재인의 선임/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절차의 개시
- 준비서면 교환
- 증거조사
- 중재인 앞의 변론절차
- 중재판정
- 항소
- 집행
독일에서는 소송의 업무 부담 증가와 소송 지연에 대한 효율적 대응수단으로써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
변호사 화해 제도는 민사 분쟁의 당사자가변호사의 관여하에 성립한 화해에 대해서는 중재 화해와 같은 집행력을 인정. 변호사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 화해를 내용으로 하는 화해 계약이 있어야 하고 민법 제779조 9의 요건에 합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나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화해의 당사자들은 화해서면에 서명하여야 하고,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이외에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할 수 있음.
독일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판 외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직무 발명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음. 즉 독일 직무 발명제도는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제도를 선택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중재 전치주의를 택함(독일 특허법 제28조 이하).
중재기구는 특허청에 설립되며 그 소재지 밖에서도 소집될 수 있음. 당사자는 언제든지 중재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기구는 타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중재 기구는 1인의 의장 중재인과 2인의 배석 중재인으로 구성. 중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법원 조직법상 법관자격을 가진 자. 의장 중재인 및 그 대리인은 연방 법무장관에 의하여 임명됨.
배석 중재인은 당해발명 및 기술적 개량 제안에 관계가 있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경험을 지녀야. 배석 중재인은 특허청장에 의하여 특허청 구성원 또는 보조 구성원중에 개개의 분쟁 사건마다 임명.
조정 위원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종업원 발명에 관한 법률하에서 우호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절차를 수행. 이러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형평성 있는 보상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조정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private law하에서 해결안을 제시. 당사자들은 구속력 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결안에 반대할 수 도 있고 또한 위원회 밖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음.
프랑스에서는 재판 외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중재⋅조정업무를 수행함. 국제 상업회의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1919년 1월에 설립되어 1932년 3월부터 분쟁업무를 처리하기 시작.
국제 중재를 목적으로 설립된 ICC 중재 재판소(ICC Court of Arbitration)는 각국의 국제 중재제도를 점진적으로 통일하고 재판 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32년 설립됨. 현재 8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70개 당사국이 개입된 13,000여 건의 중재사건을 해결해 옴.
ICC 제소절차는 다음과 같음.
- ICC중재법원에 소장제출
- 중재인단 구성확정 및 중재지결정
- Terms of Reference 작성
- 심리단계
- 중재판정
- 집행단계
프랑스에서는 순수 국내중재를 위한 중재기관과 특정한 국가와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프랑스와 외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재기관이 있고, 국제중재를 위한 중재기관이 설립됨.
프랑스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임시중재를 많이 이용함. 임시중재의 중재인은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 판정부를 관장할 의장중재인을 선정. 프랑스에서 중재인의 책임 사유는 판사의 경우와 같고, 중재인이 규정된 제한기간 내에 중재판정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건을 기각시킨 경우에는 중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당사자는 중재인의 이러한 부당 행위를 입증하여야 함.
중재인은 증인의 증언을 명할 수 있지만 증인을 선서시키거나 강제로 소환할 수는 없음. 중재인은 판사와 같이 재산에 대한 임시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음.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1994년 국제 사무국 산하에 WIPO중재 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며 전문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 중재절차를 제공.
동센터는 WIPO 규칙에 따른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조정-중재(Med-Arb),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 등 5 가지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
조정-중재(Med-Arb) 절차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형태로서 제삼자가 처음에는 조정인의 역할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중립적 제삼자가 해결되지 못한 남은 쟁점에 대해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는 일반중재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절차, 센터에서 지명한 1인 중재인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단 하루의 심리를 거쳐 6주 이내에 중재판정이 내려짐.
전문가결정(Expert determination)은 계약의 구체적인 해석, 이행, 기술적 사항 등에 관해 계약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적 결정을 구하고 그 결정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절차. 이 절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정과 차이가 있음. 이 절차를 통해 전문가가 내린 결정은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중재와 유사.
이 절차는 중재, 조정, 소송절차와 연계하여 활용되며 신속하고 비공식적으로 진행.
WIPO 중재 조정 센터는 1992년 전문가 회의를 경유하여 WIPO 총회에서 그 설립이 승인되어 1994년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 WIPO는 지식재산에 관한 문제를 소관 하는 국제연합 기관이, 지식재산분쟁 특히 국제적 지식재산권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중립성, 전문성을 가짐.
1951년 ECSC 설립조약에 의하여 창설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법률이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일을 맡고 있음.
리스본조약은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라는 공식 명칭을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으로 Court of First Instance를 ‘General Court’로 변경함. 따라서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조약에 의하면,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CJEU는 Court of Justice, General Court 및 Specialized Courts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 EU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소송을 다루는 European Union Civil Service Tribunal도 존재.
한편, 소송과정에서 소송 신청에 사용된 EU의 23개 공용어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언어가 되며, 구두변론은 필요에 따라 EU의 여러 공용어로 동시통역이 이루어짐.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회원국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는 회원국 당 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TFEU(유럽연합기능에 대한 조약)에는 사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제255조가 정하는 패널의 협의 절차가 추가됨. 판사의 임명 방식은, 각 회원국에서 1명을 추천하여 전(全) 회원국이 서로 승인하는 것으로 선출함.
사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판관 이외에 8명의 법률자문관을 둠. 규정에는 없지만 법률자문관은 유럽연합에서 인구규모가 큰 국가의 국민이 1명씩 통상적으로 포함하며, 이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재판소를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재판관들은 판결을 할 때 그 의견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일반적임.
원칙적으로 사법재판소는 사법재판소규정이 사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유보한 사건에 대하여서 일심 재판관할권을 가짐. 1심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선결적 부탁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선결적 부탁사건은 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 또한 제258조에 따른 의무이행강제소송은 사법재판소의 관할에 전속적으로 속함. 일심 재판관할권이 아닌 상소심 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음. 1심재판소에서 판결된 사건의 경우, 그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서는 사법재판소에 상소가 가능함.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특별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반재판소에 대한 상소 사건의 경우 유럽연합법의 단일성, 일체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사법재판소로 상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창설된 Court of First Instance는 원래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EC설립조약에도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에 부속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그러나 니스조약을 통한 개정 이후 EC설립조약 제220조,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개정된 EU조약 제19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법재판소와 일반재판소는 각각의 관할권 내에서 조약의 해석과 준수에 있어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동일한 임무를 가진 기관으로 인정됨.
유럽연합기능에 대한 조약 제256조는 사법재판소규정에 따라 사법재판소에 유보된 사건, 제257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재판소 사건을 제외하고 직접취소소송사건, 부작위소송사건, 비계약상의 손해배상사건 혹은 계약상의 소송사건, 직원소송사건, 유럽연합과 체결된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른 소송사건 등의 일심재판소로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며, 특별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고송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짐. 또한 니스조약에 반영된 바에 의하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선결적 판결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럽연합법의 단일성 및 일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칙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도 있음. 일반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선결적 판결에 관련해서 유럽연합법의 단일성, 일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사법재판소에서 재심을 할 수 있음.
CJEU는 공동체설립조약의 해석자로서 공동체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판단하여 옴. 또한 Court of Justice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체 기관과 회원국이 공동체 영역에 속하는 분야에서 행동할 때 자신들을 구속하는 공동체법의 일부로서 헌법적 성격을 가진 원칙들을 발전시켜 왔으며, 공동체법 우위의 원칙(primacy), 직접 효력(direct effect), 국가책임(state liability)과 같은 EU 법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원칙들도 창조함.
Court of Justice는 어떤 면에서는 법을 통하여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원국의 국내무역장벽을 철폐시킨 역내시장 창설이 좋은 예가 됨.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소송물은 유럽연합의 하기 네 가지 legislation에 대한 연합국 각국의 행정 사법 주체의 판단의 적정성임.
규칙(Regulations)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일반적 적용성(General application)을 가지며, 이행해야 하는 결과와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모두 구속력을 가짐. 따라서 연방적 성격을 갖는 규칙은 유럽연합의 법질서 형성을 위해 중요한 법원.
규칙의 구체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규칙은 일반적 적용성(General application)이 있는데, 일반적 적용성이란 모든 회원국과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함. 둘째, 규칙은 전체적 구속력을 가지는데, 여기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모든 회원국과 사람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을 말함. 그리고 전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지침과 같이 달성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률과 같이 규칙에 담겨 있는 모든 규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의미함. 즉 결과 이외의 형태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짐. 따라서 규칙에 결과 달성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것도 구속력이 있음. 회원국들에게는 규칙 내의 여러 조항을 선별하여 자국민 또는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부분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없음. 셋째, 규칙은 직접 적용성을 가지는데, 직접적 용성이란 규칙이 제정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원국내 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며, 따라서 효과발생을 위한 특별한 국내적 편입절차(national legislation)가 요구되지 않는다. 넷째, 규칙은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 적용(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따라서 규칙은 공동체의 모든 영토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
어떤 국제기구도 지침(Directives)과 같은 성격을 지닌 규정은 없으며, 이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입법 장치. 지침은 이사회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의회와 이사회의 협력으로 채택. 지침도 구속력이 있는 법령. 그러나 규칙(Regulations)과는 달리 전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달성될 결과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으며, 형식과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에게 위임되어 있음. 즉, 지침에 있어서는 목표만을 수립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지침은 국내법으로의 변형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회원국들은 중요한 이해관계에 직면. 분명한 것은 지침이 회원국에 의해 이행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침을 위반하지는 못함.
지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제249조 규정상으로 지침은 직접적 용성이 없으며, 회원국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실제 모든 회원국들은 항상 지침을 이행해야 할 직접적 의무는 없음. 따라서 중요문제는 규칙의 형태로 규정하며 그 밖의 것은 지침의 형태를 취하게 됨. 이처럼 지침은 외관상으로는 연방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만 보임. 그러나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이처럼 지침이 회원국을 상대로 발표되지만, 해당 국민은 그로부터 직접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봄으로서, 그 성격을 규칙 또는 연방적 법령에 근접시키고 있음. 즉 국내법원은 직접효력을 갖지 않는 공동체규정, 곧 지침의 합법성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부탁할 수 있음. 지침의 효과에 대해 유권적 해석기관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은 지침이 연방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줌.
한편, 규칙과 공동체설립조약들은 회원국 국민 개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지만, 지침은 회원국에게는 의무부여가 가능하나 개인에게는 의무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개인과 관련된 지침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단지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법률사항을 관할할 뿐, 사실문제는 국내법원이 관할. 개인과 관련된 법률문제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판결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이며, 개인이 지침과 관련하여 직접 제소할 수 없음. 지침의 효과에 있어서 이제 지침의 수평적, 수직적, 효과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음.
결정(Decisions)은 전부 구속력이 있음. 전부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규칙과 같고 지침과 다름. 결정은 또한 오로지 확정된 대상에게 적용. 이러한 개별 적용성으로 인해 대상자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의 회원국일 수도 있고 회원국내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개인일 수도 있음. 다만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당해 결정에서 그들을 일일이 지칭할 필요는 없고 대상의 집단이 확인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일반적으로 결정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개별 문제를 다루는 수단이 됨. 따라서 결정을 국내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에 비유. 하지만 실제는 결정의 내용이 추상적인 입법적 성격의 결정도 많이 채택됨. 그 결과 지침과 비슷하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원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도 있고, 규칙과 같이 일반규칙을 수립하는 결정도 있음.
권고(Recommendations)란 일정한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권하는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이며, 의견(opinions)이란 특정대상자 없이 제삼자의 요청으로 단순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 이러한 권고 및 의견은 모두 구속력이 없음. 이들은 대부분 회원국정부에 대해 내려지지만, 공동체설립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몇몇의 경우에는 한 개인, 다수인 또는 일정한 사업가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음. 권고와 의견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하기란 쉽지 않음. 일반적으로 그 목적이 대상자로부터 행동(공동체집행기관이 회원국들의 국내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행동수단)을 얻는 것이라면 권고이고, 제삼자의 요청에 대해 어떤 관점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면 의견.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는 각국 법원의 EPC, CTM, RCD, 및 지재권 집행 지침 등과 관련된 지재권 관련 사법적 절차(소송 기타)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선결적 판결을 내리도록 됨. 그 근거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각종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decision(결정)에 의해 각국 법원이 각 사안에 대하여 제대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 판단을 하는 것. 특히, 유럽 내 다국적 소송과 관련한 관할 및 국경 간 조치 가능성에 대한 각국 법원의 질의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함으로써 유럽의 통일적 법집행에 대한 해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또한, 유럽 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안되는 지재권 관련 제정 법규(legislation)에 대하여 유럽 의회 등의 요청에 따라 유럽 헌법 등의 유럽 연합의 근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됨.
유럽 통일 특허제도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통합 특허 법원으로 대표되는 통일 특허소송 제도 (Unified Patent Litigation System).
UPLS는 EU 법이 아닌 국제 조약으로 함. EU 법인 경우, 모든 EU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EU 회원국 이외의 유럽 국가는 UPLS를 채택할 수 없음.
하지만, 조약의 형태로 하는 경우, EU 회원국뿐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는 유럽 특허 조약(EPC) 회원국(예 : 터키)이 UPLS에 가입할 수 있음.
EU 회원국 중 3 대 EP 특허출원국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에 의해 비준되는 즉시 UPLS는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UPLS는 두 개의 큰 규정으로 구분됨. 통합 특허 법원의 구성에 대한 것과 재판의 진행에 대한 것.
통합 특허 법원의 구성으로서, 제1심 법원은 하나의 중앙부(Central Division)와 다수의 지방부 (Local Division) 및 지역부(Regional Division)로 나눌 수 있으며, 항소심법원은 하나를 둠.
제1심 중앙부 법원은 많은 논란 끝에 프랑스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고, 뮌헨과 런던에 각각 특별부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IPC분류의 사건을 할당하기로 함.
UPLS 회원국은 제1심 지방부를 자국에 설치할 수 있음. 그리고, 사건 취급 건수가 3년 연속 연간 100건이 넘는 국가의 경우 100건 당 1개의 추가의 지방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부는 최대 4 개를 넘을 수 없음. 대개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의 국가에 적용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회원국은 자국의 지방부 재정을 부담하게 됨.
지역부는 사건이 적은 회원국끼리 통합하여 설치함. 이 경우 지역부 재정은 UPC가 부담.
지방부나 지역부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경우, 사건은 중앙부 법원으로 할당. 항소심법원은 일반적인 경우 최종심이 됨. 즉, UPLS는 2심 제도를 채택한다는 의미함. 항소심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위치.
CJEU은 UPLS에 포함되지는 않게 되는데, UPC는 EU 법 해석에 대하여 CJEU에게 질문을 회부할 수 있음. 따라서 UPLS에서 CJEU 역할은 EU 법의 해석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됨. 이것은 CJEU 설립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
UPC의 제1심에서는 3 명의 판사에 의해 심리가 진행. 지방부의 경우 3 명의 합의체는 해당 국가 출신의 판사 1명 또는 2명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해당 국가에서 심리되는 사건 수가 50 개 미만이면 합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국 출신 판사의 수는 1 명이고 나머지 2 명의 판사는 중앙부에서 맡게 됨.
모든 사건에서 지방부의 합의체에는 국적이 다른 판사를 최소 1 명이상 포함해야. 지방부 및 지역부는 일반적으로 법률 자격이 있는 판사만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됨. 그러나, 특허성이 쟁점이 되고 있거나 침해 소송 당사자의 일방이 기술 판사를 요청하는 경우 4 번째 판사로 기술 판사를 두어야 함.
중앙부는 항상 2 명의 법률 판사와 1 명의 기술 판사(당해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체를 사용하여야. 항소심은 5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로서 3 명의 법률 판사와 2 명의 기술판사가 합의체를 구성.
UPLS의 실제 시행 문제는 상기와 같은 합의체를 구성하는 데, 특허를 전담할 경험이 많은 판사를 모든 지방 부 및 지역 부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UPLS에 있어서, UPC에서 심리할 수 있는 판사는 특허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기술적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판사 및 법적 자격이 있는 판사를 사용하는 것.
기술 판사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소정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및 민사 소송법의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함. 이 같은 자격요건은 당연한 것이지만,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술 판사를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기술 판사의 경우, 각국의 법원에서 반드시 판사의 자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UPLS에서는 변리사가 기술 판사가 될 수도 있음.
UPLS은 EPO가 부여한 모든 유럽 특허에 적용되며, 향후 EPO가 부여하는 모든 유럽 특허에도 적용. 하지만, 각국의 개별 특허는 현행대로 각국의 개별 법원에서 처리됨.
UPC가 다룰 수 있는 심리 대상으로서는, 특허 침해 사건(비침해확인소송 포함), 특허무효사건, 특허사용권과 관련한 사건. UPC는 부정 경쟁 방지법, 계약법, 디자인법 및 상표법 등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수 없음. 이들 사건은 종전대로 개별국 법원 또는 기타 통합 법원이 심리.
지방부는 침해 판단과 무효판단을 모두 할 수 있음(영국 시스템과 동일). 그러나 침해 판단만 하고 무효 판단은 중앙부법원으로 이관할 수도 있으며(독일 시스템과 동일), 사건 전체를 중앙부법원에 이관한다는 결정도 할 수 있음(이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이 같은 규정은, 중앙부법원에서 추후에 무효판단을 하는 경우, 특허권의 유효성이 확인되기 전에 지방부법원이 먼저 유럽 전역에서 금지 청구 허용하는 결정을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UPC 중앙부는 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되며, 침해에 관한 소송은 지방부(또는 지역부)가 심리하게 됨. 또한, 재판 관할은 침해 장소 및 피고인의 소재국가에 따라 결정됨. 이는 현재 유럽의 관할규정을 따르는 것.
이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내 다수의 국가에서 침해가 벌어지는 상황인 경우, 특허권자는 포럼 쇼핑을 할 수 있게 됨. 이는 미국의 특허 소송제도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 즉, 특허권자는 특허권자에게 보다 호의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됨.
각 재판부는 소재 회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중앙부의 경우, 심리하는 특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물론, 각 재판부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심리하는 특허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만약, 지방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거부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중앙부로 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항소심재판부의 경우는 제1심 재판부에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언어규정은, 사실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 특허의 등록언어는 대개 EPO의 공식언어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UPC가 내릴 수 있는 구제 조치는,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가처분, 가압류 등이다. UPC의 하나의 판결로 유럽 전역에 내리는 가처분의 경우는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치라 할 수 있음.
당사자가 UPC의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두도록 함. UPC 회원국의 국내법원 사건에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을 포함하며, EU 특허 소송 자격(EUpatent litigation certificate)라는 자격이 현재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으로 유럽 특허 변리사도 대리인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큼.
UPLS 시행 후 5년간은 유럽 통합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인정됨. 잠정기간 5년이 지난 후에는, UPC만이 유럽 특허에 관한 모든 관할권을 가지게 됨.
- EU 기업들이 발명과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 표준필수특허 (2) 강제 실시 (3) 의약품, 식품 추가보호 법안들을 발표.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ETS),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 사회적 기후기금, 해운분야의 ETS 적용,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5건의 Fit for 55 법안을 최종 승인.
2022년 2월 집행위가 제안한 공급망 실사 지침 수정안이 유럽의회 법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2022.11월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총 19개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을 1차로 지정하여 발표.
집행위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만에 기존 의약품법 전면 개정 법안을 제안.
이번 제안의 중요 원칙은 (1) 국가 재량권 강화, (2) 간소화, (3) EU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개혁과 투자 활성화 (4) 효과적인 집행방안 확보.
과일, 채소, 과일주스, 잼, 꿀, 가금류 및 계란 등의 농식품에 적용되는 현행 표준규격 (marketing standards)의 개정안.
임금 투명성 강화조치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
SEP는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공인 표준화기구가 채택한 기술표준의 적용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하며, 특허권 보유 기업의 특허권 남용 방지 및 합리적인 특허사용료(로열티) 책정, 중소기업의 특허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행 SEP 체제의 기술투자 관련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특허권 보유 기업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중소기업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SEP 사용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임.
개정안은 발효 후 지정된 기술표준에 사용되는 모든 SEP에 적용되며, 다만, 집행위가 특정 SEP 또는 SEP의 사용이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바 복수 특허권 자간 '합계 로열티(Aggregate Royalty)' 결정과 '공정, 합리적 및 비차별적(FRAND) 조건'의 로열티 조정 과정을 면제할 수 있음.
반면, 집행위가 특정 SEP의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상당한 왜곡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 개정안 발효 이전에 부여된 SEP의 경우라도 개정안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개정안은 특허신청과정을 하나의 기관아래 통합시키고 SEP를 신청할 때 유럽지적재산 (EUIPO)의 공인 평가기관을 통한 '필수성 검토(Essentiality Check)와 EU 관계 기관 및 회원국 당국의 평가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서 SEP로 인정받는 방식을 채택함.
SEP 등록처에 등록되면 해당 SEP와 관련한 기술표준, 사용 품목, 특허권자의 로열티 정책, 특허권자 정보, 해당 특허의 SEP 지정 사유 등의 정보가 등록되고, SEP 사용과 관련한 FRAND 조건의 로열티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 사용자와 특허권자의 협의 등에 의해 결정됨.
다만, 특허권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개정안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전에 해당 건을 위해 지정된 조정자(Conciliator)가 9개월 이내 조정안을 제안할 것을 규정함.
개정안은 복수 SEP가 사용되는 특정 기술표준이 발표되는 경우 동 기술표준 적용을 위한 합계 로열티를 공개해야 하며, 모든 관련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표준과 관련한 로열티 합의 내용을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함.
특정 기술표준의 특허권 자간 로열티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기술표준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SEP 특허권자들은 합계 로열티 협의를 위해 관계 당국에 조정자 신청을 할 수 있음.
*출처 :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표준특허필수(SEP)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이번 지적재산권 패키지의 두 번째 법안은 특정 긴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EU 차원에서 특허권의 사용을 강제로 허용하는 이른바 EU 강제 라이센싱을 도입하는 내용임.
특허 라이센싱은 당사자간 자발적 협상이 원칙이나, 각 회원국은 긴급 상황에서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강제 라이센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동 법안은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 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강제 라이센싱 제도를 EU 공통 제도로 통합하기 위함임.
동 패키지의 세 번째 법안은 각 회원국에 산재한 인체 및 동식물 의약품 특허에 대한 추가보호증명을 EU 차원의 제도로 통일하기 위한 것임.
EU 차원의 추가보호증명은 EUIPO가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검증 절차에 의해 부여되며, 추가보호증명 신청자가 지정한 모든 회원국에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증명이 인정됨.
| [표 10] 유럽 국가별 유효화 요건
*출처 : 유럽특허청(EPO) ☞국가별 유효화 요건 자세히 보기: https://www.epo.org/en/legal/epc |
|||||
|---|---|---|---|---|---|
| 국가코드 | 국가명 | 런던협약가입 | 번역문 | 관납료 | |
| 청구범위 | 발명의 설명 | ||||
| AL | AL | O | O | X | O |
| AT | 오스트리아 | X | O | O | O |
| BE | 벨기에 | O | X | X | X |
| BG | 불가리아 | X | O | O | O |
| CH/LI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
O | X | X | X |
| CY | 키프로스 | X | O | O | O |
| CZ | 체코 | X | O | O | O |
| DE | 독일 | O | X | X | X |
| DK | 덴마크 | O | O | X | O |
| EE | 에스토니아 | X | O | O | O |
| ES | 스페인 | X | O | O | O |
| FI | 핀란드 | O | O | X | O |
| FR | 프랑스 | O | X | X | X |
| GB | 영국 | O | X | X | X |
| GR | 그리스 | X | O | O | O |
| HR | 크로아티아 | O | O | X | O |
| HU | 헝가리 | O | O | X | O |
| IE | 아일랜드 | O | X | X | X |
| IS | 아이슬란드 | O | O | X | O |
| IT | 이탈리아 | X | O | O | O |
| LT | 리투아니아 | O | O | X | O |
| LU | 룩셈부르크 | O | X | X | X |
| LV | 라트비아 | O | O | X | O |
| MC | 모나코 | O | X | X | X |
| MK | 마케도니아 | O | O | X | O |
| MT | 몰타 | X | O | O | O |
| NL | 네덜란드 | O | O | X | O |
| NO | 노르웨이 | O | O | X | O |
| PL | 폴란드 | X | O | O | O |
| PT | 포르투칼 | X | O | O | O |
| RO | 루마니아 | X | O | O | O |
| RS | 세르비아 | X | O | O | O |
| SE | 스웨덴 | O | O | X | O |
| SI | 슬로베니아 | O | O | X | O |
| SK | 슬로바키아 | X | O | O | O |
| SM | 산 마리노 | X | O | O | O |
| TR | 터키 | X | O | O | 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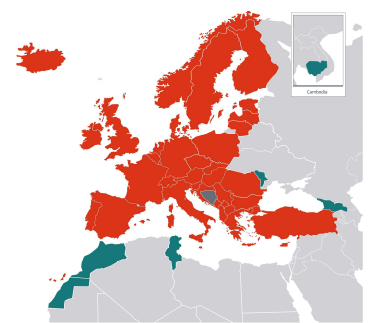
|
[표 16] EPC 가입국 현황
*출처 : 유럽특허청(EPO), 2023.12. 기준 ☞EPC 가입국 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456 |
|||||
|---|---|---|---|---|---|
| Member States | |||||
|
Albania Austria Belgium Bulgaria Switzerland Cyprus Czech Republic Germany Denmark Estonia Spain Finland France United Kingdom Greece Croatia Hungary Ireland Iceland Italy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Latvia Monaco Montenegro North Macedonia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erbia Sweden Slovenia Slovakia San Marino Türkiye |
|||||
| Extention Member | |||||
|
Slovenia Lithuania Latvia Croatia Albania North Mecedonia Serbia Bosnia and Herzegovina Montenegro |
|||||
| Validation Member | |||||
|
Morocco Republic of Moldova Tunisia Cambodia Georgia |
|||||
*출처 : 유럽특허청(EPO), 2023.12. 기준
☞EPC 가입국 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456
EPC 회원국 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출원인은 EPO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유럽 변리사를 선임하여야 함. 유럽 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 EPA)는 유럽 특허 조약(EPC)에 따라 정해져 있는 자격이며, 유럽 변리사가 아닌 자가 EPO에 대한 절차의 대리를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는 유럽 변리사의 전권 사항 (EPC 제134 조 제1 항).
유럽 대리인의 대리 수임료는 국가 및 수임 계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수임료표(Schedule of fee)를 기준으로 하면 영국 대리인이 독일 대리인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싼 편. 하지만, 거래하는 조건 및 거래하는 한국 특허사무소와의 관계에 따라 차별적 디스카운트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제 지불되는 지재권 출원등록 비용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의 로펌이 더 비싸거나 하는 상황은 많지 않음. 물론, 일부 동구권이나 출원이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 상당히 싼 수임료로 EPO 출원을 대리한다고 프로모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중간 사건 처리 같은 부분에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편임.
EUIPO의 연합 상표(EUTM)나 등록 공동체 디자인(RCD)은 절대적 요건 심사 및 무심사 주의이므로, 보정서나 의견서 등이 중간사건에 대한 대리인의 대처 능력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로펌을 선호함.
보통 EPO 단계를 통해 유럽 내 국가로 진입하는 경우와, PCT 루트나 파리 조약의 우선권을 통해 개별국가로 진입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하기 국가들은 EPC 가맹국임에도 PCT 루트를 통해 직접 진입할 수 없으며, PCT지정국선택시 EPO를 지정하여야 함. 벨기에,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유럽 내 4개국에 대한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는 경우, 개별국 출원은 국내대리인 비용 및 번역비용을 제외하고 1 국당 1,000 - 1,500 EUR 정도가 소요. 예를 들어,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을 출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출원 시 약 5,000 EUR 정도의 비용을 예상. EPO 출원 비용이 5,000 EUR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많은 유럽 대리인들은 유럽 5개국을 초과하여 특허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EPO 절차를 밟는 것이 비용이 저렴할 수 있다고 판단.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중간 사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즉, 개별 국가 특허 등록 절차 진행 시 OA는 각 국 대리인별로 개별적으로 1,000 - 3,000 EUR 정도가 소요되나, EPO의 경우에는 공통 심사이므로 동일한 사안의 OA가 발생하는 경우 1/4의 비용이 소요됨.
EPO 절차는 EPO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개별 국 절차시에는 각 국의 심사관의 판단에 따르게 됨. 예를 들어, 프랑스는 예비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만 하게 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실체 심사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특허 등록은 용이한 편. 반면, 독일의 경우, EPO의 심사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개별국 심사관행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럽 내 특허 출원의 방식을 판단해야 함.
특허 등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EPO의 우선심사 제도인 PACE를 사용할 것인지, 프랑스나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보완적 무심사제도를 통해 일단 등록을 먼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됨.
유럽 특허청은 Espacenet이라는 특허 검색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 홈페이지 주소는 http://worldwide.espacenet.com
검색방식은 smart search, quick search, advanced search, number search 그리고 classification search로 총 다섯 가지가 있음.
Smart search는 자유형식의 검색방식으로 인식기호와 검색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방식. EP 특허 이외에도 92개국의 공개공보를 검색할 수 있음.
Advance search는 항목별 검색방법을 지원하며, number search는 공보 번호나 출원번호, 등록번호등의 번호검색방법을 제공. classification search는 IPC를 기반으로 하는 Euro 기술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방법을 제공.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도 무료로 특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EP 특허도 검색 DB에 포함됨. 검색 서비스 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음.
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한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KIPRIS에서도 유럽 특허를 검색할 수 있음. 웹페이지 주소는 http://www.kipris.or.kr
유럽 연합에서 사전 권리를 검색하기 위한 매개 변수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경됨. 유럽 연합 상표(EUTM, 이전에 CTM으로 알려짐)는 1996년에 현실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상표 소유자가 선택한 등록으로 입증됨. 유럽 연합은 2004년에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2007년에는 27개국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28개국으로 확대되어 검색 문제가 복잡해짐.
EUIPO에서 제공하는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EUTM, RCE, 소유권자(owner), 대표자(representatives)가 있으며, EUIPO의 웹페이지(https://euipo.europa.eu/eSearch)에서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