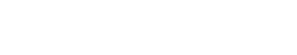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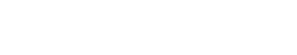
국가선택
| [표 1] 국가 기본 정보 출처: 외교부 누리집 | |
| 일반사항 |
|
|---|---|
| 정치현황 |
|
| 경제현황(2022년 기준, IMF 추정치) |
|
| 우리나라 와의 관계 |
|
인도 지식 재산권 진흥 및 관리부(CIPAM: Cell for IPR Promotion & Magement)는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산하 조직으로서, 지식 재산권 정책 이행 및 관련 부처 간 협력 진흥을 담당함.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CGPDTM: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 Marks)에서 관할하는데, 지식 재산권 관련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집행 기관임. 본부는 콜카타에 소재하고 있으나, 첸나이와 뉴델리, 뭄바이 등 총 3개의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음.
인도 정부는 상표법(The Trade Marks Act,1999),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1957), 특허법(The Patent Act,1970)과 디자인법(The Designs Act,2000)을 중심으로 여러 개별 법령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있음.
2016년, 인도 정부는 본격적인 지식 재산권 보호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지식 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도입했고, 동 정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도(Creative India, Innovative India)”를 골자로 하며 지식 재산권 전 분야를 다루고 있음
정책 목표는 크게 7가지로 나뉘며, i) 인도 내 각계각층에 대한 지식 재산권 인식 제고, ii)양질의 지식 재산권 창출 촉진, iii)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강력한 지식 재산권 법률 제정, iv) 지식 재산권 등록 절차 현대화, v) 지식 재산권 상업화, vi) 지식 재산권 보호 절차 강화 및 침해 방지, vii)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연구기관 확대임.
최근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 아래 유관 정책 및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 전산화 및 지식 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디지털화로 진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추세임. 2010년에는 특허 출원 후 허가까지 최대 8년 정도 소요됐으나, 현재는 2~3년으로 단축됐음.
2023년 10월, 인도 정부는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디자인·상표 관리실(CGPDTM) 전문가 900명 추가 채용을 발표했고, 인도 대외무역 총국(DPIIT)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인도 특허 출원은 10배, 상표 출원은 6배 증가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와 같은 급증에 대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임.
인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상표 및 특허 출원이 증가했고, 특히 상표권 출원은 전년 대비 15.4% 증가했는데, 주요 상위 10개국 중 2020년에 출원 규모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 대한민국과 인도뿐임.
2023년 인도 내 특허 출원 건수는 82,807건이었는데, 이 중 52.3%인 43,337건이 인도 기업의 출원임. 코로나19 이전에는 국내 출원 비율이 30~35%에 불과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인도 정부의 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개선이 주효했음을 보여줌.
인도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했는데, 학술기관의 경우 80%나 인하하였으며, 이러한 수수료 인하도 출원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착수하면서 인도 자회사의 특허 출원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있음.
특허청 예하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모두 관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는 특허사무국, 상표 사무국, 지리적 표시 등록 사무국에서 각각의 권리를 관리하며 이를 통괄하는 특허상표청이 상위 기관임.
특허상표청은 특허, 디자인 및 상표와 같은 지식 재산권 전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인도 Mumbai에 설립되었으며 특허, 상표 및 기타 지식 재산권 관련 기관의 상위기관으로써 하부 기관인 특허, 상표 사무국들의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지식 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기관 및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
인도 특허사무국은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출원,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 인도 특허사무국은 총 4개의 지점으로 Kolkata, Chennai, Delhi, Mumbai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Kolkata에 Head Office를 가짐. 특허사무국은 “Patent Act 1970”의 법에 의거하여 특허법의 형식에 맞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서를 접수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하여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을 시켜주는 업무를 주로 함.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특허법 및 수수료와 같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인도 진출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 출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특허사무국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간편. 인도는 매우 면적이 넓은 나라로서 진출할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의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인도의 상표 출원은 특허 출원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인도는 특허사무국과 별도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표 사무국을 운영. 상표 사무국은 5개의 지점(Mumbai, Kolkata, New Delhi, Chennai, Ahmedabad)에 위치함. 특허사무국과 마찬가지로 상표 사무국도 상표의 출원, 등록,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상표 출원 서류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함. 인도 진출에 있어서 상표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상품일 경우 복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상표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상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도의 상표사무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규정으로 보호를 하며 지리적 표시를 출원 및 등록의 관리를 하는 기관을 따로 둠.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로 보호받고 싶다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이용하여 상표법에 의거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지만 인도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를 주의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 사무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보호받아야 함. 지리적 표시의 출원, 등록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 사무국을 이용해야 함.
NIPPM은 인도 “Nagpur”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식 재산권의 훈련, 교육, 관리, 조사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즉 NIIPM에서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심사관이나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IP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역시 맡음. 이 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Patent Information System은 인도의 “Nagpur”에 위치한 기관으로 1980년 설립됨. R&D 종사자, 정부 기관, 사업가, 기타 발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 정보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정보와 관련 문헌을 모으고 관리하며, 특허의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를 검색, 복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함. 특정 특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거쳐 가야 하는 기관이며 선행기술 조사를 해주기도 함.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PIS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인도는 영국 법에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게 됨. 인도는 연방과 28개의 주 7개의 연방 자치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법 체계는 이와 다르게 하나의 체제로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고등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됨. 3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루어짐. 연방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각 연방, 주에 대한 법이 각각 있으며 사법기관도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데 비해 인도의 각 법원은 관할 재판 구역의 모든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음. 이하 사법기관에 대하여 알아봄.
인도의 대법원은 최고 법률 기관으로 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역시 포함. 대법원은 제1심의 배타적 재판권, 상고심 재판권,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재판권을 가짐. 제1 심의 배타적 재판권은 연방과 주 또는 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 대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심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다툼이 심화되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짐.
고등법원은 총 18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한 개씩 위치하여 그 주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3개의 고등법원은 한 개 주 이상의 재판관할을 가짐. 7개의 연방직할지 중 Delhi만 독립된 고등법원을 가지며, 나머지 6개의 연방직할지는 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같이 담당. 고등법원은 관할 지역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권을 가지며, 재판권은 연방의회나 주 의회에 의해 조정됨. 일부 고등법원의 경우는 항소심 재판권 뿐 아니라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지는데 Bombay, Calcutta, Madras 고등법원의 경우는 25,000루피 이상의 민사재판에 대한 제1심 재판권을 가짐.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법원은 관할지 지역의 하급법원을 감독하며 항소심 판권만을 가짐.
하급법원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과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나뉨. 민사 담당 하급법원은 Munsif courts와 Courts of Subordinate Judges로 나뉘는데, 이곳의 결정에 불복 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항소 할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항소 할 수 있음.
민사재판의 경우 두 번의 항소가 허용되는데, 첫 번째 항소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소에서는 오직 법률적용에 대한 항소만 가능함. 형사재판의 하급 법원은 Magistrates of first or second class와 Court of Session으로 이루어지며, Magistrates court에 대한 항소는 Court of Session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고등법원에 재항소 할 수 있음.
전문법원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데, 소득세 법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회사법 법원 (Company Law Board), 판매세 법원(Sales Tax Appellate Tribunal), 소비자 법원(Consumer Forums), 행정법원(Central and State Administrative Tribunals), 채권회수 법원(Debt Recovery Tribunal) 등이 있음. 이러한 모든 전문법원들은 이것들이 위치한 지역 고등법원의 감독을 받음. 이에 대해서 지재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침해 및 비 침해 선언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하급법원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은 크게 3 분류로 나뉘며 지식 재산권 국제보호조약, 국제 등록 조약, 분류제도 관련 조약이 있음.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식 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꾀하는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상표법 조약, 나이로비 조약, 특허법 조약, 베른협약, 로마협약이 있고 둘째로, 지식 재산권이 하나의 절차로 국제 출원하여 각 지정국에 진입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협력조약,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 부다페스트 조약, 헤이그 협정, 마드리드의 정서, 음반 불법복제 방지 제네바 협약, 통신위성 송신 프로그램 신호 배분에 관한 브뤼셀 협약이 있음. 셋째, 상품, 물품의 국제적 분류 기준에 관한 것으로 분류제도 관련 조약 (스트라스부르 협정, 니스 협정, 비엔나 협정, 로카르노 협정)이 그것임.
이 중에서 인도가 가입한 주요 국제 조약으로는 내국민 대우 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 주의, 소급 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1928), 미생물의 보호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정(2001), 상표권의 국제적 보호를 꾀하는 마드리드 의정서(2013),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1998), 조약 1국에 출원 시 조약 2국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시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제1국의 출원일을 제2국의 출원일로 판단 해주는 파리협약(1998)등 다수의 협약 협정에 가입됨.
2014년 10월 12일에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투명한 법적 기틀을 제공한다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인도 역시 유전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연구 활동 발전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생물 다양성의 기여도를 증진. 인도의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는 인도의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규제. NBA는 인도 정부의 환경산림 및 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의 자율적인 법적 기관. NBA는 생물 다양성법(2002) 및 규칙(2004)의 조항을 이행하도록 위임 받음.
2019년 6월 7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는 인도가 상표와 디자인 검색의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관련 국제 협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이번에 인도가 가입한 국제 협약은 모두 3개로, ① 표장의 도형 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약칭 ‘비엔나 협정’), ②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약칭 ‘니스 협정’), ③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 노협정3)(약칭 ‘로카르 노협정’)임 비엔나 협정은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의 국제적인 기준 및 표준을 정한 국제 조약으로 1973년 체결됨. 인도는 동 협정의 34번째 회원국임 니스 협정은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1957년 출범되었으며, 상표 법조 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하려면 니스 협정에도 가입해야만 함 인도는 동 협정의 88번째 회원국임 로카르노 협정은 1968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 관련 국제 협정으로, 동 협정에서 채택된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는 제11판 기준으로 32개의 류(classes)와 211개의 하위류(subclasses)를 두고 있음. 인도는 동 협정의 57번째 회원국임
2020년 12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인도 상무부 산업 통상 진흥부(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는 양국 간의 지식 재산권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식 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동 MOU는 인도 내각의 승인이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체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DPIIT의 구루프라사드 모하파트라 장관과 USTPO의 안드레이 이안쿠 청장이 화상 형식으로 서명함
이번 지식 재산권 협력에 관한 MOU는 향후 10년간 지식 재산권 관련 심사와 양국의 지식 재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호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국이 공동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 등을 주관하여 산업계, 대학, 연구개발(R&D) 기관 및 중소기업(SME), 개인에게 지식 재산에 대한 모범사례, 경험, 지식의 공유 및 보급을 촉진함
-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교류, 기술 교류, 홍보 활동 등의 협력을 장려함
- 특허,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산업디자인에 대한 출원 심사 및 등록 절차, IP 권리의 보호, 시행 및 사용에 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함
- IP 관련 문서 및 정보 시스템, 행정서비스 관리 절차에 관한 자동화·현대화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한 정보를 교환함
-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및 기존 IP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전통지식 및 모범사례의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협력함
인도는 신흥 경제 국가로서 세계 인구의 1/7이 거주하고 있는 2010년 기준 세계 10위의 거대 시장임. 인도와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FTA라는 용어 대신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사용하여 2020년 협정을 체결하였음
동 FTA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원산지 규정 및 절차, 무역원활화, 관세협력, 통신, 인력 이동, 시청각 공동제작, 투자, 경쟁, 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장에서 지식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음.
인도와의 CEPA에서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만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제12.5조 지식 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제1항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① 상대국의 지식 재산정책 및 경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지식 재산 분야에서의 교육, 워크숍 및 박람회 등, ②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국제 특허절차의 간소화, ③ 선행기술조사 결과의 상호 교환・조사 결과의 비교 및 조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선행기술 공동조사, ④ 지식 재산의 라이선싱 및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한 시장정보, ⑤ 식물신품종 보호, ⑥ 심사관을 포함한 인적 교류, ⑦ 지식 재산에 관한 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 대해 특히 더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12.6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CEPA의 분쟁해결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지식 재산권 관련 분쟁은 CEPA의 분쟁해결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표 2]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 |||||
|---|---|---|---|---|---|
|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링크) | 비고 | |
| 지식재산창출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대 3년간 IP 서비스(해외권리화 지원 등)를 제공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www.ripc.org | ||
|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스타트업 대상으로 원하는 IP 서비스(국내외 IP 권리화 등)를 원하는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 www.kipa.org | |||
|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 PCT 출원 비용 등 중소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시급한 IP 애로 사항 상담 및 해결 | www.ripc.org | |||
| 지식 재산 활용 | 지식 재산 서비스 활성화 사업 | 지식 재산 서비스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www.kaips.or.kr | ||
| 지식재산보호 |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운영 | 개별국가에 설치된 IP-DESK를 통해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지재권 상담 및 분쟁 초동대응 등 지원 | www.kotra.or.kr | ||
|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 수출기업의 K-브랜드 해외 지재권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위조 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 www.koipa.re.kr | |||
| 특허 분쟁대응 지원 | (사전예방)기업 맞춤형 특허분쟁 위험 진단 및 예방 지원 (사후대응)특허침해·피침해 분석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
www.koipa.re.kr | |||
| 기타 수출지원 사업 |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 | 중소·중견기업 중 세부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IP 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exportvoucher.com | 산업부 | |
| 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 유망 중소기업 대상, 해외 IP획득 및 활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exportvoucher.com | 중기부 | ||
|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중기부)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IP 출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 | www.mssmiv.com | 중기부 | ||
※ 사업분류 1,2,3은 특허청 산하 사업임
※ 위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함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함.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과 같이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 법으로 일정 기간을 보호함. 인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력 및 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권리 확보와 보호가 필요함.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제품의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 지식 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로서 영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국의 특허법을 수입하여 특허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일, 일본 등 대륙법의 체계를 수용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성, 출원 공개 등에 대한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것도 많음.
창작한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라는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 2005년에 최종 개정되었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 특허권의 유형으로는 일반 특허권(ordinary patents), 우선 특허권(priority patents), 추가 특허권(patents of addition)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일반 특허권의 경우 등록 후 20년까지, 추가 특허권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기간에 귀속.
특허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특허 등록은 각 지점 (콜카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위치한 특허 사무국 에서 신청이 가능함.
상표권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1999년에 제정된 ‘New Trademarks Act’는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보호 대상으로는 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 새 상표법을 통해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방법, 색상 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특유성을 가져야 하며, 법에 위배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함.
등록된 상표의 최초 사용자가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받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나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더 부여.
상표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상표 등록은 각 지점(뭄바이, 델리, 아마다바드, 콜카타, 첸나이)에 위치한 상표 사무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권 변리사가 상표 소유권자를 대신해 상표등록을 접수해야 함.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 디자인법은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법률이 현재 적용되는데, 보석류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주로 적용.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10년까지이며,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5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 디자인 등록은 특허사무국 (https://ipindiaonline.gov.in/eDesign/goForLogin/doLogin)에서 진행.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농업, 생산업 및 기타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출처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 이는 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표는 임의의 표장을 선택하여 출처를 표시하여 형성된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비롯하여 그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여하는 차이가 있음.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함.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존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함.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존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함.
지리적 표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는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 (https://ipindiaonline.gov.in/eGIR/Login/LoginNew.aspx)
에서 진행.
저작권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법적 조치.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만 루피(약 78만원, 2018년 10월 기준 1루피=15.6원)에서 20만 루피(약 31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저작권법의 유효기간은 서적의 경우 저자 사후(死後) 60년까지이며 그 밖에 작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출판(혹은 출시) 이후 60년까지.
저작권 등록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in New Delhi Registration)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무료.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작권 침해 발생하였을 때 법적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2023년 1월 19일, 인도 특허청(Indian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은 스타트업 지식 재산 보호 촉진계획(Start-Up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IPP)1)의 연장선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IP를 보호하고자 ‘IP Mitra’를 도입함
SIPP는 스타트업의 독창적인 발명품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을 장려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초기 대비 효과 증진을 위해 실시 기간이 3년 더 연장됨
인도 특허청(CGPDTM)은 IP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SIPP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돕고자 ‘IP Mitra’를 도입하게 됨
기존 SIPP 체계에서는 특허 출원 시 스타트업 기업은 자사를 대신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 중재자)를 정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임료는 인도 정부가, 법정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함
IP Mitra는 기존 퍼실리테이터와 같이 출원 절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아가 IP 전문가로서 기업들의 IP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자 함
CGPDTM은 IP Mitra의 도입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는 데 동력을 제공해 인도의 경제 성장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에 따라 전자출원 포털(e-filing portals) 내에 IP Mitra가 적격자로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 재산권 출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2021년 6월 21일,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 개정안(amendments to the Consumer Protection(E-commerce) Rules, 2020)’을 고시함
- 인도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을 2020년 7월 23일 발표하였으나, 동 규칙의 고시 이후에 오히려 인도의 전자상거래 생태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불만을 갖는 많은 소비자·판매자·협회 등이 인도 정부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촉구함
-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준법 책임자, 법 집행 기관과의 연락 담당자 및 소비자 고충처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분쟁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게 함
-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왜곡시켜 잘못된 상품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허위 판매(mis-selling) 기업으로 정의하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수입품의 경우 수입 판매자 정보·원산지 표기 등 정보를 제공하게 함
- 이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행위(기만 광고,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를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018년 12월 12일, 인도 특허청 산업 정책 및 증진과(the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특허 허여의 신속성과 용이성을 향상하기 위해 개정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함
- 이번 개정안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부분은 ‘우선심사’ 관련 조항의 수정임
- 현 특허법에 따르면 PCT에 따른 조사 기관으로 인도 특허청을 지정한 스타트업 기업과 출원인만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인 경우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됨
- 소기업이란 설비 투자 수준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업의 경우 695,000달러 (한화 약 7억 8천 원) 이하, 제조 기업의 경우 1,390,000달러 (한화 약 15억 6천 원) 이하의 경우에 소기업으로 인정됨
- 외국 기업은 자사가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의 경우 제출 문서 종류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음
-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출원인, 외국인 출원인 그리고 인도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 출원인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심사 중인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출원인과 제3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이의신청에 관하여 판단하게 됨
- 2023년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가 유럽연합(EU), 대만 등에 수출한 IT 제품 분야 중 일부에 대하여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을 발표함
- 인도는 글로벌 제조업체의 인도 투자를 장려하고 인도의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통신 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20%)를 부과하기 시작함
- WTO 패널은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제품(스위치, 라우터, 기지국, 안테나 등)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이 EU, 일본, 대만과의 분쟁에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힘
- 인도는 “이번 분쟁에서 언급된 여러 제품은 ITA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예시로 1997년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함
- WTO의 패널에 따르면 “인도가 특정 상품에 대해 당초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조건 무관세여야 할 상품에 대해 관세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함
|
• 인도는 특허사무국, 상표사무국,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에서 각각의 권리를 관리하며, 상위기관인 특허상표청(CGPDTMㆍ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Trademarks)이 이를 통괄함.
• 특허사무국(India Patent Office)은 특허ㆍ디자인에 대한 출원ㆍ등록을 담당하며, 전국에 4개지부(Mumbai, Delhi, Kolkata, Chennai)가 있음. Head Office는 Kolkata에 있음. • 특허사무국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특허법 및 수수료 등 정보를 제공하므로, 특허 출원ㆍ등록에 관한 정보는 특허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함. • 인도는 영토가 매우 넓은 국가이므로 진출할 지역과 가장 가까운 특허상표청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함. • 인도는 특허보다 상표 출원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며, 인도 진출 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상품일 경우 복제품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상표법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상표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표 출원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에 5개 지부(Mumbai, Kolkata, New Delhi, Chennai, Ahmedabad)가 있음. • 우리나라와 달리 지리적 표시를 별도의 규정을 두고 별도의 관리 기관인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India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y)이 관할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별도로 관할하지 않고, 일반 사법 체계를 따름. 인도는 연방과 28개의 주, 7개의 연방자치령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지역이 하나의 사법체계를 따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고등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된 3심제로운영 됨. • 인도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ㆍ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회원국이며, 인도가 가입한 국제 협약은 다음의 3개임. 비엔나협정(표장의 도형요소 국제분류 제정), 니스협정(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 제정), 로카르노협정(디자인의 국제분류제정) • 인도는 세계 인구의 1/7이 거주하는 거대 시장을 보유한 신흥 경제국가로서 다양한 다국적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가 늘고 점차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신설ㆍ개정ㆍ강화하고 있음. •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규칙 2020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고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준법책임자, 법 집행 기관과 연락 담당자, 소비자 고충처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분쟁에 상시 대응할 수 있게 함. 불공정한 거래행위(기만광고, 끼워팔기, 거래강제 등)를 규제하는 조항이 있음. •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출원인, 외국인 출원인 그리고 인도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인출원인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 [표 3] 한국특허법과 인도특허법 비교 | |||
|---|---|---|---|
| 한국 | 인도 | ||
| 가명 세서 | 국내 우선권 제도와 유사 | 가명 세서 작성 후 12개월 내 완전 명세서 작성 가능 가명 세서에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 세서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 | |
| 청구 범위 기재 |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만 기재하여 출원하고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출원 가능, 후에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청구 범위 기재를 추가하면 요건 충족됨 | 출원 시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을 반드시 성해야 함 | |
| 작성 언어 | 명세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한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PCT 등에 있어서도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 |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인도 언어인 힌두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 | |
| 실용신안 제도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해서 10년간의 보호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특허보다 진보성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규정 X | |
| 심사 청구 시기 | 심사 청구는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 실질 심사를 하여 등록이 가능함 | 심사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출원인 또는 해당 출원의 이해관계인만 가능 우선 일로부터 48개월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질 심사를 함 |
|
| 추가 특허 | 규정 X | 추가 특허제도가 존재, 특허의 관리 및 진보성 등에 의해서 출원이 거절되지 않고 주발명과 같이 보호됨 | |
|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무효심판 제도로 통합되어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특허 취소 신청이 신설되어 특허 설정 일로부터 등록 공고 후 6개월 동안 누구든지 특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
원 공개 후 특허 허여 전에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 가능 특허 허여 후 1년 이내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의 신청 가능 |
|
| 우선심사제도의 유무 |
있음(48의 6) | 있음. 실체 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 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
| BM 특허 S/W 특허 | 일정 요건에 따라 인정 | S/W는 일정 요건 하에 인정 BM특허는 불가능 | |
| [표 4] 한국 디자인보호법과 인도 디자인보호법 비교 | |||
|---|---|---|---|
| 한국 | 인도 | ||
| 보호의 대상 | 글자체 디자인 포함 | X |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일반적인 공지 행위 | 중앙 정부 인정 산업과 관련된 박람회에서 공개 시 인정 | |
| 무심사 제도 | 무심사(디자인 일부 심사) 제도 존재(일부 물품에 한해서) | X | |
| 확대된 선출원 주의 | 제 33조 3항에서 출원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하여 후 출원 등록 배제효 인정 | X | |
| 보호 기간 |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 후 20년이며, 다만, 관련 디자인권의 경우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 디자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 가능, 단 5년의 기간 동안 연장 가능 | |
| 기타 제도 | 관련 디자인제도(구,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부분 디자인 제도, 권리범위 확인 심판, 정당 권리자 출원 제도, 분할 출원 제도, 재심사 청구 제도, 우선심사청구제도, 이용 저촉 관계 규정 | X | |
| [표 5]한국 상표법과 인도 상표법 비교 | |||
|---|---|---|---|
| 한국 | 인도 | ||
| 보호의 대상 | 색채 상표, 홀로그램 상표, 동작 상표, 입체 상표, 소리 및 냄새 상표 | 상표의 부분 등록, 연속 상표, 상품의 외관 등 | |
| 인물 관련 거절 이유 | 저명한 고인(34조 1항 2호) 저명한 살아있는 사람 (34조 1항 6호) | 생존인 및 출원일 전 20년 내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 | |
| 선의의 경합 상표 | 등록 불가 | 일정한 경우 심사관의 허락을 얻어 등록 가능 | |
| 유사 상표 이전 |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동 시 취소 |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이전에 의해 혼동 시 이전 무효 | |
| 영업권 이전 | 업무 표장 제외하고 업무와 같이 이전할 필요 없음 | 상표권 이전시 영업권과 같이 이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여 재 공고 필요 | |
| 이의신청기간 | 출원 공고 후 2개월 | 출원 공고 후 3개월 | |
|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 |
| 불사용 심판 적용 요건 |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불사용 | 등록 후 5년 후 청구 가능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불사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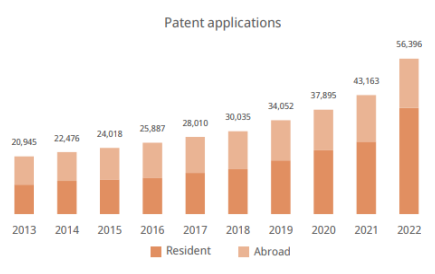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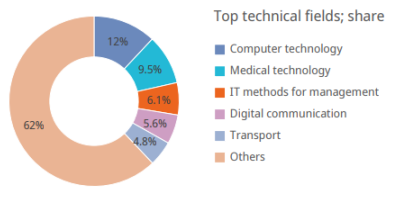
인도에는 가명 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인도 특허법 제9조에는 가명 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명 세서를 첨부했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 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 세서의 출원일을 우선 일로 인정해 주는 것임.
다만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 및 국내 우선권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음.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고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내 우선권 제도는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출원을 하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그 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주는 것인바 인도의 가명세서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가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원을 함에 있어서 국내 우선권 제도를 많이 이용함. 발명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발명의 최종 단계를 기다렸다가 출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미 한 발명에 대해서 먼저 출원을 하고 그 후에 개량 또는 변경된 발명을 국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출원.
이렇게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전 출원에 대해서는 이전 출원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함.
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가명 세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진출에 있어서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함.
선언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인도에서는 자국 내 심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특허법 제8조에서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장관의 요구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서 인도 외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제공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바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임.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선출원 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여 주고 있고 우선권 주장 등에 의해서 우선 일이 빠른 발명에 대해서 등록을 인정. 다만 인도에서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협의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짐. 이는 미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권에 대해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특허상표청 장관 허가서의 권한 이외에는 인도 국외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인도 국외로 한 출원일보다 6주 이상 전에 인도에 출원된 경우 및 인도 출원에 관해서 비밀 유지 지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 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도 자국 내 출원 후에 외국 출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본 규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다만 이 규정은 인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인도에 출원한 후 6주 후 에는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하여, 이 두 조건을 숙지하여 본 규정에 의해 불측의 손해를 막아야 함. 또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에 있어서 주로 인도 현지에 기업의 자사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 쉬워 인도에 특허 출원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함.
특허란 어떠한 새롭고 진보적이며, 유용한 기기, 물질, 방법, 과정 등에 의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임. 특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음.
인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인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할 수도 있음.
그러나 특허를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이를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로 관리할 수도 있음. 왜냐면 특허제도는 신규 한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발명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임 발명을 공개할 경우 발명을 도용할 수도 있고 약간의 개량을 통해 타인이 특허권을 받을 수도 있음.
이러한 타인의 특허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여 특허권 발생을 저지 할 수도 있음. 또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제3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감시가 필요함.
따라서 자신의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지는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인도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신규의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명의 정의로서 특허 요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함. 인도 특허법 제3조에서는 발명이 아닌 것을 열거하고 있음.
|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사항을 클레임 하는 발명
(b) 주요하거나 의도된 용도 또는 상업적 실시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발명 (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 추상적 이론의 수식화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 혹은 비생물 물질의 발견 (d) 기존 물질의 알려진 효능이 향상 되지 않은 기존 물질의 어떠한 신규 형태의 단순한 발견, 기존 물질의 신규 한 특성 혹은 신규 용도의 단순한 발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방법, 기계, 혹은 장치의 단순한 용도의 단순한 발견. (e)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성질들에 대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 혼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 , 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f) 기존 장치의 단순한 배치 혹은 재배치 또는 복제이며, 이것을 구성하는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 기능하는 것 (g) 농업 또는 원예에 대한 방법 (h) 사람의 내과적, 외과적, 치료적, 예방적, 진단적, 요법적 혹은 그 외의 치료 방법, 또는 동물의 유사한 치료 방법이며 동물들을 질병으로부터 롭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 혹은 그러한 제품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 시키는 것 (i)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의 전부 또는 그러한 일부. 이것에는 종자, 변종 및 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 번식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 방법을 포함 (j) 수학적 혹은 영업의 방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혹은 알고리즘 (k) 문학, 연극, 음악 혹은 예술 작품, 또는 다른 어떠한 심미적 창작물. 이것에는 영화 작품 및 텔레비전 제작품을 포함 (l)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단순한 계획, 규칙, 혹은 방법, 또는 게임을 하는 방법 (m) 정보의 제시 (n)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 (o) 사실상 전통 지식인 발명 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부품의 기존 특성의 집합 혹은 복제인 발명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만의 발명이라든지 BM(영업 방법)발명 등은 특허로서 보호받기 어려우며,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는 다른 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특허로 보호하지 않음. |
① 산업상 이용 가능성
특허권의 일반적인 목적은 발명을 이용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특허법 역시 발명은 산업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하여 산업 가능성을 특허권의 요건으로 봄.
이에 대해서 인도 특허법에서는 제2조 제1항 (ac)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등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이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각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약 및 기타 규정을 바탕으로 서로 비슷한 조건하에 특허를 허여하여 주기 때문임 과거 인도는 2005년 이전에 “물질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 등 특허의 대상으로서 제한을 두었으나 국제적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물질 발명도 특허를 허여하여 줌. 실질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절 이유로서 사용될 여지가 있음.
② 신규성
(가) 신규성의 정의
신규성은 일반 특허 요건으로서 전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는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이는 특허의 목적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규 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임.
인도 특허법 역시 신규성에 대해서 제2조 제1항 (1)에서 ‘신규 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 한 물건 또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허여. 인도 특허권의 신규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신규성과 관련해서 인도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주의로서 전세계에서 공개된 문헌 또는 서류를 바탕으로 신규성을 판단함.
(나) 신규성의 판단 방법 및 기준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도 역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을 판단하게 되며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기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하고, 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판단 방법에 있어서는 인도 역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청구항이 이전에 공개된 출원, 문헌 또는 인쇄물과 같은 공개 문헌에 기재로부터 예측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써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아가 여기서는 인도 자국 내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규모로서 실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자료가 될 수 있음.
또한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개된 자료의 일부로서 구성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은 전체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써 일부에 대한 공개가 되었더라도 발명 전체로 보아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허여할 수 없음. 그러나 위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서 발명 후에 출원하지 않고 먼저 공개한 경우에 자신의 공개에 의해 자신의 특허출원이 신규성을 이유로 거절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음.
이를 막기 위하여 출원인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개행위는 일정 요건 하에 출원하면 공개가 없는 것으로 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이 존재. 또한 정당 권리자가 아닌 타인의 무단 공개에 의해서 출원이 상실된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지 행위는 출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공개가 없는 것으로 봄.물론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③ 진보성
(가) 진보성의 의미
진보성은 출원된 특허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는 특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건.
이는 발명을 대중에 공개하더라도 전혀 진보되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다면 그에게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임. 즉 특허는 공지 등이 된 발명을 보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특허로서 권리를 허여.
인도 특허법 제2조 제1항 (ja)에서는‘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둘 모두를 가지는 발명이고,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나) 진보성 판단 방법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특허 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은 갖추기 쉬운 요건일 수 있으나 진보성 요건은 실제적으로 특허를 허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 요건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거절이유, 무효사유가 되는 요건으로 특허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
인도 역시 Inventive Step에 대해서 특허성 여부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당업자를 기준으로 구성에 곤란성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
④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공서양속, 국민의 건강 및 자국 내 산업 보호 등의 여러이유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중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에 대해서 인도 역시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규정함.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나열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
인도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해서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음. 과거 인도는 자국 내 산업 발전 및 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발명의 대상에 대해서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았음.
그러나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수학적 또는 영업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알고리즘,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등 특허 허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하며 그 범위를 좁히고 있음. 2005년 화학 의약과 같은 ‘물질 발명’도 특허법 제5조의 삭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그러나 인도 특허법 제4조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여전히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아직은 좀 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함.
특허 출원은 요식행위로써 서면으로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출원 절차가 시작.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임의 대리인인 변리사로 하여금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통신의 발전으로 전자 출원도 간편하게 가능함.
출원 과정에서 권리화하고자 하는 발명을 기재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을 제출하게 되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심사를 하고, 출원 공개가 되며 이의신청을 받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목적상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만을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권리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불비될 경우에는 보정, 분할 출원 등의 기회를 주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같은 출원인 이익 제도를 두어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인도는 선출원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출원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하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및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같은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봄.
인도 특허법 제6조에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함. 우리나라 역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인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음.
인도 특허법 제6조에서 진정한 발명을 한 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승계한 자, 발명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의해서 출원인이 된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대 국가에서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국가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진정 발명자가 아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 후 6개월 내에 출원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인도 특허 규칙 제10조) 인도 및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각국의 국민에게 상대 국가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인도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출원 발명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선행 기술을 조사하게 되며 이는 보통 관련 특허를 검색하여 이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인도는 인도 특허상표청(http://ipindiaservices.gov.in/publicsearch)
에서 특허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를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음.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 서류로서 특허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서를 작성해서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도면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타 서류는 특허 출원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12조에 의해서 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를 통지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음.
Bibliography는 서지적 사항으로 출원서, 선언서 및 기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Description은 권리 보호에 대한 기재 및 기술에 대한 기재가 있는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된 곳. 마지막으로 Drawing/Workable Example 은 도면에 관한 것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상으로는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① 출원서
출원서는 출원에 대한 표지로서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대리인을 기재하고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에 대한 정보 기재 및 우선권 서류와 선언서 및 특허 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출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서 작성 언어와 관련해서는 인도의 언어인 힌두어나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기재 역시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등록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기재도 하여야 함. 또한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의 명칭은 15단어 이내로 발명의 특징으로서 발명과 관련된 주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
② 요약서
요약서는 발명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출원 시 요약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함.
요약서는 기술 특징을 담은 간략한 서면으로 특허 검색 및 특허 공개 공보 기재에 있어서 요약서의 내용이 공개되는 바 선행 기술 검색에 이용되기도 함. 요약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발명의 명칭으로 시작하여 명세서 사항에 대한 간결한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며 보통 150단어 내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③ 도면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물건 발명은 주로 도면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일반적. 도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면은 원칙적으로 도면상에 설명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봄.
다만 Flow Chart는 흐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명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예외로 봄. 또한 도면이 아닌 물품의 모형이나 견본에 있어서는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하며 심사관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 없음.
④ 선언서
인도 특허법 제8조에서는 ‘인도에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고 있는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이에 대한 선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장관의 요구가 있다면 진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음.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동일 발명의 경우에 다른 국가의 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이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시 이와 같은 선언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함.
⑤ 명세서
명세서는 특허 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허 출원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리범위를 정해주고 자신의 권리를 등록시켜주길 요구하는 권리 요구서의 역할을 하며, 출원 명세서가 공개되고 난 후에는 제3자에게는 기술 자료로써 인용문헌 및 선행기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음. 따라서 출원에 있어서 명세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받고 제3자에게 공개 자료로써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바 이에 대한 작성 역시 중요한 부분.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가)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
인도에서는 가명세서로써 완전하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이는 개량발명이나 기타 불완전한 발명에 대해서라도 우선 출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일을 빨리 인정받기 위함임.
인도 특허법 제9조에서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가명 세서를 첨부하고 난 후에는 완전 명세서를 가명 세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이는 가명 세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권리로 보아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의 권리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12개월 내에 완전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함. 또한 2이상 출원의 가명세서에 대해서 1군 발명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완전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그리고 출원인의 의도는 완전 명세서이나 심사관은 12개월 내에는 언제라도 완전 명세서라고 주장하는 명세서를 가명 세서로 취급함을 지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출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이처럼 인도의 출원에 있어서는 출원인의 의지에 따라서 또는 심사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명세서로서의 취급이 가능함. 그러나 가명세서는 출원일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음. 가명 세서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불완전한 발명이며 다른 개량 발명 전에 미리 출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출원일이 완전 명세서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규정은 무의미할 것임.
따라서 인도 특허법 제11조에서는 가명세서 중에 개시된 발명이 완전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가명세서의 출원일로 우선일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이미 완성된 발명 및 그에 대한 개량 발명을 하기 전에 가명 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여기서 2이상의 가명 세서에 의해서 발명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늦게 출원된 가명 세서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결정하게 됨.
또한 국제 출원의 경우 모두 완전 명세서로 간주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 따라서 인도 자국 내 출원이 아닌 국제 출원을 바탕으로 인도 자국 내 진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완전 명세서로 취급되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나) 명세서 기재사항
명세서 기재 사항과 관련해서 가명 세서 및 완전 명세서 모두 발명의 명칭 및 도면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완전 명세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권리가 보호되는 부분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인바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여야 하며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 이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하여야 하며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서를 제공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이와 같은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명세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기재는 발명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즉 당업자가 보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을 의미.
인도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1 또는 2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요약서 역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인도 출원에서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행 기술에 대한 자료 역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바 인도 출원 시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⑥ 청구항
마지막으로 출원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는 가장 중요한 청구항이 있음. 청구항은 그 권리범위 해석에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청구항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청구항 작성 시 독립 항과 이를 인용하여 부가, 한정하는 종속 항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복수의 카테고리를 갖는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음
인도 역시도 1발명 1출원 주의를 채택하며 서로 관련성을 갖는 1군의 출원은 1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고 심사관의 판단하에 1군의 출원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 출원을 명령할 수 있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발명만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원의 심사라 함은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그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의 행위. 출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술 내용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 심사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피해 갈 수 없으나 이는 특허 출원인을 특허권이 인정될지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두게 되어 제3자와의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 또한 심사가 길어지면 최근의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특허가 되더라도 기술적 가치가 거의 없어질 수 있음.
반대로 심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혹은 무심사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면 부실 특허의 등록이 많아지고 특허 분쟁이 더 많아지게 되며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어 사업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도 생기게 되어 빠르고 간단히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특허의 심사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각 나라 별로 어떤 점을 중요시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이 심사 청구가 된 경우에만 실질 심사를 거치는 바 특허받을 의사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도록 하여 심사 적체를 해소하고자 함. 이 외에 심사시기가 길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원 공개나 우선 심사와 같이 출원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공중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를 둠.
인도 역시 선출원 주의를 취하며 심사 청구 제도 및 출원 공개 제도가 존재하고 방식 심사 및 실질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구조로 됨. 인도와 우리나라 심사 절차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봄.
특허 출원을 한 후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출원에 대해서 심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방식 및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됨. 이때 특허상표청에 하는 신청이 심사 청구제도. 세계 각 나라별로 심사 제도가 다른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는 나라도 있으나 인도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에 착수하는 심사 청구 제도를 취함. 심사 청구 제도의 목적은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에 대한 기술을 파악하고 그 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 조사 및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검토하는 일을 함. 최근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에따라 그 시간 및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심사의 지연을 초래.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진정으로 심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방어 출원 등 출원 행위 자체에 의미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59조에서 심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둠. 심사 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기재. 이는 출원된 특허에 한해 제3자가 실시하는 중 경고를 받아 권리관계에 불안정이 존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제3자라도 특정 출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의 등록 허여 여부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확정시킬 수 있게 함.
또한 심사청구 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출원된 특허 발명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할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 위함. 그러나 3년보다 더 길 경우 권리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있을 위험이 있어 기간을 한정하였으며 이 기간 내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 또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1B조 에서 심사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둠. 인도 특허법 제11B조에서는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11B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법 규칙에서 48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되어 출원이 소멸돼 더 이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공개의 효과만 있으며 등록은 되지 않게 됨.
인도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심사청구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인도는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한정하여서만 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2)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36개월(3년)의 기간이 주어지나 인도는 48개월(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심사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음.
따라서 인도 진출에 있어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심사 청구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1년이 긴 것을 주의하여야 심사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됨.
심사청구가 된 후에는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 심사에 착수하게 되면 방식 심사 및 실질 심사를 함. 방식 심사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가 일정한 형식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실질 심사에서는 특허 출원이 특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
우리나라 역시 심사 청구가 있으며 방식 심사를 거쳐 출원서,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방식에 맞는 경우 실질 심사를 하게 됨. 실질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성이 있는지를 판단.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2조에서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방식 심사를 거쳐 실질 심사를 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짐. 또한 인도 역시 발명의 대상 여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 심사를 하는 바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특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거의 유사.
출원 공개는 출원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출원에 관한 내용을 출원 공개 공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 이는 특허법의 기본 목적이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이기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있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출원 공개를 통해서 제3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특허 출원이 이미 존재함을 알려 중복 연구, 중복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출원된 발명을 통해서 제3자의 개량 발명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출원 공개의 취지는 출원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고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연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선 출원일로부터 18 개월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함. 즉 통상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우선권 주장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우선일 로부터, 최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64조에서 출원 공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경과된 때에 특허 출원이 공개되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이 기초된 출원의 출원일, 즉 우선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이 공개. 또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 공개가 가능함.
인도 역시 특허법 제11A 조에서 출원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함. 법문 상으로는 소정의 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하여 특허 규칙에서 18개월로 정해놓고 있음. 인도 역시 조기공개 제도가 있어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출원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 공개를 할 수도 있음.
우리나라 및 인도의 출원 공개에 대한 규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출원 공개가 특허법의 제1목적인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에 부합하기 위한 특허법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공개가 되는 것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각 나라 간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임
인도 역시 출원이 계속 중이면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음. 인도 특허법 제14조에서는 보정과 관련하여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사관의 명령에 의한 보정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57조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따르는 신청이 있을 때에 심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으로서 완전 명세서 또는 그것들과 관련되는 다른 서류를 보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정에 대해 인정해 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15조에서 단일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분할 출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여 분할 출원 역시 가능함.
(1) 분할출원
인도에서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완전 명세서에 단일 발명이 아닌 것이 있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특허법 제15조를 근거로 분할 출원에 대해서 시사한 경우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가명 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이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 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서 부당하게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한 것임.
또한 분할 출원은 완전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완전 명세서는 최초 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포함해서는 안 되는 바 주의가 필요함.
(2) 보정(시기 및 범위)
분할과 마찬가지로 보정 역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한 후 특허법 제14조를 근거로 출원 및 기타 서류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 보정이 가능함.
보정의 시기와 관련해서 특허의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해 소송이 재판소에 계류 중이거나 특허의 취소 절차가 고등 재판소에 계류 중인 때라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가 해당 보정 신청서의 제출 전후인지 와 관계없이 출원 및 기타 서류의 보정 신청에 대해서 이를 허가 또는 거절하는 명령을 발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송이나 심판 등에 있어서는 보정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보정서 신청과 관련해서 보정 허가 신청서에는 제안된 보정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의 이유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정 신청에 있어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보정의 범위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허 출원서 또는 완전 명세서나 이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에 대해서 포기, 정정 혹은 해명 이외의 방법에 따른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의 삽입과 같이 자명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정할 수 없음. 보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발명을 구항에 기재하거나, 보정 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보정 전의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은 때에 보정을 허가하지 않음.
인도에서는 특허 출원 및 기타 서류에서의 보정이 청구 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보정 전의 청구항에서 자명한 사항에 대한 것만을 보정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정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오기의 정정, 기존 명세서에 기재되었던 사항으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 인도에서 특허 출원 후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인도는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인정. 우리나라도 기존에는 이의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무효 심판으로써 누구든지 등록 공고 후 3개월 동안에는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것과 달리 인도 특허법 제25조에서는 이의 신청을 인정하고 있음. 이의 신청은 특허 허여 전 및 허여 후에 가능한 것으로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중요시함.
인도 특허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시기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을 함. 먼저 특허법 제25조 제1항에는 ‘특허 출원이 공개되었지만 특허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누구나 다음의 열거된 사유에 의해서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가 허여되기 전이라면 누구든지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열거된 사유란 특허 등록 요건으로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한 것으로써 이를 심사관이 항상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요청하여 특허 출원의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함.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 허여 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직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형성되기 전으로 누구든지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권리를 불안정하게 두지 않기 때문임
특허법 제25조 제2항에서‘특허 허여 후 특허 공고의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언제나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다음 열거된 사유로 인해 소정의 방법으로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특허 허여 전후로 이의 신청인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다른데 이는 특허권이 허여된 후에 나라에서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한바 심사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두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둠. 또한 심사관이 한 심사를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제도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의 신청 사유는 특허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
이의 신청은 특허가 공개된 후에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 특허법 역사는 그리 길지는 않으나 지금까지 상당한 수의 특허가 출원이 되어왔고, 또 기술적으로 과거부터 많은 발명들 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기술에 이를 수 있었음. 이런 기술들은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에 있어서 선행기술이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
그러나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축적된 선행기술의 양이 상당수에 이르러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모두를 검토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또한 비슷한 분야의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공지된 발명 전부를 알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서 공중에 협력을 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제도.
반면 인도는 여전히 이의신청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출원 공개 후 등록 전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인 사전 이의신청 제도(제25조 제1항)와 등록 공고일 후 1년 내 신청할 수 있는 사후 이의신청 제도(제25조 제2항)으로 나누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간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이라면 비록 심사 지연이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기 전으로 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안정성 있는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특허 허여 전이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특허가 등록된 직후라면 이를 안정된 상태의 권리로 보지 않아 심판을 강요하기보다 이의 신청 제도라는 보다 간단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함.
반면에 특허가 등록이 되고 공고가 된 경우라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생긴 것으로써 하나의 권리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권리가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고 후 1년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등록 공고 후 1년 이내의 이의 신청인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나열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체적, 객체적, 절차적 요건으로 실질적인 특허 거절이유와 유사함.
이의신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인도는 인정 여부, 기간 및 이해관계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임. 공중의 협력을 구하고 부실 특허 허여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사업자의 보호 차원에서 무효 심판 또는 이의 신청으로 이를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어 두 나라 모두 이에 대한 길은 열려 있으나 절차, 기간 및 사유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할 필요성이 있음.
특허의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 출원을 한 후 특허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심사 받아 특허가 등록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출원인은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등록받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타인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권원 없이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에 기하여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의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 출원을 한 후 특허의 등록 가능성 여부를 심사받아 특허가 등록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고 출원인은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음. 이렇게 등록받은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서 타인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업으로서 권원 없이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에 기하여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특허권의 권리내용은 특허 명세서의 특허 청구범위에서 묘사한 특허 발명에 대한 것이며 글 또는 도면 등으로 표현해야 하므로 권리의 특성상 무체재산권적 성격을 가짐. 이러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 권리범위의 판단이 쉽지 않은 권리의 특성상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할지, 특허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해 권리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범위 내의 발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불의의 침해를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법 제94조에서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하여 특허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특허발명’과 ‘실시’에관한 규정을 두어 구체화하고 있다 ‘특허 발명’이란 특허받은 발명을 말하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정해짐.(특허법 제97조) ‘실시’란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청약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특허권의 실시로 보고 있음.(특허법 제2조)
인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인도에서의 해당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되며,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인도에서의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됨.
특허권은 위와 같이 일정한 범위에서 효력을 갖음. 그러나 특허권의 효력은 개인의 재산권이면서 동시에 산업 입법의 성질상 공공의 이익 또는 특허권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 각 나라의 특허법에서는 각 나라의 실정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인도의 특허법을 비교해 봄.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96조에서 효력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교통수단 및 이에 사용되는 장치 등 출원 당시에 국내에 있던 물건 및 2 이상 의약을 혼합하는 발명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제조행위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특허권의 독점 배타적 성격에 따른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시 및 응당 정당한 사용이 되어야 할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임.
인도에서는 특허법 제107A 조에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여 어떠한 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로 인도 또는 인도 이외의 나라에 있어 실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개발 및 정보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및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반포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음.
특허권의 공유란 공동 출원, 양도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특허권이 복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임. 발명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할 수 있음.
이런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함께 실제로 그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으로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며 공동발명자 전원이 출원인이 되어야 함. 이는 특허권이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지분에 따른 권리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1)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음. 2)각 공유자는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 이에 위반하는 지분 양도 및 질권 설정 행위는 무효로 해석. 3)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허여된 실시권은 무효로 해석되어 제3자의 실시는 타 공유자에 침해를 구성. 4)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해야 함. 심판은 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 (무효심판, 정정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을 미칠 수 있어 법문상 고유 필수적 공동 심판으로 규정함. 심결 취소소송의 경우는 논란이 있으나 유사 필수적 공동 소송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특허권자 전부가 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5)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6)특허의 정정 및 정정심판 모두 공유자 전원이 절차를 밟아야 함.
인도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도에서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제한되는 권리 및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2 이상의 사람에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지며, 동의 없이 제3자에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지분의 양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 특허가 공유되는 경우 공유자 각자는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실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갖음.
실시권 제도는 우리나라와 인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 인도에서는 계약에 의한 실시권에 특별한 한정을 두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권이 부여되며 통상실시권은 비배타적인 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으로, 전용실시권을 배타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으로 하여 배타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 포함시켜서 이해함.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상표 청장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권이 특정인에게 허가되는 실시권. 특허권의 취소 제도와 함께 파리협약 제5조(A)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공익상 필요, 특허권의 오・남용 및 등록 후 불사용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의 수용 (특허법 제106조 제1항),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법 제138조)에서 이를 인정.
먼저 특허권의 수용의 경우 국방상 필요하며 전시ㆍ사변 등 극도의 긴급 상태일 경우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청장의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 및 대가를 지급해야 함.
재정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는 특허권자의 발명 실시에 대한 제재 또는 특허권자의 보호보다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더 클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실시, 불충분한 실시, 실시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불공정 거래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발명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 의약품 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생산된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해야 함.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실시권의 경우는 기존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되었을 때(특허법 제98조) 후 출원에 의한 특허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임에도 선 출원에 의한 특허권리자의 허락이 있어야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가 있지만 특허법 제138조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선 출원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대가에 라이선스 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발명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중대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경우 심판에 의하여 실시를 허가해주는 제도.
인도에서도 이런 강제실시권 제도를 인정. 특허 발명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가격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리고 특허 발명이 인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을 때 장관에 강제 라이선스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인도에는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부여 제도가 있음.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배타적, 비 배타적을 불문하고)가 본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저해 또는 방해받는 것을 이유로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를 장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또한 국가적 긴급 상황, 초긴급 상황,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특허에 대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를 중앙정부에 신청하고 중앙정부는 그 취지를 고시하여 라이선스를 허여. 개발도상국 등 의약품 제조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의약품 수출을 하기 위한 강제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제도도 있음.
우리나라와 인도의 강제실시권 제도는 그 이념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규정 및 그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음.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히 강제 실시권의 부여 조건 및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련 특허의 라이선스 등을 유의하여야 함.
추가특허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이는 기존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특허를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서 보호 및 관리하는 제도. 추가특허제도의 취지는 개량 또는 변경 발명과 관련해서 기존 발명에 부가적인 출원으로 보고 기존 발명에 부가되어 보호되도록 하는 취지이며 그 유효기간은 주 발명의 존속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추가 특허는 주 발명에 부가되어 그 기간 동안 보호되는 특허.
또한 추가 특허의 특징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주 발명은 선행기술이 되지 않는다는 점. 원칙적으로 자신이 한 발명이어도 출원일 후 1년 6개월이 지나서 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는 기존 발명은 선행기술로서의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기존 발명에 비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이 규정함.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개량 및 변경 발명이 기존 발명이 아닌 다른 선행기술에 의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나 자신의 기존 발명에 대해서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음. 이는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서 자신의 출원 공개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서 추가 특허로서 기존 발명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추가특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출원이 가능하지만 발명 후 1년 6개월 전에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을 하여야 자신의 발명에의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기존 발명에 비해서 진보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함.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추가특허제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이 역시 인도 특허법과의 주된 차이 중에 하나이며 인도 진출에 있어서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 추가특허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무권리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또는 발명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특허출원을 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무권리자 경우에는 특허 등록을 허여하여 주지 않음.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무권리자의 출원은 특허 거절 이유로 규정함. 따라서 진정한 발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정 발명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라면 무권리자의 출원은 거절되며 진정 발명자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을 것임.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반대 해석상 무권리자의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이 정당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된 후에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원한 경우(특허법 제34조) 또는 무권리자에 대한 출원이 등록이 된 후에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고 이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일 후 30일 이내에 정당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있거나 그전에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특허법 제35조) 발명이 동일하다면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규정이 있음.
인도는 특허법 제52조에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되고 신청인 혹은 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취득되었다는 이유로 인해 제64조에 근거하여 취소되었을 때 또는 취소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해당 특허를 취소하는 대신에 청구항에 포함되는 발명이 청인으로부터 지득한 것임을 인정한 결과로 해당 청구항을 삭제하는 완전 명세서의 보정을 해야 할 취지를 지시할 때에는 심판부 또는 재판소는 동일 소송에 대해 명하는 명령에 의하여 심판부 또는 재판소가 특허권자에 의해서 부정하게 지득되었다고 인정한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특허 부여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허권이 허여된 후에 특허 출원인이 사기 등에 의해서 타인의 발명을 무단으로 출원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출원한 것이 인정되고 그 타인이 진정한 발명자 및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특허에 대해서 무권리자에 대한 특허를 진정한 권리자의 특허로 보아 진정 권리자의 특허로 인정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함. 이는 무권리자의 출원이었어도 심사관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같은 실질적인 심사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등록된 특허이기 때문에 심사 경제 및 효율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진정한 권리자에게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무권리자의 출원일을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로서 출원일을 소급해 줄 뿐, 법적으로서 특허가 바로 허여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최종 개정 법은 제99조의2 특허권의 이전 청구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도 인도와 유사하게 진정 권리자가 특허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함.
우리나라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는 사실상 큰 실익이 없는 조문으로 볼 수 있음. 진정 권리자의 출원을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출원에 의해서 진정 권리자의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써 무권리자임이 증명된다면 진정 권리자는 무권리자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원일을 소급시켜줄 실익이 크지 않음. 오히려 존속기간 면에서 출원일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 바 존속기간이 짧아져 손해를 볼 수 있음. 무권리자 보호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허법 제35조보다 인도의 법체계가 더 효율적.
특허가 등록이 된 후 특허권으로서 특허료 납부, 존속기간 및 권리범위에 대해서 살펴봄.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추가 특허가 등록이 된 후 그 권리범위 및 존속기간을 알아봄.
심사를 거치고 나서 방식 및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도 특허상표청은 등록 공고와 함께 특허권을 허여함.(특허법 제43조) 특허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권리자로서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동일. 다만 등록된 이후에도 국가에 특허 유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미납 시 특허권은 포기 간주됨.
신생기업이나 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경우에 특허권의 보호 이익이 더 크고 개인 및 신생기업은 그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인 발명 및 신생기업의 보호 차원에서 특허권 유지 비용을 차등하게 책정. 또한 기간별로 차등하게 출원 후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출원 후에는 특허권에 대한 기술적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낮은 금액으로, 그 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특허권자에게 유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허권의 심사를 거치고 일정액의 수수료까지 납부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이 인정. 그렇다면 특허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인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둠.
인도 특허법 제48조 (a)에는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특허법 제48조 (b)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다.’라고 규정함.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해당 발명의 제조, 수입 등의 행위에 특허권의 범위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속지주의 원칙상 수출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음. 다만 수출을 하기 위한 전제 행위로서 생산, 양도 행위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닌바 이를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특허품을 만들더라도 이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수출 행위 자체는 제재할 수 없어 수출하려는 국가에 동일한 특허를 받아야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수입 행위는 특허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바 인도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인도에 수출하는 경우 특허권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방법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의 직접 실시에도 권리범위가 미치지만 물건을 만드는 방법 발명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을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도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미침. 이는 특허권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인도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특허권은 속지주의로서 자국 내에 있는 특허품에 대해서 권리범위가 미치나 일정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됨. 인도 특허법 제49조에서 외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육상 차량 등이 일시적 또는 한정적, 우발적으로 인도 내에 들어온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순히 교통과 같은 행위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이는 영리 목적이나 제품 판매 등이 아닌 교통이나 운송 등을 목적으로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이동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등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
인도 특허법 제54조는 ‘추가 특허’에 대해서 규정함. 이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인정되는 제도. 특허법 제54조를 보면 ‘특허 출원을 위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기재 혹은 개시된 발명(이하 “주 발명”이라고 한다)의 개량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특허 출원이 있고 그 출원인이 주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특허권자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그 취지를 청구할 때에는 장관은 해당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특허를 추가 특허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으로서 주 발명과 관련된 개량 발명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있어서 주 발명과 연관되어 특허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추가 특허를 함에 있어 추가 특허가 주 발명과 독립적으로 특허가 허여된 경우는 이 특허를 취소하고 주 발명에 대한 추가 특허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 특허의 경우에는 주 발명의 특허 부여 전에는 특허가 허여될 수 없다고 규정함. 즉 추가 특허 제도에 있어서는 주 발명을 기준으로 하여 주 발명에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특허인 것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인 경우에만 인정
(1)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
추가 특허는 추가 특허를 출원한 날이 추가 특허에 대한 출원일로 인정. 그러나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은 인도 특허법 제55조에서 추가 특허는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존속기간 또는 그 잔존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기간 및 해당 주 발명과 관련되는 특허의 실효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 주 발명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나 주 발명이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함께 소멸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그러나 주 발명의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추가 특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아 재판소 또는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의 청구가 있는 경우 추가 특허는 주 발명에 관계된 특허의 잔존 기간에 대해서 독립한 특허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고 주 발명의 존속기간 동안 발명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는 추가 특허는 독립된 특허가 되었는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독립된 특허가 되기 전까지 추가 특허는 별도의 수수료의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음.)
(2) 추가 특허의 효력
인도 특허법 제56조는 ‘완전 명세서에서 청구된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어떠한 공개 또는 실시에 의하여 진보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가 특허의 부여에 대해 거절하지 않으며, 추가 특허로 부여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열거 사유에는 추가 특허와 관련된 완전 명세서의 주 발명, 주 발명 특허에 대한 추가 특허 또는 해당 추가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완전 명세서의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에 대한 것은 진보성의 판단 자료가 되지 않음을 명시함.
이는 진보성 및 신규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발명에 대해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않아 진보성 및 신규성에 대한 판단 시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 더 자세하게는 기본 발명인 주발명이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공개 공보에 기재되어 선행기술이 됨. 따라서 주 발명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주 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한 출원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주 발명이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서 주 발명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출원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자신이 한 발명이 정당한 절차에 거쳐 출원을 하고 그것이 공개되었는데, 자신의 공개에 의해서 자신이 한 개량 또는 변경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출원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신의 주 발명을 인용 참증으로 하지 않은 채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이 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과는 다른 제도로서 인도 진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함.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 주장과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존속기간도 원 발명의 존속기간에 합치되는 점, 주 발명은 추가 특허 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 다른 점도 많으니 주의하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함.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은 장래로 향하여 소멸. 특허권은 공개에 의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이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 특히 장래로 향하여 소멸되는 포기 및 취소를 알아봄.
(1) 특허권의 포기
인도 특허법 제63조에서 특허권의 포기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허권의 포기는 특허권의 가치가 특허권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거나 더 이상 유지할 자금이 없는 경우,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 이루어지게 됨.
인도에서는 포기 시기와 관련해서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포기 절차에 관해서 포기 신청이 있을 때에 장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포기 신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허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 모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특히 특허권의 포기로 실시권자, 질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통지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포기 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으며 특허권의 포기가 정당한 경우 포기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은 존속.
(2) 특허권의 취소
인도 특허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서 특허권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둠. 특허권의 취소는 제64조에서 사유를 열거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제65조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특허의 취소를, 제66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함.
- 일반적 취소 사유
인도 특허법 제64조에서 일반적인 특허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나열함. 이와 같은 일반 취소 사유로 특허권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중앙정부의 제기에 근거해 심판부 또는 특허 침해 소송에 맞제기된 반소에 근거해 고등재판부가 다음의 열거된 이유로써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특허권이 취소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중앙정부의 청구가 필요하며 이렇게 제기된 특허의 취소 판단 주체는 심판부 또는 고등 재판소가 되며 특허의 취소에 대한 판단을 함. 다음은 특허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 나열한 것으로써 이는 특허권의 거절 이유와 유사.
거절 이유와 관련해서 주체적인 요건으로서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실질적인 특허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같은 객체적 요건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절차 법인 특허법과 관련해서 일정한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음.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 특허권을 등록 받는 것도 중요하나 이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부실한 특허를 사업 시작 전에 취소시킬 수도 있어 취소 사유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특허에 실시권이라는 제도가 존재. 실시권에는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비 배타적(non-exclusive) 실시권과 전용실시권에 해당하는 배타적(exclusive) 실시권이 존재하며 특히 배타적 실시권의 경우는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함. 또한 강제 실시권에 대해서도 역시 알아봄. 우리나라와 강제 실시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조금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인도 역시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타적인 실시권과 비 배타적인 실시권을 허여하는 것 모두 가능함. 실시권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로열티와 같은 실시료를 받을 수 있을뿐더러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에 있어 인도의 특허권을 허여 받고 이를 인도 자국 내 기업에게 라이선스를 주어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 역시 진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인바 실시권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함.
강제 실시권은 특허권에 대해서 정부 또는 법 규정에 의해 강제로 실시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임. 이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강제 실시권의 범위가 논란이 될 수 있음. 인도는 특허권의 기본적인 태도를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다른 나라보다 강제 실시권 허여에 좀 더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조문이 존재.
① 강제 실시권 사유
인도 특허법 제84조, 제92조 및 제92조 A에서 강제 실시권의 사유를 규정함.
특허법 제84조는 일반적인 강제 실시권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건으로 특허가 허여된 후 3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장관에게 강제 실시권을 신청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써 그 사유로는 1)특허 발명에 관한 공중의 적절한 수요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것 2)특허 발명이 적정하게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3)특허 발명이 인도 영역 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있고 위의 사유를 이유로 강제 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음. 본조에서 근거하는 신청은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의 소유자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강제 실시권 신청을 하는 경우 강제 실시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각 신청에서는 1)신청인의 이해관계의 내용 2)소정의 상세 사항 3)해당 신청의 기초인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이 신청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강제 실시권을 허여. 나아가 이와 같은 강제 실시권이 허락되었으나 계속적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실시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 또는 이해관계인은 강제 실시권 허락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만료 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유로써 불실시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있으면 장관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취소 여부를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이와 같이 특허권의 실시가 불충분하거나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강제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특허권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특허권의 본질은 공중에 특허를 공개하여 그 대가로 특허권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데, 단지 권리로서 등록을 받고 사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실시를 막는다면 특허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바 발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함.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기업은 특허 출원 후에 일정기간 특허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강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허권의 관리가 필요함.
위의 사유 말고도 1)중앙정부의 고시에 의한 강제 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2)일정한 예외 상황 하에서 특허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가적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로서 중앙정부가 납득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로써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의약제조 기술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오로지 수출을 목적으로 인도에서 특허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실시권을 허여함.
② 강제 실시권의 기간, 조건 및 종료
강제 실시권 역시 실시권의 하나인바 사용에 대한 일정 기간 및 조건의 설정이 필요함. 특허법 제90조에서는 강제 실시권의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은 여기에 규정된 사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아래는 강제 실시권 허여 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
|
(i) 로열티 및 특허권자 또는 그 외의 사람으로 특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보된 다른 대가(있는 경우)가 발명의 본질, 발명의 창작 혹은 개발, 특허의 취득 및 그 유효 유지에 지출한 비용 및 그 외의 관련 요인으로부터 적절한 것
(ii) 특허 발명이 그 라이선스가 허락된 당사자에 의해서 충분히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이익을 수반해 실시되는 것 (iii) 특허 물품이 적절히 적당한 가격으로 공중에 있어 입수 가능하게 되는 것 (iv)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비 배타적 라이선스인 것 (v) 실시권자의 권리가 양도 불가능인 것 (vi) 라이선스의 기간이(보다 짧은 기간이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의 잔존 기간에 대응하고 있는 것 (vii) 라이선스가 인도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허락되고 있는 것 및 실시권자는 제84조 (7)의 (a)(iii)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특허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는 것 (viii) 반도체 기술의 경우는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발명을 실시하는 것 (ix) 허락되는 라이선스가 사법 또는 행정 절차 후 반경쟁적이라고 결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일 때에는 필요한 때 특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실시권자에게 허가되는 것 |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강제 실시권이 허여될 수 있음. 위에서 보듯 강제 실시권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며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이는 이를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린다면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공공의 이익이 해하여질 우려가 크고 특허권자가 권리의 오・남용 또는 불사용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적을 때 인정될 것임.
강제 라이선스의 종료와 관련해서 특허권자, 특허의 권원 또는 이해를 얻은 사람의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허락된 강제 라이선스는 그 부여에 이른 상황이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고 해당 상황이 재발할 우려가 없을 때인 경우로서 장관이 이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면 강제 라이선스를 종료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종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존의 강제 라이선스가 허락되고 있던 사람의 이해가 부당하게 해쳐지지 않음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본 특허 출원료는 최대 30페이지, 10개 청구항 기준임. 이를 초과할 경우 페이지당, 청구항당 정해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함
- 금액은 출원인의 자격에 따라 4개 분류로 나누고 있음
- 예를 들어, 개인이 디자인 출원을 신청할 경우, 디자인 출원료는 1600루피+(초과 페이지수*160루피)+(초과 청구항수*320루피)
- 인도 특허청 비용 자세히 보기 : https://ipindia.gov.in/form-and-fees.htm
| [표 6] 인도 특허 출원 비용 | |||||
|---|---|---|---|---|---|
| *단위: INR (KRW) | |||||
| 특허법상의 근거조문 | |||||
| 온라인 제출 | 직접 제출 | ||||
| (ⅰ) 자연인/스타트업/Small Entity/교육기관 | (ⅱ) 기타/ | (ⅰ) 자연인/스타트업/Small Entity/교육기관 | (ⅱ) 기타 | ||
| 기본 출원료 | 1,600 (24,910₩) |
8,000 (124,560₩) |
1,800 (28,030₩) |
8,800 (137,020₩) |
|
| 초과 페이지 | 160 (2,490₩) | 800 (12,460₩) | 180 (2,800₩) | 880 (13,700₩) | |
| 초과 청구항 | 320 (4,980₩) | 1,600 (24,910₩) | 350 (5,450₩) | 1,750 (27,250₩) | |
※ 참고사항
- 환율 : 1INR = 15.57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별도의 특허 등록료는 없으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 후 3 년차부터 매년 정해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함
| [표 7] 인도 특허 연차료 | ||||
|---|---|---|---|---|
| 특허 등록 관납료 | ||||
| *단위: $(USD) | ₩(KRW) | |||
| 특허 유지료 | 등록후 3~6년차 | 50 | 70,200 | |
| 등록후 7~10년차 | 150 | 210,600 | ||
| 등록후 11~115년차 | 300 | 421,200 | ||
| 등록후 16~20년차 | 500 | 702,000 | ||
| 월 단위 연장 비용 | 50 | 42,120 | ||
※ 참고사항
- 환율 : 1USD = 1,303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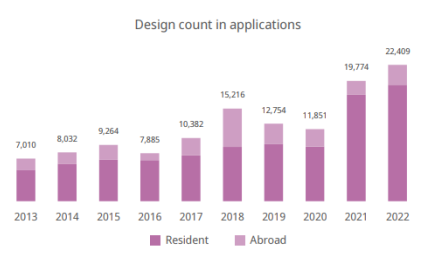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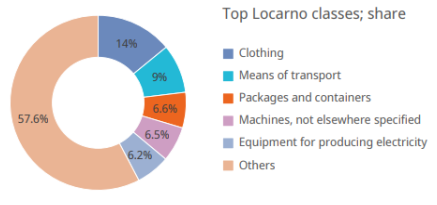
디자인은 특허사무국에서 같이 관할하고 있어서 그 연혁에서 특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디자인은 Invention & Design으로 특허와 같이 보호해왔으며, 현재 인도 특허상표청에서도 특허사무국에서 디자인에 관한 업무까지 같이 담당하는 구조를 이룸.
그러나 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을 뿐 디자인에 대한 제재 규정은 특허법과 똑같지 않고 별도의 디자인법인 “The Design Act of 2000”에 의해서 규율됨. 디자인은 Trips 조약 및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인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정세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며 또한 “The Design Rules, 2001”과 같은 규칙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자인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호되도록 함.
2014년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및 국제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더 자세한 분류 및 구조를 통해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지금도 이에 따르고 있음.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디자인 보호와 관련해서 디자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가짐. 우리나라의 정의 규정에는 물품 및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으로서 이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호를 해줌. 우리나라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디자인은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하고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디자인권은 단순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며 물품과 결합하여 물품에 대한 공업상 디자인을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규정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임.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조 (d)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도 역시 물품과 결합된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을 디자인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음.
이처럼 인도와 우리나라 모두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유사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디자인의 정의에서 글자체 역시 보호를 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글자체를 따로 디자인으로 보호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음.
다른 차이점으로는 실질적인 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저작물 등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조문을 구성함.
인도는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써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선출원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거나 담고 있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함.
우리나라 역시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써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주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일치. 디자인 역시 창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산업발전을 이바지함이 그 목적인바 물품과 결합하여 공업상 이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등록 받기 위한 요건은 동일. 또한 우리나라의 등록 요건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역시 비방적인 것 또는 외설적인 사항에대해서는 공공질서 및 공서양속을 위하여 등록을 허여하지 않음.
(1) 신규성
신규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 신규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및 인도 모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 33조 제1항에서 국내외에 공연 실시 및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제4조 (b)에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허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인도와 우리나라에 있어서 신규성 판단의 기준은 국제주의로써 세계적으로 공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유사.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지의 형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인도에서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사 디자인 역시 신규성 상실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에 대해서 인도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인도 역시 이를 신규성 상실로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디자인이 공지 또는 공개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신규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디자인 등록이 허여되지 않음. 그러나 디자인을 완성한 후 출원 전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디자인 출원을 신규성 상실로서 등록을 허여하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가혹할 수 있는바 출원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신규성 상실 사유로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및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위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공개 후 12개월 내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 2)출원 후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3)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인도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르게 규정함. 인도 역시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1조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업 및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표시의 공개이거나 타인의 박람회 기간 중 또는 이후에 허가 없는 공개로서 공개 후 6개월 내에 출원이 이루어지고 소정의 양식으로 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기타 공개 사유까지 포함하는 우리나라 신규성 상실 규정과 조금 다른 것으로써 인도는 중앙정부 등이 인정한 산업의 박람회와 관련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또한 증명서류 역시 우리는 출원일 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도에서는 이와 같은 기간이 아닌 출원에 있어서 소정의 양식을 갖춘 서류에 대한 사전 제출을 통해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소극적으로 규정함.
따라서 인도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신규성상실이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3) 창작성
용이 창작 디자인이란, 당업자가 출원 전 국내외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국내 주지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용이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디자인만을 등록대상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 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는 신규성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인도 역시 디자인보호법 제4조 (a)에서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4조 (c)에서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식별력이 없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인도 역시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허여하고 줌.
이는 디자인권 역시 독점 배타권으로서 법 목적에 부합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와 우리나라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둠.
(4) 공업상 이용 가능성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의 범주에 속하고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은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기 때문에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을 순수한 외형의 미감을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에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디자인의 등록요건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함.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이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말함. 따라서 공업상 이용 불가능한 디자인이란 물품에 화체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 표현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디자인, 공업적인 방법으로 양산이 불가능한 것 등이 이에 해당.
인도에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디자인에 대한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유사.
(5) 선출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하는 것임. 디자인권의 본질은 독점 배타권이므로 중복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의 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 선출원주의는 산업발전이라는 디자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여 심사절차상으로는 심사의 촉진이라는 행정적 목적에도 잘 부합. 그러나 선출원주의는 선창작, 선발명주의와는 달리 진정한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하고 출원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상태에서 출원이나 권리화의 필요성이 적은 출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서 선출원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함.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 등록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 등록 출원한 자가 등록받을 수 있으며, 동일자 출원의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정해진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음. 특허청장은 동일자 출원인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 명령을 하여야 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 등록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음.
인도 역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선출원을 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디자인 출원 역시 창작물에 대한 보호로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는바 디자인 출원이 있으면 디자인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짐.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심사 청구를 따로 할 필요 없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받아 등록 여부를 판단.
하지만 심사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차이점이 존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사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유행성이 강한 물품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일정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를 통해 등록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으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디자인의 실질적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제도가 있음. 이를 무심사 제도라고 하는데 유행성이 빠르거나 디자인 등록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 디자인권의 의미가 상실되는 일정 물품에 한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무심사 제도의 규정이 없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디자인출원이 실질적인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바 실질적으로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 무심사 대상의 물품을 인도에 디자인 출원하더라도 무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함.
디자인이란 그 물품의 하나 이상의 시각 특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외관을 말함.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공업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물품의 구성요소라도 그 물품과 독립하여 존재 할 수 있는 경우 물품으로 볼 수 있음. 시각적 특징이란 물품과 관련한 물품의 형상,구성, 패턴, 장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즉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서 특정의 형상, 패턴 또는 구성과 같은 형태로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형상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 디자인이란 물품에서의 심미감 등을 줄 수 있는 창작품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한 장치나 물품과 관련하지 않은 그림 및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디자인은 물품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이라는 특정의 형태를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나라 및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은 물품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창작하고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
디자인권은 그 출원의 수가 많지 않고 관련 규정도 적으나 기능성을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도만큼 물품의 심미감도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상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가고 있음.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며 사이클이 짧아 침해 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권의 등록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중요함.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은 지정 물품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점, 주요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신규성 및 창작성을 살펴봄. 특히 인도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모든 공지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중앙 정부에의 관보 고시에 의한 박람회 등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만 이에 해당하게 되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함.
① 물품과의 관련성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디자인은 소정의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해서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과 관련하여 등록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이는 저작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단순한 미적 창작물은 물품과 무관한 저작물 자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임 또한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표지인 상표와도 차이가 있음.
디자인 출원의 경우 특정 물품 군에 포함된 물품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군에 속하는지 의문인 경우 장관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은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함.
② 공서양속 및 공공질서 위반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4조 (d)에서 ‘비방적인 또는 외설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담고 있는 것’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이는 디자인 자체가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외설적인 이미지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서양속 및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디자인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음.
인도의 디자인 출원은 신규한 디자인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 이는 디자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이 만들어진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임.
또한 인도 특허법 제4조 (b)에서는 등록 출원의 출원 전 또는 우선일 전에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중에게 개시된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규성에 대해서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 공개된 것은 신규성 상실의 자료로 삼아 이와 같이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은 거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① 신규성 상실의 예외
특허법에서는 출원일 전에 공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발명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가 있음.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역시 출원 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는 경우라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가 존재함.
도 디자인보호법 제21조는‘중앙정부에 의한 관보의 고시에 따라 본조가 적용되는 산업 및 그 외의 박람회에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에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거나, 누군가에 의해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의 개최 기간 중 혹은 그 후의 디자인 혹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전시 또는 디자인 표시의 공개이며, 디자인 소유자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지 않는 공개는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 되게 하지 않음. 단 이를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 혹은 물품을 전시하거나 디자인 표시를 공개하는 전시자가 장관에게 소정의 양식으로 통지를 하고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디자인은 창작물이라는 점, 디자인은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서 주로 공개되는 사실에 기인하여 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서 공개 되거나 타인이 이를 보고 정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개한 경우에 이와같은 공개는 신규성 상실 사유로 삼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특허법과 동일하게 6개월로 함.
디자인 출원 역시 특허 출원과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인도에 진출함에 있어 디자인은 출원 전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에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디자인 출원 시 본 규정을 염두에 두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창작성 역시 인도 디자인 등록을 위한 실질적 요건. 디자인 출원은 단순히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조합하는 것이나 기계적인 결합으로서 사람에게 심미감을 주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결합에 불과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허여하지 않고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4조(a)에서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을, 제4조 (c)에서 주지 디자인 또는 주지 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두드러질 정도로 식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창작성이 있을 것을 요구함.
비록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다르다 하더라도 단순한 변경에 불과한 경우 창작성 위반에 해당하여 디자인권 등록에 이르지 못할 것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주지된 디자인의 단순 결합 역시 두드러질 정도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을 것임. 인도에서 디자인 출원을 함에 있어서 신규성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지 디자인에 비해서 창작성을 가지는 디자인에 한해서 등록이 가능함.
출원에 필요한 서류, 기재 방법 등을 알아보고 지정물품의 선택 및 1군의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며, 선출원주의 위반 및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살펴봄.
디자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함.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출원은 소정의 양식을 갖추고, 소정의 방법으로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디자인 출원 시에 일정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일정 방법에 따라 출원을 하여야 함. 소정의 서류는 출원서, 도면, 투사도 및 표지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4부씩 제출하여야 함.
① 출원서
출원서는 표지사항 및 출원서 각각을 4부씩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각각에는 출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서명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서명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권리 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위에서 보았듯이 디자인은 저작물과 같이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물품과 결합된 상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서는 동일 물품 분류에 대한 1 또는 2이상의 물품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함.
또한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사용용도 및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함.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창작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로서 일정한 권리 범위가 존재하며,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출원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출원하도록 함.
② 문서 기재 방법
디자인 출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도면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확정됨. 도면에 대한 기재 및 그 형식에 있어서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인도는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함.
디자인 규칙 제7조에서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힌두어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과 표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A4용지로 작성하도록 함. A4용지는 4cm의 여백을 두고 작성하여야 하며 양면을 사용할 수 없고 출원인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 서류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자를 출원서에 기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③ 표지사항
표지사항은 출원인이 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서면으로서 여기에는 출원인이 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또한 표지사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A4(210mm × 296.9mm)로 한 면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표지사항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는 것 역시 필요함.
또한 도면 작성 시 어구, 문구 또는 숫자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라면 이를 기재하지 말아야 함.
인도는 선행 디자인의 경우 출원 번호 또는 출원일자 등으로만 검색 가능하도록 함. 즉 출원 전 미리 검색을 통해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출원 후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경우 출원 번호를 통해서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하거나 디자인권자가 침해임을 주장하며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을 때 또는 자신의 출원 디자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인도는 인도 특허상표청(http://ipindiaservices.gov.in/designsearch/)에서 디자인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디자인 또는 공개된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군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장관은 그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하나의 물품 군에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 그러나 하나의 물품 군이라면 이 물품 군에 속하는 1 또는 2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이는 특허권에서의 1발명 1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디자인권 역시 서로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품류로 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복수개의 물품을 선택하여도 심사의 어려움이나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서로 다른 물품 군에 대해서 동일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심사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재를 두고 있는 것임.
인도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선출원주의를 취함. 따라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출원을 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은 등록되지 않음.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적용되며 자신이 한 디자인 출원은 본인이 전에 한 출원이 거절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자신이 한 출원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디자인권자가 동일 물품 군에서 1 또는 2이상의 다른 물품에 대해서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출원 또는 그 공개로 인하여 다른 물품에 대한 자신의 출원이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다만 이런 경우 후속 출원이 등록되어도 그 존속기간이 이전에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도록 제재함.
디자인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출원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때, 즉 이전 등록된 권리와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출원 위반이 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디자인 등록 출원의 심사 일반, 방식 심사, 실질 심사, 심사 절차를 살핀 후 거절이유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봄. 디자인 출원은 심사 청구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디자인 출원서가 접수 되고 나면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 특허법은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 청구를 한 후에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로 됨. 이는 불필요한 심사를 줄이며 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을 위한 것임. 그러나 디자인의 경우 아직 디자인 출원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판단이 도면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디자인이 출원되면 심사 청구가 없어도 출원 순서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 심사는 형식에 맞는 출원인지를 살피는 방식심사를 한 후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며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을 허여함.
방식심사와 관련해서 인도의 디자인법 및 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이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됨. 또한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권 서류를 명확히 갖추었는지,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또는 기타 증명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됨. 실질 심사는 디자인의 등록 대상인지, 신규성, 창작성,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심사.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면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후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이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 도록 함.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거절이유가 있다면 장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 및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 때 거절 이유를 통 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제거하여 청문을 신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됨. 또한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그 신청에 대한 청문 일자를 결정하고 청문에 대해서 판단한 후 거절 또는 허여에 대한 결정을 함.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명 또는 디자인 창작에 대한 공개 대가로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을 주는 제도. 따라서 디자인권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있음. 이를 존속기간이라고 하며 존속기간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바 우리나라와 인도의 존속기간을 비교.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다만 관련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기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기본 디자인을 등록 후 20년간 보호함.
인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우리나라와 미세한 차이가 있음. 인도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존속기간을 판단. 그러나 인도는 등록일로부 터 10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원하는 경우 5년의 기간을 더 연장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결국 인도 디자인권의 최대 보호 기간은 15년이고 디자인권의 관리 및 보호에 있어서 디자인권의 가치 및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 동안 디자인권을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선택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인도의 제도가 더 효율적.
또한 인도의 디자인권의 연장에 있어서는 기간 연장 신청서 및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와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 진출 시 우리나라와 달리 15년 기간을 보호받고 싶으면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을 유의.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로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및 등록료 미납 등이 있음.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소멸하거나 일정 시간의 보호 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경우로서 디자인권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소멸사유임.
디자인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디자인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19조에서 디자인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다음 열거된 사유에 한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함.
(a) 해당 디자인이 먼저 인도에서 등록된 경우
(b) 해당 디자인이 등록일 전에 인도 또는 외국에서 공개된 경우
(c) 해당 디자인이 신규성 또는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이 아닌 경우
(d) 해당 디자인이 본법에 의하여 등록 가능하지 않은 경우
(e) 해당 디자인이 제2조 (d)에 정의된 디자인이 아닌 경우
위의 5가지 사유로 디자인권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취소 사유는 대부분 디자인권의 실질적인 등록 요건으로 심사 단계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하자 있는 권리를 존속시키지 않기 위해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함.
심사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권이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출원은 등록에 이르게 됨.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면 장관은 신속하게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등록 공고하여야 하고 그 후 해당 디자인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함. 이는 특허권이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디자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함. 특허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특허 출원은 출원일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공개 제도를 통해서 공개되나 디자인권의 경우에는 등록과 함께 등록 공고를 통해서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음.
또한 이렇게 디자인 등록부에 등록이 되면 특허상표청에서는 디자인 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 지속적으로 보전.
디자인권이 등록되고 나면 디자인 출원인은 해당 디자인권의 소유자가 되며 인도 특허상표청은 디자인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부여.
디자인권이 등록 되면 디자인권은 정부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됨. 존속기간은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11조에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지된다고 규정함. 또한 5년의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장관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등록을 받을 수 있음. 결국 최종적으로 인도에서의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15년의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음.
디자인권이 등록되고 나면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가 존재함. 특허권과는 달리 청구항 및 구체적인 서술적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 사진 등의 그림에 의해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22조에서는 등록 디자인의 도용과 관련된 규정을 통해서 권리범위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함.
디자인권의 침해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을 등록받은 물품군의 물품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사용이거나 모방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 물품에 대한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디자인권은 디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물품도 같은 물품류에 속하여야 권리범위에 해당하게 됨. 디자인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디자인 자체만을 위한 등록이 아니라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물품류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디자인권의 침해를 인정하게 됨. 따라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뿐 아니라 사용할 여지가 있는 물품류도 면밀히 검토 후 출원에 임하여야 할 것임.
실시권이란 소유자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받은 독점적인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써 실시권 설정은 서면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함. 라이선스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됨. 전용실시권은 라이선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써 허여권자는 제3자와 지식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 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 통상실시권은 라이선스의 범위에 대해서 비 배타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임.
디자인권 역시 하나의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권리의 양도가 있었음을 특허상표청에 통지하고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 인도의 산업디자인 수수료는 2014년 디자인법 개정에 따라(2014년 12월 30일 발효) 신청인 자격을 두 가지로 세분화하여 (ⅰ)자연인, (ⅱ)자연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관납료 금액이 달라짐
- 디지털 서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과 납부가 가능함
- 인도 특허청 비용 자세히 보기 :https://ipindia.gov.in/form-and-fees.htm
| [표 8] 인도 디자인 출원 비용 | ||||
|---|---|---|---|---|
| *단위: INR (KRW) | 특허 등록 관납료 | |||
| 자연인 | Small entity | Large entity | ||
| 기본 출원료 | 1,000 (15,570₩) | 2,000 (31,140₩) | 4,000 (62,280₩) | |
| 등록 디자인 검사료 | 500 (7,790₩) | 1,000 (15,570₩) | 2,000 (31,140₩) | |
| 디자인 등록부에 권리자 이름 등재 | 500 (7,790₩) | 1,000 (15,570₩) | 2,000 (31,140₩) | |
| 보정 | 500 (7,790₩) | 1,000 (15,570₩) | 2,000 (31,140₩) | |
※ 참고사항
- 환율 : 1USD = 1,303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인도 디자인특허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연차료 납부 시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디자인특허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디자인 개수 당 추가 등록료를 납부해야 함
| [표 9] 인도 디자인 등록 비용 | ||||
|---|---|---|---|---|
| *단위: INR (KRW) | 디자인특허 관납료 | |||
| 자연인 | Small entity | Large entity | ||
| 디자인특허 등록료 | 500 (7,790₩) | 1,000 (15,570₩) | 2,000 (31,140₩) | |
| 디자인 추가 등록료 | 200 (3,110₩) | 400 (6,230₩) | 800 (12,460₩) | |
| 갱신 | 2,000 (31,140₩) | 4,000 (62,280₩) | 8,000 (124,560₩) | |
| 실효 디자인 복원 | 1,000 (15,570₩) | 2,000 (31,140₩) | 4,000 (62,280₩) | |
※ 참고사항
- 환율 : 1INR = 15.57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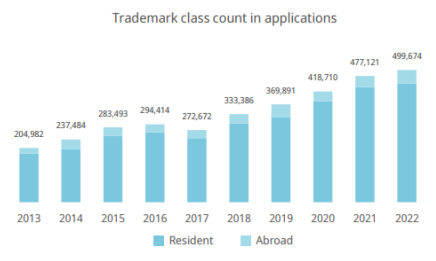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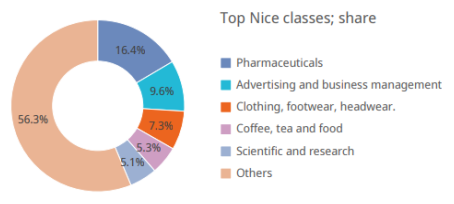
| [표 10] 출원서류 | |
|---|---|
| NO | 출원서류 |
| 1 | 출원서 3통 및 수수료 |
| 2 | 표장의 추가 표시 서류 5통 |
| 3 | 우선권 증명 서류 |
| 4 | 위임장 |
| 5 | 증명 표장의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 규제 규약에 대한 사항 |
| 6 | 연속 상표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 서류 |
인도의 경우 출원이 있으면 필요서류 구비 여부 및 정식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할지 결정한 후 수리하며 수리된 출원에 대해서 등록 여부를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함. 이때 출원 수수료의 5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한 선언서를 첨부하여 조기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출원공고 제도란 실체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 공고하여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것임. 이의 신청을 통하여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우리나라는 상표법 제57조에서 심사관은 상표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출원 공개의 효과로 출원인은 제58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제3자는 누구든지 제60조에 의한 상표등록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제40조 보정에 대한 보정 각하가 있는 경우 각하 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경과 시까지, 출원인이 보정 각하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심판의 심결 확정 시까지 심사를 중지하여야 하므로 출원공고도 보류됨.
이의 신청은 상표 출원에 대해서 공중에게 심사의 협력을 위한 제도. 실질적으로 모든 거절 이유에 대해서 심사관이 판단하고 모든 상표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표 출원 공고가 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이에 대해서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출원 공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의 신청은 이 출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는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인도는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출원 공고를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표 등록 출원이 수리되는 대로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의 신청기간은 출원 공고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따라서 인도에서 역시 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통해 거절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송달하여 진술 기회를 주며 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함.
상표 출원을 위해 출원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실질 심사를 거쳐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을 허여. 거절 이유가 있다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보정 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라면 등록을 허여하고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거절 결정함.
인도 상표법 제22조에서 출원에 대한 정정 및 보정에 대해서 규정함. 정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등록 출원의 수리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봄. 다만 정정 및 보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출원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정도의 보정은 허용되며 이때 일정의 양식을 갖추어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상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상품 및 서비스 항목의 추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출원을 하는 경우가 되므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추가는 불가능함. 그러나 단일 출원이 보정에 의해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처음 출원할 때에 분할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
출원 번호를 부여받고 난 후에 출원인은 출원의 빠른 등록을 위해서 출원 수수료의 5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한 선언서를 첨부하여 조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이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 침해가 의심스러운 경우나 상표의 활용을 위해서 조기에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조기 심사 청구를 통해 빠르게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음. 조기 심사 청구가 되면 청구일로부터 3월 내에 심사 보고서가 발행됨.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달리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출처 표시로써 상표를 통해 쌓은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상표의 기능을 보면 1)출처 표시 기능 2)자타 상품 식별 기능 3)품질 보증 기능 4)광고 선전 기능이 있음. 이는 사회 및 기술발전이 되면서 물품 생산의 대량 화가 시작되었으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누가 물품을 제공하는지 그 출처가 일반 수요자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와 같이 상표를 사용하게 되고 상표가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써 유명해짐에 따라 이 상표에 화체 되어있는 신용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기망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짐. 이는 상표 소유자의 쌓아 올린 신용을 통해 타인이 이익을 얻으며 때로는 신용을 헤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소비자는 기대했던 품질의 상품 및 서비스를 얻지 못하게 되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상표의 정의 규정 및 각종 거절 이유를 살펴봄. 거절 이유는 타 상표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 거절 이유와 절대적 거절 이유가 존재. 우리나라와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규정의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으며 절대적 거절 이유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도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우리나라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라고 상표를 정의함. 상표는 상품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품이 없다면 상표법에 의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음을 의미. 실제로 기업의 로고, 기타 광고 문구들의 경우 상품과의 관련성 없이 그 자체만은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상표라고 볼 수 없음.
① 인도 상표법에서 표장에 대한 정의로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상품은 거래 또는 생산이 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상표법에 의한 상표의 보호 대상은 상품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됨.
② 단체표장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g)에서 ‘표장의 소유자인 사람들의 단체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함.
③ 증명표장은 제2조 제1항 (e)에서 ‘증명표장은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품질, 정도 또는 그 외의 특징에 관하여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증명된 표장으로서, 증명이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 가능한 표장이며, 제 IX 장의 규정에 의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증명표장의 소유자 명의로 증명표장으로서 등록된 것을 말한다.’라고 함. 증명 표장은 상품이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이에 대한 표장을 통해서 이를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상표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④ 그 밖에도 상표의 일부에 대해서 독립된 상표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그 부분만을 분리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분리 상표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복수의 상표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유사하나 색채 또는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경 등을 이유로서 비슷한 상표에 대해 연속 상표(Series)로서 등록을 받는 것도 가능함.
인도 상표법에서는 절대적인 거절 이유와 상대적인 거절 이유를 가짐.
① 절대적 거절이유
인도 상표법 제9조에서 출원에 대한 절대적 거절 이유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규정함.
먼저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와 비교해서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상표가 상품과 관련해서 상품의 품질, 수량 또는 그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된 경우라면 상품을 거래하는 동종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하여 이런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그러나 표장‘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되는 경우라면 등록받을 수도 있는바 주의가 필요함.
상품에 대한 동종업자가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문구 등도 동종업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상표법 제9조 단서 규정에서 출원일 전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거나 주지한 상표일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된 경우라면 그 신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예외적으로 등록을 시켜줌.
이 밖에도 공공의 이익, 공공질서 및 인도 내의 종교적 보호를 위한 경우도 절대적 거절 이유에 포함됨.
마지막으로 포장은 문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림이나 형상도 가능함. 형상으로 된 상표는 상품 자체에서 기인하는 유리한 형상이나 기술적 의미가 있는 형상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 기능성 원리에 따른 것으로써 상표는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기능의 특이성은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상품의 당연한 기능은 동종업자 누구나가 사용할 필요가 있어 등록을 불허함.
② 상대적 거절이유
상표법 제11조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상대적 거절 이유가 존재함
상대적 거절 이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거절 이유로서 선행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이는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와 같은 제재를 둠.
또한 상표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상표가 주지 상표인 경우 또는 사용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식별력을 해치거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라면 비록 상품이 유사하지 않더라도 거절되는 것을 규정함. 이는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품과 연관되어 의미가 있으나 상표가 주지해지면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과의 관련성이 적더라도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며 타인의 상표의 평판이나 식별력을 해치는 것 역시 막을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거절 이유를 두고 있는 것임. 또한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 역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행 상표권자 또는 선행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등록이 금지되지 않음. 또한 상품이 비유 사하지만 상표가 주지한 경우와 법에 저촉되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 상표권자 또는 권리자가 거절 이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거절되는 것으로써 주의를 요함.
또한 인도 상표법 제12조에서는 선의의 경합 사용 등의 경우 타인의 상표에 형성된 신용에 편승할 의도가 아니며 선의로써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표, 상품이 동일 유사하더라도 두 상표 모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③ 기타 거절이유
상대적, 절대적 거절 이유 외에도 화학원소의 명칭 및 국제적 독점 불가 명칭, 단일 화합물로서 보통 사용되고 인정되는 명칭이나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 국제적으로 독점 불가한 명칭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현존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암시를 주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 등록이 거절됨.
상표 출원을 하기에 앞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절차가 필수적. 인도 특허상표청 ((http://ipindiaonline.gov.in/tmrpublicsearch/)) 에서 상표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상표 또는 공개된 상표를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음.
상표 등록 출원을 함에 있어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방식으로 출원을 하여야 함.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에 비해서 관련 서류가 많이 존재하며 인도의 상표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음. (출원 서류는 상기 표 10을 참고)
또한 출원서 기재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함. 인도의 상품 분류 체계는 국제 상품 분류 체계를 따르며 이에 따른 상품에 대한 상품류 구분 기재를 하여야 하고 상품에 대한 기재가 애매한 경우에는 장관의 결정을 따르는 것으로 함. 또한 상표 출원에 있어서 하나의 상표에 대해서 여러개의 류 구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1 상표 다류 1출원주의로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복수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함.
도 상표법 제20조에서 출원 공고에 대하여 규정함. 인도의 상표 출원에 있어서 상표 등록출원이 조건 없이 수리되거나 또는 조건부나 제한부로 수리되었을 경우에 심사관은 수리되는 대로 신속히 출원 수리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조건부나 제한부의 경우라면 이 역시 함께 기재하여야 함.
출원 공고는 상표 출원에 대한 공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밖에도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이의 신청의 전제가 되는 제도인 점에서 의미가 큼. 출원이 공고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함.
이의 신청 제도는 공중에 심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도. 실질적으로 심사관이 모든 주지 상표를 파악하고 모든 출원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출원 후 출원공고가 되고 나면 이 등록 출원 공고 또는 재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함.
인도 상표법 제21조에서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함.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재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심사관의 허가를 얻은 소정의 방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총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해야 하며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답변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함.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심사관은 그 부본을 이의 신청인에게 송달. 출원인 및 이의 신청인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는 것임. 이의 신청인 및 출원인은 증거가 있을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함. 심사관은 제출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함.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에 대해 판단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면 심사관은 출원 거절 이유를 통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상표 등록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이의 신청까지 거쳐서 상표 등록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상표 출원은 등록된 상표로서 보호받게 되어 일정 기간 상표권을 부여하게 됨.
상표권이 소멸되는 사유들을 살펴보겠는데 일반적인 상표의 소멸 사유와 단체 표장 및 증명 표장의 특유한 소멸 사유로 나누어서 살펴봄.
상표권은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이는 상표가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식별력을 상실하거나 상표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아래 열거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도 상표법에서도 규정함.
-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 본 등록이 법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상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 사용 의도 없이 등록받은 경우
-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의 불사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상표는 취소될 수 있을 것임. 위의 사유 중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등록과 또는 심판부에 소정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등록 상표는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음. 요건을 살펴보면 등록 후 5년이 지난 후에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어느 소유자에 의해서도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상표가 취소될 수 있음.
다만 상표법 제12조에 의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허여 받았을 경우 또는 심판 위원회가 그 사람에게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동종 유사성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 소유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있는 경우 심판 위원회는 상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단체 표장은 특성상 위의 사유 외에도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음. 그 사유로는 소유자 또는 허락 사용자에 의해 해당 단체 표장이 사용된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 표장으로서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해당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상기 준수를 보증하지 못한 경우에 단체 표장은 취소될 수 있음.
단체 표장은 특정 단체라는 출처를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써 이를 오인하여 잘못 인식하게 한 경우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며, 단체 표장을 규제하는 규약을 어긴다면 단체에 대한 보증이 어려우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등록 단체 표장을 취소시켜 공중의 오인 혼동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취소 사유를 둠.
증명 표장은 상품 등에 대한 특정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표장으로서 그 특유의 취소 사유가 존재.
-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어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적격을 잃은 경우
- 소유자가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상표 등록의 존속이 이미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상표의 등록이 존속하는 경우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상 불가결한 경우
상기 사유를 이유로 이해관계인이 상표권의 취소를 신청하면 심사관은 상표권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준 후, 신청이 이유 있다면 증명표장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명령을 할 수 있음.
상표 출원이 등록에 이른 후에 그 상표권의 권리 범위, 존속기간 및 갱신에 대해서 살펴봄. 우리나라의 상표권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인도에서는 상표의 부분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는바 부분 등록 시 권리 및 보호 범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상표권은 출원, 방식 및 실질 심사, 이의 신청 및 답변서의 제출, 거절 이유 통지, 의견서 및 보정서의 제출의 과정을 지나 거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등록됨. 등록이 된 경우에 출원일을 등록일로 간주하게 되어 상표를 보호하며,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받게 됨. 그러나 상표 등록이 출원인의 태만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소정의 방법에 의해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 뒤, 해당 통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등록된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살펴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해당 상표의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상표권자는 자신만의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 및 등록받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상표의 부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문제 될 수 있음.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며 부분 등록된 경우에는 그 부분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별도의 보호를 인정해 줄 뿐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사항을 포함하는 상표인 경우 그 등록은 그 등록 상표 전체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상표 등록부에는 상표 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표시, 양도, 이전 등에 대한 조건을 기재해야 함.
상표 등록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다만 상표권은 다른 지식 재산권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공중이 이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사용을 오래 할수록 이에 형성된 신용 등의 가치가 더욱 커지며 영구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간이 지난 후라도 갱신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단 상표권자가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어지는 등 계속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 존속 기간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고 10년의 기간을 주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존속기간을 갱신하기 위하여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존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하여야 함.
소정의 수수료 및 형식을 갖추어 존속기간을 갱신하게 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되며 다시 10년 동안 존속하게 됨.
상표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상표의 최종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신청에 의해 소정의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심사관은 해당 상표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이렇게 회복된 상표권은 기존의 최종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존속기간을 가지게 됨.
인도 상표의 실시권을 살펴봄. 상표 사용자인 실시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본 후 인도 상표 실시권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살펴봄.
① 실시권자의 등록
상표권은 다른 지식 재산권의 실시권과 같이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음. 사용권은 배타적 사용권 및 통상 사용권으로서 타인의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짐. 그러나 상표는 특정의 출처 표시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사용권 설정에 있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인도 상표법 제48조에서 사용권자의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의 등록 소유자 이외의 자는 상표에 대한 지정상품,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등록 사용자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함.
등록 사용자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 소유자 및 상표 사용자가 공동으로 심사관에게 가서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이 서류에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나 기타 조건 등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상표법은 다른 지식 재산권과는 달리 사용권 설정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함.
② 실시권자 등록의 취소 사유
상표권의 소유자는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상표권 사용에 대한 등록을 해줄 수 있음. 그러나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쌓아 올린 신용에 대한 것으로써 소비자는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잘못 사용된 경우에 소비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인도 상표법 제50조에서는 등록 사용자의 등록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둠.
i) 등록 사용자가 상표법 제49조 (1)의 (a)에 의한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 또는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에 의해 그 상표를 사용한 경우
(ii) 등록 신청 시 정확하게 표시했거나 개시를 하였다면 등록 사용자의 등록이 정당화되지 못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등록 사용자가 부실표시를 하거나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iii) 등록 사용자의 등록 이후 상황의 변경이 있어, 그 등록의 취소 신청 시에 있어 그 등록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된 경우
(iv) 등록 신청인이 당사자가 되어 있는 계약에 의해 그 사람에게 부여한 권리가 등록되어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경우
상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표 사용자의 등록은 취소될 수 있음. 상표권의 경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회사나 기타 기업에게 상표의 사용 권리를 주어 사용하게도 하는 바 본 규정에 주의를 해야 함.
- 인도 특허청 상표 비용 자세히 보기 : https://ipindia.gov.in/form-and-fees-tm.htm
| [표 11] 인도 상표 출원 비용 | ||||
|---|---|---|---|---|
| *단위: INR (KRW) | 특허 등록 관납료 | |||
| (ⅰ) 자연인/스타트업/ Small Entity/교육기관 | (ⅱ) 기타 | |||
| 기본 출원료 | 우편 제출 | 5,000 (77,850₩) | 10,000 (155,700₩) | |
| 온라인 제출 | 4,500 (70,070₩) | 9,000 (140,130₩) | ||
※ 참고사항
- 환율 : 1INR = 15.57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 인도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표 12] 인도 상표 등록 및 갱신 비용 | ||||
|---|---|---|---|---|
| *단위: INR (KRW) | 상표 특허 관납료 | |||
| (ⅰ) 자연인/스타트업/ Small Entity/교육기관 | (ⅱ) 기타 | |||
| 기본 출원료 | 상표권 갱신 신청 | 10,000 (155,700₩) | 9,000 (140,130₩) | |
※ 참고사항
- 환율 : 1INR = 15.57KRW로 환산하여 1의 자리에서 반올림
도에서 부경 경쟁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미법 국가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즉, 우리나라에서 부전경쟁 행위 및 그 구제수단 등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성문법에 규정하여 민사적ㆍ형사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타인의 신용이 체화된 영업권(goodwill)을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상표의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에게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유발시키는 행위, 밖에 유명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와 일정한 제휴 관계가 있다는 등의 그릇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망적 허위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판례를 통해 널리 상사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보통법에 따라 규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만을 인정하고 있음.
또한, 인도는 현재 영업비밀 및 미공개 정보를 보호하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그 대신 보통법 및 형평법 원리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구제를 행하고 있음.
인도에서는 2002년 MTRP(독과점 금지법)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정된 Competition Law(경쟁법)이 있으나 이는 독점, 가격 담합, 이유 없는 거래 거절, 우위에 있는 회사의 지위 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제정되어 공정거래법의 성질을 가짐. 우리나라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 상의 불법행위로 취급되어, 형법, 상표법 등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인도에서 부정경쟁이란 단순히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 서비스, 직업, 비영업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신용 등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함.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요소는 명성, 혼동 가능성 및 신용의 손해. 따라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명성 또는 신용이 있고, 공중으로 하여금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믿게 하거나 믿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중이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오인함에 따라 원고의 신용에 손해를 입었을 것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
객관적인 유사 판단을 통하여 오인 혼동이 발생함을 추정하지 아니하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혼동 발생 여부를 판단.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면 피고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됨.
인도에서는 영업 비밀 침해 구제를 위해 첫 번째로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 존재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만약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신뢰의 훼손이 보통법상 인정되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는 일방 당사자의 전적인 희생 하에서 타당 당사자가 형평에 어긋나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결과 양자 사이에 심각한 이익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검토함.
인도에서 영업 비밀은 “사용자가 채택하고 있는 타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한 공식, 기술적 노하우 또는 특별한 영업 방식 내지 수단”으로 매우 폭넓게 정의되며, 다만 다수인 이 알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널리 널리 알려져 있는 일상적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이 소극적으로 영업 비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됨. 인도 법원에서 위와 같은 영업 비밀 침해가 보통법 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어떠한 정보가 그 자체로서 그에 대한 신뢰 보호를 보호할 만한 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
② 그 정보가 신뢰보호 의무가 부여될 수 있는 환경에서 타인에게 전달될 것
③ 그 정보를 전달받은 당사자가 이를 전달하여 준 당사자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허락 없이 이용할 것
한편 인도에서는 신뢰 훼손의 불법행위 사건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평에 따른 구제 외의 다른 구제수단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즉, 인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업 비밀 침해가 형사적 사건으로는 다루어지지 않음. 영업 비밀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인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그 침해자인 피고에 대해 영업 비밀의 공개 금지, 미공개 정보 기록물 등의 반환, 손해의 배상 등을 명할 수 있음.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가 인도에서 인정받는지 여부를 살펴봄.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일본 및 미국에서는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아직 소프트웨어 자체만의 특허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BM 특허 또는 하드웨어와 접목한 형태로서 우회적으로 그 특허성을 인정해 주고 있는 실태이나 인도의 경우를 다음에서 살펴봄.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이며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고 두뇌에서 수행하는 정신적, 지능적 수단 또는 과정과 동일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즉 소프트웨어는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임. 이에 반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 구조의 일부로서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어내는 배선 또는 접선 수단과 동일시 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특허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
현재 미국, 일본, EU 등의 국가에서는 순수한 알고리즘을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유용하거나 형태가 존재하는 결과를 생산하는 방법에 의한 특허성을 인정. 우리나라 역시 1998년 개정 법을 통해 방법 발명, 물건에 화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발명 및 기록 매체 청구항을 통하여 특허성을 인정.
IT가 주산업 중에 하나인 인도에서도 소프트웨어 그 자체만으로 특허성을 인정해 주지는 않음. 2005년 개정법 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2005년 4월 인도 의회는 이를 삭제.
현재 인도에서도 특허법 제3조 (k)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을 특허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계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 중인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알려진 기술에 기능적인 공헌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 즉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나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하드웨어에 구현되어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정도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인도 특허상표청은 “MANUAL OF PATENT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 (MPPP)에서 밝힌 바 있음.
BM(Buisiness Model) 발명은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통신 기술을 통해 영업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발명으로서, 영업 방법 또는 비즈니스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초기에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모든 국가에서 특허로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우리나라에서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영업 방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이 시계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또한 인간의 행위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이 되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로그인이나 클릭하는 등 단순한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역할이 발명에 포함되어서는 그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업 방법 자체의 신규함 이나 진보함 보다는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등 컴퓨터 기술이 기존에 비해 얼마나 진보한지 영업 방법과 결합하는 것이 비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인도에서도 1990년대 후반까지 BM 특허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았음. 특히 2002년 개정법 으로 들어온 인도 특허법 제3조 (k)에서 영업 방법은 특허성이 없다고 규정하여 인도에서는 BM 발명에 특허를 허여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야후와 레디프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도 법원은 야후의 발명을 ‘컴퓨터분야의 커다란 기술적 혁신이나 기계를 위한 발명이 아닌 영업 발명을 위한 발명’으로 보아 야 후의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을 기각하여 인도에서 BM 발명은 특허성이 없음을 확실히 함. 이는 인도에 진출하려는 IT 계열 회사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소프트웨어와 BM 발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적이나마 특허를 허여해 주기 시작했으나 인도에서는 법 규정으로 BM 발명은 원천 봉쇄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발명도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양상.
• (특허) 인도 특허법은 알고리즘을 AI의 기본 구성 요소로 봄에 따라 AI 프로그램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반면, AI를 적용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구축된 기본 하드웨어에 기반한 AI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저작권) 인도 저작권법은 ‘자연인(natural person; 기업, 비즈니스 및 파트너십 포함)’만이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 예술·노래·음악 등 AI가 생성한 창의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은 확보할 수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문학적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므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코드 또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소유권) 회사 및 관련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IP의 소유권은 관련 조직이나 직원에게 명확하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음
• (침해) AI 시스템은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작품과 유사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의도치 않게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유효성) AI 시스템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 여부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적격성 여부는 여전히 모호한 상황임
• (라이선스) 기업은 AI 시스템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AI 생성 콘텐츠 라이선스 방법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영업 비밀) AI 기반 소프트웨어는 특정 알고리즘, 코드 및 데이터 셋을 학습하고 복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의 남용 및 영업 비밀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상품의 외관과 느낌에서 형성되는 출처 표시 기능을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2D에서 벗어난 3D의 입체 상표, 비시각적 상표(냄새, 소리 상표)가 인도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봄.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아직 상표법상 보호하고 있지 않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음. 입체 상표 및 비시각적 상표는 인정.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한 지식 재산권 제도로 최근 ‘히트 상품 베끼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자주 활용됨.
상품의 외관으로부터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하고 상품의 장식에 주안을 두는 점,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며 상표와 좀 더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인도에서는 상표법 제2조 (1)(m)에서 상표 표장의 정의로 도형, 브랜드, 헤딩,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말,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또는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다고 하고, 상표법 제2조 (1)(zb)에서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형상, 그 포장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한다고 하여 상품의 형상 포장을 표장의 범위에 포함시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임.
단 트레이드 드레스는 반드시 이런 상품의 외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 시설의 외형적 느낌이나 판매 기법 까지도 포함하는데 인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
단지 2차원적인 상표가 아닌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상표로서 우리나라와 인도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개정으로 입체 상표를 인정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1999년 개정을 통하여 이런 입체 상표가 등록 가능함을 명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2월 개정으로 소리, 냄새를 인정. 한미 FTA에 따른 개정인데 지정 상품, 서비스업과 관련이 없어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등록을 허여하는 것으로 심사지침서에 규정함. 인도에서도 이런 소리 및 냄새 상표를 인정. 법 규정상으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이런 소리와 냄새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음.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농업, 생산업 및 기타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 그 지 역에 대한 출처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를 의미함.
이는 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표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하여 신용을 형성하는데 비해서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비롯하여 그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 역시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함.지리적 표시에 대한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된 요즘,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는 특산물 또는 특산품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줌.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그 맛과 품질에 있어서 월등하다고 주장하며, 어느 지역의 어떤 물품이 유명하다는 식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제품임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과 특정 지역의 제품 생산자들이 자신의 제품들에 대해서 타인이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규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출처 표시’와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등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상품의 품질, 명성 다른 기타의 특성이 그것의 지리적 기원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연유되는 것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임.
결과적으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어떠한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상품이 그 지역만의 지역적인 특성(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생산 또는 제조 방법 등)에 의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또는 물품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그러한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 수단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하면 될 것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상표법상에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단체의 구성원에 한하여 그 표식 수단인 표장(문자, 색채, 도형 등)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표장의 일종으로 지리적인 표시인 지역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라고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역의 명칭을 상표로써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관장하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리적 표시 제도는 농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종전까지는 단순히 품질 인증의 수단인 품질인증 마크 정도의 개념.
그러나 2009년 6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상표와 유사한 지식 재산권의 개념이 추가됨. 이는 상표와 유사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심판,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권리자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신설되어 타인이 무단으로 인증표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지리적 표시 제도의 특징은 농식품부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매년 검사를 시행하여 그 존속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것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는 다른 점.
인도는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법을 규정하여 법으로써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 아직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출원 및 등록이 미미하나 지리적 출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출원 등록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점을 살펴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타인이 그와 같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른 WTO 가입국에서 역시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
인도의 지리적 표시와 관련해서 정의 및 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봄. 그러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해도 모두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님. 인도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1) 및 (9)에서 등록 받을 수 없는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규정함.
그 사유는
①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기만이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②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③ 지리적 표시에 외설적이거나 비방적인 것이 포함되는 경우
④ 지리적 표시가 인도 국민들에게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⑤ 법원에 의해서 보호에 대한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⑥ 특정 지역에서는 지리적 표시로 인식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리적 표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인도에서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관련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리적 표시 출원이 등록될 수 없어 지리적 표시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유의하여야 함.
인도는 유전자원 부국 중 하나이며 전통지식 전통의약 분야에 대한 역사도 깊고, 인도는 일찍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 규칙,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인도의 적극적인 행보는 유전자원 부국이지만 관련 법· 정책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우수모델로 작용하고 있음. 유전자원 부국 중 상당수가 인도의 행보를 모델로 삼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때문에 인도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분석할 경우, 인도를 모델로 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음.
한편, 인도는 유나니(Unani), 싯다(Siddha), 요가(Yoga), 자연요법(Naturopathy), 티베트(Tibet) 의학 체계와 함께 아유르베다(Ayurveda)가 인도 전통의약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음. 인도는 전통의학과 관련하여 2002년에 국가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관련한 법령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1995년 인도 의학 및 동종요법을 다루는 부서로 알려진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였고
추후 명칭을 “아유르베다, 요가, 유나니, 싯다 및 동종요법에 관한 부서”(the Department of ayurveda, Yoga, Unani, Siddha and Homeopathy (AYUSH)로 변경하면서 2014년에 독립된 AYUSH 부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인도에는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을 위한 여러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며. AYUSH 내에서 분야별 개별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음. 아유르베다, 동종요법, 유나니 등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국가 및 각 주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전통의학과 관련하여 국가는 라이선스를 발급함.
인도의 생물 다양성 법은 생물 다양성의 보존 생물 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및 그 밖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과 유전 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정하고, 내외국인의 유전 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와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법에서는 인도에서 획득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발명에 대해서 NBA의 사전 승인 취득 없이는 지식 재산권을 출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단 특허를 이미 출원한 경우 특허 취득 이후, 관련 특허 당국의 특허 검인 이전에 NBA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의회에서 제정한 다양한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련되는 법률 하에 권리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NBA는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인도에서 취득한 유전 자원 또는 유전 자원과 관련 지식에 대하여 해외에서의 지식 재산권 등록에 반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02년에 제정된 생물 다양성 법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4년 생물 다양성 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이 제정됨. 생물 다양성 규칙에서는 생물 다양성 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BMCs는 유전 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 부과된 수집료, 발생한 이익의 공유 방식에 대한 정보를 등록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NBA는 NBA가 결정한 사항들(접근 및 이익공유의 승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인도 내에서는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인도의 정부기관인 NBA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즉 접근절차는 ①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② 연구결과 이전, ③ 지식 재산권 신청, ④ 제3자 이전으로 나누어지고,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사전 승인 대상 활동은 이익공유 대상 활동에도 해당됨.
가. 2014년 11월 21일, NBA는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18차에 걸친 초안 검토를 거쳐 「2014 유전자원 및 관련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을 최종 마무리하고, 법무부 심사 완료 후 관보에 공표함. 이 가이드라인은 인도 내 유전 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연구결과의 이용, 연구결과의 이전 및 지식 재산권의 취득에 관하여 절차 및 이익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나. 연구를 위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자는 ‘생물 다양성 규칙 양식 1’을 작성하여 제출, NBA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토대로 NBA는 신청인과 이익공유 계약에 들어가는데, 이때,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NBA와 신청인 간 동의하에 선불금을 포함한 이익공유의 효력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함.
인도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유전 자원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전 받으려는 자는 생물 다양성 규칙의 양식 2를 작성하여 NBA 신청하여야 함. 연구에 포함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에 대해 NBA의 승인의 증거를 증명해야 하고, 신청인의 지식 내에서 연구결과의 잠재적 상업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함. NBA는 연구결과의 이전에 관한 승인을 부여받은 신청인과 이익공유 계약을 실시하여야 함.
다. 또한 인도로부터 획득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연구 또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발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획득하려는 자는 생물 다양성규칙의 양식 3으로 NBA에 신청을 하여야 함. 만약 신청인이 생물 다양성법 제3(2)조에 따른 자라면, 발명으로 이어진 연구에 이용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 지식의 접근에 관한 NBA의 승인 증거를 증명하여야 함. 식물신품종 및 농부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자임이 증명되었다면 예외로 처리됨. NBA는 지식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부여한 신청인과 이익공유 계약을 실시하여야 함.
라. 인도 내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비율 내에서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각 이익공유의 사례별로 다를 수는 있으나, 이익공유 절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NBA는 이익공유 원칙을 마련함. 구체적인 내용은, ① 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생산물의 출하 판매액의 2~5퍼센트를 NBA에 로열티로 지불하여야 함. ② 신청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해 적절히 인증된 ‘이용자의 연례 보고서’로부터 알게 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생산물의 출하 판매액의 5퍼센트를 NBA에 로열티로 지불하여야 함.
③ 연구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해 적절히 인증된 ‘이용자의 연례 보고서’로부터 알게 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 출하 판매액의 5퍼센트를 NBA에 로열티로 지불하며, 특허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 또는 이전되었다면 선불금의 5퍼센트도 NBA에 로열티로 지불하여야 함. ④ 수입자는 Director General of Foreign Trade(DGFT)에 의한 라이선스에 종속되며, 운송비용 영수증(bill)과 공인회계사의 인증서의 사본에 의해 증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Free on Board(FOB) 가치의 5퍼센트를 NBA에 로열티로 지불하여야 함.
인도의 2005년 특허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에서는 유전자원 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005년 특허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8조에 의하면, 발명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유전 자원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해당 유전 자원이 공중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중앙정부가 관보에 공표한 공인 저장소에 유전자원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첫째, 인도 내 특허출원일 이전에 해당 유전 자원을 보관하여야 하며, 둘째, 학명, 저장소 주소, 저장소에 보관한 날짜와 보관 번호를 포함한 유전 자원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특징을 포함하여야 하며, 셋째, 인도 내 특허출원일 이후 또는 필요하다고 정해진 경우 정해진 날 이후에만 저장소 내 유전 자원에 접근하여야 하며, 넷째, 발명에 이용된 특정 유전 자원의 직접출처 및 원시 출처를 공개하여야 함.
자국의 전통의약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은 바로 전통지식 디지털 도서관(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KDL 이하 ‘TKDL’)이라고 불리는 전통지식 전자화 사업임. 이는 전통지식 자체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것보다는 이것이 타국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유전자원 부국이지만 국내적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입법이 미비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하여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TKDL은 인도 과학 산업 연구위원회(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와 과학기술부 및 아유르베다, 요가 및 자연 요법, 유나니, 싯다 및 동종 요법에 관한 부서(Department of Ayurveda, Yoga and 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eopathy, AYUSH)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보건 및 가족복지부와 CSIR에 의하여 구현되고 있음.
TKDL은 네 가지 인도 전통(Ayurveda, Unani, Siddha 및 Yoga)과 관련된 기존 문헌을 문서화하고 있음. TKDL은 특허 심사관에게 선행 기술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5개 국제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하여 잘못된 특허 부여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TKDL은 전통지식 자원 분류(TKRC)에 의하여 인토의 전통의학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각 전통의학을 수천 개의 하위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 TKRC는 A61K 35/00에 따라 약용 식물에 대해 이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몇 개의 하위 그룹 대신 국제 특허 분류에 A61K 36/00에 따라 약 200개의 하위 그룹을 통합할 수 있게 하여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선행 기술의 검색 및 조사 품질을 향상시킴.
TKDL은 3,400만 페이지가 넘는 전통지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도에 존재하는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국제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형식으로 제공함. 또한 TKDL은 산스크리트어 및 기타 현지 언어로만 사용할 수 있는 선행기술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여, 특허 심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TKDL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특허청은 오용 가능성으로부터 인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TKDL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됨.
TKDL의 자료를 통하여,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개발된 특허출원에 있어서 잘못된 특허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특히 진보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정보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 더하여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정보와 특허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형식의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이에 특허심사관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기존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경미한 수정만을 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함
TKDL이 생성되던 2001년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의 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전 세계의 특허청에서 매년 약 2,000건의 잘못된 특허가 부여되고 있었음. 뿐만 아니라 요가 자세에 대한 저작권, 요가 도구에 대한 상표권조차 서구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 증가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만 100건 이상의 요가 관련 특허가 부여되었음. 2009년 TKDL 이후로, EPO는 인도의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특허 출원 건들을 확인하였음.
몇몇 특허에 대하여는 EPO가 특허출원 승인을 보류하였으며, 다른 출원인들은 출원을 철회하였음. 이렇게 심사 단계에서 TKDL이 활용됨에 따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의 제기 절차를 방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TKDL의 선행 기술 증거와 함께 다양한 국제 특허청에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효과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 현재까지 230개 이상의 특허 출원이 TKD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선행 기술 증거를 기반으로 비용 없이 몇 주 또는 몇 개월 이내에 특허 보류, 취소, 수정되었음.
TKDL은 생물 해적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노력으로 인정받고 있음. TKDL은 인도의 의약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 출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글로벌 생물 불법 복제 감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특허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3자가 인도의 전통지식을 남용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음. 이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직접적인 비용 없이 생물 해적행위를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함. 현재까지 인도는 이러한 시스템을 시행한 유일한 국가임.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의 활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꾸준히 새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악용과 남용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는 전통지식을 자산으로 하여 생계를 의존하는 인도의 토착민 또는 지역공동체에 위협으로 작용함. 또한 인도의 생산자가 해외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경제 위기의 위험에 직면하도록 함.
전통지식에 대한 잘못된 특허는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통지식의 보유자 그룹에 대한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발생시킴. TKDL은 사전 조치의 이점과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 특히 전통지식이 풍부한 국가에서 전통지식 보호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있음.
인도 정부는 ABS 전자 파일링(ABS e-filing)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자국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음. ABS 전자 파일링 플랫폼은 인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접근하려는 자가 NBA의 사전 승인을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이용 매뉴얼과 함께 양식, 수수료, 절차 등을 제시해 주고 있음.
한편 지방정부의 경우 생물 다양성 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일례로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주가 UN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주 내 주요 6개 도시 366개 마을 자치기구에 생물 다양성 관리 위원회(BMCs)를 설치하고, 지역 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 다양성 및 관련 전통지식을 문서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인도는 고등법원에 중재 센터(DIACㆍDelh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를 운영하고 있음. DIAC가 집계한 통계치에 따르면 연도별 분쟁 건수는 최근 10년간(2012~202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건수가 감소했다가 펜데믹 이후인 2021년, 2022년 급격하게 증가함.
이 통계는 인도 고등법원에서 분쟁 조정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델리국제중재센터(DIAC)가 집계한 수치임.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30일까지 이뤄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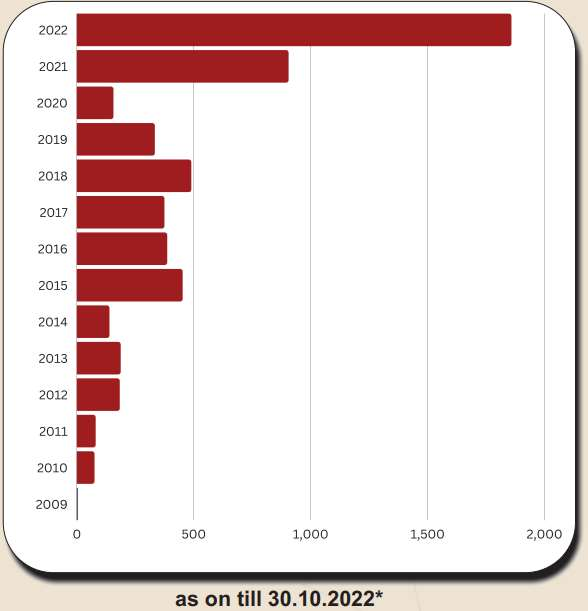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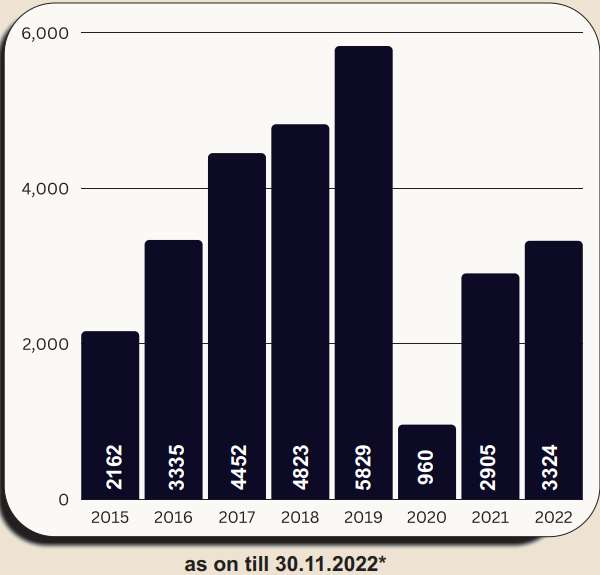
지식 재산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사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봄. 우선 소송 관련 제도에서 각 권리마다 침해로 보는 행위를 살펴본 후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을 살펴보고 인도의 법원의 심급 제도를 알아봄. 이후 비소송제도 ADR 즉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중재, 조정, 화해 제도를 살펴봄.
지식 재산권의 분쟁 및 기타 소송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결 방안으로 관할권이 있는 지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과 행정 기관 등에 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임. 거절 결정이나 기타 장관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심판 절차를 통해 하게 되며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지식 재산권 전반에 걸쳐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권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함.
(1) 침해로 보는 행위
지식 재산권은 등록이 되고 나면 일정한 권리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여받고 제3자가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와 자신의 권리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부여받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① 특허법
특허권은 청구범위(claim)에 의해 권리범위가 성립됨. 청구항 이외의 명세서로 권리범위를 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인도 특허법에서는 침해로 보는 행위를 특허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그 사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던 제품을 사용, 판매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특허권자에게 주어진다고 규정함.
즉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과 동일한 물건을 실시하거나 청구범위에 기재한 방법을 실시하거나 이를 통해 생산된 물건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됨.
그러나 특허법 제49조 및 제107조 A에서 1)외국에 등록된 선박, 항공기 또는 통상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육상 차량이 인도에 일시적 혹은 우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수단에 필요한 기기 등이 특허 발명과 동일한 경우
2)인도(또는 인도 외)에 있어 실제로 유효한 것에 근거해서 필요하게 되는 개발 및 정보의 제출에 적절히 관계된 사용을 위해서만 특허 발명을 제조 등(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하는 행위 및 해당 제품을 제조 등(제조 및 판매 또는 반포)을 하는 것을 법률(제품의 제조, 조립, 사용, 판매 또는 수입을 규제)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미치지 않음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특허권을 적용시키려 함.
② 상표법
등록 상표권자가 되면 자신의 상표를 자신이 지정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하지만 만약 특허권처럼 동일 범위에서만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상표의 혼동은 오히려 유사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유사하지 않더라도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 상표권의 효력이 의미를 잃게 됨.
인도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사람 또는 허락 사용에 의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서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표장을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상표로써 사용하면 등록 상표의 침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함.
상표의 등록 소유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 표장을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등록 상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등록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
단지 표장이 동일, 유사한 것뿐만 아니라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성 역시 고려하여야 함.
또한 인도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아도 등록 상표의 평판이 높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표장을 사용하여 해당 등록 상표의 식별력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를 끼치는 이른바 희석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침해행위로 규정함.
우리나라에서는 유사 범위까지만 권리범위를 인정하며 비유사 범위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을 뿐 사용을 저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고 있어 인도에서 상표를 사용, 등록을 할 때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함.
인도 상표법에서는 1)등록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붙이는 표시 행위 2)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을 목적으로 판매 또는 전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또는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4)등록상표를 영업 문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의 사용으로 봄. 특허와 달리 수출 행위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함.
효력 제한 사유는 1)선행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그 사용 사실을 알면서 연속하는 5년간 이를 묵인했을 경우 2)기득권에 대한 예외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출원일 또는 그 상표의 사용일 전에 사용한 상표를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라면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③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역시 배타권의 본질로서 디자인 권리자 본인만이 자신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음.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1)디자인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서면 동의 없이 판매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군에 포함되는 어떠한 물품에 해당 디자인 또는 부정하거나 명백한 모방을 적용하거나 적용시키는 것 또는 해당 디자인이 그처럼 적용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2)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군에 속하고 거기에 해당 디자인 또는 그것의 이를 모방한 것이 명백한 물품에 대한 판매 목적으로 동의 없이 수입하는 경우 3) 해당 디자인 또는 이를 모방하였음이 명백한 디자인으로서 해당 디자인의 물품 군의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 동의 없이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공개 또는 개시하거나 또는 공개, 개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침해하는 것으로 봄.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유사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디자인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뿐만 아니라 모방하였음이 명백한 디자인까지 효력을 넓히고 있으며 같은 물품류까지 범위를 넓혀 권리범위로 인정해 줌.
① 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
지식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침해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이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수단임.
인도 특허법 제108조에서 침해 소송에 있어서 구제 조치를 규정함. 재판소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에 따라 금지명령 및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침해품의 압수, 몰수,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를 통해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제품에 대한 압수를 할 수 있음.
위의 법원에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식 재산권 법상의 조문과는 별도로 인도의 특별구제법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일시적, 영구적으로 금지명령에 의해 사전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있음. 영구적 금지명령은 구두 심리에서 판결에 의해서 주어지고 피고는 영구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에 반하는 주장, 행위에 위탁하는 것이 금지됨. 일시적 금지명령은 소송 계류 중에 내려지며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해서 규제됨.
금지명령은 본질적인 금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정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가처분과 비슷한 형태로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서 잠정적인 구제책으로 금지명령을 중간 판결로 내릴 수 있음. 또한 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 길어지고 원고의 침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중에 실시할 수 없었던 피고가 얻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금지명령에 이런 손해배상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법원은 이런 금지 명령의 기간과 조건을 정함에 있어 상당히 넓은 재량권이 있음.
금지 명령 신청에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1)위반을 위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인지 2)원고 측을 지지하는 편익의 균형과 3)금지명령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또는 고충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거가 확실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법원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음.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됨. 경제적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은 만약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피침해 당사자가 가졌을 이익 보전을 목적으로 결정됨. 적당한 로열티 또는 실시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로열티 또는 실시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손해를 계산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됨. 동일한 시장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동일한 경쟁적 침해에서 피고의 이익이 원고의 손해가 됨. 원고의 손해는 다른 경쟁 라인의 다른 시장에 발판을 피고가 얻음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얻게 되는 손해를 포함.
② 손해배상의 제한
침해 행위가 있던 날 해당 특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던 것을 입증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명령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특허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갱신 수수료의 납부를 게을리하여 해당 기간의 연장전에 행해진 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손해 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의 허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그리고 권리의 부분 포기나 정정 등에 대한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되기 전에 해당 발명의 사용과 관련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즉 특허권자의 잘못이나 침해자가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제한하나 이런 경우라도 침해 금지 명령은 제한되지 않아 특허권자는 보호받을 수 있음.
상표권의 경우도 증명 표장 또는 단체 표장에 대한 침해 소송의 경우나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당시 원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권리자라는 사실 또는 원고가 허락된 방법에 의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등록 사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는 경우 피고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의 존재 및 내용을 안 즉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
또한 부정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소송 대상 상표의 사용을 개시 당시 원고의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고 피고가 상표의 존재 내용을 안 즉시 상표의 사용을 멈추었다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③ 형사 절차
인도의 법률 시스템에서 민사와 형사는 그 구제방법에 있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남. 형벌은 침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내려지며 금지명령 등 중간 명령은 형사 절차에서 내려지지 않고 그 입증책임이 민사 절차보다 엄격. 인도에서는 국가적 형벌을 가하는 형사 절차보다 그나마 절차가 간이하고 유리한 민사 절차를 많이 택하게 됨. 형사 기소가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일단 기소를 해놓고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음. 이하 각 지식 재산권에서 형사 죄에 관한 규정을 살펴봄.
- 상표법
인도 상표법에서는 민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 조치고 가능하도록 규정함. 상표법은 특허법과 달리 공익상 보호의 요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익적 요청이 강한 특허법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형사상 죄를 규정함.
- 디자인보호법
인도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형사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아직 디자인보호법의 역사가 길지 않고 출원, 등록 건수나 소송 사례가 적어 구체적으 로 제정된 바가 없음. 다만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특허법을 준용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음.
④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복
지식 재산권 법 하에서 등록, 허가 무효, 취소 또는 조건의 부과 등에 대한 결정에 사법상 검토를 요청하여 행정기관 결정의 당위성을 판단 받을 수 있음. 특허상표청의 명령에 항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등법원이 항고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
지식 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취소, 무효 혹은 원치 않는 재정 명령 등이 떨어진 경우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으며 제3자는 권리의 연장, 취소 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음.
① 하급법원
인도의 하급법원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과 특화분야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나뉨. 민사 담당의 하급법원은 Munsif courts와 Courts of Subordinate Judges로 나뉘는데 이곳에서 불복 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항소(appeal)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으로 재항소 할 수 있음.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게 두 번의 항소가 허용되며 두 번째 항소는 법률적용에 관해서만 할 수 있음.
②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총 18개가 있으며 한 주에 한 개씩 위치하여 그 주의 최고 법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권만을 가지며 관할 지역 하급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함.
③ 대법원
대법원은 인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갖음. 대법원은 제1심의 배타적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 상고심 재판권(appellate jurisdiction),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재판권(advisory jurisdiction)을 가짐.
특허법 제104조에서 재판 관할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05조에 근거하는 소송, 제106조에 근거하는 소송 혹은 제106조에 근거하는 어떠한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 특허 침해와 관련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 심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지방 재판소보다 하급 재판소에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침해 관련 소송은 하급 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해 소송에 있어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는 매우 중요함. 입증책임이란 주장하는 바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게 되는 패소 부담으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여야 하지 피주장자가 상대 주장하는 사실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침해 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재산권의 입증 난이성을 이유로 또한 실시자가 자신의 발명의 특허발명과 동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함.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특허법 제104조A에서 제조 방법의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넘겨 특허 발명이 제조 방법인 경우 생산되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생산 물품과 동일하다면 제조 방법이 특허 발명과는 다름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함.
이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은 특허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에 기한 소송도 역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기하여야 함. 특이한 점은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음에도 상표와 관련된 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상표권에 관한 소송은 다음과 같음.
1)등록 상표의 침해에 대한 소송 2)등록 상표의 권리에 대한 소송 3)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소송은 상표에 대한 소송으로 인정하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대부분의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권리자들은 우선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 경고장에는 법정 기재 사항은 없지만 대체로 자신이 권리자이고 상대방이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침해에 해당되므로 실시 중지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게 됨. 이로 인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악의의 실시를 포함한 기타 입증이 매우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또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함. 그러나 이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한 절차이외의 분쟁해결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러한 대체분쟁해결 방법으로는 중재, 화해, 조정 등이 있음.
ADR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과 달리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또는 제3자의 중재,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써 법원과 재판소에 비해 대체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여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구체적으로 ADR의 장점으로는 유연성(flexibility),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Privacy and confidentiality), 자체 감독(Self-directed),비용(cost),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고(Focus on what’s important to you), 절차가 덜 형식적이며(Less formal), 결과(outcome)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는 근본적으로 ADR의 절차는 특정 분쟁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프로세스에 비하면 훨씬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임 또한 법원과 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개인정보도 많기 때문에 ADR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개인적인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음. 이는 특히 특허나 노하우, 영업 비밀과 관련한 분쟁에서 큰 장점. 또한 ADR은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자는 법원이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람과 상대방의 합의하에 절차와 결과를 조정할 수도 있어 더 유연한 상황 대처가 가능함. 또한 법원의 심리와 결정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재판소에 의하는 것도 법원보다는 저렴할 수 있으나 청문회 및 법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음. 또한 일정 형식에 따라 진행해야 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 몇 년 후에야 그 결과가 나와 시간적인 소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ADR에 의한 분쟁 해결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아가 관련자들도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
또한 WIPO에서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고자 하는 자는 WIPO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음. WIPO의 중재 규칙에 의하면 ‘중재 계약은 WIPO 중재 규칙 하에 중재를 위해 제공되는 이러한 규칙들은 그 중재 계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분쟁의 당사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은 본 규칙에 따라 개시 날짜에 중재의 개시 효과를 가짐.(Scope of Application of Rules, Article 2). 중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의 개시를 위해 WIPO 중재센터 및 상대방에 대해 중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됨. 이때 중재의 개시 날짜는 중재를 위한 요청이 센터에 접수되는 날로 함.분쟁 중재 요청의 신청서에는 (i)분쟁은 WIPO 중재 규칙 하에서 중재될 수 있는 분쟁의 범위 내에서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 (ⅱ)이름, 주소 및 전화, 팩스, 전자 메일 또는 당사자와 원고의 대표자 기타 통신 참조 (ⅲ)중재 계약의 사본 및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조항 (ⅳ)권리와 재산 관계에 관련된 모든 기술, 성질을 포함한 분쟁의 성격과 상황 (ⅴ)(ⅳ)에 의해 요구되는 약속 또는 관찰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협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관계자 또한 협의의 과정에서 참여가 가능하나 정해진 형태는 없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게 됨. 의견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사용하는 데 협상을 할 경우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본인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실행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낼 수도 있음.
알선・중개・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중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됨.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이에 비하여 조정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조정에 부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달려 있지만, 예외적으로 강제조정이 인정되기도 함. 일반적으로는 분쟁 당사자가 제3자(조정자)의 도움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널리 쓰이는 과정. 조정은 논쟁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선택사항을 개발하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 조정자는 이러한 합의의 도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 분쟁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음. 이는 중재자의 결정이 바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과 차이가 있음.
조정자(mediator)는 양 당사자들의 동의 또는 법원에 의해 선정됨. 조정자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닌 양 당사자로 하여금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내어놓도록 촉매의 역할을 함. 중재를 통해 분쟁이 가속화되기 전 조기에 종식될 수 있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소송(litigation)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약서를 통해서 이를 약정해 두었어야 가능하며 그런 내용이 양 당사자 사이에 없었던 경우라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임.
화해는 분쟁의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는 해결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임.
화해는 근본적으로 중재나 조정과는 다른 분쟁 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임. 화해자(conciliator)라고 하는 것은 비 편향적인 사람으로서 양 당사자의 협상을 도와주고 만족스러운 합의점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사람. 중재와는 달리 화해는 훨씬 덜 적대적인 과정으로 지식 재산권에 있어서는 침해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음.
화해는 공통의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이상적이고 개별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이것은 비록 조정과 비슷하게 들리기 하지만 둘사이에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있어서 화해자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함. 그리고 심지어 양 당사자에게 해결을 위한 특정한 해결책을 제시함. 화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종종 해결 조건을 발달시키고 제안함.
양 당사자는 화해자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 오며 당사자는 화해자의 제안에 대해 결정함. 이러한 점에서 화해자의 역할은 조정자의 역할과 다름. 화해자는 과거 잘못의 전통적인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해결 방법을 발생시키는 데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대신 화해자는 적절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과 파트너로서 함께 모색해 나감. 화해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조정과 중재가 분쟁이 발생하여 심각하게 된 상황에서 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다름. conciliation은 종종 mediation과 유사한 의미로 많이 쓰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조정이 자발적이었던 것인 반면, 중재는 당사자의 상호 중재 합의 계약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중재인은 중재 당사자 모두의 의견과 사실을 청취한 후에 판단을 함으로써 이 판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 이미 중재 판정이 되면 법정에서 더 이상의 법적 절차가 허용되지 않으나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중재도 가능하며 소송도 합법적인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음.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일정한 형식이 있으며 중재자는 일정한 법적 지식과 경쟁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함.
또한 어느 정도는 법적인 구제 절차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자율에 따른 창의력 있는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가 어려움.
인도에서 중재는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임시 중재(adhoc) 또는 기관 중재(institutional)가 있음. 임시 중재의 경우 양 당사자가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음.
① 임시 중재
임시 중재는 양 당사자 및 중재자 간에 절차의 합의가 필요함. 이는 서로 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 특히나 분쟁 중에는 상호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② 기관 중재
기관 중재의 경우 양 당사자에 의해 선택된 기관이 중재자 및 중재 장소의 선택 결정 등 중재 절차를 진행. 중재 기관은 일정한 수의 중재자들을 그들의 프로필과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음. 이런 중재 기관들은 전문 중재자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함. 또한 중재 기관들은 중재에 필요한 여러 하부 조직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바 임시 중재에서는 이런 편의를 누릴 수 없음.
중재 기관은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ICA), Indian Institut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IAM), The Delh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DAC), LCIA India 등이 있음.
이런 중재 기관들에 의해 중재를 개시하고 싶다면 중재 신청서를 해당 기관의 심사관 또는 직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 신청서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i) 중재 당사자들 및 대리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 인적 사항
(ii) 중재 조항의 복사본 또는 별도의 중재 동의서를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의 발생과 관련된 문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과 관련된 계약서, 동의서 및 각종 문서들 (iii) 분쟁의 상황을 설명하는 요약문 및 상대방에 대한 중재 요구사항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iv) 양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되었거나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타 요구사항(중재 언어, 중재자의 수 - 짝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재자의 자격 등) (v) 수수료 (vi) 중재는 중재 위원회가 중재 신청서, 수수료 및 주장사항을 받은 순간부터 개시된 것으로 간주됨. 전담하는 중재기관에 따라 상기 요구 서류 및 세부적인 중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함 (vii) 인도에서는 고등법원에 중재 센터(Delh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를 둠. |
다음에서는 인도에서 지식 재산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사안들을 살펴봄. 경고장의 의미, 발송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 수령 시 대응 조치, 실시자의 대응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경고장이란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특허권 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하는 서면(내용증명 우편). 경고장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송 단계에 진행하기 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차.
인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에 의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함을 규정함.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 및 침해 금지 청구에 있어 침해 금지 청구는 물권적 권리로서 실시자의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 청구나 부당 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실시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함. 이런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있음.
이런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에 경고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실질적으로 침해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고 모방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사정일 뿐이므로 고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임 경고장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나 미리 경고장을 보내 둔 경우라면 침해자가 이를 알고도 실시하는 것이 되므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됨.
따라서 특허권에 의한 침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먼저 보내어 고의성에 대한 입증을 준비하고, 실시자 와 협상 가능성 즉 라이선스 허여 등과 같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침해 소송의 전단계로 이용됨.
통상적인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a. 요구서를 보내는 자가 주장하는 권리
b. 침해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
c.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서를 보내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d. 요구사항
e. 요구가 만족되어야 하는 기일(deadline)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실시 중인 발명이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발명임을 주장하고, 출원 중인 특허라면 등록된 경우 경고장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및 등록된 특허라면 실시 시부터 소급하여 침해가 됨을 주장할 수 있고, 형사상 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실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경고장은 통상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됨. 또한 경고장은 단순히 경고만으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개될 상황들도 고려한 전략적인 경고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특허침해를 인지한 경우,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특허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과 침해 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함.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 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 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함. 경고장에는 그동안의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를 삽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통상적으로 특허권 등의 경고장은 타인의 실세를 제약하거나 그로 인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나중에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경고장을 발송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함.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권리자는 경고장의 발송을 통하여 권리의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 및 침해자와 침해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 경고장의 발송은 추후의 보상금 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침해죄 등과 관련한 상대방의 고의 입증 등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음.
타인으로부터 침해 중지요청의 경고장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송부하여야 함. 답변서에는 자신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침해를 인정하고 실시를 중지하겠다고 할 수 있음.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에게 비침해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 및 입증 자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경고장을 받았다고 바로 사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특허발명의 침해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이후의 실시가 가능할지 판단해야 함.
실시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야 함.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임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우선 경고장을 수령받은 후에 실시자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유효하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유효하지 않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더 이상 유효한 특허가 아님을 주장하거나 특허상표청에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여야 함.
아직 출원 중인 경우에도 이에 거절 이유가 있다면 정보제공,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거절 이유를 검토해 보아야 함.
특허가 유효한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인도의 청구항도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리범위는 특허권의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청구 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AER(All elemental rule)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됨.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 법정 실시권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검토가 필요함. 이때 변호사 또는 변리사 등 법률 지식인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수도 있음.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허권자에게 답변서를 보내야 함. 하지만 권리범위 판단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특허권자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자명할 때에는 인도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서 근거가 없는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협박이 부당한 취지의 선언이며 협박의 속행에 대한 금지명령, 이에 따라 입게 된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본인의 실시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실시를 즉각 중단하고 특허권의 양수 또는 실시권 허여를 위해 계약을 시도해야 함. 특히 가장 유용한 것은 실시권 설정이 될 것임. 실시권은 일정한 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주면서 자신의 실시를 보장받는 것으로써 특허권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실시를 보장받게 됨. 특허권자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동종업자인 경우 본인에게도 특허권이 있다면 서로 Cross License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음.
특허의 무효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이 법정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임.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는 자신의 실시 행위가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특허권의 무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음.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이 유효한 권리이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무효 소송에 의해 특허가 무효가 된다면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해당 발명을 자유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음. 즉 등록 후라도 특허권이 등록받을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특허를 없앨 수 있도록 함.
이는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그 발명을 쓸 자유를 제한하여 공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며 나아가 불필요한 보호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반면, 누구나 권리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파상공격에 시달릴 위험이 있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정함.
또한 특허 무효는 침해 소송에 대한 반소로써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여 특허를 무효로 할 수도 있음. 등록 후에 다시 해당 특허에 관한 특허요건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면 특허상표 청장은 그 특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임
인도 특허법 제107조에서는 침해 소송에서 제64조에 근거해 취소(무효) 할 수 있다는 모든 이유는 항변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고 하여 특허 취소 사유(무효 사유)를 항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함.
회피 설계란 해당 제품의 기능 및 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문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침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임. 회피설계는 특히 자사 제품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문제 특허를 발견한 경우 구성요소 일부의 삭제 또는 치환, 대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해당 특허의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 활용됨.
비침해 판단과 회피설계 방안은 판단 방법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 이는 특허권의 청구항을 해석하여 권리범위의 발명을 특정하고 이를 벗어남으로써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발명을 해야 하기 때문임. 최소한 특허청구 범위의 구성요소 중 하나가 누락되거나 혹은 다르게 변경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게 됨. 그러므로 이러한 회피 설계는 권리범위의 해석과 실질적으로 특허발명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구성 등을 달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하므로 객관적으로 특허침해 분석을 할 수 있는 특허 전문가와 제품 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회사 내의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실시자 입장에서는 회피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특허권자의 입장에서는 실시권의 설정이나 자신의 독점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회피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① 회피 설계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출원시에 보통 출원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총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가급적 넓게, 실시 예를 다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청구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진보성 등에 의해서 거절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종속항을 이용한 추후 보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되므로 독립항은 기재를 넓게 하여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고 종속항으로 권리범위를 좁혀 회피 설계를 방지할 수 있음.
②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된 유사한 발명들 및 개량 발명을 지속적으로 출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는 개량 발명이 기존의 특허권의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특허를 받는다면 선행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실시할 수 없게 되어 Cross Licence를 로 허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함.
③ 또 다른 방법은 주요 기술을 특허를 받지 않고 노하우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음. 특허로 공개하여 독점권은 보장받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 회피 설계 자체를 차단하는 것임. 그러나 타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오히려 특허로 등록받아 버린다면 자신의 발명이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특허권의 목적이 발명의 공개를 대가로 권리자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부여해 주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회피 설계 또는 개량 발명은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회피설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 특허제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반대로 회피 설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이 역시 특허법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라이선스는 지식 재산권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략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지식 재산권의 소유자가 타인 또는 타 법인에게 합의된 조건 또는 계약에 따라 지식 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임. 라이선스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특정인의 배타적 실시만 인정하는 전용실시권과 복수인의 사용을 허가하는 통상실시권이 있음.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자유에 따라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때에 따라서 강제 실시권이나 법정 실시권이 발생할 수 있음.
①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이 정당하고 충분하게 실시되어 자신에게 로열티 등으로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표권의 경우는 실시권자의 사용으로 상표권자의 명성,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시권자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것도 필요함.
또한 인도 지식재산권법 및 과세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i) 실시권자의 해당기 술과 관련한 기술력
(ii) 실시권자의 재무구조 및 로열티 지불 능력
(iii) 실시권자 국가의 지식 재산권 제도
(iv) 자신 특허권의 유효성 및 등록 여부
(v) 실시권자 국가의 투자환경 및 과세 제도
(vi) 실시권자와 제3자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여부
(vii) 실시권자의 정당한 실시 여부 감시
(viii) 특허권 침해 시 대응 여부
(ix) 로열티의 조정
② 실시권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실시권자는 특허권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써 해당 특허권,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완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실시가 어려운 특허는 실시권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역시 중요함. 또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전기 통신 분야 특허의 경우는 기술의 수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특허권자가 보유한 해당 기술의 수준 및 진보성
(ii)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의 완성도
(iii) 해당 기술의 개발 비용 및 기간
(iv) 해당 기술의 가치 평가
(v) 해당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수명
(vi)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및 소유권 형태
(vii) 해당 기술 분야에서 실시권자 자체의 기술 개발 현황
③ 라이선스 계약 후 주의 사항
라이선스가 허여된 후에도 라이선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것 역시 자신의 지속적인 실시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며 아래의 사항들은 이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임
(i) 계약서 정본의 보관
(ii) 신고 수리 통지
(iii) 사내 관계 부서의 계약 내용 주지 철저
(iv) 대가의 수납과 지출 관리
(v) 수납과 지출 대가의 세금 관리
(vi) 계약 대상 특허관리
(vii) 부작용 정보의 상호 통보
(viii) 계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 해결
(ix) 계약 개정
2018년 11월 6일, 인도 델리 최고법원(The high court of Delhi)은 인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Darveys社에게 동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상품 전부에 대해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하라고 명령함
|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게 위조상품 검사 명령 사건 | |
|---|---|
| 사건배경 |
⦁ 루이비통社는 Darveys.com에서 판매되는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Darveys社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Darveys社는 section 79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개인 면책조항(safe harbour to intermediaries)’를 근 거로 항변하였음 ⦁ 동 Sec. 79는 인터넷 중개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상에서 제3의 사용자가 행한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에 대해 동 인터넷 중개인은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 판결요지 |
⦁ 2018년 11월 2일,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의 정책을 살펴보면 동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Darveys社가 ‘완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Darveys社는 중개인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보았음 ⦁ 델리 최고법원은 Darveys社가 판매자를 지정하고, 판매자를 동 판매사이트 상에서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단순한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Darveys社를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론을 근거로 델리 최고법원은 다음의 명령을 내렸음 ⦁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에 루이비통 제품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루이비통 제품에 관하여는 위조상품 여부를 검사해야 함 ⦁ Darveys社는 모든 루이비통 판매자로부터 판매되는 제품이 정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 루이비통 판매자가 인도 내에 있는 경우,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를 특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함 ⦁ 판매자가 인도 외에 있는 경우, Darveys社는 루이비통社로 부터 판매 동의를 받아야 함 ⦁ Darveys社가 루이비통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Darveys社는 동 판매자를 특정하고 해당 메타 태그를 삭제해야 하며, 해당 판매자가 판매 상품이 정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루이비통社에게 고지해야 함 |
2019년 3월 26일, 인도 봄베이 고등법원(Bombay High Court)은 금속 파이프 상표와 제품을 위조한 피고들에게 5,000만 루피(한화 약 8억 2천 7백만 원)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 피고 Kishor D Jain과 Anr는 인도 현지 시장에서 브랜드가 없는 금속 파이프에 일본 금속기업인 Nippon Steel & Sumitomo Metal社의 상표를 부착하고 도금을 위조하여 판매함 또한 피고들은 위조 제품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판매한 위조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어 석유공장 파이프로 사용되었음 법정에서 원고는 석유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문 배관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위조행위로 인하여 자사의 세계적인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사실상 국가의 평판에도 불명예를 가져왔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무겁고 전례 없는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봄베이 고등법원은 다양한 다른 위조행위와 유사한 사기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5,000만 루피의 손해배상을 판결함 인도의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봄베이 고등법원이 상표 위조와 관련하여 이번 판결에서와 같은 무거운 손해배상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유명상표를 위조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려는 행위에 대한 억제제가 될 것이라고 표명함
• 2022년 7월 26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원고 영국 제과 브랜드 Cadbury와 피고 인도 기업 Neeraj Food 제품 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Cadbury의 승소 판결을 내림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피고는 원고의 유명 초콜릿 제품인 ‘Cadbury Gems’와 매우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고 있음
• 피고는 ‘James Bond’라는 컨셉으로 자사의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는데, 해당 표현은 원고가 이전 광고 캠페인에서 사용한 ‘Gems Bond’ 캐릭터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함
• 피고는 소비자의 혼동(confuse)을 일으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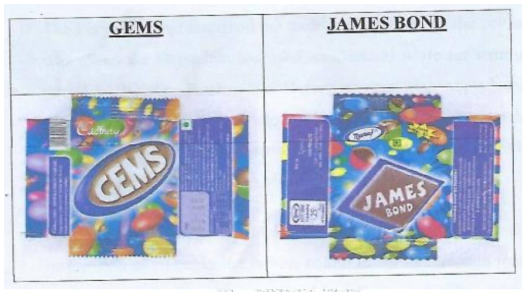
• 델리 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만 유로(한화 약 2,716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함
• 판결에서 프라티바 M 싱(Prathiba M Singh) 판사는 상표권 침해 판단은 ‘혼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even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s sufficient) 절대적인 혼란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음
• 동 판결은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혼동 가능성의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인도에서 상표권자가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인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0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온라인상의 지식 재산권 보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인도인들은 토종 기업인 Flipkart, 미국 Amazon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Flipkart는 지식 재산 권리 침해에 대해 이용자 정책 위반사항 신고의 일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Amazon은 권리침해신고 자체 프로세스를 보유함
| 구분 | 내용 |
|---|---|
| Flipkart |
• 이용자 약관에 지식재산정책 보유 • 이용자ㆍ판매자 정책 위반사항 신고 제도 보유 (해당 메일로 권리 침해 신고 가능) |
| Amazon |
• 판매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 권리자에 대한 지식재산정책 보유 (권리침해신고 프로세스 보유) |
플립카트는 인도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2007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 전자기기, 패션, 가정용 소비재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하며 성장
- 가입자 수는 2022년 기준 4억 5,000만 명이며, 온라인 의료서비스, 여행 예약,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음
- 월마트가 2018년 플립카트의 지분 77%를 160억 달러에 인수해 계열사로 운영 중이며, 2021년 인도 여행 예약 사이트 Cleartrip을 인수함. 2023년 내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플립카트가 미국계 아마존을 제치고 인도 이커머스 플랫폼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재유행과 지속적인 폐쇄 조치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UPI(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급부상 등이 꼽힘
- 80여 개 카테고리에 8,0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플립카트는 IP 보호에 관한 방침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저작권 및 상표("IP")를 포함한 모든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움. IP 침해 혐의에 대한 명확한 통지에 신속하게 대응함
- 플립카트의 IP 정책 자세히 보기 :https://www.flipkart.com/pages/infringement-policy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매자 또는 상품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플립카트 침해 확인 프로세스’를 마련함
당사가 IP 침해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은 경우, 그러한 통지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는 침해 활동의 대상이라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한 제거 또는 액세스 비활성화가 포함됨.
IP 침해 신고하는 방법
- 판매자가 IP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 또는 승인된 대리인이 infringement@flipkart.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신고할 수 있음
⦁ 침해된 저작물/상표의 식별 또는 설명
⦁ 기본 정보(신고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적절한 세부 사항과 함께 앱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식별 또는 설명이 있어야 함. 침해 제품의 제품 ID(저작권 침해의 경우). 정확한 제품 ID를 지정하지 않은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불만이 제기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귀하의 진술
⦁ 통지한 정보가 정확하고 귀하가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이거나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귀하의 진술
⦁ 브랜드 이름(상표권 침해의 경우)
⦁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내용(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또는 상표권 증명서를 첨부파일로 제공)
IP 침해 신고 후 플립카트의 대응
- 플립카트는 이메일 신고서를 받고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침해 콘텐츠 게재를 신속하게 중지 또는 중지하도록 통보, 침해 츠의 웹페이지를 비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할 수 있음
- 또한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리고 저작권 침해 통지 사본을 제공함
아마존 인도는 미국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의 인도 현지 법인이며, 2013년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해 2위로 인도 토종 기업인 플립카트와 양강 구도를 형성함
- 아마존은 1994년 미국에서 설립돼 다양한 소비재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는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인도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등록 절차를 거쳐 셀러(Seller) 등록이 가능함 아마존은 인도 법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
-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물류 시설을 확충하고 프라임 멤버십 제도를 운영
-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통해 인도 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음
- 현지 마트 키라나(Kirana)와 협력해 배송, 물류 관리가 가능한 지역의 유통망을 확보
아마존은 상표ㆍ디자인ㆍ특허ㆍ저작권에 대해 진출해 있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을 따르고 있음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www.amazon.com/gp/help/customer/display.html?nodeId=G577MV72HLUW97KC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리포트 및 제거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https://www.amazon.in/report/infringement/signin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모조품이 인도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amazon.com/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
② IP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 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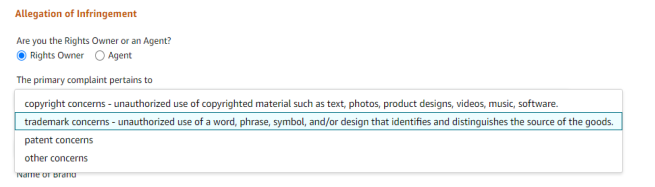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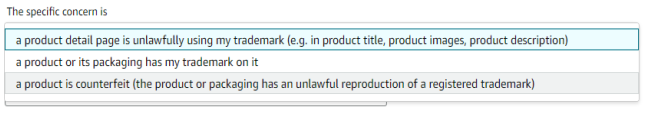
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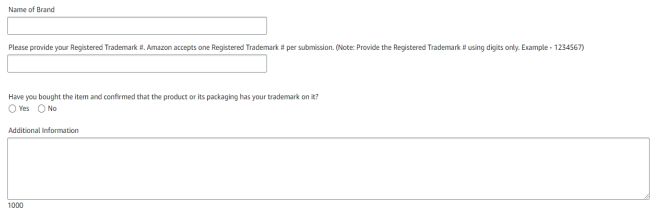
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 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 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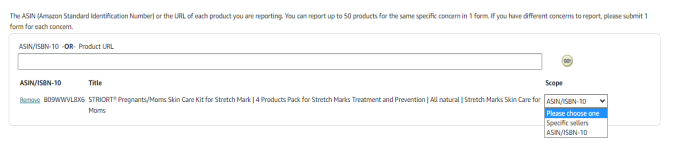
(※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침해 상품이 아님)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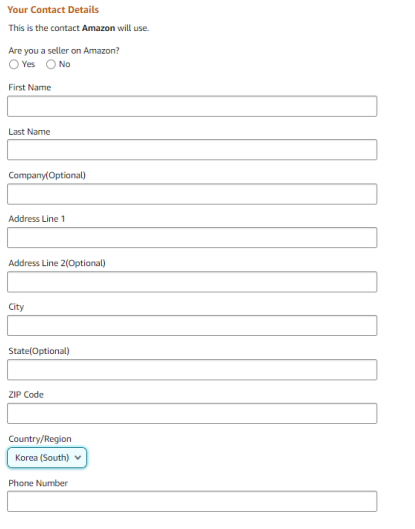
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①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짐
- 혜택 중에 하나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 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 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RAV)’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음
-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임
②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 아마존의 IP(지식 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 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 이는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요건으로 ‘등록된 상표’를 요구하던 시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해진 아마존 IP Accelerator 로펌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③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 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툴
-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 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음
④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 아마존은 상표 보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용(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 특허 중립 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하 UPNE)’ 또한 운영 중임
- 아마존에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리스팅을 발견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하면 아마존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 본 프로그램(UPNE) 참여 여부를 3주 이내에 결정하게 됨
- 판매자가 UPNE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침해 의심 리스팅은 바로 삭제됨
- 판매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허권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 4000달러의 참여 비용을 지급하며, 아마존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신속하게(보통 3~4개월 이내)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4000달러의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비용을 돌려받고 리스팅도 유지됨
- 현재는 ‘Invitation Only’로 아마존이 선정한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음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
|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
|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
|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
|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
|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 하는가?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
|
| 7 |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 |
| 8 | 특허유지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 |
|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
|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센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
| 11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특허 |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남아공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
|
| 2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
||
| 상표 | 1 |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검색사이트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
|
| 2 | 상표는 ‘선의의 사용의도(Bona fide Intent to Use)’가 있는 상표인가? | ||
| 3 | 1개의 상표출원당 1개의 류만을 지정하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영업 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
| 2 |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 비밀 관련 제재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
|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
|
|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
|
|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
|
|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
|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 |
|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 |
|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 |
| 2 | (기술제공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
| 3 |
(기술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함 |
|
| 4 |
(기술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
| 5 | (개량기술) 기술공급자의 개량기술과 기술도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방법을 정하였는가? | |
|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 |
| 7 |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국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
| 2 |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
| 3 |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
| 4 |
• 해외 전시회 참가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
| 5 |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리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IP-DESK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IP-DESK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https://www.kotra.or.kr/kp/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DD0201 |
|
| 6 |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 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
|
| 7 |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
| 8 |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형태 및 공지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ex.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한 국제박람회’로 제한되어 있음)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
| 2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
| 3 | 브랜드 레지스트리(아마존)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
|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 |
|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
| 6 | 신고시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 |
|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
|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
| 3 |
특허 침해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
| 4 |
침해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
|
|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
|
|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7 |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
2019년 1월 4일, 인도 정부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특허 의약품에 적용하고 있던 가격 상한제를 해제하여 신약 출시 후 5년 동안 가격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함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 인도는 자국에서 연구·개발되었으며 동시에 자국에서 생산된 신약만 가격 상한제에서 제외시킴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은 ‘고아약(orhpan drug)’1)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환자 수가 적고 개발하기 어려워 이익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인도의 신약 가격 상한제로 인하여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에 소극적이어서, 그동안 인도의 희귀질환자는 약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야 했음
동 조치로 인해, 인도에서 특허를 허여 받고 인도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된 희귀질환 약의 경우에도 출시 후 첫 5년 동안은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동 조치에 대해 인도에서 희귀질환 약의 R&D가 활성화되어 희귀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가격규제 제거로 약 값이 상승하여 환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2019년 2월 7일, 인도 제약 연합(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 IPA)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인도를 무역 관련 ‘감시 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함
2018년 4월 27일, USTR은 무역과 관련하여 글로벌 지식 재산 보호 및 집행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인 ‘2018 스페셜 301(Special 301)’을 발표함
USTR은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무역 관련 장애와 관련하여 세계 100개 이상의 무역대상국을 검토하여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및 ‘감시 대상국(Watch List)’ 등을 지정하고, 이를 무역 관련 협상에 활용하고 있음
동 보고서에서 인도는 특허를 허여 받기 위해 지나치게 긴 심사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으며, 이 외에도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 집행 등과 관련하여 과거 수년 동안 미국의 지식 재산권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이슈들이 존재하여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됨
IPA는 ‘2018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이후 USTR에 지적한 지나치게 긴 심사처리 기간에 대해서 인도 특허청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으므로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인도 특허청은 인력을 증가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심사 대기 중인 특허의 건수가 2017년 3월 204,177건에서 2018년 12월 127,881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힘
또한 인도 특허청은 현재 약 한 달 안에 상표 출원의 심사를 처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출원 후 1년 이내에 등록이 완료된다고 설명함
2023년 5월 16일, 유럽연합(EU)과 인도는 벨기에 수도인 브뤼쉘에서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의 첫 번째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 TTC는 양측 간 무역 및 디지털 기술 정책 협력 등을 위한 협상 채널을 의미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임.
EU와 인도 간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양자 및 고성능 컴퓨팅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여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고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인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5G, 통신 및 사물 인터넷 표준화에 참여할 것이며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안전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솔루션 장려 예정임
시장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글로벌 및 다자간 무역 문제를 다룰 것이며, 탄소 국경 조치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EU는 2050년까지, 인도는 2070년까지 기후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할 계획함. 구체적으로 양국은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폐수 관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할 예정임.
가. 2023년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가 유럽연합(EU), 대만 등에 수출한 IT 제품 분야 중 일부에 대하여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음.
인도는 글로벌 제조업체의 인도 투자를 장려하고 인도의 수입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통신 제품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20%)를 부과하기 시작하엿고, 인도는 1997년 3월 25일에 IT 제품의 양허에 동의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2)에 가입하였으나, IT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인상을 감행하고 있음.
EU는 2019년 4월 인도에 WTO 협의를 요청하였고, 인도는 2020년 2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며 EU 외에도 브라질,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제3자 제소서를 제출한 바 있음.
나. 위 판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WTO 패널은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제품(스위치, 라우터, 기지국, 안테나 등)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인도의 결정이 EU,일본, 대만과의 분쟁에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혔고, 인도는 “이번 분쟁에서 언급된 여러 제품은 ITA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예시로 1997년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함.
WTO의 패널에 따르면 “인도가 특정 상품에 대해 당초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조건 무관세여야 할 상품에 대해 관세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함.
2023년 4월 18일, 인도는 일부 IT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세계무역규칙을 위반하였다는 WTO 패널의 판정에 대하여 항소할 계획임을 밝힘.
가. 2023년 3월 10일, 미국 상무부(DOC)는 인도 뉴델리에서 미국-인도 반도체 공급망(Semiconductor Supply Chain)과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성명서를 발표함.
2022년 8월 9일, 미국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함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제조 및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함.
나. 위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3월 10일,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장관과 공동으로 ‘미국-인도 통상 대화(US-India Commercial Dialogue)’를 주최함.
동 대화에서 DOC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및 과학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 상공부와 반도체 및 전자 공급망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함.
또한 미국과 인도가 반도체 분야에서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함에 따라 이번 MOU는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과 다각화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힘.
DOC는 향후 인도 상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MOU에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키고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의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세분화하며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정에 있어 상업적 기회, 연구 개발, 인재 및 기술 개발 등 상호 우선순위를 조정할 예정임.
2023년 3월 14일 DOC는 미국-인도 CEO 포럼 회의를 추진하여 양국의 상업 관계 강화 방안과 더불어 ① 공급망 복원력, ② 기후 및 청정 기술 협력 강화, ③ 포괄적인 디지털 무역의 발전, ④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의 경제 회복 등 4가지 우선순위 영역에 대해 논의함.
| [표 21]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 |||||
|---|---|---|---|---|---|
| 종류 | 내용 |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
||||
|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
||||
|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
||||
-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IP RIDGE 바로가기 : https://ipridge.kpaa.or.kr/
| [표 22] IP RIDGE가 제공하는 현지 대리인 정보 | |||||
|---|---|---|---|---|---|
| 번호 | 로펌 | 홈페이지 | |||
| 1 | K&S Partners | www.knspartners.com | gurgaon@knspartners.com | ||
| 2 | Archer & Angel | archerangel.com | info@archerangel.com | ||
| 3 | Chadha & Chadha | www.candcip.com | info@candcip.in | ||
| 4 | D.P Ahuja & Co. | www.dpahuja.com | patents@dpahuja.com | ||
| 5 | De Penning & De Penning | www.depenning.com | contactus@depenning.com | ||
| 6 | RAHUL CHAUDHRY & PARTNERS | rahulchaudhry.com | mail@rahulchaudhry.com | ||
| 7 | Remfry & Sagar | www.remfry.com | remfry-sagar@remfry.com | ||
| 8 | Subramaniam & Associates | www.ip-sna.com | sna@sna-ip.com | ||
| 9 | Kan & Krishme | www.kankrishme.com | knk@kankrishme.com | ||
| 10 | Khaitan & Co | www.khaitanco.com | mumbai@khaitanco.com | ||
| 11 | K & S Partners | www.knspartners.com | gurgaon@knspartners.com | ||
| 12 | Remfry & Sagar | www.remfry.com | remfry-sagar@remfry.com | ||
| 13 |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 www.krishnaandsaurastri.com | info@krishnaandsaurastri.com | ||
| 14 | R K DEWAN & CO. | www.rkdewan.com | rkd@rkdewan.com | ||
| 15 | Saikrishna & Associates | www.saikrishnaassociates.com | info@saikrishnaassociates.com | ||
| 16 | L.S. Davar & Co. | lsdavar.com | mailinfo@lsdavar.in | ||
| 17 | InvnTree IP Services | www.invntree.com | contact@invntree.com | ||
| 18 | Obhan & Associates | www.obhanandassociates.com | email@obhans.com | ||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
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특허의 검색이 가능
(2) 구글 사이트 (http://www.google.com/advanced_patent_search)를 이용한 검색
- 구글 검색창에 “고급 특허검색”을 입력하는 경우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등에 제출된 특허 데이터를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 가능
(1)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
(www.kipris.or.kr)
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의 메인화면으로 해외상표의 검색이 가능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 사이트(USPTO)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 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임.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임.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함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함. 즉 국제상표 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임.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함.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임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함.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 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 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